목차
Ⅰ. 서론
Ⅱ. 착상 - 각 말터(loci)들의 분류
Ⅲ. 인위적 순서로서의 배열
Ⅳ. 표현 - 사소설과 반복, 점층의 문체론적 전략
Ⅴ. 결론
Ⅱ. 착상 - 각 말터(loci)들의 분류
Ⅲ. 인위적 순서로서의 배열
Ⅳ. 표현 - 사소설과 반복, 점층의 문체론적 전략
Ⅴ. 결론
본문내용
(내러티브)”라고 정의하면서 “독자가 해당 텍스트의 작중 인물과 화자 그리고 작자의 동일성을 기대하고 믿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 텍스트를 사소설로 만든다. 사소설은 일종의 읽기 모드로 정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그것은 사소설이 단일한 목소리로 작자의 ‘자기’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거기에 씌어진 말은 ‘투명’하다고 상정하고 있는 읽기 모드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텍스트라도 이 모드로 읽힌다면 사소설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자세한 내용은 스즈키 토미, 『이야기된 자기』, 생각의 나무, 2004, 22~31면을 참조).
이라는 단적인 근거로 작동된다. 작가가 S라는 인물, 즉 자기 자신을 중심인물로 설정하고 있다는 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추측해볼 수 있다. 그것은 ‘나’의 체험을 직접 서술함으로써 사실성은 자연스럽게 획득될 수 있고 독자로 하여금 설득력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바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작가는 사소설이라는 장르적 특성을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의 희작」은 자기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의 형태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S라는 인물을 통해 작가관의 통찰에까지 의미를 확장시킬 가능성도 있다.
한편 사소설이라는 거시적 문체와는 별개로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문채의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자. H. F. Plett은 텍스트의 단위를 분석하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텍스트의 단위들은 1. 서로 자리를 바꾸거나, 2. 거듭되거나, 3. 늘려지거나 줄여지거나, 4. “방향을 잡거나”, 5. 갈음되거나 한다. 이에 따라 1. 자리, 2. 거듭, 3. 분량, 4. 호소, 5. 갈음 등의 범주가 설정된다. 규범 문체론은 1에서 4까지의 무리들을 “무늬(Figuren)”라 부르고, 5의 무리는 비유(Tropen)라 한다. H. F. Plett, 앞의 책, 71면.
본고에서는 이러한 5가지 분석 단위 중에서 「신의 희작」에서 드러나는 거듭무늬의 일부만을 살펴보는 것으로 한다. 다음은 「신의 희작」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문구를 추출, 나열한 것이다.
“나는 부모두 형제두 집두 없는 사람이다.”(210)
“나는 부모도 형제도 집도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다.”(223)
“나는 부모도 형제도, 집도 돈도, 고향도 조국도 아무것도 없는 놈이다.”(232)
상기한 S의 항변을 통해서 점층적으로 자기부정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정의 논리는 ‘배열’에서 다룬 여로의 과정 속에서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한국-만주-일본-한국’의 여로를 거치면서 S는 점점 더 ‘불우한’ 상황으로 나아간다. 작가는 바로 그러한 상황의 논거들을 마련함과 동시에 자기 부정을 점층적으로 반복하는 문채를 구사함으로써 S라는 인물의 상황을 핍진하게 그려내고 있다고 본다.
Ⅴ. 결론
지금까지 「신의 희작」을 중심으로 수사학적 분석을 개괄적으로 시도해보았다. 착상에 있어서는 다소 도식적일 수 있으나, 5가지 말터들을 분석함으로써 작품 전체에 기여하는 논리적 근거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또한 「신의 희작」이 액자형, 여로형 소설이라는 점을 감안, 기본적으로 수사학이 갖는 배열의 4분 구조-도입, 진술, 논증, 종결-을 그 틀에 맞게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표현에서는 거시 문체론적 분류에 의해 사소설을 검토하고, “거듭무늬”라는 문체 범주에 한해서 작품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을 시도해봤다.
본고에서 시도한 수사학적 분석을 표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도입부
진술부 논증부
종결부
작가로서의 S를 설명
S 자신의 외모에 대한‘기형성’묘사
S의 유년기~625 전쟁까지 삶의 여로 회상(여로형)
자기부정의 말터들 나열
자기부정의 점층화
S의 작품세계에 대한 정리 및 전망
액자 밖
액자 안
액자 밖
표를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관심 유도 차원에서 S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는 도입부와 S의 작품세계가 왜 기형적이고 불구적인지에 대한 대답을 정리한 것이 종결부라 할 수 있는데, 도입부와 종결부는 시간상으로 S의 현재에 해당한다. 즉, 회상주체로서의 S가 등장하는 셈이다. 작가는 기형적이고 불구적인 작품세계에 대한 논거들을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에 배치시켰다. 바로 그 부분은 진술부 논증부라고 할 수 있고, 그 부분은 소설의 ‘액자 안’에 들어가 있다. S는 유년기에서 6 25 전쟁까지 한국-만주-일본-한국의 여로를 거치면서 자기 부정이 점층화되고 있는데, 작가는 이러한 S의 모습을 통해서 본인의 작품세계를 정리함으로써 소설은 끝이 난다.
1950년대 한국소설에서는 보통 유랑하는 인물형을 그려냄으로써 해방과 전후라는 민족사적 현실을 그려낸 작품이 두드러졌다. 전통수사학의 입장에서는 설득의 구성요소를 알리기(docere), 즐겁게 하기(delecrare), 감동시키기(movere)로 설정하고 있는데, 1950년대 민족적 상황을 그려냄으로써 리얼리즘적 전통을 고수해왔다는 측면에서 당대 소설은 ‘즐겁게 하기’보다는 ‘알리기’나 ‘감동시키기’의 측면에 많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판단된다.
1950년대 일련의 한국소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측면을 「신의 희작」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다. 「신의 희작」이 갖고 있는 효과목표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이 소설의 진술부 논증부에서 그리고 있는 S의 비극적이고 ‘난센스’인 삶은 S의 작품세계가 왜 기형적이고 불구적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논거들로 작동한다. 결국 작가가 노리고 있는 ‘효과목표’라 함은 자신의 작품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준다는 측면에서 ‘알리기’를, 또 작가 자신의 삶 자체에서 격정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감동시키기’를 각각 성취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오형엽, 「시학과 수사학」, 『어문논집』(제49집), 민족어문학회, 2004
박성창, 『수사학과 현대 프랑스 문화이론』, 서울대출판부, 2002
스즈키 토미, 『이야기된 자기』, 생각의 나무, 2004, 22~31면을 참조)
『수사학』, 김현 편, 문학과 지성사, 2005
손창섭, 『손창섭 단편전집 2』, 가람기획, 2005
B. Sowinski, 『문체론』, 이덕호 역, 한신문화사, 2006
이라는 단적인 근거로 작동된다. 작가가 S라는 인물, 즉 자기 자신을 중심인물로 설정하고 있다는 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추측해볼 수 있다. 그것은 ‘나’의 체험을 직접 서술함으로써 사실성은 자연스럽게 획득될 수 있고 독자로 하여금 설득력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바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작가는 사소설이라는 장르적 특성을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의 희작」은 자기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의 형태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S라는 인물을 통해 작가관의 통찰에까지 의미를 확장시킬 가능성도 있다.
한편 사소설이라는 거시적 문체와는 별개로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문채의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자. H. F. Plett은 텍스트의 단위를 분석하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텍스트의 단위들은 1. 서로 자리를 바꾸거나, 2. 거듭되거나, 3. 늘려지거나 줄여지거나, 4. “방향을 잡거나”, 5. 갈음되거나 한다. 이에 따라 1. 자리, 2. 거듭, 3. 분량, 4. 호소, 5. 갈음 등의 범주가 설정된다. 규범 문체론은 1에서 4까지의 무리들을 “무늬(Figuren)”라 부르고, 5의 무리는 비유(Tropen)라 한다. H. F. Plett, 앞의 책, 71면.
본고에서는 이러한 5가지 분석 단위 중에서 「신의 희작」에서 드러나는 거듭무늬의 일부만을 살펴보는 것으로 한다. 다음은 「신의 희작」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문구를 추출, 나열한 것이다.
“나는 부모두 형제두 집두 없는 사람이다.”(210)
“나는 부모도 형제도 집도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다.”(223)
“나는 부모도 형제도, 집도 돈도, 고향도 조국도 아무것도 없는 놈이다.”(232)
상기한 S의 항변을 통해서 점층적으로 자기부정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정의 논리는 ‘배열’에서 다룬 여로의 과정 속에서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한국-만주-일본-한국’의 여로를 거치면서 S는 점점 더 ‘불우한’ 상황으로 나아간다. 작가는 바로 그러한 상황의 논거들을 마련함과 동시에 자기 부정을 점층적으로 반복하는 문채를 구사함으로써 S라는 인물의 상황을 핍진하게 그려내고 있다고 본다.
Ⅴ. 결론
지금까지 「신의 희작」을 중심으로 수사학적 분석을 개괄적으로 시도해보았다. 착상에 있어서는 다소 도식적일 수 있으나, 5가지 말터들을 분석함으로써 작품 전체에 기여하는 논리적 근거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또한 「신의 희작」이 액자형, 여로형 소설이라는 점을 감안, 기본적으로 수사학이 갖는 배열의 4분 구조-도입, 진술, 논증, 종결-을 그 틀에 맞게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표현에서는 거시 문체론적 분류에 의해 사소설을 검토하고, “거듭무늬”라는 문체 범주에 한해서 작품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을 시도해봤다.
본고에서 시도한 수사학적 분석을 표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도입부
진술부 논증부
종결부
작가로서의 S를 설명
S 자신의 외모에 대한‘기형성’묘사
S의 유년기~625 전쟁까지 삶의 여로 회상(여로형)
자기부정의 말터들 나열
자기부정의 점층화
S의 작품세계에 대한 정리 및 전망
액자 밖
액자 안
액자 밖
표를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관심 유도 차원에서 S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는 도입부와 S의 작품세계가 왜 기형적이고 불구적인지에 대한 대답을 정리한 것이 종결부라 할 수 있는데, 도입부와 종결부는 시간상으로 S의 현재에 해당한다. 즉, 회상주체로서의 S가 등장하는 셈이다. 작가는 기형적이고 불구적인 작품세계에 대한 논거들을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에 배치시켰다. 바로 그 부분은 진술부 논증부라고 할 수 있고, 그 부분은 소설의 ‘액자 안’에 들어가 있다. S는 유년기에서 6 25 전쟁까지 한국-만주-일본-한국의 여로를 거치면서 자기 부정이 점층화되고 있는데, 작가는 이러한 S의 모습을 통해서 본인의 작품세계를 정리함으로써 소설은 끝이 난다.
1950년대 한국소설에서는 보통 유랑하는 인물형을 그려냄으로써 해방과 전후라는 민족사적 현실을 그려낸 작품이 두드러졌다. 전통수사학의 입장에서는 설득의 구성요소를 알리기(docere), 즐겁게 하기(delecrare), 감동시키기(movere)로 설정하고 있는데, 1950년대 민족적 상황을 그려냄으로써 리얼리즘적 전통을 고수해왔다는 측면에서 당대 소설은 ‘즐겁게 하기’보다는 ‘알리기’나 ‘감동시키기’의 측면에 많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판단된다.
1950년대 일련의 한국소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측면을 「신의 희작」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다. 「신의 희작」이 갖고 있는 효과목표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이 소설의 진술부 논증부에서 그리고 있는 S의 비극적이고 ‘난센스’인 삶은 S의 작품세계가 왜 기형적이고 불구적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논거들로 작동한다. 결국 작가가 노리고 있는 ‘효과목표’라 함은 자신의 작품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준다는 측면에서 ‘알리기’를, 또 작가 자신의 삶 자체에서 격정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감동시키기’를 각각 성취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오형엽, 「시학과 수사학」, 『어문논집』(제49집), 민족어문학회, 2004
박성창, 『수사학과 현대 프랑스 문화이론』, 서울대출판부, 2002
스즈키 토미, 『이야기된 자기』, 생각의 나무, 2004, 22~31면을 참조)
『수사학』, 김현 편, 문학과 지성사, 2005
손창섭, 『손창섭 단편전집 2』, 가람기획, 2005
B. Sowinski, 『문체론』, 이덕호 역, 한신문화사, 2006
추천자료
 [교육과정및평가]형식도야이론을 마음의 정의와 마음의 개발이라는 두 측면으로 나누어 비판...
[교육과정및평가]형식도야이론을 마음의 정의와 마음의 개발이라는 두 측면으로 나누어 비판... 이기호의 「최순덕 성령충만기」분석과 수업 지도 방법 연구
이기호의 「최순덕 성령충만기」분석과 수업 지도 방법 연구 [공관복음 양식 비평][공관복음 기독론적 칭호][공관복음 미드리쉬 비평][공관복음 생명에 대...
[공관복음 양식 비평][공관복음 기독론적 칭호][공관복음 미드리쉬 비평][공관복음 생명에 대...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와 교육사상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와 교육사상 [르네상스] 르네상스의 사상
[르네상스] 르네상스의 사상 [현대시론 공통] 박남수와 청록파시인 중 일인을 선택하여 그들 두 시인의 시세계의 특성을 ...
[현대시론 공통] 박남수와 청록파시인 중 일인을 선택하여 그들 두 시인의 시세계의 특성을 ... 2014년 동계계절시험 동서양고전의이해 시험범위 핵심체크
2014년 동계계절시험 동서양고전의이해 시험범위 핵심체크 교과서를 만든 철학자들 우수독후감
교과서를 만든 철학자들 우수독후감 2015년 동계계절시험 동서양고전의이해 시험범위 핵심체크
2015년 동계계절시험 동서양고전의이해 시험범위 핵심체크 은유의 세계
은유의 세계 [마가복음과 공관서] 마가복음에서 예수와 갈등 관계의 의미
[마가복음과 공관서] 마가복음에서 예수와 갈등 관계의 의미 2018년 1학기 동서양고전의이해 기말시험 핵심체크
2018년 1학기 동서양고전의이해 기말시험 핵심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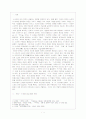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