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가져다 주지 않는 경우에도 내가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라는 요구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도덕’이라는 말의 쓰임새를 생각해보아도, 그것은 원래 ‘자기 이익’이나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태도가 아니라, 비록 자기 희생이 따르더라도 타인들이나 보다 큰 어떤 목적을 위해 헌신하는 태도에 대해 쓰여졌던 말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도덕 형이상학의 정초 작업을 상식 도덕의 검토로부터 시작했던 칸트 또한 도덕의 근본 원리를 세움에 있어 자기애나 행복주의 원리를 멀리했던 것이다. 만일 ‘도덕’의 본질이 이렇게 ‘이익’이나 ‘행복’과 무관한 것이라면, ‘우리는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할 도덕과 무관한 이유’를 대라는 요구인 셈이다. 이러한 요구는 물론 충족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른바 ‘자연주의적 오류’의 벽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도덕적 가치나 당위의 근거가 자연(현상) 세계의 사실로부터 도출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 가치를 통찰한 사람에게 있어서 위와 같은 물음은 사실상 사이비 물음(pseudo-question)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물질문명에 물든, 그래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상실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병든 모습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할 도덕과 무관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가치의 왕국을 향해 그냥 한 발 내딛는 것일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 열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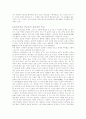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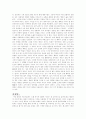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