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는 말
1. 연구 목적 및 선행 연구 검토
Ⅱ. 적막과 독백적 언술
1. 여백의 울림 - 「라산스카」
2. 부재의 질서 - 「돌각담」
3. 침묵과 언어의 경계 - 「라산스카」, 「돌각담」
Ⅲ. 맺는 말
1. 연구 목적 및 선행 연구 검토
Ⅱ. 적막과 독백적 언술
1. 여백의 울림 - 「라산스카」
2. 부재의 질서 - 「돌각담」
3. 침묵과 언어의 경계 - 「라산스카」, 「돌각담」
Ⅲ. 맺는 말
본문내용
세 번째가 비었다는 사실과 접하게 되면서 우리는 돌각담이 다시 무너질 것을 예측하게 되고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이 ⑩ 의 진술은 ⑧ 의 화자의 태도돠 대조되면서 이 시의 비극적인 정서를 환기시키고, ① ~ ⑨ 까지의 모호한 의미는 ⑩ 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의미로 나아가게 된다. 즉 작품에서 돌각담이 쌓이고 무너지는 과정들은 돌각담을 쌓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세 번째가 비어있음으로 인해 번번이 좌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연결되면서, 우리는 화자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또한 우리는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직사각형으로 시각화한 시어의 배열을 통해 빈틈없이 쌓아놓은 돌각담의 무게감을 시각적으로 체험하면서 독서를 진행하다가 돌각담의 세 번째가 비어서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허술함을 발견하는 것이다. 또한 「돌각담」은 독자의 자동화된 지각을 방해하고 작품에 긴장감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낯설게하기’의 효과를 내기도 한다.
이처럼 「돌각담」은 어떤 하나의 의미로 고정하기 어려운 작품이지만 시에서 사용된 다양한 이미지들은 작품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시각을 제공해준다. 그것은 바로 돌각담을 쌓으려고 하지만 ‘세번째’가 비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부조리한 삶의 조건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즉 아무리 쌓으려고 해도 쌓을 수 없는 돌각담을 시인과 세계 사이에 놓인 깊이를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다.
Ⅲ. 맺는 말
김종삼은 형식에 있어서 ‘아름답다’라는 시어를 여러 번 말했는가 하면 시상의 전개에서 앞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의 묘서와 서술로 완만하게 진행시켰으나 뒷부분 즉, 마지막 행에서 인식을 집약해 보이는 주관적 태도를 취하는 독특한 의미 구조를 이루었으며, 시행의 병렬 구조를 통하여 음악적 효과를 살리는 구성상의 특성을 이루었다. 특히 시행과 연에서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뒤에 올 내용을 생략함으로써 여운을 남겼으며, 간결하고 서명한 시어 처리로써 여백에 함축된 내용을 반향시키는 울림의 아름다움을 이룩했다.
또한 「라산스카」와 「돌각담」에서 살펴보았듯이 김종삼의 시는 절제된 정서에서 비롯된 언어와 압축된 빛나는 이미지들을 담고 있는 동시에 음악형식을 이용해 그것에 기초하여 이미지즘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그의 시는 시 전체를 “내용 없는 아름다움”이라는 형식으로 보여주면서 적막의 혹은 절제된 미학을 창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권명옥, 「적막의 미학 : 김종삼의 「북치는 소년」, 「돌각담」, 「라산스카」」, 한국현대 문예비평학회, 한국문예비평연구. 제15집 (2004. 12), 2004.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1993.
권정순, 「김종삼 시의 심미주의적 특성」,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86.
김정배, 「김종삼 시 연구」,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2005.
류순태, 「1950~60년대 김종삼 시의 미의식 연구」
유애숙, 「김종삼 시 연구 : 시와 음악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중앙대 예술대학원, 2005.
이해금, 「김종삼 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2.
이와 같이 ⑩ 의 진술은 ⑧ 의 화자의 태도돠 대조되면서 이 시의 비극적인 정서를 환기시키고, ① ~ ⑨ 까지의 모호한 의미는 ⑩ 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의미로 나아가게 된다. 즉 작품에서 돌각담이 쌓이고 무너지는 과정들은 돌각담을 쌓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세 번째가 비어있음으로 인해 번번이 좌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연결되면서, 우리는 화자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또한 우리는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직사각형으로 시각화한 시어의 배열을 통해 빈틈없이 쌓아놓은 돌각담의 무게감을 시각적으로 체험하면서 독서를 진행하다가 돌각담의 세 번째가 비어서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허술함을 발견하는 것이다. 또한 「돌각담」은 독자의 자동화된 지각을 방해하고 작품에 긴장감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낯설게하기’의 효과를 내기도 한다.
이처럼 「돌각담」은 어떤 하나의 의미로 고정하기 어려운 작품이지만 시에서 사용된 다양한 이미지들은 작품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시각을 제공해준다. 그것은 바로 돌각담을 쌓으려고 하지만 ‘세번째’가 비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부조리한 삶의 조건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즉 아무리 쌓으려고 해도 쌓을 수 없는 돌각담을 시인과 세계 사이에 놓인 깊이를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다.
Ⅲ. 맺는 말
김종삼은 형식에 있어서 ‘아름답다’라는 시어를 여러 번 말했는가 하면 시상의 전개에서 앞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의 묘서와 서술로 완만하게 진행시켰으나 뒷부분 즉, 마지막 행에서 인식을 집약해 보이는 주관적 태도를 취하는 독특한 의미 구조를 이루었으며, 시행의 병렬 구조를 통하여 음악적 효과를 살리는 구성상의 특성을 이루었다. 특히 시행과 연에서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뒤에 올 내용을 생략함으로써 여운을 남겼으며, 간결하고 서명한 시어 처리로써 여백에 함축된 내용을 반향시키는 울림의 아름다움을 이룩했다.
또한 「라산스카」와 「돌각담」에서 살펴보았듯이 김종삼의 시는 절제된 정서에서 비롯된 언어와 압축된 빛나는 이미지들을 담고 있는 동시에 음악형식을 이용해 그것에 기초하여 이미지즘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그의 시는 시 전체를 “내용 없는 아름다움”이라는 형식으로 보여주면서 적막의 혹은 절제된 미학을 창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권명옥, 「적막의 미학 : 김종삼의 「북치는 소년」, 「돌각담」, 「라산스카」」, 한국현대 문예비평학회, 한국문예비평연구. 제15집 (2004. 12), 2004.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1993.
권정순, 「김종삼 시의 심미주의적 특성」,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86.
김정배, 「김종삼 시 연구」,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2005.
류순태, 「1950~60년대 김종삼 시의 미의식 연구」
유애숙, 「김종삼 시 연구 : 시와 음악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중앙대 예술대학원, 2005.
이해금, 「김종삼 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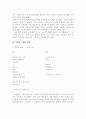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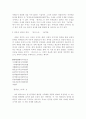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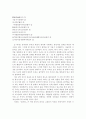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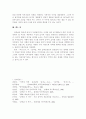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