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3.1 운동의 배경
2. 3.1운동의 전개
3. 3.1운동의 의의
4. 한계
[참고문헌]
2. 3.1운동의 전개
3. 3.1운동의 의의
4.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뿐인즉, 다 바라건대 각자 주의하라(중략)” 전게서,「韓國獨立運動史略」, p57.
고 하였다.
캐나다의 신문기자 메켄지는 그의 저술에서
“ 3.1운동은 시위였지만 폭동은 아니었다. 첫날이래(경찰이 군중을 격분시키기 전까지는) 폭행은 조금도 일어나지 않았다.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일본인들 중에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그들 일본인 상점도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한국 지도자들은 대중에게 경찰이 습격해왔을 때 처형은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전게서, 「韓國의 獨立鬪爭」, 401p
고 말하고 있다.
1905년 12월 무장봉기를 앞두고 일찍이 스탈린 노동자들에게 향하여 “참으로 이기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에 무장 둘째에 무장 셋째 또다시 무장”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민족대표들도 이러한 진리를 파악하여야 했을 것이다. 무저항주의적, 평화주의적 투항주의로 지도되었기 때문에 3.1운동은 일종의 ‘시위행진’에 불과한 비전투적 평화군중의 행렬로 일관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우리 민족 자체의 투쟁으로써 적을 격퇴하려고 결심하지 않고 조선인민의 반일성을 다만 시위로써 보이어 자주적이 아닌 의타적으로 열강의 동정으로써 독립을 해결하려고 계획하였나니 이것으로써 의타적 사대사상과 독자적 투쟁성의 결여가 여실히 폭로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과오이다.
1차 대전을 일본이 승리함에 따라 그들은 군사적 경제적으로 더욱 강화되었으며 또한 1차대전 후의 국제연맹은 제국주의 열강들의 식민지 재분할을 의사일정에 올리고 토론한 만큼 조선민족의 호소는 전연 무시되었나니 이러한 불리한 조건과 이상에 열거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주관적 재과오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 해방투쟁인 3.1운동은 실패에 돌아간 것이다.
당시의 지도자인 33인은 무저항 비폭력을 주장하고 3.1운동의 지도자로서 투옥되기를 자청하였다는 사실은 프랑스혁명 당시의 Danton이 “용감하라! 용감하라! 용감하라!” 하는 비타협적, 결정적 투쟁을 강조한 구호와 비교해 볼 때 아쉬움이 남는다. 박헌영, “3.1운동의 의의와 그 교훈” 김남식심지연 편저 「박헌영 노선비판」서울:세계, 1986 p420-425, passim.
셋째로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나누어 주라”는 토지개혁의 과업이 도무지 제기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인구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문제가 나서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독립’이외 토지개혁의 구호가 하나도 나서지 아니하여 반봉건적 투쟁을 망각하였다. 박헌영, “3.1운동의 의의와 그 교훈” 김남식심지연 편저 「박헌영 노선비판」서울:세계, 1986 p420-425, passim.
추가로 종교인들이 적극적인 항일투쟁 의지를 가지지 않았다. 한용운은 정신적인 준비만 갖추고 있으면 즉각 독립할 수 있다고 보았고, 정춘수나 홍명희 경우에는 심지어 지금은 독립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므로 적어도 즉각적 독립은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에 서 있었다. 이러한 노선의 차이가 결국은 폭력적인 투쟁형태를 채택하느냐 않으냐 시위운동을 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와 연결되었던 것이다.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한겨레 신문후원 3.1운동 70주년 기념논문집 : 3.1민족해방 운동 연구」, 청년사 532-533p.
3.1운동은 명확한 지도부도, 뚜렷한 운동방향도, 합리적인 전략도 부재했다. 지도부가 없었으니 각지의 운동은 일시 발생했다가 손쉽게 진압되었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것 외에는 운동의 구체적 이념이 없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1운동은 독립을 즉각 쟁취하는 목적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3.1운동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성공한 운동이며 특히 당시 이 운동의 초기 조직자의 누구의 예상보다도 훨씬 크게 성공한 독립운동이다. 독립운동을 고양시키고 궁극적으로 독립을 쟁취하는 기초를 닦았기 때문에 더 그러하다. 하지만, 3.1운동을 당시의 즉각적 독립쟁취의 여부를 기준으로 그 결과를 고찰할 때에는 3.1운동은 실패한 운동임에 틀림이 없다.
3.1운동에 참여한 민중 속에는 즉각적 독립의 쟁취를 목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한 민중들도 상당히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3.1운동은 즉각의 독립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제 1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의 일본 제국주의의 역량과 이에 연합한 승전 제국주의 국가들의 역량은 한국 민족이 단독으로 선두에 서서 이를 바로 물리치고 즉각적으로 독립을 쟁취하기에는 벅찬 것이었기 때문이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실패가 분명하지만 3.1운동의 성과와 민족정서에 미친 영향, 이후 세계 여라나라에 미친 영향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다. 발표를 준비하며 수많은 자료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은 3.1운동이 비폭력 운동, 즉 평화적인 운동에 그쳤다는 것이다. 수백만 민중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비폭력으로 대항함으로써 독립을 이루려 했던 것은 너무 이상적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되든 안 되든 수백만이 일어선 이 같은 호기를 폭발적인 힘으로 분출하지 못하고 사그라진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참고문헌]
- 「3.1운동사 연구」김진봉. (서울 : 국학자료원. 2000)
- 「한겨례 신문후원 3.1운동 70주년 기념논문집 : 3.1민족해방 운동연구」 한국역사 연구회 역사문제 연구소 (서울 = 청년사. 1989)
- 「3.1독립운동의 사회사」 신용하. (현암사. 1984)
- 「3.1혁명약사 : 3.1운동 이것이 궁금하다」 김행식. (서울 : 우삼, 2000)
- 「강점기 조선의 정치질서 : 忍從과 저항의 단층 변동」 박종성 (서울 : 인간사랑 1997)
- 「朴憲永論 : 한 조선 혁명가의 좌절과 꿈」 박종성 (서울 : 인간사랑 1992)
- 「한국 독립 운동사」 한국 근대사 연구회 (서울 : 한울 아카데미, 1998)
- 「이야기 독립 운동사 : 지금도 그 함성이」 이현희 (서울 : 청아, 1994)
- 「갑오개혁과 독립협회 운동의 사회사」 신용하 (서울대학교출판부 : 2001)
- 동영상 자료 : 「재암리 3.1운동순국기념관」 http://www.jeam.go.kr ⇒ 시청각실
- 3.1운동 지도 http://blog.naver.com/ssoy115?Redirect=Log&logNo=70004570634
고 하였다.
캐나다의 신문기자 메켄지는 그의 저술에서
“ 3.1운동은 시위였지만 폭동은 아니었다. 첫날이래(경찰이 군중을 격분시키기 전까지는) 폭행은 조금도 일어나지 않았다.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일본인들 중에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그들 일본인 상점도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한국 지도자들은 대중에게 경찰이 습격해왔을 때 처형은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전게서, 「韓國의 獨立鬪爭」, 401p
고 말하고 있다.
1905년 12월 무장봉기를 앞두고 일찍이 스탈린 노동자들에게 향하여 “참으로 이기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에 무장 둘째에 무장 셋째 또다시 무장”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민족대표들도 이러한 진리를 파악하여야 했을 것이다. 무저항주의적, 평화주의적 투항주의로 지도되었기 때문에 3.1운동은 일종의 ‘시위행진’에 불과한 비전투적 평화군중의 행렬로 일관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우리 민족 자체의 투쟁으로써 적을 격퇴하려고 결심하지 않고 조선인민의 반일성을 다만 시위로써 보이어 자주적이 아닌 의타적으로 열강의 동정으로써 독립을 해결하려고 계획하였나니 이것으로써 의타적 사대사상과 독자적 투쟁성의 결여가 여실히 폭로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과오이다.
1차 대전을 일본이 승리함에 따라 그들은 군사적 경제적으로 더욱 강화되었으며 또한 1차대전 후의 국제연맹은 제국주의 열강들의 식민지 재분할을 의사일정에 올리고 토론한 만큼 조선민족의 호소는 전연 무시되었나니 이러한 불리한 조건과 이상에 열거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주관적 재과오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 해방투쟁인 3.1운동은 실패에 돌아간 것이다.
당시의 지도자인 33인은 무저항 비폭력을 주장하고 3.1운동의 지도자로서 투옥되기를 자청하였다는 사실은 프랑스혁명 당시의 Danton이 “용감하라! 용감하라! 용감하라!” 하는 비타협적, 결정적 투쟁을 강조한 구호와 비교해 볼 때 아쉬움이 남는다. 박헌영, “3.1운동의 의의와 그 교훈” 김남식심지연 편저 「박헌영 노선비판」서울:세계, 1986 p420-425, passim.
셋째로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나누어 주라”는 토지개혁의 과업이 도무지 제기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인구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문제가 나서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독립’이외 토지개혁의 구호가 하나도 나서지 아니하여 반봉건적 투쟁을 망각하였다. 박헌영, “3.1운동의 의의와 그 교훈” 김남식심지연 편저 「박헌영 노선비판」서울:세계, 1986 p420-425, passim.
추가로 종교인들이 적극적인 항일투쟁 의지를 가지지 않았다. 한용운은 정신적인 준비만 갖추고 있으면 즉각 독립할 수 있다고 보았고, 정춘수나 홍명희 경우에는 심지어 지금은 독립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므로 적어도 즉각적 독립은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에 서 있었다. 이러한 노선의 차이가 결국은 폭력적인 투쟁형태를 채택하느냐 않으냐 시위운동을 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와 연결되었던 것이다.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한겨레 신문후원 3.1운동 70주년 기념논문집 : 3.1민족해방 운동 연구」, 청년사 532-533p.
3.1운동은 명확한 지도부도, 뚜렷한 운동방향도, 합리적인 전략도 부재했다. 지도부가 없었으니 각지의 운동은 일시 발생했다가 손쉽게 진압되었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것 외에는 운동의 구체적 이념이 없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1운동은 독립을 즉각 쟁취하는 목적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3.1운동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성공한 운동이며 특히 당시 이 운동의 초기 조직자의 누구의 예상보다도 훨씬 크게 성공한 독립운동이다. 독립운동을 고양시키고 궁극적으로 독립을 쟁취하는 기초를 닦았기 때문에 더 그러하다. 하지만, 3.1운동을 당시의 즉각적 독립쟁취의 여부를 기준으로 그 결과를 고찰할 때에는 3.1운동은 실패한 운동임에 틀림이 없다.
3.1운동에 참여한 민중 속에는 즉각적 독립의 쟁취를 목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한 민중들도 상당히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3.1운동은 즉각의 독립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제 1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의 일본 제국주의의 역량과 이에 연합한 승전 제국주의 국가들의 역량은 한국 민족이 단독으로 선두에 서서 이를 바로 물리치고 즉각적으로 독립을 쟁취하기에는 벅찬 것이었기 때문이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실패가 분명하지만 3.1운동의 성과와 민족정서에 미친 영향, 이후 세계 여라나라에 미친 영향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다. 발표를 준비하며 수많은 자료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은 3.1운동이 비폭력 운동, 즉 평화적인 운동에 그쳤다는 것이다. 수백만 민중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비폭력으로 대항함으로써 독립을 이루려 했던 것은 너무 이상적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되든 안 되든 수백만이 일어선 이 같은 호기를 폭발적인 힘으로 분출하지 못하고 사그라진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참고문헌]
- 「3.1운동사 연구」김진봉. (서울 : 국학자료원. 2000)
- 「한겨례 신문후원 3.1운동 70주년 기념논문집 : 3.1민족해방 운동연구」 한국역사 연구회 역사문제 연구소 (서울 = 청년사. 1989)
- 「3.1독립운동의 사회사」 신용하. (현암사. 1984)
- 「3.1혁명약사 : 3.1운동 이것이 궁금하다」 김행식. (서울 : 우삼, 2000)
- 「강점기 조선의 정치질서 : 忍從과 저항의 단층 변동」 박종성 (서울 : 인간사랑 1997)
- 「朴憲永論 : 한 조선 혁명가의 좌절과 꿈」 박종성 (서울 : 인간사랑 1992)
- 「한국 독립 운동사」 한국 근대사 연구회 (서울 : 한울 아카데미, 1998)
- 「이야기 독립 운동사 : 지금도 그 함성이」 이현희 (서울 : 청아, 1994)
- 「갑오개혁과 독립협회 운동의 사회사」 신용하 (서울대학교출판부 : 2001)
- 동영상 자료 : 「재암리 3.1운동순국기념관」 http://www.jeam.go.kr ⇒ 시청각실
- 3.1운동 지도 http://blog.naver.com/ssoy115?Redirect=Log&logNo=700045706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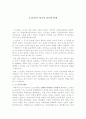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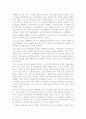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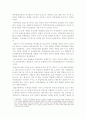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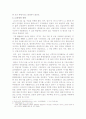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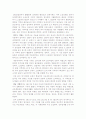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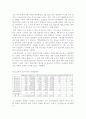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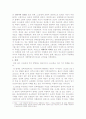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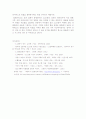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