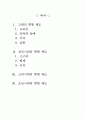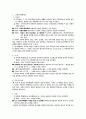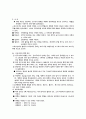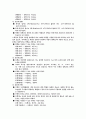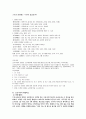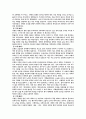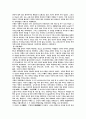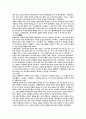목차
Ⅰ. 고대의 형행 제도
1. 고조선
2. 옥저와 동예
3. 부여
4. 삼한
Ⅱ. 삼국시대의 형행 제도
1. 고구려
2. 백제
3. 신라
Ⅲ. 고려시대의 형행 제도
Ⅳ. 조선시대의 형행 제도
1. 고조선
2. 옥저와 동예
3. 부여
4. 삼한
Ⅱ. 삼국시대의 형행 제도
1. 고구려
2. 백제
3. 신라
Ⅲ. 고려시대의 형행 제도
Ⅳ. 조선시대의 형행 제도
본문내용
(1774년) 다시 동기관을 폐지하고 형조에 이 업무를 귀속시켰다.
⑦ 부가형
조선의 형벌에는 기본형인 5형 이외에도 여러종류의 부가형이 있었다. 그 중 중요한 것은 자자(刺字), 노비몰수, 재산몰수, 피해배상 등을 들 수가 있으며 연좌제도도 일종의 부가형의 성질을 띠고 있다.
자자형은 신체의 어느 부위에 먹물로 글씨를 새겨 넣는 형벌인데 주로 도적으로서 장 도 유형에 처하여진 자에게 부과되었다. 대명률직해의 규정에 의하여 팔목과 팔꿈치 사이에 매자를 각 1촌 5분의 네모안에 매획의 넓이를 1분 5리로 하여 글자를 새겨 넣었다. 자자형을 부과하는 목적은 전과자임을 알려 수치심을 갖게 하는 동시에 요시찰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팔뚝에 자자를 하게 되면 외관상 바로 문신이 드러나지 않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이유에서 얼굴에 자자하는 제도가 생겼는데 이를 경면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경면형은 도둑의 창궐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였으나 실제 시행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중종 20년 실록에 의하면 "경면형으로 다스려진 죄인은 다만 2명 뿐이다"라고 적혀 있다. 자자형은 평생동안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고 살아야 하는 가혹한 처벌이었기 때문에 그 시행에 신중을 기하였다. 영조 16년(1740년)에 이르러 자자의 도구를 소각시키고 다시 사용치 못하도록 전국에 엄명을 내림으로써 완전히 폐지하였다.
⑧법외의 예
조선시대 형벌 중에는 법에 규정된 형 이외에 행하여지던 몇 개 종류의 형이 있는데 법 이외의 형이라도 실제 관에서 관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일반화되어 있던 것과 권세가 있는 사가에서 불법으로 행하여지던 것 등이 있다. 주리, 태배, 압슬, 난장, 낙형 등은 전자에 속하고 의비, 월형, 비공입회수, 고족 등은 후자에 속한다.
주리형은 사람의 양다리를 함께 결박하여 그 중간에 2개의 주장을 넣어 가위 벌리듯이 좌우로 벌리게 하는 것으로 일종의 고문방법으로 사용한 것이다. 모반 등의 중대사건에서 행해졌고 일반의 경우는 포도청에서 도적을 다스릴 때 사용되었다. 주리형을 받게 되면 죄를 면하고 풀려난다고 하여도 불구가 되기 쉬운 참혹한 형벌이었으므로 이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태배형은 태로써 등을 난타하는 형벌인데 고문의 방법으로 사용되었고 이형은 목숨을 잃기 쉬운 형이었으므로 세종 임금 때에 금지하는 영을 내렸다. 압슬형은 무릎 위에 압력을 가하는 고문의 일종인데 언제부터 이 형벌이 존재하였는지 확실치 않으나 조선초기에 본형에 대한 기록이 있다. 실록에 의하면 태종 17년 죄인을 신문함에 있어 "압슬형을 시행할 때 1차 시행에는 2명이, 2차 시행에는 4명이, 3차 시행에는 6명이 하는데 그 범죄가 10악, 강도살인과 같은 중죄가 아니면 압슬형을 시행하지 못한다"고 하였다(조선왕조실록 태종 17년 5월 11일). 본형은 현종 6년(1665년) 왕명으로 금지하였고 영조 1년(1725년) 다시 압슬형을 영구히 없애라는 영을 내렸다.
난장은 여러명이 장으로 신체의 어느 부분도 가리지 않고 난타하는 형벌로서 주로 고문의 일종으로 사용된 것 같으나 자칫하면 목숨을 잃게 하는 위험한 형벌이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주장당문형(朱杖撞問刑)이 있는데 이는 죄수를 가운데 두고 여럿이 죄수의 주위를 돌면서 때리는 형벌이다. 이때 사용하는 장이 붉은 색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중종 6년(1511년) "난장의 형은 국법이 아니므로 이를 금한다"라는 하교가 있었고(증보문헌비고 권제 134 형고휼형) 영조 46년 다시 주장당문을 없애라는 하교를 내려(대전통편, 대전회통 형전 추단안) 이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상천민으로서 신분이 높은 여자를 범하였거나 근친상간 등의 반윤리적 죄를 범한 자를 멍석으로 싸서 여럿이 몽둥이로 난타하는 사벌로서의 난장이 민간의 오랜 관습으로 존재하였다고 한다.
낙형은 쇠를 불어 달구어 몸을 지지는 형벌이다. 대적죄인의 신문에 사용되었다고 하며 권문사가에서는 노비의 죄를 벌 할 때 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세종 때 이를 금하는 영을 내렸다. 그러나 숙종 때 강도익명서의 옥서에서 낙형을 행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 따라서 영조 9년(1733년)에 다시 왕명을 내려 낙형을 폐지하였다(속대전, 대전통편 형전 추단안).
의비형은 코를 베어버리는 형벌로서 권세가 있는 사가에서 노비의 죄를 다스릴 때 자행한 경우가 있었다. 세종 임금이 이를 엄중히 금하는 영을 내린 후(대전통편 형전 추단안) 역대 왕은 본 형을 불법행위로 엄히 단속하였다.
단근형은 죄인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형벌로서 도적이 성할 때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임시조치로 시행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세종 26년 황희의 건의로 단근형을 폐지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단근형은 중종 5년 영의정 김수동의 건의로 영구히 이를 폐지하는 영을 내렸다(서일교, 조선형사제도의 연구, 1974 : 173).
월족형은 단근형의 일종으로 발뒤꿈치의 힘줄을 베어버리는 형인데 월족형을 하게 되면 절음발이 또는 앉은뱅이가 되는 매우 잔인한 형벌이다. 이 역시 사가에서 노비의 죄를 다스릴 때 자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세종임금이 영을 내려 법으로 이를 금하였다(대전회통 형전 추단안). 그러나 패륜행위를 하는 자에게 문중 혹은 마을 사람들이 사벌로서 행하는 풍습이 존재하였다고 전한다.
비공입회수(鼻孔入灰水)는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코에 잿물을 붓는 일종의 고문방법인데 권세가 있는 사가에서 노비나 천민의 죄를 다스릴 때 사용된 경우가 있었다고 하나 이 역시 불법적인 것이었으므로 형전사목에서 남형의 사례로서 특별히 금지하는 영을 내린 바 있다.
고족형은 발을 쪼개는 형벌인데 사가에서 노비의 죄를 다스리면서 자행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형전사목에서 이를 금하는 영을 내렸다.
그 외 물에 삶아 죽이는 형벌이라는 어의를 지닌 팽형(烹刑)이라는 형벌이 있었다.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특별히 서정쇄신에 관한 죄를 범하여 나라의 재물이나 백성의 재물을 탐한 관리를 이 형에 처했다는 사료가 있다.
⑦ 부가형
조선의 형벌에는 기본형인 5형 이외에도 여러종류의 부가형이 있었다. 그 중 중요한 것은 자자(刺字), 노비몰수, 재산몰수, 피해배상 등을 들 수가 있으며 연좌제도도 일종의 부가형의 성질을 띠고 있다.
자자형은 신체의 어느 부위에 먹물로 글씨를 새겨 넣는 형벌인데 주로 도적으로서 장 도 유형에 처하여진 자에게 부과되었다. 대명률직해의 규정에 의하여 팔목과 팔꿈치 사이에 매자를 각 1촌 5분의 네모안에 매획의 넓이를 1분 5리로 하여 글자를 새겨 넣었다. 자자형을 부과하는 목적은 전과자임을 알려 수치심을 갖게 하는 동시에 요시찰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팔뚝에 자자를 하게 되면 외관상 바로 문신이 드러나지 않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이유에서 얼굴에 자자하는 제도가 생겼는데 이를 경면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경면형은 도둑의 창궐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였으나 실제 시행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중종 20년 실록에 의하면 "경면형으로 다스려진 죄인은 다만 2명 뿐이다"라고 적혀 있다. 자자형은 평생동안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고 살아야 하는 가혹한 처벌이었기 때문에 그 시행에 신중을 기하였다. 영조 16년(1740년)에 이르러 자자의 도구를 소각시키고 다시 사용치 못하도록 전국에 엄명을 내림으로써 완전히 폐지하였다.
⑧법외의 예
조선시대 형벌 중에는 법에 규정된 형 이외에 행하여지던 몇 개 종류의 형이 있는데 법 이외의 형이라도 실제 관에서 관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일반화되어 있던 것과 권세가 있는 사가에서 불법으로 행하여지던 것 등이 있다. 주리, 태배, 압슬, 난장, 낙형 등은 전자에 속하고 의비, 월형, 비공입회수, 고족 등은 후자에 속한다.
주리형은 사람의 양다리를 함께 결박하여 그 중간에 2개의 주장을 넣어 가위 벌리듯이 좌우로 벌리게 하는 것으로 일종의 고문방법으로 사용한 것이다. 모반 등의 중대사건에서 행해졌고 일반의 경우는 포도청에서 도적을 다스릴 때 사용되었다. 주리형을 받게 되면 죄를 면하고 풀려난다고 하여도 불구가 되기 쉬운 참혹한 형벌이었으므로 이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태배형은 태로써 등을 난타하는 형벌인데 고문의 방법으로 사용되었고 이형은 목숨을 잃기 쉬운 형이었으므로 세종 임금 때에 금지하는 영을 내렸다. 압슬형은 무릎 위에 압력을 가하는 고문의 일종인데 언제부터 이 형벌이 존재하였는지 확실치 않으나 조선초기에 본형에 대한 기록이 있다. 실록에 의하면 태종 17년 죄인을 신문함에 있어 "압슬형을 시행할 때 1차 시행에는 2명이, 2차 시행에는 4명이, 3차 시행에는 6명이 하는데 그 범죄가 10악, 강도살인과 같은 중죄가 아니면 압슬형을 시행하지 못한다"고 하였다(조선왕조실록 태종 17년 5월 11일). 본형은 현종 6년(1665년) 왕명으로 금지하였고 영조 1년(1725년) 다시 압슬형을 영구히 없애라는 영을 내렸다.
난장은 여러명이 장으로 신체의 어느 부분도 가리지 않고 난타하는 형벌로서 주로 고문의 일종으로 사용된 것 같으나 자칫하면 목숨을 잃게 하는 위험한 형벌이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주장당문형(朱杖撞問刑)이 있는데 이는 죄수를 가운데 두고 여럿이 죄수의 주위를 돌면서 때리는 형벌이다. 이때 사용하는 장이 붉은 색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중종 6년(1511년) "난장의 형은 국법이 아니므로 이를 금한다"라는 하교가 있었고(증보문헌비고 권제 134 형고휼형) 영조 46년 다시 주장당문을 없애라는 하교를 내려(대전통편, 대전회통 형전 추단안) 이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상천민으로서 신분이 높은 여자를 범하였거나 근친상간 등의 반윤리적 죄를 범한 자를 멍석으로 싸서 여럿이 몽둥이로 난타하는 사벌로서의 난장이 민간의 오랜 관습으로 존재하였다고 한다.
낙형은 쇠를 불어 달구어 몸을 지지는 형벌이다. 대적죄인의 신문에 사용되었다고 하며 권문사가에서는 노비의 죄를 벌 할 때 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세종 때 이를 금하는 영을 내렸다. 그러나 숙종 때 강도익명서의 옥서에서 낙형을 행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 따라서 영조 9년(1733년)에 다시 왕명을 내려 낙형을 폐지하였다(속대전, 대전통편 형전 추단안).
의비형은 코를 베어버리는 형벌로서 권세가 있는 사가에서 노비의 죄를 다스릴 때 자행한 경우가 있었다. 세종 임금이 이를 엄중히 금하는 영을 내린 후(대전통편 형전 추단안) 역대 왕은 본 형을 불법행위로 엄히 단속하였다.
단근형은 죄인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형벌로서 도적이 성할 때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임시조치로 시행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세종 26년 황희의 건의로 단근형을 폐지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단근형은 중종 5년 영의정 김수동의 건의로 영구히 이를 폐지하는 영을 내렸다(서일교, 조선형사제도의 연구, 1974 : 173).
월족형은 단근형의 일종으로 발뒤꿈치의 힘줄을 베어버리는 형인데 월족형을 하게 되면 절음발이 또는 앉은뱅이가 되는 매우 잔인한 형벌이다. 이 역시 사가에서 노비의 죄를 다스릴 때 자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세종임금이 영을 내려 법으로 이를 금하였다(대전회통 형전 추단안). 그러나 패륜행위를 하는 자에게 문중 혹은 마을 사람들이 사벌로서 행하는 풍습이 존재하였다고 전한다.
비공입회수(鼻孔入灰水)는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코에 잿물을 붓는 일종의 고문방법인데 권세가 있는 사가에서 노비나 천민의 죄를 다스릴 때 사용된 경우가 있었다고 하나 이 역시 불법적인 것이었으므로 형전사목에서 남형의 사례로서 특별히 금지하는 영을 내린 바 있다.
고족형은 발을 쪼개는 형벌인데 사가에서 노비의 죄를 다스리면서 자행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형전사목에서 이를 금하는 영을 내렸다.
그 외 물에 삶아 죽이는 형벌이라는 어의를 지닌 팽형(烹刑)이라는 형벌이 있었다.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특별히 서정쇄신에 관한 죄를 범하여 나라의 재물이나 백성의 재물을 탐한 관리를 이 형에 처했다는 사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