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하지만 <왕의 남자>의 주인공은 연산이 아니었어도 상관없다. 연산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췄다기 보다는 현대사회 하나의 인간 군상의 캐릭터로서 연산을 선택했을 뿐이다. <왕의 남자>는 광대 장생을 주축으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다.
<왕의 남자>의 주요 인물들을 말한다면.
장생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거부하는 인물이다. 광대는 가장 천한 신분이지만, 장생은 왕보다 자유롭게 산다. 연산 역시 권력의 정점에 있지만, 자신을 둘러싼 운명과 업을 피하고자 한다. 하지만 연산은 그럴 수 없는 왕의 신분이고, 그렇기에 혼란 속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이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 그대로 닮아 있지 않은가. 주어진 운명을 거부하고자 하지만 거대한 사회 속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공길은 장생이나 연산과는 다르게 운명에 순응하는 캐릭터다. 좋아서는 아니지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는 또 다른 현대인의 모습이다.
<왕의 남자>라는 제목이 가지는 의미는.
남성은 여성, 여성은 남성이라는 일반적인 이성의 조합을 역행하는 제목이다. 성의 조합이라는 것에서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역설적인 제목을 통해 성을 넘어서 인간이 지니는 존재의 소중함을 담으려 했다. 공길이라는 존재는 연산에게 결핍된 어떤 것에 대한 동경이고 허상과 같은 존재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연산이 아니라 누구든 그런 존재를 바라지 않나.
연극 爾(이)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 어떤 점이 다른가.
상연 중에는 보지 못했다. 대본을 읽었고 VHS로 잠깐 봤을 뿐이다. 연극은 공길의 이야기였다. 권력의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권력화 되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다루고 있고, 장생은 외피적으로 떠도는 주변인물이었다. <왕의 남자>는 장생을 부각했다. 연산과 공길의 캐릭터는 유지하되 많이 약화시켜 표현했다. 장생의 입장을 통해 보다 인간적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
\'왕의 남자\'로 세상 읽기
1.
왕의 남자가 궁궐장면 촬영을 위하여 문화재청에 촬영협조를 구하였다가 거부를 당했다, 이유는 문화재의 훼손 우려가 많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영화를 보고나면 그 거부 이유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훼손을 우려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눈치를 보며 자기 밥그릇의 훼손을 우려한 것이었다,
이 영화를 보고서 영화를 관통하는 동성애 코드나 또는 인간의 욕망과 그에 따르는 비극적인 결말만을 보고 왔다면, 또는 공길역의 아름다운 남자 얼굴만을 쳐다보다가 극장문을 나섰다면 그 사람은 이 영화의 껍데기만을 핥아보고 진정한 이 영화의 매력에는 빠져보지 못한 것이다,
이 영화에는 수많은 코드들이 숨어있다, 저자거리에서 광대질과 노름등으로 겨우 입에 풀칠하던 광대들이 얼떨결에 궁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영화는 숨길래야 숨길 수 없고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세태 풍자와 정치 조롱이라는 빛나는 상징들을 곳곳에 드러낸다, 바로 이 영화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다,
2.
연산은 자기 자신의 오락거리를 위하여 궁중에 들어온 광대들을 위하여, 이들이 기거할 희락원을 만들라는 어명을 내리고 대신들은 ´천한 상것´들이 궁중에 기거할 수 없다고 반대한다, 그 ´천한 상것´들은 저자거리에서 왕을 조롱하는 광대질을 하다가 역설적이게도 왕을 웃기기 위하여 궁중으로 들어오게 된 사람들이다,
´천한 상것´들은 대학에서 화염병을 던지며 권력에 저항하다가 얼떨결에 권력의 중앙으로 들어오게된 화염병386들을 떠올리게 된다, 화염병386들에게는 대학에서 공부를 한 것도 없고, 정치를 할 전문지식도 없고, 민심을 다스릴 어떤 능력도 없으니 그들은 영원히 천한 쌍것들일수 밖에 없다,
주인공의 직업을 광대로 설정한 것은 이 영화의 빼어난 덕목이다, 온갖 삽질로 난장판이 되어버린 정치현실과 개판이 되어버린 국민들의 살림살이, 천한 쌍것들이 얼굴에 두껍게 분칠을 하고 가르마를 하여 전문가가 되고 진보 개혁이 되는 이 천한 쌍것의 현실을 응징하기 위해서는 천한 쌍것들의 육두문자를 빌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3.
연산이 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광대들에게 만들어주는 ´자리´는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수두룩하게 만들어진 수많은 ´위원회´와 능력이나 전문소양에 상관없이 오로지 자기 편의 코드만 맞으면 떨어지는 장관감투 자리이다, 그것을 반대하는 대신들의 ´민심´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왕을 웃기기 위한 광대극은 나중에 왕을 모시는 내시의 의중에 따라 춤추는 정치극이 된다, 내시는 정적을 처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시가 미리 준비한 각본으로 광대극을 연출할 것을 장생에게 요구하게 되고, 그 각본은 연산의 친모 윤씨가 사약을 받게되는 내막의 정치적 폭로였고 그 것은 바로 지금의 과거사 파헤치기였다,
\"이게 웬일이여, 소극이 할 때마다 누가 작살이 나니 살 떨려서 하겠어, 어디?\"
\"희락원 세운게 그냥 웃자고 한 일이 아닌가 봐\"
물정 모른 광대들의 대사에는 정치를 비꼬는 일격필살의 살수가 시전되고 있다, 정치행위들이 무지한 백성들에게는 백성을 위한 정치이지만 내막을 알면 정치나 위원회라는 것들이 패거리들의 이익을 위한 장난이고 상대방을 쓰러트리려는 음모라고 풍자하고 있다,
4.
왕과 대통령이 동격이라는 선입감을 빼더라도 영화의 연산은 노무현을 연상시키는 히스테리와 콤플렉스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사약을 받아 죽은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것과 탄핵을 당했던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연산은 죽은 어머니의 사모 앞에서 이성을 잃고 광포해지며 노무현은 그 때의 탄핵을 생각하며 지금의 증오를 뿌리고 있는지 모른다,
아마도 두사람은 어머니가 사약을 받을 때 찬성했던 사람들과, 탄핵을 당했을 때 찬성했던 사람들을 세상 끝까지 쫓아가 복수하고 싶은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 아픈 기억에서 벗어날 때 쯤이면 그 옆에 있던 내시가 모종의 사건을 만들며 다시 기억을 상기시켜 주는 것처럼 누군가 대통령의 옆에서 ´상기하자 그 때 탄핵´을 외치고 있는지 모른다,
그 옛날의 연산은 중종반정으로
<왕의 남자>의 주요 인물들을 말한다면.
장생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거부하는 인물이다. 광대는 가장 천한 신분이지만, 장생은 왕보다 자유롭게 산다. 연산 역시 권력의 정점에 있지만, 자신을 둘러싼 운명과 업을 피하고자 한다. 하지만 연산은 그럴 수 없는 왕의 신분이고, 그렇기에 혼란 속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이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 그대로 닮아 있지 않은가. 주어진 운명을 거부하고자 하지만 거대한 사회 속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공길은 장생이나 연산과는 다르게 운명에 순응하는 캐릭터다. 좋아서는 아니지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는 또 다른 현대인의 모습이다.
<왕의 남자>라는 제목이 가지는 의미는.
남성은 여성, 여성은 남성이라는 일반적인 이성의 조합을 역행하는 제목이다. 성의 조합이라는 것에서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역설적인 제목을 통해 성을 넘어서 인간이 지니는 존재의 소중함을 담으려 했다. 공길이라는 존재는 연산에게 결핍된 어떤 것에 대한 동경이고 허상과 같은 존재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연산이 아니라 누구든 그런 존재를 바라지 않나.
연극 爾(이)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 어떤 점이 다른가.
상연 중에는 보지 못했다. 대본을 읽었고 VHS로 잠깐 봤을 뿐이다. 연극은 공길의 이야기였다. 권력의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권력화 되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다루고 있고, 장생은 외피적으로 떠도는 주변인물이었다. <왕의 남자>는 장생을 부각했다. 연산과 공길의 캐릭터는 유지하되 많이 약화시켜 표현했다. 장생의 입장을 통해 보다 인간적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
\'왕의 남자\'로 세상 읽기
1.
왕의 남자가 궁궐장면 촬영을 위하여 문화재청에 촬영협조를 구하였다가 거부를 당했다, 이유는 문화재의 훼손 우려가 많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영화를 보고나면 그 거부 이유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훼손을 우려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눈치를 보며 자기 밥그릇의 훼손을 우려한 것이었다,
이 영화를 보고서 영화를 관통하는 동성애 코드나 또는 인간의 욕망과 그에 따르는 비극적인 결말만을 보고 왔다면, 또는 공길역의 아름다운 남자 얼굴만을 쳐다보다가 극장문을 나섰다면 그 사람은 이 영화의 껍데기만을 핥아보고 진정한 이 영화의 매력에는 빠져보지 못한 것이다,
이 영화에는 수많은 코드들이 숨어있다, 저자거리에서 광대질과 노름등으로 겨우 입에 풀칠하던 광대들이 얼떨결에 궁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영화는 숨길래야 숨길 수 없고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세태 풍자와 정치 조롱이라는 빛나는 상징들을 곳곳에 드러낸다, 바로 이 영화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다,
2.
연산은 자기 자신의 오락거리를 위하여 궁중에 들어온 광대들을 위하여, 이들이 기거할 희락원을 만들라는 어명을 내리고 대신들은 ´천한 상것´들이 궁중에 기거할 수 없다고 반대한다, 그 ´천한 상것´들은 저자거리에서 왕을 조롱하는 광대질을 하다가 역설적이게도 왕을 웃기기 위하여 궁중으로 들어오게 된 사람들이다,
´천한 상것´들은 대학에서 화염병을 던지며 권력에 저항하다가 얼떨결에 권력의 중앙으로 들어오게된 화염병386들을 떠올리게 된다, 화염병386들에게는 대학에서 공부를 한 것도 없고, 정치를 할 전문지식도 없고, 민심을 다스릴 어떤 능력도 없으니 그들은 영원히 천한 쌍것들일수 밖에 없다,
주인공의 직업을 광대로 설정한 것은 이 영화의 빼어난 덕목이다, 온갖 삽질로 난장판이 되어버린 정치현실과 개판이 되어버린 국민들의 살림살이, 천한 쌍것들이 얼굴에 두껍게 분칠을 하고 가르마를 하여 전문가가 되고 진보 개혁이 되는 이 천한 쌍것의 현실을 응징하기 위해서는 천한 쌍것들의 육두문자를 빌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3.
연산이 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광대들에게 만들어주는 ´자리´는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수두룩하게 만들어진 수많은 ´위원회´와 능력이나 전문소양에 상관없이 오로지 자기 편의 코드만 맞으면 떨어지는 장관감투 자리이다, 그것을 반대하는 대신들의 ´민심´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왕을 웃기기 위한 광대극은 나중에 왕을 모시는 내시의 의중에 따라 춤추는 정치극이 된다, 내시는 정적을 처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시가 미리 준비한 각본으로 광대극을 연출할 것을 장생에게 요구하게 되고, 그 각본은 연산의 친모 윤씨가 사약을 받게되는 내막의 정치적 폭로였고 그 것은 바로 지금의 과거사 파헤치기였다,
\"이게 웬일이여, 소극이 할 때마다 누가 작살이 나니 살 떨려서 하겠어, 어디?\"
\"희락원 세운게 그냥 웃자고 한 일이 아닌가 봐\"
물정 모른 광대들의 대사에는 정치를 비꼬는 일격필살의 살수가 시전되고 있다, 정치행위들이 무지한 백성들에게는 백성을 위한 정치이지만 내막을 알면 정치나 위원회라는 것들이 패거리들의 이익을 위한 장난이고 상대방을 쓰러트리려는 음모라고 풍자하고 있다,
4.
왕과 대통령이 동격이라는 선입감을 빼더라도 영화의 연산은 노무현을 연상시키는 히스테리와 콤플렉스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사약을 받아 죽은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것과 탄핵을 당했던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연산은 죽은 어머니의 사모 앞에서 이성을 잃고 광포해지며 노무현은 그 때의 탄핵을 생각하며 지금의 증오를 뿌리고 있는지 모른다,
아마도 두사람은 어머니가 사약을 받을 때 찬성했던 사람들과, 탄핵을 당했을 때 찬성했던 사람들을 세상 끝까지 쫓아가 복수하고 싶은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 아픈 기억에서 벗어날 때 쯤이면 그 옆에 있던 내시가 모종의 사건을 만들며 다시 기억을 상기시켜 주는 것처럼 누군가 대통령의 옆에서 ´상기하자 그 때 탄핵´을 외치고 있는지 모른다,
그 옛날의 연산은 중종반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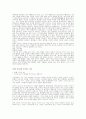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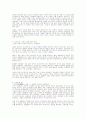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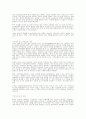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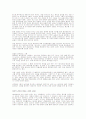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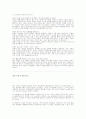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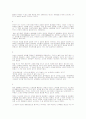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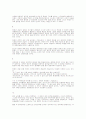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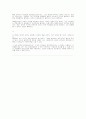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