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한국의 가구
1. 사랑방가구
2. 안방가구
3. 부엌가구
4. 반닫이가구
1. 사랑방가구
2. 안방가구
3. 부엌가구
4. 반닫이가구
본문내용
었다. 이러한 굵고 투박한 재료가 반대로 시각적으로 시원함과 신뢰감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골재로만 연결되는 것은 너무 단조로운 감을 줄 수 있어 다른 종류의 가구보다 신중한 설계화 제작이 요구되었는데 그 쾌적한 공간의 비례는 한국 목공술의 으뜸이었다.
재질로는 두꺼운 소나무 통판을 사용하거나, 얇은 판재의 경우 대청의 널처럼 판재를 끼워 넣은 은촉짜임 형식을 하고 있다. 또한 다리 부분의 족대 역시 바닥의 습기를 고려하여 높고 굵게 설계되었다. 찬장은 그릇을 넣거나 음식을 담아 보관하는 주방 가구이다. 찬장 또한 찬탁과 같이 그릇의 무게를 고려하여 튼튼한 짜임새가 요구되므로 굵은 소나무 골재에 목리가 좋은 느티나무, 참죽나무를 이용하였고 견고한 무쇠장식을 달았다. 찬장은 2, 3층이 대부분으로 전면이 같이 판재로 구성된 것과 천이나 종이로 발려져 통풍을 고려한 것이 있으며, 크기 또한 7자가 넘는 것에서 3자가 되지 않는 소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형 찬장은 부엌이나 대청에 놓여져 음식이나 곡물, 잡다한 그릇 등을 손쉽게 보관하는 역할을 했다. 반면 소형은 인간공학적인 면을 고려하여 부뚜막 위나 찬마루에 놓여졌다.
이밖에 쌀이나 곡물을 보관하는 뒤주가 있다. 뒤주는 곡물이 습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통풍이 잘 되고 쥐와 해충으로부터 보호되며 충분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굵은 소나무 골재에 두꺼운 느티나무나 소나무 판재로 높게 구성되어 있다.
뒤주에는 많은 양을 넣을 수 있는 대형에서부터 팥, 깨를 넣는 소형에 이르기까지 각종 형태가 있다. 또한 대형 뒤주 중에는 2층으로 분할하여 아래층은 그 여닫이문 안에 잡곡을 자루에 넣어 두거나 그릇이나 기타 소품들을 보관하는 동시에 위층의 곡물을 해충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한 이층뒤주도 있다.
찬장 - 음식 및 식기를 보관하는 장. 찬방에 놓이며 그릇 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하여 괴목, 소나무 등 치밀한 목재 사용
찬탁자 - 식기를 얹기 위하여 2층, 3층의 선반이 있음.
중 간부분에 상납부분이 있는 것도 있음.
뒤주(斗廚) - 쌀이나 곡물을 보관하는 궤. 대청에 놓지만 주택의 규모에 따라 찬방에도 둠. 위에 뚜껑이 있고 경첩이 없이 개폐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형의 잡곡 뒤주도 있음.
곡갑 - 뒤주와 같은 구실을 하나 원형이 많다. 대나무로 골격을 만들고 한지를 발라 기름칠을 하여 유통시키고 지독이라고도 불림.
찬합 - 음식물을 담아 운반하는 것으로 여러 형태가 있음.
소반 - 음식물을 받치고 부엌에서 각 방에 운반하는 것으로 여러 형태가 있음.
반과 각으로 구성되고 원반과 각반이 대부분임.
해주반 : 장방형의 천판과 좌우면 끝에 판각이 있음.
나주반 : 평판에 변죽을 깎아 붙이고 반 아래 중대가 있으며 죽절형, 구족형, 호족형의 각이 있음.
통영반 : 장방형 통판 천판과 그 밑에 문양장식의 초엽이 있고 이를 받치는 상중대와 다리를 고정시키는 하중대가 있음.
공고상 : 점심을 이고 나를 때 쓰는 소반
④ 반닫이가구 - 명칭, 용도 및 종류
반닫이는 위쪽 반을 여닫는 것인데, 의복 ·책 ·두루마리 ·제기(祭器) 등 많은 종류의 기물을 보관하고, 위판에 항아리나 소품을 올려 놓거나 이불을 쌓기도 하는 다목적 가구이다. 그 밖의 가구로는 돈 ·제기 등을 보관하는 궤, 화살을 넣던 전궤(箭櫃), 약장, 조상의 영정을 모셔 두는 영정함(影幀函), 여닫이문과 청사(靑絲) ·황사(黃絲) 등을 바른 창을 달아 등잔이나 초를 안에 넣어 간접 조명의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게 한 좌등(座燈) 등이 있다.
반닫이 - 장방형의 단층 옷궤로서 문판을 아래위로 열게 되어 있음.
박천반닫이(평안도) : 구멍이 많은 무쇠장식을 사용
강화반닫이(경기) : 왕실용으로 우아함
충청반닫이 : 거멀쇠를 쓰지 않고 장식이 없음
경상반닫이 : 높이가 중보다 얕다
제주반닫이 : 무쇠로 된 불로초경첩장식 사용
⑤ 한국의 전통 가구에 사용된 재료와 그 기법
가구 표면의 칠은 생칠, 주칠, 흑칠, 그리고 일반 기름칠이 있다. 이는 가구의 표면에 흠이 생기거나 때가 묻는 것을 막고 방수가 되게 하여 수명을 연장시키고 동시에 화사한 빛을 발해 미장효과를 가져오기 위함이다.
색은 황토분, 석간, 치자 등을 물에 묽게 타서 바르는데, 이때 좀더 진한 색을 얻기 위해 먹물이나 고운 검은흙을 섞어 바르기도 했다. 이를 마르기 전에 걸레로 원하는 색만큼 닦아내고 그 위에 잣, 호두, 콩, 오동 등의 식물성 기름을 바른 후 곱게 헝겊으로 문질러 자연 그대로의 질감을 살리는데, 식물성 기름은 나무의 표면에 엷은 막을 형성하여 트는 것을 막아 기물을 보호하고 은은한 광택으로 아름다움을 더해주어 널리 애용되었다.
소반과 고급 가구에는 생칠을 하였으며, 궁중용과 내간용 가구에는 주칠 또는 흑칠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불투명한 칠은 일반 가구에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한국 목가구는 자연 목리를 살리는 데 주력하였다.
금속장식으로는 무쇠, 주석, 백동 장식이 주로 사용되었다. 무쇠장식은 힘을 많이 받는 반닫이 등에서 크고 두껍게 사용되었고, 검소한 질감으로 인해 사랑방의 가구에 널리 이용되었다.
주석장식은 고려시대 이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구리, 주석, 백동을 합금하여 만든다. 이는 배합 비율에 따라 성질과 색깔이 달라지게 되는데 비교적 연질이어서 자유로이 오려낼 수 있다. 색감이 밝고 화사하여 여성용 가구에 애용되었으며, 단순한 형태로 제작하여 사랑방 가구에도 이용하였다.
백동장식은 20세기 초부터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희고 깨끗하여 단정한 멋을 내는 장식이다. 나무질보다 금속장식에 치우치던 20세기 초의 가구와 함께 성행되던 것으로 다양한 형태가 발달되었다
이러한 금속장식들은 문을 여닫는 경첩, 들어 옮기거나 당기는 들쇠, 짜임새와 이음새를 견고히 해 주는 거멀장식, 모서리를 튼튼하게 하는 귀장식, 자물쇠 앞바탕, 고리 등의 형태로 널리 사용되어졌다.
금속장식은 대체로 초기에는 필수적이고 기능적인 역할을 강조하여 단순하고 검소하게 제작되었으나 후대에 내려오면서 점차 복잡해지고 도식적으로 흐르고 있다.
재질로는 두꺼운 소나무 통판을 사용하거나, 얇은 판재의 경우 대청의 널처럼 판재를 끼워 넣은 은촉짜임 형식을 하고 있다. 또한 다리 부분의 족대 역시 바닥의 습기를 고려하여 높고 굵게 설계되었다. 찬장은 그릇을 넣거나 음식을 담아 보관하는 주방 가구이다. 찬장 또한 찬탁과 같이 그릇의 무게를 고려하여 튼튼한 짜임새가 요구되므로 굵은 소나무 골재에 목리가 좋은 느티나무, 참죽나무를 이용하였고 견고한 무쇠장식을 달았다. 찬장은 2, 3층이 대부분으로 전면이 같이 판재로 구성된 것과 천이나 종이로 발려져 통풍을 고려한 것이 있으며, 크기 또한 7자가 넘는 것에서 3자가 되지 않는 소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형 찬장은 부엌이나 대청에 놓여져 음식이나 곡물, 잡다한 그릇 등을 손쉽게 보관하는 역할을 했다. 반면 소형은 인간공학적인 면을 고려하여 부뚜막 위나 찬마루에 놓여졌다.
이밖에 쌀이나 곡물을 보관하는 뒤주가 있다. 뒤주는 곡물이 습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통풍이 잘 되고 쥐와 해충으로부터 보호되며 충분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굵은 소나무 골재에 두꺼운 느티나무나 소나무 판재로 높게 구성되어 있다.
뒤주에는 많은 양을 넣을 수 있는 대형에서부터 팥, 깨를 넣는 소형에 이르기까지 각종 형태가 있다. 또한 대형 뒤주 중에는 2층으로 분할하여 아래층은 그 여닫이문 안에 잡곡을 자루에 넣어 두거나 그릇이나 기타 소품들을 보관하는 동시에 위층의 곡물을 해충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한 이층뒤주도 있다.
찬장 - 음식 및 식기를 보관하는 장. 찬방에 놓이며 그릇 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하여 괴목, 소나무 등 치밀한 목재 사용
찬탁자 - 식기를 얹기 위하여 2층, 3층의 선반이 있음.
중 간부분에 상납부분이 있는 것도 있음.
뒤주(斗廚) - 쌀이나 곡물을 보관하는 궤. 대청에 놓지만 주택의 규모에 따라 찬방에도 둠. 위에 뚜껑이 있고 경첩이 없이 개폐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형의 잡곡 뒤주도 있음.
곡갑 - 뒤주와 같은 구실을 하나 원형이 많다. 대나무로 골격을 만들고 한지를 발라 기름칠을 하여 유통시키고 지독이라고도 불림.
찬합 - 음식물을 담아 운반하는 것으로 여러 형태가 있음.
소반 - 음식물을 받치고 부엌에서 각 방에 운반하는 것으로 여러 형태가 있음.
반과 각으로 구성되고 원반과 각반이 대부분임.
해주반 : 장방형의 천판과 좌우면 끝에 판각이 있음.
나주반 : 평판에 변죽을 깎아 붙이고 반 아래 중대가 있으며 죽절형, 구족형, 호족형의 각이 있음.
통영반 : 장방형 통판 천판과 그 밑에 문양장식의 초엽이 있고 이를 받치는 상중대와 다리를 고정시키는 하중대가 있음.
공고상 : 점심을 이고 나를 때 쓰는 소반
④ 반닫이가구 - 명칭, 용도 및 종류
반닫이는 위쪽 반을 여닫는 것인데, 의복 ·책 ·두루마리 ·제기(祭器) 등 많은 종류의 기물을 보관하고, 위판에 항아리나 소품을 올려 놓거나 이불을 쌓기도 하는 다목적 가구이다. 그 밖의 가구로는 돈 ·제기 등을 보관하는 궤, 화살을 넣던 전궤(箭櫃), 약장, 조상의 영정을 모셔 두는 영정함(影幀函), 여닫이문과 청사(靑絲) ·황사(黃絲) 등을 바른 창을 달아 등잔이나 초를 안에 넣어 간접 조명의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게 한 좌등(座燈) 등이 있다.
반닫이 - 장방형의 단층 옷궤로서 문판을 아래위로 열게 되어 있음.
박천반닫이(평안도) : 구멍이 많은 무쇠장식을 사용
강화반닫이(경기) : 왕실용으로 우아함
충청반닫이 : 거멀쇠를 쓰지 않고 장식이 없음
경상반닫이 : 높이가 중보다 얕다
제주반닫이 : 무쇠로 된 불로초경첩장식 사용
⑤ 한국의 전통 가구에 사용된 재료와 그 기법
가구 표면의 칠은 생칠, 주칠, 흑칠, 그리고 일반 기름칠이 있다. 이는 가구의 표면에 흠이 생기거나 때가 묻는 것을 막고 방수가 되게 하여 수명을 연장시키고 동시에 화사한 빛을 발해 미장효과를 가져오기 위함이다.
색은 황토분, 석간, 치자 등을 물에 묽게 타서 바르는데, 이때 좀더 진한 색을 얻기 위해 먹물이나 고운 검은흙을 섞어 바르기도 했다. 이를 마르기 전에 걸레로 원하는 색만큼 닦아내고 그 위에 잣, 호두, 콩, 오동 등의 식물성 기름을 바른 후 곱게 헝겊으로 문질러 자연 그대로의 질감을 살리는데, 식물성 기름은 나무의 표면에 엷은 막을 형성하여 트는 것을 막아 기물을 보호하고 은은한 광택으로 아름다움을 더해주어 널리 애용되었다.
소반과 고급 가구에는 생칠을 하였으며, 궁중용과 내간용 가구에는 주칠 또는 흑칠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불투명한 칠은 일반 가구에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한국 목가구는 자연 목리를 살리는 데 주력하였다.
금속장식으로는 무쇠, 주석, 백동 장식이 주로 사용되었다. 무쇠장식은 힘을 많이 받는 반닫이 등에서 크고 두껍게 사용되었고, 검소한 질감으로 인해 사랑방의 가구에 널리 이용되었다.
주석장식은 고려시대 이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구리, 주석, 백동을 합금하여 만든다. 이는 배합 비율에 따라 성질과 색깔이 달라지게 되는데 비교적 연질이어서 자유로이 오려낼 수 있다. 색감이 밝고 화사하여 여성용 가구에 애용되었으며, 단순한 형태로 제작하여 사랑방 가구에도 이용하였다.
백동장식은 20세기 초부터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희고 깨끗하여 단정한 멋을 내는 장식이다. 나무질보다 금속장식에 치우치던 20세기 초의 가구와 함께 성행되던 것으로 다양한 형태가 발달되었다
이러한 금속장식들은 문을 여닫는 경첩, 들어 옮기거나 당기는 들쇠, 짜임새와 이음새를 견고히 해 주는 거멀장식, 모서리를 튼튼하게 하는 귀장식, 자물쇠 앞바탕, 고리 등의 형태로 널리 사용되어졌다.
금속장식은 대체로 초기에는 필수적이고 기능적인 역할을 강조하여 단순하고 검소하게 제작되었으나 후대에 내려오면서 점차 복잡해지고 도식적으로 흐르고 있다.
추천자료
 문화재 조사(인천 도호부 청사)
문화재 조사(인천 도호부 청사) 욕실 인테리어
욕실 인테리어 araby 번역
araby 번역 한국건축의 시대별 구분
한국건축의 시대별 구분 인테리어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한국 민가론] 수내동 가옥
[한국 민가론] 수내동 가옥 [실내공기환경정화]실내공기환경정화를 위한 통풍과 환기, 실내공기환경정화의 중요성, 실내...
[실내공기환경정화]실내공기환경정화를 위한 통풍과 환기, 실내공기환경정화의 중요성, 실내... [계절별관리][계절별 에너지관리][계절별 영양관리][계절별 피부관리][계절별 자동차관리][계...
[계절별관리][계절별 에너지관리][계절별 영양관리][계절별 피부관리][계절별 자동차관리][계... 주거의 기능과 주거사, 주거 형태별 분류에 대해서
주거의 기능과 주거사, 주거 형태별 분류에 대해서 초등학교 실과교과(실과교육) 교육중점과 교육실태, 초등학교 실과교과(실과교육) 교양농업교...
초등학교 실과교과(실과교육) 교육중점과 교육실태, 초등학교 실과교과(실과교육) 교양농업교... [노인주거환경] 노인의 주거환경 특성과 주거생활문제, 노인주택개발 필요성, 노인 주거 선호...
[노인주거환경] 노인의 주거환경 특성과 주거생활문제, 노인주택개발 필요성, 노인 주거 선호... 놀이지도 놀이관찰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
놀이지도 놀이관찰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 가정안전사고의 실태
가정안전사고의 실태 집의 역사 (원시~고려)의 개념 (원시시대의 주거, 삼국시대의 주거, 고려시대의 주거, 온돌)
집의 역사 (원시~고려)의 개념 (원시시대의 주거, 삼국시대의 주거, 고려시대의 주거, 온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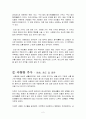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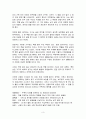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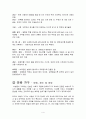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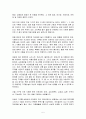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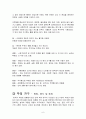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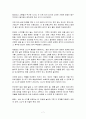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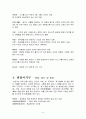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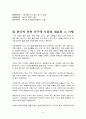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