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폴 드 만 (Paul de Man)
2. 헤이든 화이트 (Hayden White)
3. 해롤드 블룸 (Harold Bloom)
4. 제프리 하트만 (Geoffrey Hartman)
5. 힐리스 밀러 (J. Hillis Miller)
6. 바바라 존슨 (Barbara Johnson)
2. 헤이든 화이트 (Hayden White)
3. 해롤드 블룸 (Harold Bloom)
4. 제프리 하트만 (Geoffrey Hartman)
5. 힐리스 밀러 (J. Hillis Miller)
6. 바바라 존슨 (Barbara Johnson)
본문내용
면, 동시에 스스로의 비유성도 인정한다. 우리는 환유도 은유만큼이나 허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밀러는 ’사실적‘인 환유와 ’시적‘은유의 사이에 대한 야콥슨 적 대립개념을 해체한다. 그리고 그것들의 ’올바른 해석‘은 ’비유적인 것을 비유적인 것으로‘ 본다.
6. 바바라 존슨 (Barbara Johnson)
바바라 존슨의 《비평적 차이》(1980)는 문학과 비평에 대한 미묘하고도 명료한 해체 이론적 독서를 포함하고 있다. 그녀는 문학적비평적 텍스트들은 모두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약속 때문에 유혹되어 들어가는 차이의 그물망”을 세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S/Z》에서 바르트는 발자크의 <사라진>에서 남성적/여성적 ‘차이’를 찾아내서 해체시키고 있다. 그 중편소설을 독서단위로 자름으로써 바르트는 성적(性的)인 견지에서 텍스트의 의미의 완벽한 독서에 저항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존슨은 바르트의 독서가 ‘거세(castroation)’에 특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더욱 그의 ‘읽을 수 있는’ 텍스트와 ‘쓸 수 있는’ 텍스트 사이의 구별이 발자크의 이상적 여자(사라진에 의해 생각되는 잠비넬라)와 거세된 남자(실제의 잠비넬라) 사이의 구별과 상통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잠비넬라는 읽을 수 있는 텍스트의 완전한 통일성과도, 단편적이고 불확실한 쓸 수 있는 텍스트와도 모두 비슷하다. 바르트의 독서방법은 명백히 ‘거세(자르기)’를 더 좋아하고 있다. 잠비넬라에 대한 사라진의 이미지는 나르시시즘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녀의 완성(완전한 여인)은 사라진의 남성적인 자아 이미지와 대칭이 되는 상대가 된다. 즉, 사라진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부족한 것의 이미지”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하게도 거세된 남자는 “성(性)의 차이의 밖에 있으며 동시에 그것의 환상적 대칭의 현실적 구현”을 대표하고 있다. 그런 방법으로 잠비넬라는 사라진의 남성적 특성을, 그것이 거세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파괴시키고 있다.
바르트의 발자크 독서에 대한 존슨의 기본적 태도는, 발자크가 말하지 않고 남겨 놓은 곳에서 바르트가 ‘거세’라는 사실을 실제로 판독했다는 것을 판독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바르트는 ‘차이’를 ‘정체성‘으로 축소시킨다. 존슨은 그것을 바르트에 대한 비판으로서가 아니라 비평적 통찰력의 불가피한 눈멂(드 만의 용어를 빌리면)의 한 예증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6. 바바라 존슨 (Barbara Johnson)
바바라 존슨의 《비평적 차이》(1980)는 문학과 비평에 대한 미묘하고도 명료한 해체 이론적 독서를 포함하고 있다. 그녀는 문학적비평적 텍스트들은 모두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약속 때문에 유혹되어 들어가는 차이의 그물망”을 세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S/Z》에서 바르트는 발자크의 <사라진>에서 남성적/여성적 ‘차이’를 찾아내서 해체시키고 있다. 그 중편소설을 독서단위로 자름으로써 바르트는 성적(性的)인 견지에서 텍스트의 의미의 완벽한 독서에 저항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존슨은 바르트의 독서가 ‘거세(castroation)’에 특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더욱 그의 ‘읽을 수 있는’ 텍스트와 ‘쓸 수 있는’ 텍스트 사이의 구별이 발자크의 이상적 여자(사라진에 의해 생각되는 잠비넬라)와 거세된 남자(실제의 잠비넬라) 사이의 구별과 상통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잠비넬라는 읽을 수 있는 텍스트의 완전한 통일성과도, 단편적이고 불확실한 쓸 수 있는 텍스트와도 모두 비슷하다. 바르트의 독서방법은 명백히 ‘거세(자르기)’를 더 좋아하고 있다. 잠비넬라에 대한 사라진의 이미지는 나르시시즘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녀의 완성(완전한 여인)은 사라진의 남성적인 자아 이미지와 대칭이 되는 상대가 된다. 즉, 사라진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부족한 것의 이미지”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하게도 거세된 남자는 “성(性)의 차이의 밖에 있으며 동시에 그것의 환상적 대칭의 현실적 구현”을 대표하고 있다. 그런 방법으로 잠비넬라는 사라진의 남성적 특성을, 그것이 거세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파괴시키고 있다.
바르트의 발자크 독서에 대한 존슨의 기본적 태도는, 발자크가 말하지 않고 남겨 놓은 곳에서 바르트가 ‘거세’라는 사실을 실제로 판독했다는 것을 판독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바르트는 ‘차이’를 ‘정체성‘으로 축소시킨다. 존슨은 그것을 바르트에 대한 비판으로서가 아니라 비평적 통찰력의 불가피한 눈멂(드 만의 용어를 빌리면)의 한 예증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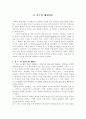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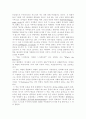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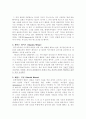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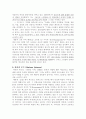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