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향사 의례
1. 선현 맞이하기
< 분정례 : 헌관과 집사의 선정 >
< 진설 >
< 축문쓰기 >
2. 선현과 만남
< 향사 >
< 폐백을 올리는 예 >
< 초헌을 행하는 예 >
< 아헌을 행하는 예 >
< 종헌을 행하는 예 >
< 음복을 행하는 예 >
< 폐백과 축문 불사르기 >
3. 복 나누어 받기
< 음복개좌(飮福開座 >
1. 선현 맞이하기
< 분정례 : 헌관과 집사의 선정 >
< 진설 >
< 축문쓰기 >
2. 선현과 만남
< 향사 >
< 폐백을 올리는 예 >
< 초헌을 행하는 예 >
< 아헌을 행하는 예 >
< 종헌을 행하는 예 >
< 음복을 행하는 예 >
< 폐백과 축문 불사르기 >
3. 복 나누어 받기
< 음복개좌(飮福開座 >
본문내용
동문을 통하여 사당으로 들어간다. 초헌 때와 같은 과정으로 술항아리 앞에서 서향하고 작주(2작)하면 봉작이 잔을 들고 북향하고 잔을 올린 후 잠시 엎드려 있은 후동문으로 나가서 서문 앞에서 북위한 후 재배한다.
<종헌을 행하는 예>
찬인이 종헌관을 모시고 관세한 후 동문을 통하여 사당으로 들어간다. 봉장의 도움을 받으며 제주를 올린 후 엎드려 읍하고 잠시 후 동문으로 나가서 다시 북위한 후 재배한다.
< 음복을 행하는 예 >
알자가 중앙문 밖에서 자리를 펴면 초헌관이 문안에서 북향하여 앉는다. 저를 세매 올려놓은 상에 고기를 조금 떼어놓고 복주(술)를 조금따라 초헌관에게 가져가서 올린다. 초헌관이 잔을 비우면 빈 잔을 가져가서 다시 올려놓고 생선을 조금 잘라서 목기에 올려 다시 헌관에게 가져가면 저로 입만 대고 다시 올려다 놓고 헌관은 다시 동문 앞으로 간다. 3헌관이 함께 재배한다.
< 폐백과 축문 불사르기 >
알자의 인도하에 초헌관이 망예를 하게 된다.폐백과 축을 내려서 서문으로 나와 사당의 동쪽 옆에 있는 망예하라는 장소로 가서 폐백과 축을 모두 태의 소지를 올린다. 망예가 끝나면 3헌관은 모두 잠시 북향하여 서 있다가 찬인이 초헌관을 모시고 내려간다.
알자와 찬인은 다시 올라와서 대축과 집사, 학생과 함께 동문 아래로 내려가서 함께 재배한다. 제집사가 먼저 나가고 두 명의 대축은 다시 사당 안으로 들어가서 신위 옆에 마주보고 서있고 알자와 찬인이 동문으로 내려가서 재배한다. 신위를 덮고 철상하면 향사례는 끝나게 된다.
3. 복 나누어 받기
< 음복개좌(飮福開座 >
일반적으로 제를 지내고 나면 제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제사에 올려지기 위해 준비된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제물을 나누어 먹는 데에 조상이 주는 복을 모두 나누어 받는다는 의미를 두고 있다.
향사가 끝나면 모두 강당으로 내려오고 봉작과 봉로는 밤, 대추 몇 개를 상위에 올려서 내려온다. 관리인이“음복례 아뢰오”를 3번 외치고 나면 술과 안주를 차린 상을 내온다.
3헌관이 자리를 잡으면 다른 제집사와 학생들은 모두 그 앞으로 앉고 헌관께 잔을 올리고 상읍한 후 순배한다. 향사의 제물은 모두 날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차려진 제물을 모두 음복할 수 없으므로 음복의 주된 음식은 술과 안주이다. 순배가 끝나면 제향은 모두 마무리 된다.
참고자료
향촌의 유교의례와 문화 <민속원>
서원 한국 사상의 숨결을 찾아서 <예문서원>
차례와 제사 이영춘 저
<종헌을 행하는 예>
찬인이 종헌관을 모시고 관세한 후 동문을 통하여 사당으로 들어간다. 봉장의 도움을 받으며 제주를 올린 후 엎드려 읍하고 잠시 후 동문으로 나가서 다시 북위한 후 재배한다.
< 음복을 행하는 예 >
알자가 중앙문 밖에서 자리를 펴면 초헌관이 문안에서 북향하여 앉는다. 저를 세매 올려놓은 상에 고기를 조금 떼어놓고 복주(술)를 조금따라 초헌관에게 가져가서 올린다. 초헌관이 잔을 비우면 빈 잔을 가져가서 다시 올려놓고 생선을 조금 잘라서 목기에 올려 다시 헌관에게 가져가면 저로 입만 대고 다시 올려다 놓고 헌관은 다시 동문 앞으로 간다. 3헌관이 함께 재배한다.
< 폐백과 축문 불사르기 >
알자의 인도하에 초헌관이 망예를 하게 된다.폐백과 축을 내려서 서문으로 나와 사당의 동쪽 옆에 있는 망예하라는 장소로 가서 폐백과 축을 모두 태의 소지를 올린다. 망예가 끝나면 3헌관은 모두 잠시 북향하여 서 있다가 찬인이 초헌관을 모시고 내려간다.
알자와 찬인은 다시 올라와서 대축과 집사, 학생과 함께 동문 아래로 내려가서 함께 재배한다. 제집사가 먼저 나가고 두 명의 대축은 다시 사당 안으로 들어가서 신위 옆에 마주보고 서있고 알자와 찬인이 동문으로 내려가서 재배한다. 신위를 덮고 철상하면 향사례는 끝나게 된다.
3. 복 나누어 받기
< 음복개좌(飮福開座 >
일반적으로 제를 지내고 나면 제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제사에 올려지기 위해 준비된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제물을 나누어 먹는 데에 조상이 주는 복을 모두 나누어 받는다는 의미를 두고 있다.
향사가 끝나면 모두 강당으로 내려오고 봉작과 봉로는 밤, 대추 몇 개를 상위에 올려서 내려온다. 관리인이“음복례 아뢰오”를 3번 외치고 나면 술과 안주를 차린 상을 내온다.
3헌관이 자리를 잡으면 다른 제집사와 학생들은 모두 그 앞으로 앉고 헌관께 잔을 올리고 상읍한 후 순배한다. 향사의 제물은 모두 날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차려진 제물을 모두 음복할 수 없으므로 음복의 주된 음식은 술과 안주이다. 순배가 끝나면 제향은 모두 마무리 된다.
참고자료
향촌의 유교의례와 문화 <민속원>
서원 한국 사상의 숨결을 찾아서 <예문서원>
차례와 제사 이영춘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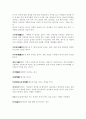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