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누벨바그의 정의
2. 누벨바그 탄생 배경
3. 누벨바그 영화의 특징
4. 누벨바그 영화감독
1). 장 뤽 고다르
2). 프랑수아 트뤼포
5. 누벨바그의 영향
2. 누벨바그 탄생 배경
3. 누벨바그 영화의 특징
4. 누벨바그 영화감독
1). 장 뤽 고다르
2). 프랑수아 트뤼포
5. 누벨바그의 영향
본문내용
트뤼포가 레오를 굳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혹시 그에게서 자신의 상처를 엿봤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고다르와 트뤼포 뿐 아니라 누벨바그의 모든 감독들의 영화에는 공통점이 없는 것 같다. 물론, 사실적인 내용과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려는 것인 누벨바그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안의 세세한 감독들 간의 공통점은 크게 띄지 않는다.
우선 영화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본 누벨바그 영화들에서 인상 깊었던 것들은 모두 앤딩 장면이었다. 고다르의 <네 멋대로 해라>와 <비브르 사 비>란 영화는 모두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총에 맞아 죽는 것이 결말이다. 다른 영화들은 보지 않아서 고다르의 영화의 결말은 이렇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두 영화로 봐서는 고다르가 보는 각 영화의 주인공들의 현실은 정말 비극적이고 희망이 없는 자들이기에 죽음으로 마감되어 더 비극성을 강조한 것 같다.
고다르와는 다르게 트뤼포 영화 <400번의 구타>는 결말이 없다. 영화의 끝은 있지만 영화 안에서의 끝은 알 수 없는 것이다. 주인공 자신조차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한없이 달리기만 하다가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머뭇거린다. 아마 트뤼포는 이 것이 사람들의 인생이라고 해석하거나 자신의 답답했던 과거의 모습을 이러한 장면으로 마무리 지었는 것인지도 모른다.
영화의 전체적인 줄거리에서 고다르와 트뤼포의 차이점은 쉽게 느끼지 못했다. 왜냐 하면 두 감독의 영화 모두 평범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튀는 소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화의 결말로 두 감독의 차이점을 조금이나마 설명할 수 있었다.
5. 누벨바그의 영향
1968년 5월 혁명 이후 누벨바그의 집단적 운동이 쇠퇴한 반면 감독들 각자의 독특한 개성에 따라 작품을 작하는 경향이 커졌는데, 현대영화를 거론할 때 이 개인적 규칙을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것은 바로 60년대부터 이어져 온 흐름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에도 프랑스 영화계는 대중성보다도 예술로서의 영화, 예술가로서의 감독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며, 누벨바그의 영향과 결과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80년대 다양성을 계승하면서 발전해 온 프랑스 영화계는 피아라, 타베르니에, 두아용 등 중견감독들이 활동하고 있고, 다시 상업영화로 복귀한 고다르, 트뤼포 등 누벨바그 세대 장도 작품 활동을 계속하였다. 이후 기독교 권위주의를 고발한 <장미의 이름>으로 성공을 거두고 <베어(1988)>로 확고한 명성을 얻은 아노, <세상의 모든 아침(1992)>을 만든 코르노, 에밀 졸라의 대서사시 <제르미날>을 1993년 같은 제목으로 영화화한 베리 등이 주목받는 감독이다.
1995년에는 유럽통합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영화가 제작되었는데, 유럽의 마지막 거장이라고 하는 크쥐쉬도프 키예슬로브스키가 막대한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제작한 <블루> <화이트> <레드>가 각각 옴니버스 식으로 만들어졌다. 프랑스 국기를 상징하는 이 영화는 유럽이 하나의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의 막대한 물량공세에 자국의 영화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영화인들도 많다. 최근에 이른바 \'누벨 이마쥬\'라는 새로운 장르의 영화로 프랑스 영화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끌어 가는 젊은 감독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영화천재라고 불리 우며, <퐁네프의 연인> <나쁜 피> 등을 제작한 레오 까락스, <디바> <베티블루> 등을 만든 장 작크 베네스, <그랑 블루> <니키다>를 제작한 뤽베송, 1959년 데뷔작을 발표한 루이말의 최근작 <데미지>에 이르기까지 프랑스는 다시 한번 영화 정신의 진정한 종주국으로서의 자리 매김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고다르와 트뤼포 뿐 아니라 누벨바그의 모든 감독들의 영화에는 공통점이 없는 것 같다. 물론, 사실적인 내용과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려는 것인 누벨바그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안의 세세한 감독들 간의 공통점은 크게 띄지 않는다.
우선 영화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본 누벨바그 영화들에서 인상 깊었던 것들은 모두 앤딩 장면이었다. 고다르의 <네 멋대로 해라>와 <비브르 사 비>란 영화는 모두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총에 맞아 죽는 것이 결말이다. 다른 영화들은 보지 않아서 고다르의 영화의 결말은 이렇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두 영화로 봐서는 고다르가 보는 각 영화의 주인공들의 현실은 정말 비극적이고 희망이 없는 자들이기에 죽음으로 마감되어 더 비극성을 강조한 것 같다.
고다르와는 다르게 트뤼포 영화 <400번의 구타>는 결말이 없다. 영화의 끝은 있지만 영화 안에서의 끝은 알 수 없는 것이다. 주인공 자신조차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한없이 달리기만 하다가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머뭇거린다. 아마 트뤼포는 이 것이 사람들의 인생이라고 해석하거나 자신의 답답했던 과거의 모습을 이러한 장면으로 마무리 지었는 것인지도 모른다.
영화의 전체적인 줄거리에서 고다르와 트뤼포의 차이점은 쉽게 느끼지 못했다. 왜냐 하면 두 감독의 영화 모두 평범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튀는 소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화의 결말로 두 감독의 차이점을 조금이나마 설명할 수 있었다.
5. 누벨바그의 영향
1968년 5월 혁명 이후 누벨바그의 집단적 운동이 쇠퇴한 반면 감독들 각자의 독특한 개성에 따라 작품을 작하는 경향이 커졌는데, 현대영화를 거론할 때 이 개인적 규칙을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것은 바로 60년대부터 이어져 온 흐름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에도 프랑스 영화계는 대중성보다도 예술로서의 영화, 예술가로서의 감독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며, 누벨바그의 영향과 결과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80년대 다양성을 계승하면서 발전해 온 프랑스 영화계는 피아라, 타베르니에, 두아용 등 중견감독들이 활동하고 있고, 다시 상업영화로 복귀한 고다르, 트뤼포 등 누벨바그 세대 장도 작품 활동을 계속하였다. 이후 기독교 권위주의를 고발한 <장미의 이름>으로 성공을 거두고 <베어(1988)>로 확고한 명성을 얻은 아노, <세상의 모든 아침(1992)>을 만든 코르노, 에밀 졸라의 대서사시 <제르미날>을 1993년 같은 제목으로 영화화한 베리 등이 주목받는 감독이다.
1995년에는 유럽통합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영화가 제작되었는데, 유럽의 마지막 거장이라고 하는 크쥐쉬도프 키예슬로브스키가 막대한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제작한 <블루> <화이트> <레드>가 각각 옴니버스 식으로 만들어졌다. 프랑스 국기를 상징하는 이 영화는 유럽이 하나의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의 막대한 물량공세에 자국의 영화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영화인들도 많다. 최근에 이른바 \'누벨 이마쥬\'라는 새로운 장르의 영화로 프랑스 영화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끌어 가는 젊은 감독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영화천재라고 불리 우며, <퐁네프의 연인> <나쁜 피> 등을 제작한 레오 까락스, <디바> <베티블루> 등을 만든 장 작크 베네스, <그랑 블루> <니키다>를 제작한 뤽베송, 1959년 데뷔작을 발표한 루이말의 최근작 <데미지>에 이르기까지 프랑스는 다시 한번 영화 정신의 진정한 종주국으로서의 자리 매김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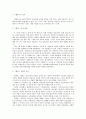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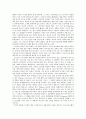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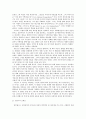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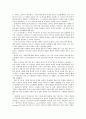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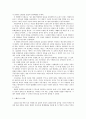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