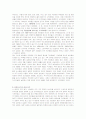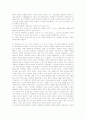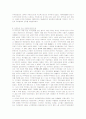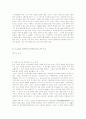목차
1. 까레이스키란?
2. 까레이스키의 강제 이주
3. 이주민의 고난 극복과 한인의 얼
4. 자랑스런 한인의 후예들
* 빅토르 최
* 아니타 최
5. 재소 동포와 사할린의 한.
6. 구 소련내 ‘민족주의’와 까레이스키의 2차 수난.
7. 까레이스키와 바람직한 대-러 관계.
2. 까레이스키의 강제 이주
3. 이주민의 고난 극복과 한인의 얼
4. 자랑스런 한인의 후예들
* 빅토르 최
* 아니타 최
5. 재소 동포와 사할린의 한.
6. 구 소련내 ‘민족주의’와 까레이스키의 2차 수난.
7. 까레이스키와 바람직한 대-러 관계.
본문내용
외국인에게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교포를 방문하지 못하도록 50여년 동안 어둠의 장막으로 덮어 왔었던 것이다. 그 동안 한인교포들의 생활과 고통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리라 본다. 한국정부는 지금 춘천에 사할린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때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확대되어 민족애의 따뜻한 인정이 동포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기를 바래야 겠다.
5. 구 소련내 '민족주의'와 까레이스키의 2차 수난.
(비디오 감상)
6. 까레이스키와 바람직한 대-러 관계.
한인 사회가 얼마나 이국땅에서 탄압과 고통을 받아가며 쓰라린 민족적 차별을 당하고 있었던가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또 한인들은 법적인 지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수 많은 고통과 탄압을 받으며 생활 하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뼈를 깎고 가슴을 돌려내는 아픔이 지금도 들어옴을 느낄 수 있다.
소련은 지금까지 러시아어를 국어로 사용하여 한인 교포들이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한국어를 잊고 살아가는 교포들이 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한인 1세대들이 이미 죽거나 노령화되어 가고, 교포사회가 2세, 3세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우즈벼의 경우, 재소한인 18만여명 가운데 모국어가 한국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56%에 불과하며, 러시아어가 모국어라고 한 사람이 43%, 우즈베크어가 모국어라고 답한 사람이 나머지 1% 였다.(1989년 조사자료). 또한, 이러한 통계 숫자는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으며, 특히 한인 2세, 3세로 내려갈수록 한국어를 아는 사람의 숫자는 아주 희박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한인교포 3세들이 얼마나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또 한국의 역사 및 전통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점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연령적으로 고령인 노인들과 사할린 동포들은 그래도 우리의 말과 풍속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점점 잊혀져 가는 점에서 재소한인 교포들의 새로운 대책이 마련되어야 겠다.
1993년 4월 1일 러시아 최고회의 민족원(하원)에서는 56년만에 <한인명예회복법안>의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강제로 추방된 한인들의 정치적 명예회복이 주요 내용이 된 이 법률안 <재러시아 한인명예회복법안>을 러시아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이 법안 내용은 1937년 원동지방에서 죽음, 고통, 그리고 굶주림과 탄압의 갖은 핍박을 다 받으면서 강제추방 당하게 하였던 소련지도층의 잘못된 정치적 정책을 이제 시인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동안 탄압 받아오던 한민족의 한이 백일하에 밝혀진 역사적 사실이였다. 이 법안이 완전히 통과되고 실행에 옮겨진다면, 재소 한인 50만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한인들의 연해주 지방 이주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한인들을 위한 법률적 제반문제들이 해결될 것은 물론 한국의 역사, 전통, 예술을 위한 러시아 정부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5. 구 소련내 '민족주의'와 까레이스키의 2차 수난.
(비디오 감상)
6. 까레이스키와 바람직한 대-러 관계.
한인 사회가 얼마나 이국땅에서 탄압과 고통을 받아가며 쓰라린 민족적 차별을 당하고 있었던가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또 한인들은 법적인 지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수 많은 고통과 탄압을 받으며 생활 하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뼈를 깎고 가슴을 돌려내는 아픔이 지금도 들어옴을 느낄 수 있다.
소련은 지금까지 러시아어를 국어로 사용하여 한인 교포들이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한국어를 잊고 살아가는 교포들이 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한인 1세대들이 이미 죽거나 노령화되어 가고, 교포사회가 2세, 3세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우즈벼의 경우, 재소한인 18만여명 가운데 모국어가 한국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56%에 불과하며, 러시아어가 모국어라고 한 사람이 43%, 우즈베크어가 모국어라고 답한 사람이 나머지 1% 였다.(1989년 조사자료). 또한, 이러한 통계 숫자는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으며, 특히 한인 2세, 3세로 내려갈수록 한국어를 아는 사람의 숫자는 아주 희박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한인교포 3세들이 얼마나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또 한국의 역사 및 전통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점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연령적으로 고령인 노인들과 사할린 동포들은 그래도 우리의 말과 풍속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점점 잊혀져 가는 점에서 재소한인 교포들의 새로운 대책이 마련되어야 겠다.
1993년 4월 1일 러시아 최고회의 민족원(하원)에서는 56년만에 <한인명예회복법안>의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강제로 추방된 한인들의 정치적 명예회복이 주요 내용이 된 이 법률안 <재러시아 한인명예회복법안>을 러시아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이 법안 내용은 1937년 원동지방에서 죽음, 고통, 그리고 굶주림과 탄압의 갖은 핍박을 다 받으면서 강제추방 당하게 하였던 소련지도층의 잘못된 정치적 정책을 이제 시인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동안 탄압 받아오던 한민족의 한이 백일하에 밝혀진 역사적 사실이였다. 이 법안이 완전히 통과되고 실행에 옮겨진다면, 재소 한인 50만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한인들의 연해주 지방 이주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한인들을 위한 법률적 제반문제들이 해결될 것은 물론 한국의 역사, 전통, 예술을 위한 러시아 정부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