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장르의 변화와 미시적 관점에서 본 ‘개성’
2. 구체적인 작품 분석 - [우아한 세계]
1) 영화의 서사구조
2) 전형적이지 않은 조폭 - 주인공 ‘강인구’
3) 전형적이지 않은 영화양식(Film Style)
4) [우아한 세계]의 메시지
Ⅲ 글을 마치며
Ⅱ 본론
1. 장르의 변화와 미시적 관점에서 본 ‘개성’
2. 구체적인 작품 분석 - [우아한 세계]
1) 영화의 서사구조
2) 전형적이지 않은 조폭 - 주인공 ‘강인구’
3) 전형적이지 않은 영화양식(Film Style)
4) [우아한 세계]의 메시지
Ⅲ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한 세계]의 메시지
인구는 자신이 존경해마지 않았던 노회장까지 어쩔 수 없이 죽여가며 결국 오매불망 꿈에 그리던 전원주택을 얻고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된다. (4)에서 말했듯이 “저봐, (인생이란) 저런거지, 저런 거. 뭐, 애들 데리고.”라던 그의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인구의 소원성취 상태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희순이 캐나다로 유학을 가고 싶어하자 희순을 유학 보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두 자식이 모두 캐나다에 있는 꼴이 되니 부인 역시 자식들을 뒷바라지 하러 따라가게 된다. 꿈을 이룬지 며칠 만에 기러기 아빠가 된 셈이다. 이후 기러기 아빠 인구의 생활은 극도로 불규칙해지고, 1년 후에는 당뇨마저 찾아온다. 그러던 어느 날이다. 햇살이 좋은 아침에 인구는 이불 빨래의 먼지를 털고 있다(그림9). 햇살도 좋고, 집도 좋지만 인구의 표정은 그리 밝지가 않다(그림10). 아침도 라면으로밖에는 때울 수가 없다(그림11). 그 때, 캐나다로부터 가족들의 소포-비디오가 배달되고 인구는 만면이 희색이 되어(그림12) 허겁지겁 비디오를 틀기 시작한다. 인구의 기분은 너무나도 좋다(그림13).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가족들은 저기서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여기서 뭔가.”하는 생각에 슬퍼지기 시작하고는 급기야 울음을 터뜨린다(그림14). 인구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고 흐느낀다. 그리고는 먹던 라면 그릇을 던진다(그림15). 하지만 인생의 진짜 단면이 어떤지 우리는 알고 있다. 인구는 라면 그릇을 던졌지만, 곧 후회하고는 부엌으로 가서 노란 걸레와 검정 봉지하나를 들고 저벅저벅 되돌아와 치워야만 한다(그림16). 치우다가 화가 나면 다시 노란 걸레를 던지겠지만(그림17), 그래도 또다시 묵묵히 치워야만 한다. 이 시퀀스는 감독이 의도적으로 인구의 라면 그릇 치우는 행동을 부각하도록 연출되었다. 텔레비전 안의 가족들의 모습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나중에 입혀진 것이고, 선명도도 극히 떨어진다. 게다가, 창에서 들어오는 빛 때문에 가족들의 밝은 삶은 반사되어 잘 드러나지 않고, 따라서 인구가 치우는 장면이 강조된다. 이제 관객은 질문한다. 이 남자는 무얼 위해서 갖은 사회적 고초를 견디어 가며 가장 노릇을 했고, 기러기 아빠 노릇을 하는지, 얼마나 이 남자가 미련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한다. 행복이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가장 기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다.
Ⅲ 글을 마치며
영화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영화의 ‘사실주의’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본인이 섣불리 ‘사실주의’의 편을 들어, ‘영화는 현실 세계의 유의미한 단면을 포착하여 표현해야 한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잘못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재현’이 예술을 설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개념이며, 이것이 영화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물론 여기서 본인이 언급하는 ‘재현’은 단순히 대상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객관적인 의미가 아니라, 대상의 이상화 혹은 양식화를 통해 대상의 본질을 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때의 ‘재현’은 많은 학자들이 말하듯, 객관적인 재현이 아니라 자기의 해석을 거친 주관적인 ‘재현’이다.
영화라는 장르는 다른 예술 장르에 비해, 대상을 재현하는데 훨씬 수월하다. 오늘의 인간에게는 모든 시사적인 것, 동시대적인 것, 현시점에 함께 얽혀 있는 것들이 특별한 의의와 가치를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에 차 있는 까닭에 동시성이라는 사실 자체가 그의 눈에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즉, 현대인의 정신세계는 직접적 현재성과 동시성의 느낌에 젖어 있다.12) 영화는 카메라를 통하여 동시대적인 현실을 주관적이나마 가장 그럴듯하게 담아낼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사진처럼 ‘순간’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지닌 이야기로써 표현할 수 있다.
본 영화의 특징으로 언급했던 이른바 다큐멘터리적 양식은, 현대인의 정신세계가 직접적 현재성과 동시성의 느낌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강점으로 작용한다. 영화 장르 역시 100여년의 세월을 거쳐오면서 많은 관습을 만들어 냈고, 그 결과 관객들은 ‘저것은 현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지.’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의 양식을 빌려옴으로써, 본 영화는 다시 한 번 영화가 예전에 지녔던 현재성과 동시성의 느낌을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관객이 다시금 자신의 현실을 반추하는 계기를 만들어낸다.
인구는 자신이 존경해마지 않았던 노회장까지 어쩔 수 없이 죽여가며 결국 오매불망 꿈에 그리던 전원주택을 얻고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된다. (4)에서 말했듯이 “저봐, (인생이란) 저런거지, 저런 거. 뭐, 애들 데리고.”라던 그의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인구의 소원성취 상태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희순이 캐나다로 유학을 가고 싶어하자 희순을 유학 보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두 자식이 모두 캐나다에 있는 꼴이 되니 부인 역시 자식들을 뒷바라지 하러 따라가게 된다. 꿈을 이룬지 며칠 만에 기러기 아빠가 된 셈이다. 이후 기러기 아빠 인구의 생활은 극도로 불규칙해지고, 1년 후에는 당뇨마저 찾아온다. 그러던 어느 날이다. 햇살이 좋은 아침에 인구는 이불 빨래의 먼지를 털고 있다(그림9). 햇살도 좋고, 집도 좋지만 인구의 표정은 그리 밝지가 않다(그림10). 아침도 라면으로밖에는 때울 수가 없다(그림11). 그 때, 캐나다로부터 가족들의 소포-비디오가 배달되고 인구는 만면이 희색이 되어(그림12) 허겁지겁 비디오를 틀기 시작한다. 인구의 기분은 너무나도 좋다(그림13).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가족들은 저기서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여기서 뭔가.”하는 생각에 슬퍼지기 시작하고는 급기야 울음을 터뜨린다(그림14). 인구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고 흐느낀다. 그리고는 먹던 라면 그릇을 던진다(그림15). 하지만 인생의 진짜 단면이 어떤지 우리는 알고 있다. 인구는 라면 그릇을 던졌지만, 곧 후회하고는 부엌으로 가서 노란 걸레와 검정 봉지하나를 들고 저벅저벅 되돌아와 치워야만 한다(그림16). 치우다가 화가 나면 다시 노란 걸레를 던지겠지만(그림17), 그래도 또다시 묵묵히 치워야만 한다. 이 시퀀스는 감독이 의도적으로 인구의 라면 그릇 치우는 행동을 부각하도록 연출되었다. 텔레비전 안의 가족들의 모습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나중에 입혀진 것이고, 선명도도 극히 떨어진다. 게다가, 창에서 들어오는 빛 때문에 가족들의 밝은 삶은 반사되어 잘 드러나지 않고, 따라서 인구가 치우는 장면이 강조된다. 이제 관객은 질문한다. 이 남자는 무얼 위해서 갖은 사회적 고초를 견디어 가며 가장 노릇을 했고, 기러기 아빠 노릇을 하는지, 얼마나 이 남자가 미련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한다. 행복이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가장 기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다.
Ⅲ 글을 마치며
영화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영화의 ‘사실주의’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본인이 섣불리 ‘사실주의’의 편을 들어, ‘영화는 현실 세계의 유의미한 단면을 포착하여 표현해야 한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잘못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재현’이 예술을 설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개념이며, 이것이 영화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물론 여기서 본인이 언급하는 ‘재현’은 단순히 대상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객관적인 의미가 아니라, 대상의 이상화 혹은 양식화를 통해 대상의 본질을 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때의 ‘재현’은 많은 학자들이 말하듯, 객관적인 재현이 아니라 자기의 해석을 거친 주관적인 ‘재현’이다.
영화라는 장르는 다른 예술 장르에 비해, 대상을 재현하는데 훨씬 수월하다. 오늘의 인간에게는 모든 시사적인 것, 동시대적인 것, 현시점에 함께 얽혀 있는 것들이 특별한 의의와 가치를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에 차 있는 까닭에 동시성이라는 사실 자체가 그의 눈에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즉, 현대인의 정신세계는 직접적 현재성과 동시성의 느낌에 젖어 있다.12) 영화는 카메라를 통하여 동시대적인 현실을 주관적이나마 가장 그럴듯하게 담아낼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사진처럼 ‘순간’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지닌 이야기로써 표현할 수 있다.
본 영화의 특징으로 언급했던 이른바 다큐멘터리적 양식은, 현대인의 정신세계가 직접적 현재성과 동시성의 느낌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강점으로 작용한다. 영화 장르 역시 100여년의 세월을 거쳐오면서 많은 관습을 만들어 냈고, 그 결과 관객들은 ‘저것은 현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지.’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의 양식을 빌려옴으로써, 본 영화는 다시 한 번 영화가 예전에 지녔던 현재성과 동시성의 느낌을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관객이 다시금 자신의 현실을 반추하는 계기를 만들어낸다.
추천자료
 영화와 정치 : 68 이후 프랑스 영화의 화두
영화와 정치 : 68 이후 프랑스 영화의 화두 영화 속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틀과 여성영화의 중요성
영화 속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틀과 여성영화의 중요성 [영화 평론] 페미니즘 영화 분석
[영화 평론] 페미니즘 영화 분석 영화음악이 영화에 끼치는 영향
영화음악이 영화에 끼치는 영향 [한국영화산업][영화시장][상업영화]한국영화산업(영화시장, 상업영화)의 구조, 한국영화산업...
[한국영화산업][영화시장][상업영화]한국영화산업(영화시장, 상업영화)의 구조, 한국영화산업... [프랑스영화][누벨바그][프랑스영화산업][프랑스 유명 영화인][프랑스영화 작품]프랑스영화의...
[프랑스영화][누벨바그][프랑스영화산업][프랑스 유명 영화인][프랑스영화 작품]프랑스영화의... [표현주의][다리파][청기사파][표현주의 영화][표현주의 건축][표현주의 시]표현주의의 대표...
[표현주의][다리파][청기사파][표현주의 영화][표현주의 건축][표현주의 시]표현주의의 대표... 회색으로 재현된 영화속 공간과 캐릭터에 대한 고찰-팀버튼 영화를 중심으로
회색으로 재현된 영화속 공간과 캐릭터에 대한 고찰-팀버튼 영화를 중심으로 [영화역사 분석] 중남미 영화의 역사
[영화역사 분석] 중남미 영화의 역사 할리우드영화산업 - 스크린쿼터제,영화산업,브랜드마케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사례분석,...
할리우드영화산업 - 스크린쿼터제,영화산업,브랜드마케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사례분석,... [인도영화]인도영화사
[인도영화]인도영화사 [취미와예술][독립영향][워낭소리][독립영화와상업영화의차이점] 취미로서의 영화: 영화란 무...
[취미와예술][독립영향][워낭소리][독립영화와상업영화의차이점] 취미로서의 영화: 영화란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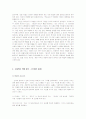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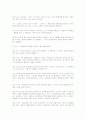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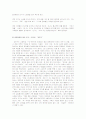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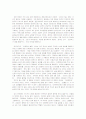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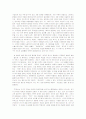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