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당시의 시대적 상황
Ⅲ. 일연의 생애
Ⅳ. 일연의 사상
Ⅴ. 일연의 저서와 『삼국유사』
Ⅵ. 맺음말
Ⅱ. 당시의 시대적 상황
Ⅲ. 일연의 생애
Ⅳ. 일연의 사상
Ⅴ. 일연의 저서와 『삼국유사』
Ⅵ. 맺음말
본문내용
및 일화 등을 대부분 금석 및 고적으로부터의 인용과 견문에 의하여 집대성해 놓은 한국 고대 정치·사회·문화 생활의 유영(遺影)으로서 한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일대 서사시라 할 수 있다.
저자 고운기는 삼국유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고운기,「 일연과 삼국유사의 시대」, 월인, 2001
“세계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한국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계는 우리를 향해 ‘너희는 누구냐’는 질문을 더 자주 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 우린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주야 하는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 삼국유사만한 텍스트는 없습니다.”
기실 이 삼국유사가 아니면 우리가 고대 삼국사의 여러 정치를 어떻게 그려낼 것이며, 이 책이 아니면 향가로 나타나는 우리 문학사의 한 시대를 송두리째 유실되지는 않았을 까?
Ⅵ. 맺 음 말
처음엔 다만 공부를 하기 위해 갔던 무량사에서 인연이 되어 일연은 열 네 살 되던 해 설악산 아래 강원도 양양의 진전사로 가서 삭발을 하고 스님이 되었다. 스물두살에 승과에 나가 합격한 일연은 이후 몽골 전란기의 혼란한 사회 상황 속에서도 올곧은 수도 생활을 계속하여 삼중대사, 선사, 대선사 등의 직급에 차례차례 올랐고 마흔네살에는 당대의 실력자 정안의 초청으로 정림사의 주지로 부임하면서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이때부터 바야흐로 불교계의 지도자로 자리 잡아가게 되고 1281년, 그의 나이 일흔 여덟에 국사로 책봉되었다. 이제 명실상부한 한 나라의 정신적인 지도자가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연을 그 생애의 화려한 경력 때문에 높이 평가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그를 존경해 마지않는 것은 무신정권기와 몽골 전란기를 헤쳐가면서 그가 보여준 삶의 궤적 때문이다. 비록 작은 나라의 승려로 힘없는 자의 설움을 당하면서도 그는 민족의 자존을 늘 염두에 두었던 사람이다. 그것을 그는 불교적 인식세계에서 불국토 사상으로 이었으며, 만년에 정리한 『삼국유사』에 여실히 표현해 놓았다.
그런데 누구를 붙들고라도 『삼국유사』를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이 책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한편 한 조라도 읽어보았는지를 물으면 시원한 대답을 듣기가 어렵다. 필자 또한 역사를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진득하게 『삼국유사』를 한번이라도 완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과제를 하면서 좌괴감을 감출 수 없었다.
지금까지 『삼국유사』는 몇몇 학자의 선구적인 노력으로 책의 구조와 기술체계 등이 연구되었지만, 편자로서 일연의 의식과 저술의도를 정밀히 밝혀보지는 못했다. 이것은 또한 저자인 인간으로서의 일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의 생애의 자세한 이력을 알지 못하는 형편은 남겨진 기록의 미비 때문이지만, 방증할 수 있는 자료를 두루 원용하여 구체적으로 밝혀보려는 노력이 미진했다.
앞으로 일연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일연이 편찬한 『삼국유사』에 대한 이해도 종래와 같이 『삼국사기』와 비교하여 이해하는 입장에서 탈피하여 13세기 시대적 상황과 동아시아의 사상사, 역사인식의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 아닌 가 한다.
저자 고운기는 삼국유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고운기,「 일연과 삼국유사의 시대」, 월인, 2001
“세계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한국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계는 우리를 향해 ‘너희는 누구냐’는 질문을 더 자주 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 우린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주야 하는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 삼국유사만한 텍스트는 없습니다.”
기실 이 삼국유사가 아니면 우리가 고대 삼국사의 여러 정치를 어떻게 그려낼 것이며, 이 책이 아니면 향가로 나타나는 우리 문학사의 한 시대를 송두리째 유실되지는 않았을 까?
Ⅵ. 맺 음 말
처음엔 다만 공부를 하기 위해 갔던 무량사에서 인연이 되어 일연은 열 네 살 되던 해 설악산 아래 강원도 양양의 진전사로 가서 삭발을 하고 스님이 되었다. 스물두살에 승과에 나가 합격한 일연은 이후 몽골 전란기의 혼란한 사회 상황 속에서도 올곧은 수도 생활을 계속하여 삼중대사, 선사, 대선사 등의 직급에 차례차례 올랐고 마흔네살에는 당대의 실력자 정안의 초청으로 정림사의 주지로 부임하면서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이때부터 바야흐로 불교계의 지도자로 자리 잡아가게 되고 1281년, 그의 나이 일흔 여덟에 국사로 책봉되었다. 이제 명실상부한 한 나라의 정신적인 지도자가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연을 그 생애의 화려한 경력 때문에 높이 평가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그를 존경해 마지않는 것은 무신정권기와 몽골 전란기를 헤쳐가면서 그가 보여준 삶의 궤적 때문이다. 비록 작은 나라의 승려로 힘없는 자의 설움을 당하면서도 그는 민족의 자존을 늘 염두에 두었던 사람이다. 그것을 그는 불교적 인식세계에서 불국토 사상으로 이었으며, 만년에 정리한 『삼국유사』에 여실히 표현해 놓았다.
그런데 누구를 붙들고라도 『삼국유사』를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이 책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한편 한 조라도 읽어보았는지를 물으면 시원한 대답을 듣기가 어렵다. 필자 또한 역사를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진득하게 『삼국유사』를 한번이라도 완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과제를 하면서 좌괴감을 감출 수 없었다.
지금까지 『삼국유사』는 몇몇 학자의 선구적인 노력으로 책의 구조와 기술체계 등이 연구되었지만, 편자로서 일연의 의식과 저술의도를 정밀히 밝혀보지는 못했다. 이것은 또한 저자인 인간으로서의 일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의 생애의 자세한 이력을 알지 못하는 형편은 남겨진 기록의 미비 때문이지만, 방증할 수 있는 자료를 두루 원용하여 구체적으로 밝혀보려는 노력이 미진했다.
앞으로 일연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일연이 편찬한 『삼국유사』에 대한 이해도 종래와 같이 『삼국사기』와 비교하여 이해하는 입장에서 탈피하여 13세기 시대적 상황과 동아시아의 사상사, 역사인식의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 아닌 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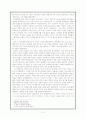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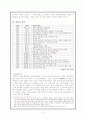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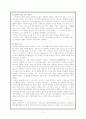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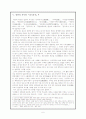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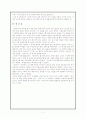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