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옥이란
한옥의 기원
한옥의 역사
1) 원시시대
▣ 구석기 시대
▣ 신석기 시대
▣ 청동기/철기 시대
2) 초기고대국가시대
3) 삼국시대
▣ 고구려
▣ 백제
▣ 신라
4) 통일신라시대
5) 고려시대
6) 조선시대
▣ 조선시대의 상류주택
▣ 조선시대의 서민주택
7) 일제시대
▣ 토막집, 판자집촌(불량주거)
▣ 영단주택
8) 근대이후
▣ 70년대 아파트시대 개막과 거실중심구조 정착
▣ 새마을 운동과 농촌의 주거문화
한옥의 구조적 분류
1) 건물분류
2) 세부분류
한옥의 기능적 분류
한옥의 지역적 분류
1) 함경도 지방형
2) 평안도 지방형
3) 중부 지방형
4) 남부 지방형
5) 제주도 형
6) 울릉도 형
한옥의 재료별 분류
▣움집
▣토담집
▣귀틀집
한옥의 기원
한옥의 역사
1) 원시시대
▣ 구석기 시대
▣ 신석기 시대
▣ 청동기/철기 시대
2) 초기고대국가시대
3) 삼국시대
▣ 고구려
▣ 백제
▣ 신라
4) 통일신라시대
5) 고려시대
6) 조선시대
▣ 조선시대의 상류주택
▣ 조선시대의 서민주택
7) 일제시대
▣ 토막집, 판자집촌(불량주거)
▣ 영단주택
8) 근대이후
▣ 70년대 아파트시대 개막과 거실중심구조 정착
▣ 새마을 운동과 농촌의 주거문화
한옥의 구조적 분류
1) 건물분류
2) 세부분류
한옥의 기능적 분류
한옥의 지역적 분류
1) 함경도 지방형
2) 평안도 지방형
3) 중부 지방형
4) 남부 지방형
5) 제주도 형
6) 울릉도 형
한옥의 재료별 분류
▣움집
▣토담집
▣귀틀집
본문내용
\'가 그와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토담집
움집이 불편하다고 느끼게 되자 인류는 지상으로 탈출을 시도한다. 지금은 초가집이 민속마을에나 가야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귀하지만 1970년대만 해도 시골마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토담집은 움집이 지상가옥으로 발전하면서 보이는 최초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토담집이 민속마을에나 가야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귀하지만 1970년대만 해도 시골마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토담집은 움집이 지상가옥으로 발전하면서 보이는 최초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가운데 부엌의 화덕이 왼쪽 방까지 연결되었고, 공간이 더 필요하니까 부엌의 오른쪽에 임시 방을 만들고 바닥을 흙인 채로 남겨놓아 일이 편리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좀더 발전한 형태가 바로 3칸의 토담집이다. 조선 시대에 백성은 초가집에서 살았지만 상당수는 토담집이 없어서 움막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도 주택 문제가 심각하지만 당시에는 토담집만해도 감지덕지할 정도였다. 이것은 1920~30년대 서울 근교에서 움막을 짓고 살았던 빈민들의 사진에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귀틀집
귀틀집이란 큰 통나무를 우물 정자 모양으로 얹고, 틈을 흙으로 메워지은 집을 귀틀집이라고 한다. 고분 벽화나 삼국지를 보면 상고시대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산악지대와 울릉도에 주로 분포한다. 돌기와를 얹은 무거운 지붕도 끄떡없이 지탱할 정도로 구조 자체가 튼튼하다. 때문에 눈이 많이 오는 지방에서 즐겨 지었다고 한다. 집안에 기둥이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울릉도 투방집은 육지의 귀틀집, 너와집과 마찬가지로 전혀 못을 사용하지 않고 통나무와 나무껍질로만 지었다. 그러나 육지와는 달리 형태와 크기가 독특하고 바람과 눈이 많은 섬 지방의 기후에 잘 견딜 수 있도록 매우 견고하게 지어져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집수리 한번 하지 않았으나 원형대로 보존되고 있다.
집 둘레에는 싸리나 옥수수대로 울타리(우데기)를 만들어 겨울의 바람을 막아주고 있으며, 내부의 방은 대개 3칸인데 부엌이 헛간과 장독을 겸하고 있어 지붕 위에까지 눈이 쌓여 통행이 되지 않아도 집안에서 식생활을 하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을 만큼 규모가 큰 편이다.
방은 지름 20 ~ 30cm, 길이 3m 가량의 통나무를 정방형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려 2개의 방을 먼저 만든 뒤 가운데의 공간 양측을 또다시 통나무를 쌓아올려 3칸의 방이 된다. 통나무 사이의 벌어진 틈은 진흙에 억새풀을 섞고 물에 반죽하여 메우며, 방바닥엔 대나무를 엮은 돗자리를 깔아 장판을 대용한다.
방이 완성되면 5 ~6평쯤 되는 커다란 부엌을 달아내며 마루가 없는 대신 울타리를 집에 바짝 붙여 놓는데 이것은 찬바람이 방벽에 직접 와 닿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벽을 쌓는 재료는 횡경피나무, 단풍나무, 너도밤나무를 주로 사용하였고, 굴뚝은 질이 단단한 주목 둥치를 잘라 속을 파낸 뒤 세웠으며, 지붕은 고로쇠나무나 솔송나무 등을 기와모양으로 빚어 얹었는데 비가 새거나 눈무게로 내려앉는 일은 있을 수 없을 만큼 튼튼하게 지어져 있으며, 여름에는 시원하고 따뜻한 것이 특색이다.
▣초가집
초가는 짚(볏짚, 조짚)이나 새(억새, 새풀), 띠풀로 지붕을 이은 띠집을 일컫는 말로서 집이 처음 생길 때는 겨릅, 새풀, 쑥대, 죽실, 띠를 모두 사용하다가 농사를 짓게 되자 벼나 조의 짚, 수수대 등 농작물의 부산물을쓴 것으로 추측된다.
▶일반적 초가
볏짚으로 지붕을 이은 집을 말한다.
▶샛집(풀집)
보통은 초가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영동과 영남지방의 산간지대에서는 샛집을 따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물론 재료가 다를 뿐 아니라 지붕의 모양도 물매가 싸서 전혀 같지 않으며, 재료의 채취, 가공 지붕잇기 등에 노동력이 많이 드는 대신 재료의 수명은 거의 십 년 이상 갈 수 있기 때문에 초가와 구별된다.
▶새
억새풀의 일종으로서 지역에 따라 종류가 조금씩 다르다. 지부의 재료로 이용된 것은 세골왕골을 포함한 골풀, 억새, 띠풀, 갈대 등을 모두 이용했다. 특히 제주와 소백과 태백산맥 산간지대의 새는 이름만 같고 종류가 전혀 다르다. 제주도에서는 볏짚으로 해 이르면 비바람이 심해서 일년도 채 견딜 수 없을 뿐 아니라 벼농사가 거의 없어져서 짚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죽실집
태백산맥 골짜기에 아주 드물게 분포하는 집이다. 너무 산간이라 벼농사는 물론이고 새도 산출되지 않는 곳에서는 판자나 굴피로 지붕을 이은 너와집이나 투비집(굴피집)을 짓는 게 일반적이지만 중요하지 않은 곁채는 산에서 많이 나는 산죽, 곧 죽실로 지붕을 해 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것은 비가 잘 새기 때문에 진새를 잘 치고 죽실을 두껍게 해 덮는다.
참고자료
참고문헌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姜榮煥, 技文堂
우리 건축, 틈으로 본다 34~35p, 대한 교과서, 권삼윤
한옥의 재발견, 주식회사 주택문화사
참고 인터넷 사이트
http://korean-house.wo.to/
http://da2003.digital-architecture.or.kr/ddugi/html/menu3/menu3_5_13.htm
http://www.hanok.org/housestory4.htm
http://www.ianaid.co.kr/special/k1.htm
http://web.edunet4u.net/~hanok
http://www2.donga.com/docs/magazine/news_plus/news183/np183ii030.html
http://hanok119.com/
http://design.skku.ac.kr/index/course/소논문/근대도시주거.hwp
http://www.at.co.kr/kr_uleung.htm
http://seoul600.visitseoul.net/seoul-history/sidaesa/txt/6-10-1-3-2.html
http://youhoa.hihome.com/framest_report1.htm
http://gunnet.co.kr/history/korea/word-01.htm
http://phy2002.com/index5.htm
▣토담집
움집이 불편하다고 느끼게 되자 인류는 지상으로 탈출을 시도한다. 지금은 초가집이 민속마을에나 가야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귀하지만 1970년대만 해도 시골마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토담집은 움집이 지상가옥으로 발전하면서 보이는 최초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토담집이 민속마을에나 가야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귀하지만 1970년대만 해도 시골마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토담집은 움집이 지상가옥으로 발전하면서 보이는 최초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가운데 부엌의 화덕이 왼쪽 방까지 연결되었고, 공간이 더 필요하니까 부엌의 오른쪽에 임시 방을 만들고 바닥을 흙인 채로 남겨놓아 일이 편리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좀더 발전한 형태가 바로 3칸의 토담집이다. 조선 시대에 백성은 초가집에서 살았지만 상당수는 토담집이 없어서 움막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도 주택 문제가 심각하지만 당시에는 토담집만해도 감지덕지할 정도였다. 이것은 1920~30년대 서울 근교에서 움막을 짓고 살았던 빈민들의 사진에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귀틀집
귀틀집이란 큰 통나무를 우물 정자 모양으로 얹고, 틈을 흙으로 메워지은 집을 귀틀집이라고 한다. 고분 벽화나 삼국지를 보면 상고시대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산악지대와 울릉도에 주로 분포한다. 돌기와를 얹은 무거운 지붕도 끄떡없이 지탱할 정도로 구조 자체가 튼튼하다. 때문에 눈이 많이 오는 지방에서 즐겨 지었다고 한다. 집안에 기둥이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울릉도 투방집은 육지의 귀틀집, 너와집과 마찬가지로 전혀 못을 사용하지 않고 통나무와 나무껍질로만 지었다. 그러나 육지와는 달리 형태와 크기가 독특하고 바람과 눈이 많은 섬 지방의 기후에 잘 견딜 수 있도록 매우 견고하게 지어져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집수리 한번 하지 않았으나 원형대로 보존되고 있다.
집 둘레에는 싸리나 옥수수대로 울타리(우데기)를 만들어 겨울의 바람을 막아주고 있으며, 내부의 방은 대개 3칸인데 부엌이 헛간과 장독을 겸하고 있어 지붕 위에까지 눈이 쌓여 통행이 되지 않아도 집안에서 식생활을 하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을 만큼 규모가 큰 편이다.
방은 지름 20 ~ 30cm, 길이 3m 가량의 통나무를 정방형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려 2개의 방을 먼저 만든 뒤 가운데의 공간 양측을 또다시 통나무를 쌓아올려 3칸의 방이 된다. 통나무 사이의 벌어진 틈은 진흙에 억새풀을 섞고 물에 반죽하여 메우며, 방바닥엔 대나무를 엮은 돗자리를 깔아 장판을 대용한다.
방이 완성되면 5 ~6평쯤 되는 커다란 부엌을 달아내며 마루가 없는 대신 울타리를 집에 바짝 붙여 놓는데 이것은 찬바람이 방벽에 직접 와 닿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벽을 쌓는 재료는 횡경피나무, 단풍나무, 너도밤나무를 주로 사용하였고, 굴뚝은 질이 단단한 주목 둥치를 잘라 속을 파낸 뒤 세웠으며, 지붕은 고로쇠나무나 솔송나무 등을 기와모양으로 빚어 얹었는데 비가 새거나 눈무게로 내려앉는 일은 있을 수 없을 만큼 튼튼하게 지어져 있으며, 여름에는 시원하고 따뜻한 것이 특색이다.
▣초가집
초가는 짚(볏짚, 조짚)이나 새(억새, 새풀), 띠풀로 지붕을 이은 띠집을 일컫는 말로서 집이 처음 생길 때는 겨릅, 새풀, 쑥대, 죽실, 띠를 모두 사용하다가 농사를 짓게 되자 벼나 조의 짚, 수수대 등 농작물의 부산물을쓴 것으로 추측된다.
▶일반적 초가
볏짚으로 지붕을 이은 집을 말한다.
▶샛집(풀집)
보통은 초가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영동과 영남지방의 산간지대에서는 샛집을 따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물론 재료가 다를 뿐 아니라 지붕의 모양도 물매가 싸서 전혀 같지 않으며, 재료의 채취, 가공 지붕잇기 등에 노동력이 많이 드는 대신 재료의 수명은 거의 십 년 이상 갈 수 있기 때문에 초가와 구별된다.
▶새
억새풀의 일종으로서 지역에 따라 종류가 조금씩 다르다. 지부의 재료로 이용된 것은 세골왕골을 포함한 골풀, 억새, 띠풀, 갈대 등을 모두 이용했다. 특히 제주와 소백과 태백산맥 산간지대의 새는 이름만 같고 종류가 전혀 다르다. 제주도에서는 볏짚으로 해 이르면 비바람이 심해서 일년도 채 견딜 수 없을 뿐 아니라 벼농사가 거의 없어져서 짚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죽실집
태백산맥 골짜기에 아주 드물게 분포하는 집이다. 너무 산간이라 벼농사는 물론이고 새도 산출되지 않는 곳에서는 판자나 굴피로 지붕을 이은 너와집이나 투비집(굴피집)을 짓는 게 일반적이지만 중요하지 않은 곁채는 산에서 많이 나는 산죽, 곧 죽실로 지붕을 해 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것은 비가 잘 새기 때문에 진새를 잘 치고 죽실을 두껍게 해 덮는다.
참고자료
참고문헌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姜榮煥, 技文堂
우리 건축, 틈으로 본다 34~35p, 대한 교과서, 권삼윤
한옥의 재발견, 주식회사 주택문화사
참고 인터넷 사이트
http://korean-house.wo.to/
http://da2003.digital-architecture.or.kr/ddugi/html/menu3/menu3_5_13.htm
http://www.hanok.org/housestory4.htm
http://www.ianaid.co.kr/special/k1.htm
http://web.edunet4u.net/~hanok
http://www2.donga.com/docs/magazine/news_plus/news183/np183ii030.html
http://hanok119.com/
http://design.skku.ac.kr/index/course/소논문/근대도시주거.hwp
http://www.at.co.kr/kr_uleung.htm
http://seoul600.visitseoul.net/seoul-history/sidaesa/txt/6-10-1-3-2.html
http://youhoa.hihome.com/framest_report1.htm
http://gunnet.co.kr/history/korea/word-01.htm
http://phy2002.com/index5.htm
키워드
추천자료
 현대 중국의 음식문화
현대 중국의 음식문화 한중일 삼국의 전통복식에 관한 고찰
한중일 삼국의 전통복식에 관한 고찰 국제관계학 시험 대비 요약본
국제관계학 시험 대비 요약본  외식산업 외식
외식산업 외식 관광자원 개발
관광자원 개발 보건소의 조직․인력․기능․업무
보건소의 조직․인력․기능․업무 [공동체][봉사활동][시민운동][고용관행][지방자치]공동체의 정의, 공동체의 역사, 공동체와 ...
[공동체][봉사활동][시민운동][고용관행][지방자치]공동체의 정의, 공동체의 역사, 공동체와 ... 최근FTA의 모든 것 - 수출통관제도 과 FTA관련용어정리
최근FTA의 모든 것 - 수출통관제도 과 FTA관련용어정리 고구려의 관모와 그 영향관계
고구려의 관모와 그 영향관계 [간호학과] 혈액 종양 (백혈병, 소아신경모세포종, 악성종격동종양, 간모세포종, 랑거한스세...
[간호학과] 혈액 종양 (백혈병, 소아신경모세포종, 악성종격동종양, 간모세포종, 랑거한스세... 2015년 2학기 교육행정및경영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2015년 2학기 교육행정및경영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2017년 2학기 교육행정및경영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2017년 2학기 교육행정및경영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2017년 2학기 교육학과 교육행정및경영 기말시험 핵심체크
2017년 2학기 교육학과 교육행정및경영 기말시험 핵심체크 독후감 - 나 행복 그리고 대 인간 커뮤니케이션
독후감 - 나 행복 그리고 대 인간 커뮤니케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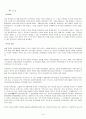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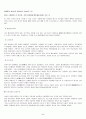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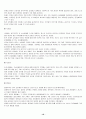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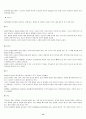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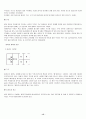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