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살설
은둔설
\'은둔설\'의 내용과 근거
은둔설
\'은둔설\'의 내용과 근거
본문내용
지에 고니시 군을 지원하기 위해 출동한 대규모의 일본 수군에 맞서 싸우는 이순신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 부상과 노환, 연일 계속된 전투와 격무로 인해 쇠약해진 몸, 2번째 백의종군과 어머니와 아들의 죽음 등으로 인해 흔들리는 마음가짐, 이러한 개인적 고뇌를 마지막으로 이 한 번에 떨치고자 이순신은 노량 해전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선두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 오후 여섯 시쯤 적선이 남해에서 무수히 나와서 엄목포에 정박해 있고 또 노량으로 와 대는 것도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 자정에 배 위로 올라가 손을 씻고 무릎을 꿇고 "이 원수를 무찌른다면 지금 죽어도 유한이 없겠습니다"고 하늘에 빌었다.
11) 그리고 노량 해전은 지금까지의 이순신과 조선 수군이 겪어 온 해전과는 성격이 다른 전투였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전체 기간에 걸쳐 이순신이 견지해 온 전략은 출항통제(出港統制)와 협수로 통제(狹水路統制)였다. 출항통제는 경상도 해안의 각 포구에 정박한 일본 수군의 소함대를 기습적으로 각개 격파하는 것이며, 협수로 통제는 일본 수군의 대함대가 전라도 남해안 혹은 서해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그 통로가 되는 좁은 수로를 막아서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이것들은 적극적이면서도 엄연히 수비 전략이었으며, 그것은 전쟁 기간 내내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에 비해 규모에서 뒤졌기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이순신은 조선 수군이 해전 이후 전과 확대에 몰두하느라 도망가는 상대를 무리하게 추격하거나, 한 전역(戰域)에 오래 머물러 있다가 적에게 역습을 당하지 않도록 하였다. 하지만 노량 해전의 경우에는 그 성격이 전혀 달랐다. 조선 수군과 마찬가지로 일본 수군도, 왜교의 고니시 군에 대한 해상 봉쇄망을 뚫기 위해 이 해전에 필사적으로 임했다. 게다가 양측의 병력 역시 일본 수군이 함선 500여 척에 병력 60,000여 명, 조·명 연 합 수군이 함선 146척에 병력 19,600여 명의 대병력이었으며, 이는 전체 전쟁 기간 동안 칠천량 해전과 맞먹는 최대 규모의 해전이었다. 즉 노량 해전은 시기적으로 임진왜 란과 정유재란 기간에 걸쳐 마지막으로 벌어진 해전일 뿐만 아니라, 참여한 병력 및 양 측의 마음가짐 면에서도 사실상 전쟁을 마무리하는 함대 결전(決戰)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유일하게 이 해전에서 이순신은 도망가는 적 함대를 추격하여 전과 확대를 꾀하였고, 그를 통해 적선 200여 척을 격침할 수 있었다(또한 100여 척을 나포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이순신이 주로 구사하였던 전술이 원거리 포격 전술이었기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하겠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이순신이 함대의 선두에 나섰다는 사실이, 전사를 위장하여 자살 하기 위한 것이었다거나 은둔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조작된 사실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상당 부분 현실성을 갖춘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이순신은 7년간의 전쟁을 마무리하게 될지도 모르는 해전에 임함에 앞서 필사의 마음가짐을 다잡았으며, 역시 필사적인 자세로 전투에 나선 일본 수군과 최후이자 최대의 함대 결전을 치렀다. 그리고 승세를 몰아서 퇴각하는 적 함대를 추격하는 와중에 무의식적으로 함대의 선두로 나섰을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해 유탄에 맞아 전사할 가능성도 커졌을 것이다. 물론 다른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이순신이 함대의 선두에 나서지 않고도 전사 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노량 해전에 참여한 명의 수군은 작은 함선 63척에 병력 2,600 명에 불과했으며,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도 적었다.
그들 중 도독인 진린(陳璘)과 등자룡만이 판옥선을 타고 선두에 나서서 싸웠을 뿐이었다. 그리고 「징비록」 과 「은봉야사별곡」 등의 사료에 따르면, 조선 수군이 전투 중 적선에 포위된 진린을 구해 주었다고 한다. 특히 「은봉야사별곡」에 따르면 이순신이 친히 기함을 이끌고 진린을 둘러 싼 포위망을 풀어 주었으며, 그로 인해 기함의 위치가 발각되어 적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때 적선이 당선(唐船, 明軍兵船)으로 모여들었다. 도독이 포위되고 말았다. 공이 마지막 사력을 다해 포위된 아군 선단을 풀었다‥‥ 적이 흐트러지는가 하더니 다시 모였다. 그리고 적이 송희립이 있는 곳을 알아내고는 곧 총을 집중적으로 쏘아댔다. 총알이 희립의 갑옷과 투구에 맞았다‥‥ 공이 크게 놀라 일어서는 찰라 겨드랑이 밑에 총알을 맞았다.
12)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여 보겠다. 노량 해전 당시 조선 수군은 밤 1∼3시(四更) 무렵에 노량 해협에 이르렀다. 그리고 새벽 4시 무렵에 관음포 앞 바다에서 500여 척의 일본 수군과 맞서 싸워, 그들을 관음포 안으로 밀어붙였다. 그리고 좁은 관음포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당시 조선 수군은 원거리 포격 전술뿐만 아니라, 갈고리로 적선을 끌어 들여 불을 지르거나 가라앉히는 등 육박 전술도 감행하였다. 그리고 그 와중에 아침이 되어 해가 떠올랐는데, 「이순신과 히데요시」의 가다노 쯔기오(片野次雄) 씨는 일출 시간인 이 무렵에 이순신이 저격당했다고 주장한다. 격전이 한창인 중에 날이 밝았다. 사방이 밝아지자 근접 거리에서 쏘는 사수에게는 표적이 훨씬 분명히 보이게 되었다. 순간 기함의 사령탑을 노리고 총화가 맹렬히 집중됐다‥‥ 정확하게 이순신을 노리고 쏜 한발의 탄환이 공기가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이순신의 몸에 꽂혔다.
13) 이 두 주장에 따르면, 이순신의 기함이 굳이 선두에 나서지 않아도 그가 유탄에 맞아 전사하였다는 것이 충분히 개연성을 갖추게 된다. 즉 이순신이 친히 기함을 이끌고 진린을 도와 주었다가 그로 인해 기함의 위치가 발각되어 집중 공격을 당했을 수도 있고, 적과 아군이 뒤엉킨 혼전 중에 떠오른 태양으로 인해 기함의 지휘소가 확연히 드러나면서 적의 공격에 노출되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이러한 주장들은 그 기반에, 이순신의 죽음은 '전사'라는 의식이 강하게 깔아 두고서 제기된 것들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나는 이순신의 최후의 모습을 굳이 '자살'이나 '은둔'이라는 심증에 기반한 주장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으며, 여러 사료와 해전 전후의 상황을 통해서도 이순신의 '전사'는 확고한 사실임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11) 그리고 노량 해전은 지금까지의 이순신과 조선 수군이 겪어 온 해전과는 성격이 다른 전투였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전체 기간에 걸쳐 이순신이 견지해 온 전략은 출항통제(出港統制)와 협수로 통제(狹水路統制)였다. 출항통제는 경상도 해안의 각 포구에 정박한 일본 수군의 소함대를 기습적으로 각개 격파하는 것이며, 협수로 통제는 일본 수군의 대함대가 전라도 남해안 혹은 서해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그 통로가 되는 좁은 수로를 막아서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이것들은 적극적이면서도 엄연히 수비 전략이었으며, 그것은 전쟁 기간 내내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에 비해 규모에서 뒤졌기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이순신은 조선 수군이 해전 이후 전과 확대에 몰두하느라 도망가는 상대를 무리하게 추격하거나, 한 전역(戰域)에 오래 머물러 있다가 적에게 역습을 당하지 않도록 하였다. 하지만 노량 해전의 경우에는 그 성격이 전혀 달랐다. 조선 수군과 마찬가지로 일본 수군도, 왜교의 고니시 군에 대한 해상 봉쇄망을 뚫기 위해 이 해전에 필사적으로 임했다. 게다가 양측의 병력 역시 일본 수군이 함선 500여 척에 병력 60,000여 명, 조·명 연 합 수군이 함선 146척에 병력 19,600여 명의 대병력이었으며, 이는 전체 전쟁 기간 동안 칠천량 해전과 맞먹는 최대 규모의 해전이었다. 즉 노량 해전은 시기적으로 임진왜 란과 정유재란 기간에 걸쳐 마지막으로 벌어진 해전일 뿐만 아니라, 참여한 병력 및 양 측의 마음가짐 면에서도 사실상 전쟁을 마무리하는 함대 결전(決戰)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유일하게 이 해전에서 이순신은 도망가는 적 함대를 추격하여 전과 확대를 꾀하였고, 그를 통해 적선 200여 척을 격침할 수 있었다(또한 100여 척을 나포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이순신이 주로 구사하였던 전술이 원거리 포격 전술이었기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하겠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이순신이 함대의 선두에 나섰다는 사실이, 전사를 위장하여 자살 하기 위한 것이었다거나 은둔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조작된 사실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상당 부분 현실성을 갖춘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이순신은 7년간의 전쟁을 마무리하게 될지도 모르는 해전에 임함에 앞서 필사의 마음가짐을 다잡았으며, 역시 필사적인 자세로 전투에 나선 일본 수군과 최후이자 최대의 함대 결전을 치렀다. 그리고 승세를 몰아서 퇴각하는 적 함대를 추격하는 와중에 무의식적으로 함대의 선두로 나섰을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해 유탄에 맞아 전사할 가능성도 커졌을 것이다. 물론 다른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이순신이 함대의 선두에 나서지 않고도 전사 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노량 해전에 참여한 명의 수군은 작은 함선 63척에 병력 2,600 명에 불과했으며,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도 적었다.
그들 중 도독인 진린(陳璘)과 등자룡만이 판옥선을 타고 선두에 나서서 싸웠을 뿐이었다. 그리고 「징비록」 과 「은봉야사별곡」 등의 사료에 따르면, 조선 수군이 전투 중 적선에 포위된 진린을 구해 주었다고 한다. 특히 「은봉야사별곡」에 따르면 이순신이 친히 기함을 이끌고 진린을 둘러 싼 포위망을 풀어 주었으며, 그로 인해 기함의 위치가 발각되어 적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때 적선이 당선(唐船, 明軍兵船)으로 모여들었다. 도독이 포위되고 말았다. 공이 마지막 사력을 다해 포위된 아군 선단을 풀었다‥‥ 적이 흐트러지는가 하더니 다시 모였다. 그리고 적이 송희립이 있는 곳을 알아내고는 곧 총을 집중적으로 쏘아댔다. 총알이 희립의 갑옷과 투구에 맞았다‥‥ 공이 크게 놀라 일어서는 찰라 겨드랑이 밑에 총알을 맞았다.
12)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여 보겠다. 노량 해전 당시 조선 수군은 밤 1∼3시(四更) 무렵에 노량 해협에 이르렀다. 그리고 새벽 4시 무렵에 관음포 앞 바다에서 500여 척의 일본 수군과 맞서 싸워, 그들을 관음포 안으로 밀어붙였다. 그리고 좁은 관음포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당시 조선 수군은 원거리 포격 전술뿐만 아니라, 갈고리로 적선을 끌어 들여 불을 지르거나 가라앉히는 등 육박 전술도 감행하였다. 그리고 그 와중에 아침이 되어 해가 떠올랐는데, 「이순신과 히데요시」의 가다노 쯔기오(片野次雄) 씨는 일출 시간인 이 무렵에 이순신이 저격당했다고 주장한다. 격전이 한창인 중에 날이 밝았다. 사방이 밝아지자 근접 거리에서 쏘는 사수에게는 표적이 훨씬 분명히 보이게 되었다. 순간 기함의 사령탑을 노리고 총화가 맹렬히 집중됐다‥‥ 정확하게 이순신을 노리고 쏜 한발의 탄환이 공기가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이순신의 몸에 꽂혔다.
13) 이 두 주장에 따르면, 이순신의 기함이 굳이 선두에 나서지 않아도 그가 유탄에 맞아 전사하였다는 것이 충분히 개연성을 갖추게 된다. 즉 이순신이 친히 기함을 이끌고 진린을 도와 주었다가 그로 인해 기함의 위치가 발각되어 집중 공격을 당했을 수도 있고, 적과 아군이 뒤엉킨 혼전 중에 떠오른 태양으로 인해 기함의 지휘소가 확연히 드러나면서 적의 공격에 노출되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이러한 주장들은 그 기반에, 이순신의 죽음은 '전사'라는 의식이 강하게 깔아 두고서 제기된 것들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나는 이순신의 최후의 모습을 굳이 '자살'이나 '은둔'이라는 심증에 기반한 주장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으며, 여러 사료와 해전 전후의 상황을 통해서도 이순신의 '전사'는 확고한 사실임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추천자료
 충장사와 김덕룡장군
충장사와 김덕룡장군 칼의 노래
칼의 노래 아직도 그치지 않는 죽음 논란
아직도 그치지 않는 죽음 논란 내가 존경하는 인물( 몽고메리 장군)
내가 존경하는 인물( 몽고메리 장군) 난중일기를 읽고
난중일기를 읽고 김훈의 '칼의 노래'에 대한 내용분석 및 서평
김훈의 '칼의 노래'에 대한 내용분석 및 서평 [신립장군전설][신립장군설화]신립장군전설(신립장군설화)의 형성원인과 형성과정, 신립장군...
[신립장군전설][신립장군설화]신립장군전설(신립장군설화)의 형성원인과 형성과정, 신립장군... [강감찬][강감찬 장군][전설][귀주대첩][낙성대]강감찬(강감찬 장군)의 생애, 강감찬(강감찬 ...
[강감찬][강감찬 장군][전설][귀주대첩][낙성대]강감찬(강감찬 장군)의 생애, 강감찬(강감찬 ... [권율 장군, 권율 장군 성장, 권율 장군 생애, 권율 장군 전설, 권율 장군과 임진왜란, 권율 ...
[권율 장군, 권율 장군 성장, 권율 장군 생애, 권율 장군 전설, 권율 장군과 임진왜란, 권율 ... [한문고전강독 공통] 오언절구, 오언율시, 칠언절구, 칠언율시를 각 한 편씩 선택하여 한시 ...
[한문고전강독 공통] 오언절구, 오언율시, 칠언절구, 칠언율시를 각 한 편씩 선택하여 한시 ... 김원봉장군을 통해 알아보는 이데올로기의 의미
김원봉장군을 통해 알아보는 이데올로기의 의미 이순신 [난중일기] 독후감, 독서감상문
이순신 [난중일기] 독후감, 독서감상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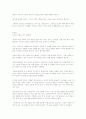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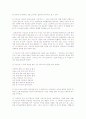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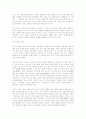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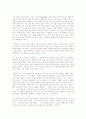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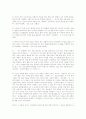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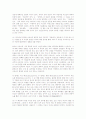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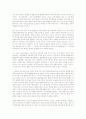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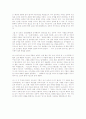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