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서울굿의 종류와 구조
Ⅲ. 서울굿의 음악
Ⅲ. 진오귀굿 거리 내용과 음악
Ⅳ. 맺음말
Ⅱ. 서울굿의 종류와 구조
Ⅲ. 서울굿의 음악
Ⅲ. 진오귀굿 거리 내용과 음악
Ⅳ. 맺음말
본문내용
에게 술을 올리고 절을 할 때는 무당이 춤을 추거나 공수를 주는 행위가 없어 이 때만큼은 유식 제사처럼 보인다. 그래서인지 민속악이 아닌 궁중악의 삼현도드리가 연주된 것으로 해석된다.
상산거리에서는 반염불의 민속악으로 시작하여 궁중악의 삼현도드리를 연주하였는데 상산거리가 최영장군을 모셔 숭배하는 거리이므로 역시 삼현도드리가 연주 된 것 같다.
도령거리에서도 민속악의 당악과 굿거리에 이어서 궁중악 취타가 연주되었다. 도령거리는 바리공주가 망자의 넋을 천도하는 과정을 그린 것인데, 바리공주이기 때문에 별상거리처럼 다른 신과 차별을 두기 위해 취타를 연주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의 민속악들은 거의 춤반주 음악으로 쓰여 굿의 분위기를 즐겁게 하는 연희적인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자진굿거리, 공수, 무가를 제외한 음악은 크게 궁중악과 민속악으로 나뉘는데 주로 민속악계통으로 이루어져있음을 알 수 있고 궁중악의 음악도 민속악과 혼용되어 춤 반주 음악으로 쓰여 분위기를 흥겹게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궁중악은 비운의 왕과 바리공주, 최영장군을 나타내는 거리에서 사용되었다. 이것으로 볼 때 왕과 공주, 귀족이라는 다른 신과의 차별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Ⅳ. 맺음말
굿은 그것을 어떤 시각視覺에서 어떤 방법方法으로 보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은 음악, 노래, 춤, 무대장식, 음식 등의 감각적 경험 대상의 측면들로 이루어진 현상일 수도 있지만, 무당과 악사들 간의 관계, 제가와 무당 간의 관계, 굿하는 집안이나 마을 사람들 간의 심리적 또는 사회적 관계, 무당과 관객과의 관계 등의 다양한 관계가 복합된 인간관계일 수도 있다. 또는 굿에 초청되는 신들과 무당, 제가 가족 내지는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하는 종교현상일 수도 있으며 그밖에도 예술, 민속, 신화, 연극, 교육 등의 현상으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복합적이며 종합적인 표현이다. 金仁會, 『韓國巫俗思想硏究』(集文堂, 1988), p.203
우리는 굿이 음악과 일체화된 종교의식이며, 음악이 굿 안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굿의 모든 요소와 융합되어 있어서 때로는 보조적으로, 때로는 굿 자체로서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장면에서는 굿의 진행을 돕는 음악으로, 또 다른 곳에서는 음악과 융합된 종합예술의식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자진굿거리의 빠른 리듬은 신을 청하고 의식의 시종始終을 알린다. 공수는 신의 뜻을 전달하며 인간과의 구체적인 만남을 유도하고, 메기고 받는 음악적 특성으로 감정 교감을 극대화시킨다. 무가는 흥겨운 가락으로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의식에서는 신의 감응을 돕는다. 이것과 함께 굿음악 전반에 녹아있는 즉흥적 특성은 무당과 악사들의 연희적 창조성 개발에 도움을 준다.
굿음악은 신과 무당, 무당과 제가, 무당과 관객 등 각각의 모든 관계에서 감정과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매체이다. 신을 불러들이고 보내며, 무당에게는 접신의 촉매로서 작용하고, 때로는 제가 식구들과 관객들을 굿에 몰입시키고 또한 긴장을 완화시키며, 굿 전체의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흥겨운 춤에 동반된 노래와 타령으로 즐거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공수의 슬픈 가락과 즉흥연주는 듣는이로 하여금 절로 눈물짓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굿에서의 음악의 역할은 단순히 굿에서의 음악의 역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닌, 때로는 음악으로서의 굿을 파악해야하고 정의해야하는 복합성과 융합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광일, 『한국전통문화의 정신분석』, 교문사, 1991
김인회, 『한국무속사상연구』, 집문당, 1988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1992
, 『한국의 무속』, 대원사, 1993
무라야마 지쥰(村山智順), 『朝鮮の巫覡』, 조선총독부, 1932
무형문화재지정조사보고서 86호, 『서울지역의 무속』, 문화재관리국, 1971
박미경 저, 윤화중 역, 『한국의 무속과 음악』세종출판사, 1996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서울민속대관 12 서울무속편, 1992
송방송, 『한국음악통사』,일조각, 1984
아키바 타카시(秋葉降), 아카마츠 지조(赤松智城), 『朝鮮巫俗の硏究』2권. 1937/8
아키바 타카시(秋葉降), 최길성 역, 『조선무속의 현지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7
유동식,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연세대학교출판부, 1989
이혜구, “시나위와 사뇌에 관한 시고”『국어국문학』(서울:국어국문학회, 1953a), 『한국음 악연구』에 재수록(서울, 1957)
, “무악연구-청수골 도당굿”『사상계』(서울:사상계사, 1955b), 3집 7호
, “별기은 고”『예술논문집』(서울:예술원, 1964), 3집, pp.124-151 『한국음악서 설』에 재수록(서울, 1967)
이보형, “무가와 판소리와 산조에서 엇모리가락 비교”『이혜구박사 송수기념 음악논총』(서 울, 1969)
, “무악장단 고-전북 당골굿을 중심으로”『문화인류학』(서울, 1970) 3집
, “시나위권의 무속음악”『문화인류학』(서울, 1971) 4집
, “메나리조(산유화제)”『한국음악연구』(서울:한국음악학회,1972) 2집
, “은산별신제의 음악적연구”『민족음악』(서울:동양음악연구소, 1977) 1집
, “시나위의 청”『한국음악연구』(서울:한국음악학회, 1979) 8/9집
, “경서 토리권의 무가, 민요”『예술논문집』(서울:예술원, 1982a) 19집
임철재, 『한국무속연구서설』한국민속연구논문선 III, 일조각, 1992
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정신문화연구원, 1994
조흥윤, 『무와 민족문화』,민족문화사, 1991
최종민, “음악적 측면에서 본 굿-전통무악(굿) 제전”『공간』(서울:공간사, 1980)
최 헌, “서울의 재수굿과 진오귀굿” 『한국음악』(서울:국립국악원, 1996), 제29집
최길성, 『한국무속론』,서울: 영설출판사, 1981
, 『한국의 무당』,열화당, 1981
칼, 구스타프 융, 설영환 옮김 ,『무의식의 분석』,선영사 1986
클락, 찰스 알렌(Clark, Charles Allen), 『Religious of Old Korea』1929년 재간. 서울: 한국기독교문화사, 1981
상산거리에서는 반염불의 민속악으로 시작하여 궁중악의 삼현도드리를 연주하였는데 상산거리가 최영장군을 모셔 숭배하는 거리이므로 역시 삼현도드리가 연주 된 것 같다.
도령거리에서도 민속악의 당악과 굿거리에 이어서 궁중악 취타가 연주되었다. 도령거리는 바리공주가 망자의 넋을 천도하는 과정을 그린 것인데, 바리공주이기 때문에 별상거리처럼 다른 신과 차별을 두기 위해 취타를 연주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의 민속악들은 거의 춤반주 음악으로 쓰여 굿의 분위기를 즐겁게 하는 연희적인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자진굿거리, 공수, 무가를 제외한 음악은 크게 궁중악과 민속악으로 나뉘는데 주로 민속악계통으로 이루어져있음을 알 수 있고 궁중악의 음악도 민속악과 혼용되어 춤 반주 음악으로 쓰여 분위기를 흥겹게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궁중악은 비운의 왕과 바리공주, 최영장군을 나타내는 거리에서 사용되었다. 이것으로 볼 때 왕과 공주, 귀족이라는 다른 신과의 차별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Ⅳ. 맺음말
굿은 그것을 어떤 시각視覺에서 어떤 방법方法으로 보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은 음악, 노래, 춤, 무대장식, 음식 등의 감각적 경험 대상의 측면들로 이루어진 현상일 수도 있지만, 무당과 악사들 간의 관계, 제가와 무당 간의 관계, 굿하는 집안이나 마을 사람들 간의 심리적 또는 사회적 관계, 무당과 관객과의 관계 등의 다양한 관계가 복합된 인간관계일 수도 있다. 또는 굿에 초청되는 신들과 무당, 제가 가족 내지는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하는 종교현상일 수도 있으며 그밖에도 예술, 민속, 신화, 연극, 교육 등의 현상으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복합적이며 종합적인 표현이다. 金仁會, 『韓國巫俗思想硏究』(集文堂, 1988), p.203
우리는 굿이 음악과 일체화된 종교의식이며, 음악이 굿 안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굿의 모든 요소와 융합되어 있어서 때로는 보조적으로, 때로는 굿 자체로서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장면에서는 굿의 진행을 돕는 음악으로, 또 다른 곳에서는 음악과 융합된 종합예술의식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자진굿거리의 빠른 리듬은 신을 청하고 의식의 시종始終을 알린다. 공수는 신의 뜻을 전달하며 인간과의 구체적인 만남을 유도하고, 메기고 받는 음악적 특성으로 감정 교감을 극대화시킨다. 무가는 흥겨운 가락으로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의식에서는 신의 감응을 돕는다. 이것과 함께 굿음악 전반에 녹아있는 즉흥적 특성은 무당과 악사들의 연희적 창조성 개발에 도움을 준다.
굿음악은 신과 무당, 무당과 제가, 무당과 관객 등 각각의 모든 관계에서 감정과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매체이다. 신을 불러들이고 보내며, 무당에게는 접신의 촉매로서 작용하고, 때로는 제가 식구들과 관객들을 굿에 몰입시키고 또한 긴장을 완화시키며, 굿 전체의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흥겨운 춤에 동반된 노래와 타령으로 즐거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공수의 슬픈 가락과 즉흥연주는 듣는이로 하여금 절로 눈물짓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굿에서의 음악의 역할은 단순히 굿에서의 음악의 역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닌, 때로는 음악으로서의 굿을 파악해야하고 정의해야하는 복합성과 융합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광일, 『한국전통문화의 정신분석』, 교문사, 1991
김인회, 『한국무속사상연구』, 집문당, 1988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1992
, 『한국의 무속』, 대원사, 1993
무라야마 지쥰(村山智順), 『朝鮮の巫覡』, 조선총독부, 1932
무형문화재지정조사보고서 86호, 『서울지역의 무속』, 문화재관리국, 1971
박미경 저, 윤화중 역, 『한국의 무속과 음악』세종출판사, 1996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서울민속대관 12 서울무속편, 1992
송방송, 『한국음악통사』,일조각, 1984
아키바 타카시(秋葉降), 아카마츠 지조(赤松智城), 『朝鮮巫俗の硏究』2권. 1937/8
아키바 타카시(秋葉降), 최길성 역, 『조선무속의 현지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7
유동식,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연세대학교출판부, 1989
이혜구, “시나위와 사뇌에 관한 시고”『국어국문학』(서울:국어국문학회, 1953a), 『한국음 악연구』에 재수록(서울, 1957)
, “무악연구-청수골 도당굿”『사상계』(서울:사상계사, 1955b), 3집 7호
, “별기은 고”『예술논문집』(서울:예술원, 1964), 3집, pp.124-151 『한국음악서 설』에 재수록(서울, 1967)
이보형, “무가와 판소리와 산조에서 엇모리가락 비교”『이혜구박사 송수기념 음악논총』(서 울, 1969)
, “무악장단 고-전북 당골굿을 중심으로”『문화인류학』(서울, 1970) 3집
, “시나위권의 무속음악”『문화인류학』(서울, 1971) 4집
, “메나리조(산유화제)”『한국음악연구』(서울:한국음악학회,1972) 2집
, “은산별신제의 음악적연구”『민족음악』(서울:동양음악연구소, 1977) 1집
, “시나위의 청”『한국음악연구』(서울:한국음악학회, 1979) 8/9집
, “경서 토리권의 무가, 민요”『예술논문집』(서울:예술원, 1982a) 19집
임철재, 『한국무속연구서설』한국민속연구논문선 III, 일조각, 1992
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정신문화연구원, 1994
조흥윤, 『무와 민족문화』,민족문화사, 1991
최종민, “음악적 측면에서 본 굿-전통무악(굿) 제전”『공간』(서울:공간사, 1980)
최 헌, “서울의 재수굿과 진오귀굿” 『한국음악』(서울:국립국악원, 1996), 제29집
최길성, 『한국무속론』,서울: 영설출판사, 1981
, 『한국의 무당』,열화당, 1981
칼, 구스타프 융, 설영환 옮김 ,『무의식의 분석』,선영사 1986
클락, 찰스 알렌(Clark, Charles Allen), 『Religious of Old Korea』1929년 재간. 서울: 한국기독교문화사, 1981
키워드
추천자료
 [교육과정] 초등 음악 4학년 그네 2차시 세안
[교육과정] 초등 음악 4학년 그네 2차시 세안 [교육과정] 초등 음악 4학년 그네 1차시 세안 지도안
[교육과정] 초등 음악 4학년 그네 1차시 세안 지도안 [초등교육] 초등 음악 세안 강강술래 1차시 지도안
[초등교육] 초등 음악 세안 강강술래 1차시 지도안 학습장애아동을 위한 음악치료
학습장애아동을 위한 음악치료 [A+평가 레포트]대중음악축제의 이해와 국내외 운영사례 분석
[A+평가 레포트]대중음악축제의 이해와 국내외 운영사례 분석 [초등교육] 초록바다 세안 기악 합주 음악 지도안 교육 초등
[초등교육] 초록바다 세안 기악 합주 음악 지도안 교육 초등 [서평] 존블래킹, 인간은 얼마나 음악적인가
[서평] 존블래킹, 인간은 얼마나 음악적인가 모차르트(모짜르트)의 음악적 특징과 모차르트(모짜르트)의 생애 및 모차르트(모짜르트)의 Se...
모차르트(모짜르트)의 음악적 특징과 모차르트(모짜르트)의 생애 및 모차르트(모짜르트)의 Se... (광고론)광고음악
(광고론)광고음악 춘향가의 유래와 음악적 짜임
춘향가의 유래와 음악적 짜임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생애,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음악적 특징, 클라우디오 몬테베르...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생애,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음악적 특징, 클라우디오 몬테베르... 영화 ‘향수: 어느 살인자 이야기 (Perfume: The Story Of A Murderer)’를 통해 본 현대음악과...
영화 ‘향수: 어느 살인자 이야기 (Perfume: The Story Of A Murderer)’를 통해 본 현대음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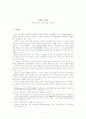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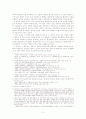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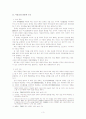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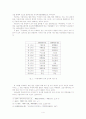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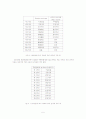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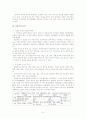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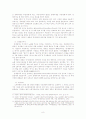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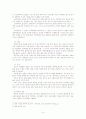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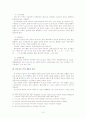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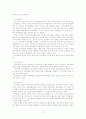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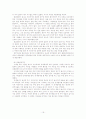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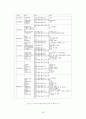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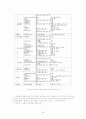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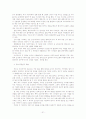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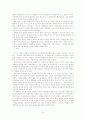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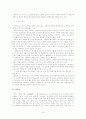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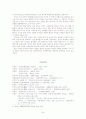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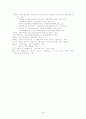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