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민중의 고뇌라는 일반화된 삶의 현실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 시가 ‘목계 장터’라는 생활 현실의 공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시적 화자가 보고 듣고 체험한 사실들이 시적 표현의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구름’ ‘바람’ 등으로 표상되는 떠남과 ‘들꽃’ ‘잔돌’등으로 표상되는 정착의 이미지 사이의 대조적 표현은 퇴색해가는 목계 나루에서 방랑과 정착의 기로에 서 있는 농촌 공동체의 시대적 삶과 화자의 개인적 삶 사이의 갈등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 작품을 지배하는 기본정서는 절망 좌절 분노 공포에도 불구하고 왁자지껄한 활기에 넘쳤던 군중적 감정이 아니라 뜨내기이자 떠돌이로 자신을 의식하는 민감한 예술가의 고독과 애수 바로 그것이 아닌가 한다.
이 작품을 지배하는 기본정서는 절망 좌절 분노 공포에도 불구하고 왁자지껄한 활기에 넘쳤던 군중적 감정이 아니라 뜨내기이자 떠돌이로 자신을 의식하는 민감한 예술가의 고독과 애수 바로 그것이 아닌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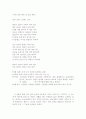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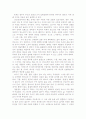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