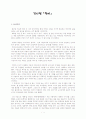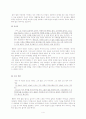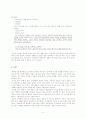목차
1. 들어가며
2. 본론
(1) 길을 잃다.
(2) 진드기, 빈대
(3) 부정
(4) 허세
(5) 순교자
(6) 도피, 바람
(7) 구원
3. 논평
4. 나가며
2. 본론
(1) 길을 잃다.
(2) 진드기, 빈대
(3) 부정
(4) 허세
(5) 순교자
(6) 도피, 바람
(7) 구원
3. 논평
4. 나가며
본문내용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살기위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온갖 거짓과 허세로 치장한 현룡의 모습과 겉으로는 낡은 제도에 반항하고 새로운 자유 연애의 길을 개척하는 선구자라고 외치면서 난륜의 길에 빠져든 소옥의 모습을 작가는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것은 결국 ‘현룡’과 같은 성격파탄의 인물이 나타난 궁극적인 원인이 식민지 현실의 모순, 즉 내선일체의 논리를 내세운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이 지닌 구조적 모순에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일제의 조선 식민지 지배 상황과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조선 사회, 나아가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낸 일제의 부당한 통치 권력을 우회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현룡’이 처한 현실과 그를 바라보는 일본인들의 시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현룡’이 내선일체를 주장하고 ‘겐노가미 류노스케’라고 창씨개명까지 하며 스스로 내지인이라고 아무리 외쳤지만 현실은 그를 내지인으로 대우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가 설 곳을 잃게 만들었고, 그를 멸시의 눈으로 지켜볼 뿐이다.
이로써 김사량은 조선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에게 조선인으로서 받게 되는 차별을 없애고 일본인으로 대우한다는 내선일체의 논리는 조선과 일본은 같은 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로 포장해서 조선이라는 민족과 민족정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도구일 뿐이며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게 만든다.
4. 나가며
초등학생인 조카 녀석이 ‘일제강점기가 무엇이냐?’ ‘항일정신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던 일본에 저항한 정신이야.’ 라고 말했었다. 그랬더니 조카의 답변이 ‘그럼 우리나라가 일본에 반항한거야?’ 라고 되물었다. 나는 버럭해서 ‘반항이라고 하면 자존심 상하지 우리나라에 지들 멋대로 쳐들어와 우리나라 민족정신까지 없애려한 일본에게 정당하게 거부한 거야, 아니 저항한 거야.’라고 답했던 기억이 난다.
김사량이 ‘현룡’을 통해 보여주려 한 것이 안타까움이고 그것이 울분을 숨기고 선택한 ‘저항정신’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저항정신’이 아니다. 저항정신 보다 더 높은 경지라고 말씀하셨다. 저항정신이라는 의식자체는 아니지만 더 높은 경지라는 말씀이 완벽하게 이해되지는 않지만 마음에 와 닿는다.
이제 대학원 수업 한 학기를 마친다. 남은 4학기 기간 동안 그 의미를 이해하고 마음에 담아낼 수 있는 폭이 지금보다는 훨씬 커지기를 희망한다.
이것은 결국 ‘현룡’과 같은 성격파탄의 인물이 나타난 궁극적인 원인이 식민지 현실의 모순, 즉 내선일체의 논리를 내세운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이 지닌 구조적 모순에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일제의 조선 식민지 지배 상황과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조선 사회, 나아가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낸 일제의 부당한 통치 권력을 우회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현룡’이 처한 현실과 그를 바라보는 일본인들의 시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현룡’이 내선일체를 주장하고 ‘겐노가미 류노스케’라고 창씨개명까지 하며 스스로 내지인이라고 아무리 외쳤지만 현실은 그를 내지인으로 대우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가 설 곳을 잃게 만들었고, 그를 멸시의 눈으로 지켜볼 뿐이다.
이로써 김사량은 조선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에게 조선인으로서 받게 되는 차별을 없애고 일본인으로 대우한다는 내선일체의 논리는 조선과 일본은 같은 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로 포장해서 조선이라는 민족과 민족정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도구일 뿐이며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게 만든다.
4. 나가며
초등학생인 조카 녀석이 ‘일제강점기가 무엇이냐?’ ‘항일정신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던 일본에 저항한 정신이야.’ 라고 말했었다. 그랬더니 조카의 답변이 ‘그럼 우리나라가 일본에 반항한거야?’ 라고 되물었다. 나는 버럭해서 ‘반항이라고 하면 자존심 상하지 우리나라에 지들 멋대로 쳐들어와 우리나라 민족정신까지 없애려한 일본에게 정당하게 거부한 거야, 아니 저항한 거야.’라고 답했던 기억이 난다.
김사량이 ‘현룡’을 통해 보여주려 한 것이 안타까움이고 그것이 울분을 숨기고 선택한 ‘저항정신’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저항정신’이 아니다. 저항정신 보다 더 높은 경지라고 말씀하셨다. 저항정신이라는 의식자체는 아니지만 더 높은 경지라는 말씀이 완벽하게 이해되지는 않지만 마음에 와 닿는다.
이제 대학원 수업 한 학기를 마친다. 남은 4학기 기간 동안 그 의미를 이해하고 마음에 담아낼 수 있는 폭이 지금보다는 훨씬 커지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