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1990년대 작가들의 빠른 변신
2. 이미지, 수단에서 목적으로
3. 상상력과 가상 현실
4. 가상 현실과 허구적 서사
5. 새로운 소설의 자기 세계 찾기
2. 이미지, 수단에서 목적으로
3. 상상력과 가상 현실
4. 가상 현실과 허구적 서사
5. 새로운 소설의 자기 세계 찾기
본문내용
목소리로 보인다. 그러나 인물의 엽기적 기행이 작품 안에서 해명될 가능성은 없다. 현상만이 문제가 될 뿐이다. 이 작품은 드라큐라식 영화를 현실 해부에 이용하려고 시도했는지 모르나 결국은 드라큐라식 인식을 보여주기 위해 현실을 빌려온 꼴이 되었다.
원재길의 <먼지의 집>은 이 작품과는 그 성격이 다르지만 기법 면에서는 컬트무비적이어서 흡사함을 보여준다. 침대에 누워있던 여인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먼지로 화해 가는 모습은 영화의 한 씬을 연상하게 한다.
하성란의 <양파>는 우연을 계기로 하여 전개하는 우리 삶의 굴곡을 담아낸 소설이다. 이 소설에서는 서술자의 기능이 거의 제거되고 있다. 모든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카메라로 보여주듯이 보여진다. 물론 거기에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서술자의 기능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고 다만 숨기고 있을 따름이다. 이런 표현 양상 역시 영화적이다. 이 소설에서는 회칼, 유모차, 찌그러진 자동차 등의 이미지가 소설 전면에서 이야기를 감싸고 있다. 삶을 이야기하려는 소통의 의지는 찾아볼 수 없고 독자는 작가의 눈이 무엇을 보는가를 볼뿐이다. 하성란을 비롯하여 많은 여성작가들의 이미지 추구는 마치 홍콩의 왕가위 영화를 보는 듯하다. 이런 이미지 추구 작업이 미적 감수성을 촉진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을 모두 이미지로 치환함으로써 현실을 몽롱하게 문질러 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우려감을 갖게 한다.
백민석도 신세대 작가 중 특이한 기풍으로 자기의 세계를 나름대로 축조하고 있는 작가이다. 그런데 그는 기본적으로 폭력의 미학(?)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폭력 자체를 미화하는 과정을 담고 있음을 뜻한다. 물론 어느 작가가 폭력을 지향하겠는가? 그가 폭력적 세계를 지향한다는 말은 폭력 자체를 즐기게 하거나 자신이 즐긴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작품의 세계를 폭력으로 설정하고 그 속에서 인간 관계를 폭력에 기반 하여 보려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백민석이 그 세계를 다루는 방식은 느와르 영화 식이다. <목화밭>은 한 대학강사와 그 부인을 중심에 두고 그 부부가 폭력으로 삶의 의미를 형성함을 이야기한다. 여기에는 어떤 근원적 이유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 이야기로 현실을 어느 정도 비판적으로 부각시킬 수가 있겠지만, 인간이 근본적으로 폭력을 사랑한다는 케케묵은 발견 외에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처럼 최근의 소설들은 영화적 논리, 영화적 기법, 영화적 문맥에 빠져있다. 그로써 얻는 것은 현실 감각의 미적 탐구, 이미지의 새로운 개발, 우리 개인의 내면적 다양화와 그 황폐한 그림자 보기 등이겠지만, 잃는 것은 소설 자체의 힘이다. 이 작가들이 설정하는 주인공의 환경이란 거의 다 가상 현실이다. <먼지의 집>의 먼지투성이 집, 형과 말없는 여인 등도 가상 현실적이고, 김영하의 <흡혈귀>가 설정한 부부의 삶도 가상 현실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목화밭>에서 그려지는 삼촌과 그의 사무실, 삼촌과 주인공과의 관계, 부부 폭력 등도 가상 현실적이다. 배수아, 하성란, 전경린 등이 그려내는 비일상적 일상화도 역시 현실의 문맥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를 비유나 상징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려면 현실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야 한다. 둘 사이를 연결하는 어떤 논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소설들은 현실을 왜곡되게 조작한 이미지들일 뿐이다. 거기에는 구체적 삶의 과정과 연결할 어떤 고리도 없기 때문이다.
5. 새로운 소설의 자기 세계 찾기
지금까지 신세대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영화화되어 가는 소설 작품 경향을 꼽아서 소설 장르의 변화라는 취지에서 살펴보았다. 어느 비평가는 약간의 언어 유희를 빌어서 오늘의 신세대는 辛세대이며, scine세대이고 seen세대라 하였다. 보는 세대이며 동시에 보이는 세대라는 것이다. 현실을 영화의 장면으로 대체하거나 영상적으로 조각내고 편집하여 보여 주려는 것이 그들의 방법이다.
문제는 장면화하고 이미지화하면서 가상 현실로 현실 대면을 뒤덮는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런 방법을 최선으로 여기거나 첨단적 기법으로 보는 착각들이다. 물론 이러한 소설들이 일정한 진보적 열정을 담고 있고 치열한 실험 정신을 겸비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를 열고자 하는 열망을 지니고 있음은 사실이다. 지금은 그 문이 보이지 않으므로 여기저기를 쳐대며 그 통로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에서 이런 경향을 추구함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복잡하기 짝이 없는 듯하면서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단순해 보이는 현실 자체의 성격에서 나온 것임도 사실이다. 즉 정보통신 사회가 필연적으로 봉착하는 개인적 삶의 무의미화, 관계의 단절 심화 등에 대한 저항적 반응이다.
그러나 사회가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질수록 우리는 총체적 본질을 찾으려는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 물론 그 방법은 다양해지는 것이 좋고 그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이해와 탐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삶의 중심은 현상이 아니라 인간이며 인간을 바로 보는 것이 모든 방법의 근원에 놓여져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현실 속의 틀을 찾아야 하고, 여러 관계 즉 개인과 개인의 관계, 인간과 자연, 사물의 관계, 개인과 사회의 관계 등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눈을 가져야 한다.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사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서사성을 회복해야 관계가 살아나고 관계가 살아나야 주체의 다양한 삶의 방법과 태도도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새로운 세기의 소설은 머지 않아 인간의 총체적 복원을 추구하려고 할 것이다. 인간이 지혜로와 진다면 잘 사는 것을 새롭게 추구할 것이고, 새로운 삶의 방법과 정신을 계몽하기 위한 서사가 필요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서사성이 되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을 터이다.
그러나 그 서사성은 이전의 이야기 방식과는 달라져야 한다. 지금 이미지화와 영화화 기법은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를 지닐 수 없으나, 근본적인 서사성을 갖춘 마당에서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잘 가꾸면서 서사의 근본적 힘을 상실하지 않도록 지키는 노력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원재길의 <먼지의 집>은 이 작품과는 그 성격이 다르지만 기법 면에서는 컬트무비적이어서 흡사함을 보여준다. 침대에 누워있던 여인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먼지로 화해 가는 모습은 영화의 한 씬을 연상하게 한다.
하성란의 <양파>는 우연을 계기로 하여 전개하는 우리 삶의 굴곡을 담아낸 소설이다. 이 소설에서는 서술자의 기능이 거의 제거되고 있다. 모든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카메라로 보여주듯이 보여진다. 물론 거기에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서술자의 기능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고 다만 숨기고 있을 따름이다. 이런 표현 양상 역시 영화적이다. 이 소설에서는 회칼, 유모차, 찌그러진 자동차 등의 이미지가 소설 전면에서 이야기를 감싸고 있다. 삶을 이야기하려는 소통의 의지는 찾아볼 수 없고 독자는 작가의 눈이 무엇을 보는가를 볼뿐이다. 하성란을 비롯하여 많은 여성작가들의 이미지 추구는 마치 홍콩의 왕가위 영화를 보는 듯하다. 이런 이미지 추구 작업이 미적 감수성을 촉진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을 모두 이미지로 치환함으로써 현실을 몽롱하게 문질러 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우려감을 갖게 한다.
백민석도 신세대 작가 중 특이한 기풍으로 자기의 세계를 나름대로 축조하고 있는 작가이다. 그런데 그는 기본적으로 폭력의 미학(?)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폭력 자체를 미화하는 과정을 담고 있음을 뜻한다. 물론 어느 작가가 폭력을 지향하겠는가? 그가 폭력적 세계를 지향한다는 말은 폭력 자체를 즐기게 하거나 자신이 즐긴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작품의 세계를 폭력으로 설정하고 그 속에서 인간 관계를 폭력에 기반 하여 보려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백민석이 그 세계를 다루는 방식은 느와르 영화 식이다. <목화밭>은 한 대학강사와 그 부인을 중심에 두고 그 부부가 폭력으로 삶의 의미를 형성함을 이야기한다. 여기에는 어떤 근원적 이유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 이야기로 현실을 어느 정도 비판적으로 부각시킬 수가 있겠지만, 인간이 근본적으로 폭력을 사랑한다는 케케묵은 발견 외에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처럼 최근의 소설들은 영화적 논리, 영화적 기법, 영화적 문맥에 빠져있다. 그로써 얻는 것은 현실 감각의 미적 탐구, 이미지의 새로운 개발, 우리 개인의 내면적 다양화와 그 황폐한 그림자 보기 등이겠지만, 잃는 것은 소설 자체의 힘이다. 이 작가들이 설정하는 주인공의 환경이란 거의 다 가상 현실이다. <먼지의 집>의 먼지투성이 집, 형과 말없는 여인 등도 가상 현실적이고, 김영하의 <흡혈귀>가 설정한 부부의 삶도 가상 현실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목화밭>에서 그려지는 삼촌과 그의 사무실, 삼촌과 주인공과의 관계, 부부 폭력 등도 가상 현실적이다. 배수아, 하성란, 전경린 등이 그려내는 비일상적 일상화도 역시 현실의 문맥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를 비유나 상징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려면 현실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야 한다. 둘 사이를 연결하는 어떤 논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소설들은 현실을 왜곡되게 조작한 이미지들일 뿐이다. 거기에는 구체적 삶의 과정과 연결할 어떤 고리도 없기 때문이다.
5. 새로운 소설의 자기 세계 찾기
지금까지 신세대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영화화되어 가는 소설 작품 경향을 꼽아서 소설 장르의 변화라는 취지에서 살펴보았다. 어느 비평가는 약간의 언어 유희를 빌어서 오늘의 신세대는 辛세대이며, scine세대이고 seen세대라 하였다. 보는 세대이며 동시에 보이는 세대라는 것이다. 현실을 영화의 장면으로 대체하거나 영상적으로 조각내고 편집하여 보여 주려는 것이 그들의 방법이다.
문제는 장면화하고 이미지화하면서 가상 현실로 현실 대면을 뒤덮는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런 방법을 최선으로 여기거나 첨단적 기법으로 보는 착각들이다. 물론 이러한 소설들이 일정한 진보적 열정을 담고 있고 치열한 실험 정신을 겸비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를 열고자 하는 열망을 지니고 있음은 사실이다. 지금은 그 문이 보이지 않으므로 여기저기를 쳐대며 그 통로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에서 이런 경향을 추구함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복잡하기 짝이 없는 듯하면서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단순해 보이는 현실 자체의 성격에서 나온 것임도 사실이다. 즉 정보통신 사회가 필연적으로 봉착하는 개인적 삶의 무의미화, 관계의 단절 심화 등에 대한 저항적 반응이다.
그러나 사회가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질수록 우리는 총체적 본질을 찾으려는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 물론 그 방법은 다양해지는 것이 좋고 그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이해와 탐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삶의 중심은 현상이 아니라 인간이며 인간을 바로 보는 것이 모든 방법의 근원에 놓여져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현실 속의 틀을 찾아야 하고, 여러 관계 즉 개인과 개인의 관계, 인간과 자연, 사물의 관계, 개인과 사회의 관계 등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눈을 가져야 한다.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사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서사성을 회복해야 관계가 살아나고 관계가 살아나야 주체의 다양한 삶의 방법과 태도도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새로운 세기의 소설은 머지 않아 인간의 총체적 복원을 추구하려고 할 것이다. 인간이 지혜로와 진다면 잘 사는 것을 새롭게 추구할 것이고, 새로운 삶의 방법과 정신을 계몽하기 위한 서사가 필요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서사성이 되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을 터이다.
그러나 그 서사성은 이전의 이야기 방식과는 달라져야 한다. 지금 이미지화와 영화화 기법은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를 지닐 수 없으나, 근본적인 서사성을 갖춘 마당에서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잘 가꾸면서 서사의 근본적 힘을 상실하지 않도록 지키는 노력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추천자료
 (현대문학강독) 최서해 작품에 나타난 신경향파적 특징과 1920년대 후반 프로소설의 주요 특징
(현대문학강독) 최서해 작품에 나타난 신경향파적 특징과 1920년대 후반 프로소설의 주요 특징 1970년대 노동문학 윤흥길(아홉켤레), 조세희(난쏘공), 황석영(객지)의 세 작품에 드러난 작...
1970년대 노동문학 윤흥길(아홉켤레), 조세희(난쏘공), 황석영(객지)의 세 작품에 드러난 작... [인문과학] 한국 문학에서의 생태주의
[인문과학] 한국 문학에서의 생태주의 한국 문학의 근대성
한국 문학의 근대성 현대 일본문학과 식민지체험 (―아베 고보(安部公房)의 〈만주체험〉을 중심으로―)
현대 일본문학과 식민지체험 (―아베 고보(安部公房)의 〈만주체험〉을 중심으로―) 민족주의와 문학
민족주의와 문학 역관사가의 문학세계
역관사가의 문학세계 [북한문학]90년대 전반기 북한 단편소설속에 나타난 여성성의 전형 양태
[북한문학]90년대 전반기 북한 단편소설속에 나타난 여성성의 전형 양태 상징주의 문학에 대한 심층 고찰
상징주의 문학에 대한 심층 고찰 1930년대 문학사
1930년대 문학사  프로농민 문학과 이기영과 서화
프로농민 문학과 이기영과 서화 [구비문학의세계 공통] 한국의 신화 전설 민담 자료를 각각 1편씩(총 3편) 선택하여 각각의 ...
[구비문학의세계 공통] 한국의 신화 전설 민담 자료를 각각 1편씩(총 3편) 선택하여 각각의 ... [고전문학개론] 향가의 해석과 현대적 응용에 관한 고찰 - 서동요 모죽지랑가 헌화가를 중심...
[고전문학개론] 향가의 해석과 현대적 응용에 관한 고찰 - 서동요 모죽지랑가 헌화가를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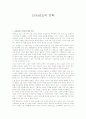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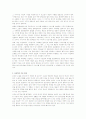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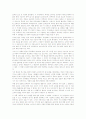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