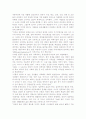목차
1. 한국 사회에 대한 내적 성찰의 계기, ‘일중독’을 사회적 질병으로 인정하기
2. 일중독 벗어나기, 사회 전체가 ‘삶의 질 중심의 구조혁신’ 필요
3. 익숙한 것과의 결별, 더 이상 행복을 유보하지 말자!
2. 일중독 벗어나기, 사회 전체가 ‘삶의 질 중심의 구조혁신’ 필요
3. 익숙한 것과의 결별, 더 이상 행복을 유보하지 말자!
본문내용
직과 사회 차원에서의 불감증, 바로 이것을 학문적으로 고발하고자 이 책을 내게 되었다.
내가 보기에, 기존의 전통적인 근면성실을 강조하는 책이나 풍토는 물론이고, 최근에 정말 새로운 듯 성공비결을 조언하는 책이나 풍토들은 모두 직간접으로 일중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어떤 책들은 주변의 익숙한 것들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지만 그 역시 일중독과 결별하기를 강조하지는 않는다.
일중독을 벗어나려면 일중독을 솔직히 ‘인정’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오기가 나서 “나는 일중독이 되어도 좋다”는 적극적 긍정론을 펴거나 조심스럽게 “나에게 일중독은 없다”는 소극적 부정론을 펴는 것은 어떤 표현과 논리를 갖다 들이대더라도 모두 일중독을 조장하는 데 일조하고 말 것이다. ‘진실한 인정’이 전제되어야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일중독에 대한 치유가 비로소 가능하다.
개인적으로는 삶과 일, 일상과 직장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회적으로는 과감한 노동시간 단축과 더불어 삶의 질 차원에서 노동내용 혁신이 필요하다. 결국 일중독을 벗어나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참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구조를 구축하자는 것이 이 책의 근본 목적이다.
내가 보기에, 기존의 전통적인 근면성실을 강조하는 책이나 풍토는 물론이고, 최근에 정말 새로운 듯 성공비결을 조언하는 책이나 풍토들은 모두 직간접으로 일중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어떤 책들은 주변의 익숙한 것들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지만 그 역시 일중독과 결별하기를 강조하지는 않는다.
일중독을 벗어나려면 일중독을 솔직히 ‘인정’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오기가 나서 “나는 일중독이 되어도 좋다”는 적극적 긍정론을 펴거나 조심스럽게 “나에게 일중독은 없다”는 소극적 부정론을 펴는 것은 어떤 표현과 논리를 갖다 들이대더라도 모두 일중독을 조장하는 데 일조하고 말 것이다. ‘진실한 인정’이 전제되어야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일중독에 대한 치유가 비로소 가능하다.
개인적으로는 삶과 일, 일상과 직장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회적으로는 과감한 노동시간 단축과 더불어 삶의 질 차원에서 노동내용 혁신이 필요하다. 결국 일중독을 벗어나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참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구조를 구축하자는 것이 이 책의 근본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