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단체(單體)목구조 건축물의 특징에 대한 연구와 토론
(1)평면 주망(柱網,pillar-intervals:기둥의 분포나 기둥 간격)
(2)목조 구조
(3)두공
(4)주방(柱枋)
(5)양가(梁架)구조
(6)항가(桁架) 추형(雛型:모형)의 출현
2.금대목구유물 (金代木構遺物)
(1) 오대현 불광사 문수전(五臺縣 佛光寺 文殊殿)
(2) 삭현 숭복사 미타전과 관음전 (朔縣 崇福寺 彌陀殿 與 觀音殿)
(3) 대동 선화사 삼성전,금 황통 삼년,1143년. 大同 善化寺 三聖殿 (金皇統三年,1143年)
(1)평면 주망(柱網,pillar-intervals:기둥의 분포나 기둥 간격)
(2)목조 구조
(3)두공
(4)주방(柱枋)
(5)양가(梁架)구조
(6)항가(桁架) 추형(雛型:모형)의 출현
2.금대목구유물 (金代木構遺物)
(1) 오대현 불광사 문수전(五臺縣 佛光寺 文殊殿)
(2) 삭현 숭복사 미타전과 관음전 (朔縣 崇福寺 彌陀殿 與 觀音殿)
(3) 대동 선화사 삼성전,금 황통 삼년,1143년. 大同 善化寺 三聖殿 (金皇統三年,1143年)
본문내용
높고 큰 기단과 전면에 넓은 월대, 처마아래 복잡한 두공(斗:공포), 지붕에는 특이한 장식이 있는 건물로, 미타전은 사원건물 중에서 많은 이목을 끄는 단체건축물(單體建築物)이라 할 수 있다. 불광사 문수전과 같이 미타전의 평면 기둥배치방법은 감주(減柱)과 이주(移柱)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첨(前:전면처마) 밑의 안열기둥은 후면에 비해 2개의 기둥이 줄어들고, 기둥의 위치가 옮겨졌기에, 결과적으로 어칸과 협칸의 4봉4연복(4縫4椽) 전단에 실린 상부하중을 길게 늘인 보에 의해 그 하중을 (기둥으로) 전달시켜야만 한다. 그중 어칸(當心間)에 있는 12.45m 길이의 보, 좌우 협칸(次間)의 각각 8.70m길이의 보가 그것이다. 이렇게 긴 길이의 내액(內額:창방)단면이 32㎝(중앙은 37㎝)x41㎝에 불과하며 4椽 이상의 하중을 감당하기란 어렵다. 그러한 까닭에 내액(內額) 하부에 유액(由額:인방)을 설치한 것이다. 유액(由額)은 크기 31㎝x51㎝, 31㎝x22㎝의 두 개의 방목(枋木)을 겹친 첩량(疊梁)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양가(樑架) 양가(樑架):기둥이나 공포위에 얹혀 내부공간을 형성하는 부재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보,도리,대공 등을 기본부재로 하여 구성한다.
의 바로 하단의 내액(內額)과 유액(由額) 사이에는 화반(斗子駝峯)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전면보의 유복(乳)후미를 받치고 있으며, 양측은 차수(叉手:솟을합장)를 사용하여 내액(內額)이 상부하중을 기둥으로 더 잘 전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은 구가량(構架梁)의 형성을 볼 수 있는 것이다.(그림 5-6-7)
미타전의 목구조는 \"八椽屋, 前後면 유복(乳)을 이용한 4柱\"이다(그림5-6-8). 안기둥의 주두와 4연복(4椽) 사이에는 오로지 십자화공(十字華) 한층을 사용해 받치고 있기에, 이는 당이나 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대한 내첨두공(內斗)과 같은 것이 아니다. 외첨두공(外斗)은 복잡한 외관을 띄고 있다. 전면 변두리 기둥의 포작을 예로 들면 이는 7포작 중공(重) 쌍하앙(雙下)수법을 썼다.
노두(斗:주두)로부터 바깥쪽으로 정면으로 뻗은 두갈래의 화공(華:살미)은 하앙(下昻)으로 변하게 된다. 노두(斗)의 양모서리방향 45°방향 좌우 사선으로 두갈래 화공(華)이 출목되어 있고, 출목에는 마책두(斗)식 사두(頭)를 놓았다. 제2출목도 좌우에 두갈래 화공(華)이 출목되어 있고, 화공(華) 끝부분에는 마책두(頭)식 사두(頭)가 있으며, 이는 정면에 비죽앙(批竹昻)식 사두(頭)와 병행하며, 도첨방(挑枋:출목장여)과 교차하면서 요풍단(風:외목도리)을 받쳐 주고 있다. 복잡한 사공(斜)의 사용은 금대(金代)에 거의 절정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목조 건축물이 목조수법을 차용한 전탑에서는 널리 나타나지만, 금 이후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그림5-6-9)
2. 관 음 전(觀音殿)
관음전은 정면 5칸, 측면3칸 단첨(鄲) 팔작지붕이다. 처마하부의 두공포식은 매우 간단하고, 두공(斗)의 세부비례는 영조법식과 유사하다. 내첨량(內樑)은 크고 긴 차수(叉手)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마치 융흥사(隆興寺)의 전륜장전(轉輪藏殿) 양가(梁架)와 유사하다. 관음전이 역사적 가치에 있어서는 미타전에 미치지 못하지만 구조적으로 보았을 때 보기드믄 정교한 것이라 할 수 있다.(그림 5-6-10)
(3) 대동 선화사 삼성전,금 황통 삼년,1143년. 大同 善化寺 三聖殿 (金皇統三年,1143年)
선화사는 산서성 대동시 남문리에 있는 요와 금시기의 명사찰이다. 현재 사원전체에는 대전(大殿), 서타전(西朶殿), 보현각(普賢閣), 삼성전(三聖殿), 천왕전(天王殿)등의 요와 금시기의 건축물이 보존되어 있으며 삼성전(三聖殿)은 금왕조 황통연간의 건축적 특징을 가장 명확하게 반영한 건물이다.
삼성전은 정면5칸, 측면4칸, 정면 32.30m×측면 19.28m에 평면의 기둥열은 감주법(減柱法)을 채택하고 있으며, 어칸(當心間)에는 후첨(後)에 2개의 내기둥을 사용하였으며, 협칸(次間)과 제2협칸(梢間)의 내진주는 어칸(當心間)에 있는 것보다 기둥을 一步架 이동한 구조로서 그 배치는 매우 특수하다.
삼성전 협칸(次間)의 보간포작(補間鋪作)에 사용된 사공(斜)은 가장 두드러진 예라 할수있다. 거대한 노두(斗)로부터 정면으로 3갈래의 화공(華)이 뻗어져나와 있고, 노두(斗)의 양쪽 45°방향으로 뻗어나온 3갈래의 화공(華)의 끝머리가 정면 화공(華)의 끝머리와 나란히 하고 있다. 이어서 제1출목 화공(華) 끝머리의 좌우로 2개가 나와 있고, 제2출목 화공(華) 끝머리에 좌우로 각각 1개씩 뻗어나와 있으며, 이들은 모두 제3출목 끝머리와 평행하게 될 때까지 뻗어져 나와 있다. 이는 길이를 늘인 영공(令)과 요첨방(枋)의 하부를 받치는 것이다. 삼성전의 사공결구(斜結構)는 본 사찰의 대전(大殿)과 보현각 보다 복잡하며, 숭복사 미타전, 불광사 문수전 등에 비해서도 더욱 복잡하다.
어칸(當心間), 제2협칸(梢間)과 경사면, 보간포작(補間鋪作)의 결구는 6포작 단초(單抄) 쌍하앙식(雙下昻)이다. 그중 화두자(華頭子)의 사용, 금면앙(琴面) 기법 및 하앙후미의 윤곽선(輪廓)은 모두 영조법식과 유사하다.
삼성전의 목가구는 영조법식에서 볼 수 없지만 “八架椽屋, 乳 對 6椽을 이용한 3柱”로 개략적인 설명을 할 수 있다. 어칸(當心間) 6연복(椽)은 전면 첨주(柱:변두리기둥)와 후면의 내부기둥 사이에 세우고 상하 두개의 보로 복량형식을 이루고 있다. 하부보의 높이는 2재1계(2材1)로 화공(華)위에 설치되어 있으며, 상부보의 높이는 2材2로 외부 끝부분은 사두(頭) 사두(頭):포작의 최상부에서 행공첨차와 조합시켜 그 끝을 돌출시키는 부재
로 처리하였다. 6연복(6椽)과 유복(乳)은 내부기둥 중심부에서 위쪽을 향한 곳에서 교차되고, 하부는 거대한 작체(雀替)로 받치고 있다. 양가(梁架)의 상향각은 약33°이기에, 지붕이 경사져 보이며, 각 도리의 수평거리는 일정하지 않다. 각주(角柱:귀기둥)과 평기둥 사이는 생기(生起)가 현저히 나타나는데, 평기둥에서 시작하여 도리상부에 생두목(生頭木:갈모산방)을 두어 처마(口)가 완만한 곡선이 되도록 한 것이다.
각각의 양가(樑架) 양가(樑架):기둥이나 공포위에 얹혀 내부공간을 형성하는 부재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보,도리,대공 등을 기본부재로 하여 구성한다.
의 바로 하단의 내액(內額)과 유액(由額) 사이에는 화반(斗子駝峯)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전면보의 유복(乳)후미를 받치고 있으며, 양측은 차수(叉手:솟을합장)를 사용하여 내액(內額)이 상부하중을 기둥으로 더 잘 전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은 구가량(構架梁)의 형성을 볼 수 있는 것이다.(그림 5-6-7)
미타전의 목구조는 \"八椽屋, 前後면 유복(乳)을 이용한 4柱\"이다(그림5-6-8). 안기둥의 주두와 4연복(4椽) 사이에는 오로지 십자화공(十字華) 한층을 사용해 받치고 있기에, 이는 당이나 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대한 내첨두공(內斗)과 같은 것이 아니다. 외첨두공(外斗)은 복잡한 외관을 띄고 있다. 전면 변두리 기둥의 포작을 예로 들면 이는 7포작 중공(重) 쌍하앙(雙下)수법을 썼다.
노두(斗:주두)로부터 바깥쪽으로 정면으로 뻗은 두갈래의 화공(華:살미)은 하앙(下昻)으로 변하게 된다. 노두(斗)의 양모서리방향 45°방향 좌우 사선으로 두갈래 화공(華)이 출목되어 있고, 출목에는 마책두(斗)식 사두(頭)를 놓았다. 제2출목도 좌우에 두갈래 화공(華)이 출목되어 있고, 화공(華) 끝부분에는 마책두(頭)식 사두(頭)가 있으며, 이는 정면에 비죽앙(批竹昻)식 사두(頭)와 병행하며, 도첨방(挑枋:출목장여)과 교차하면서 요풍단(風:외목도리)을 받쳐 주고 있다. 복잡한 사공(斜)의 사용은 금대(金代)에 거의 절정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목조 건축물이 목조수법을 차용한 전탑에서는 널리 나타나지만, 금 이후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그림5-6-9)
2. 관 음 전(觀音殿)
관음전은 정면 5칸, 측면3칸 단첨(鄲) 팔작지붕이다. 처마하부의 두공포식은 매우 간단하고, 두공(斗)의 세부비례는 영조법식과 유사하다. 내첨량(內樑)은 크고 긴 차수(叉手)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마치 융흥사(隆興寺)의 전륜장전(轉輪藏殿) 양가(梁架)와 유사하다. 관음전이 역사적 가치에 있어서는 미타전에 미치지 못하지만 구조적으로 보았을 때 보기드믄 정교한 것이라 할 수 있다.(그림 5-6-10)
(3) 대동 선화사 삼성전,금 황통 삼년,1143년. 大同 善化寺 三聖殿 (金皇統三年,1143年)
선화사는 산서성 대동시 남문리에 있는 요와 금시기의 명사찰이다. 현재 사원전체에는 대전(大殿), 서타전(西朶殿), 보현각(普賢閣), 삼성전(三聖殿), 천왕전(天王殿)등의 요와 금시기의 건축물이 보존되어 있으며 삼성전(三聖殿)은 금왕조 황통연간의 건축적 특징을 가장 명확하게 반영한 건물이다.
삼성전은 정면5칸, 측면4칸, 정면 32.30m×측면 19.28m에 평면의 기둥열은 감주법(減柱法)을 채택하고 있으며, 어칸(當心間)에는 후첨(後)에 2개의 내기둥을 사용하였으며, 협칸(次間)과 제2협칸(梢間)의 내진주는 어칸(當心間)에 있는 것보다 기둥을 一步架 이동한 구조로서 그 배치는 매우 특수하다.
삼성전 협칸(次間)의 보간포작(補間鋪作)에 사용된 사공(斜)은 가장 두드러진 예라 할수있다. 거대한 노두(斗)로부터 정면으로 3갈래의 화공(華)이 뻗어져나와 있고, 노두(斗)의 양쪽 45°방향으로 뻗어나온 3갈래의 화공(華)의 끝머리가 정면 화공(華)의 끝머리와 나란히 하고 있다. 이어서 제1출목 화공(華) 끝머리의 좌우로 2개가 나와 있고, 제2출목 화공(華) 끝머리에 좌우로 각각 1개씩 뻗어나와 있으며, 이들은 모두 제3출목 끝머리와 평행하게 될 때까지 뻗어져 나와 있다. 이는 길이를 늘인 영공(令)과 요첨방(枋)의 하부를 받치는 것이다. 삼성전의 사공결구(斜結構)는 본 사찰의 대전(大殿)과 보현각 보다 복잡하며, 숭복사 미타전, 불광사 문수전 등에 비해서도 더욱 복잡하다.
어칸(當心間), 제2협칸(梢間)과 경사면, 보간포작(補間鋪作)의 결구는 6포작 단초(單抄) 쌍하앙식(雙下昻)이다. 그중 화두자(華頭子)의 사용, 금면앙(琴面) 기법 및 하앙후미의 윤곽선(輪廓)은 모두 영조법식과 유사하다.
삼성전의 목가구는 영조법식에서 볼 수 없지만 “八架椽屋, 乳 對 6椽을 이용한 3柱”로 개략적인 설명을 할 수 있다. 어칸(當心間) 6연복(椽)은 전면 첨주(柱:변두리기둥)와 후면의 내부기둥 사이에 세우고 상하 두개의 보로 복량형식을 이루고 있다. 하부보의 높이는 2재1계(2材1)로 화공(華)위에 설치되어 있으며, 상부보의 높이는 2材2로 외부 끝부분은 사두(頭) 사두(頭):포작의 최상부에서 행공첨차와 조합시켜 그 끝을 돌출시키는 부재
로 처리하였다. 6연복(6椽)과 유복(乳)은 내부기둥 중심부에서 위쪽을 향한 곳에서 교차되고, 하부는 거대한 작체(雀替)로 받치고 있다. 양가(梁架)의 상향각은 약33°이기에, 지붕이 경사져 보이며, 각 도리의 수평거리는 일정하지 않다. 각주(角柱:귀기둥)과 평기둥 사이는 생기(生起)가 현저히 나타나는데, 평기둥에서 시작하여 도리상부에 생두목(生頭木:갈모산방)을 두어 처마(口)가 완만한 곡선이 되도록 한 것이다.
추천자료
 중국의 역사 왜곡 문제점을 통한 우리나라 초등 역사교육의 실태와 대응방안 분석
중국의 역사 왜곡 문제점을 통한 우리나라 초등 역사교육의 실태와 대응방안 분석 중국의 역사와 문화
중국의 역사와 문화 [중국 이야기] 중국의 역사와 경제발전 그리고 중국위협론(국제관계 속 중국)
[중국 이야기] 중국의 역사와 경제발전 그리고 중국위협론(국제관계 속 중국) 중국의 역사왜곡
중국의 역사왜곡 [중국 역사와 문화] 중국 역사 지리
[중국 역사와 문화] 중국 역사 지리 중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경제발전을 통해 분석한 중국의 고찰
중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경제발전을 통해 분석한 중국의 고찰 동북공정관련 중국의 역사왜곡 <동북공정관련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동북공정관련 중국의 역사왜곡 <동북공정관련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중국 통사 요약과 느낀점 <상식과 교양으로 읽은 중국의 역사> (하, 상(은), 주, 춘추전국, ...
중국 통사 요약과 느낀점 <상식과 교양으로 읽은 중국의 역사> (하, 상(은), 주, 춘추전국, ... 동북공정(東北工程)에 대한 중국의 입장 (동북공정 정의, 동북공정 문제, 중국의 변방민족국...
동북공정(東北工程)에 대한 중국의 입장 (동북공정 정의, 동북공정 문제, 중국의 변방민족국... [중국문화산책공통]중국의대표적인 두도시 베이징(북경)과 상하이(상해)의 서로 다른 역사와 ...
[중국문화산책공통]중국의대표적인 두도시 베이징(북경)과 상하이(상해)의 서로 다른 역사와 ... [중국문화산책 공통] 중국의 대표적인 두 도시 베이징(북경)과 상하이(상해)는 여러 면에서 ...
[중국문화산책 공통] 중국의 대표적인 두 도시 베이징(북경)과 상하이(상해)는 여러 면에서 ... [인문과학] [중국 역사의 진실] 중국 전통과학은 왜 근대과학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는가
[인문과학] [중국 역사의 진실] 중국 전통과학은 왜 근대과학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는가 [중국 역사의 진실 ] 중국 전통과학은 왜 근대과학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는가.
[중국 역사의 진실 ] 중국 전통과학은 왜 근대과학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는가. 중국 - 중국의 국가개황, 중국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이념적 정향), 거시환경
중국 - 중국의 국가개황, 중국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이념적 정향), 거시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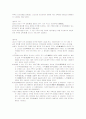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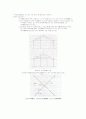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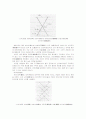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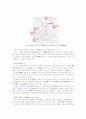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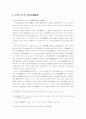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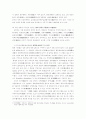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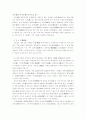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