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애제(哀祭)류 정의
2. 애제(哀祭)류의 의식(儀式)에 따른 갈래
3. 애제(哀祭)류 장르 분석
1) 뇌- 정의, 내용, 형식, 작품 정리
2) 애사(哀詞) - 정의, 내용, 형식, 작품 정리
3) 축문(祝文)과 제문(祭文) - 정의, 내용, 형식, 작품 정리
4) 도량문()과 상량문(上樑文) - 정의, 내용, 형식, 작품 정리
5) 청사(靑詞)와 재사(齎詞) - 정의, 청사의 배경과 발전사
6) 소(疏) - 정의, 작품 정리
2. 애제(哀祭)류의 의식(儀式)에 따른 갈래
3. 애제(哀祭)류 장르 분석
1) 뇌- 정의, 내용, 형식, 작품 정리
2) 애사(哀詞) - 정의, 내용, 형식, 작품 정리
3) 축문(祝文)과 제문(祭文) - 정의, 내용, 형식, 작품 정리
4) 도량문()과 상량문(上樑文) - 정의, 내용, 형식, 작품 정리
5) 청사(靑詞)와 재사(齎詞) - 정의, 청사의 배경과 발전사
6) 소(疏) - 정의, 작품 정리
본문내용
지시 ; 오직 강을 건너는 초입에서
未遑相地之宜 미황상지지의 ; 마땅한 땅을 고를 겨를이 없어
卽鄕學以經營 즉향학이경영 ; 곧 향교를 경영하여
爲泮宮而講習 위반궁이강습 ; 반궁을 삼아 강습하니
郊畿旣定 교기기정 ; 그 언저리가 이미 정해져서
連百堵以中施 련백도이중시 ; 일백 담을 이어서 그 가운데 세우니
形勢則然 형세즉연 ; 형세인 즉 그럴 듯하네
介一區而外絶 개일구이외절 ; 대개 한 구역을 이루어 밖과 단절 시키니
幸玆多暇 행자다가 ; 다행히 한가하여라
爾乃度功 이내탁공 ; 이에 공을 헤아려서
得秀壤於花山 득수양어화산 ; 북한산에 좋은 땅을 얻어
移宏模於槐市 이굉모어괴시 ; 높은 대감들의 마을에 큰 규모로 옮겼도다
(중략)
莫是英才之釀 막시영재지온양 ; 뛰어난 재주꾼을 기를 곳이 아닌가
脩梁乃擧 수양내거 ; 다듬은 대들보를 올림에
嘉頌斯揚 가송사양 ; 좋은 찬송으로 올리노라.
兒郞偉抛粱東 아랑위포량동 ; 어영차 대들보를 미세 동쪽으로
甲乙芳枝張桂宮 갑을방지장계궁 ; 이 가지 저 가지 꽃다운 가지 계수나무 궁전
此地的應鍾秀氣 차지적응종수기 ; 이 땅은 알맞게도 빼어난 기운 모두 모였으니
靑春袞袞拜三公 청춘곤곤배삼공 ; 청춘들은 넘실넘실 삼공에 오를 걸세.
兒郞偉抛樑西 아랑위포량서 ; 어영차 대들보를 미세 서쪽으로
至魯行看一變濟 지노행간일변제 ; 노나라에 가다 보니 제나라가 되었네
五學濟生言記取 오학제생언기취 ; 오교의 여러 선비 기록해 취할 걸 말하니
尙賢貴德化群黎 상현귀덕화군려 ; 어진 이를 숭상하고 덕을 귀히 여겨 백성을 교화하세.
兒郞偉抛樑南 아량위포량남 ; 어영차 대들보를 미세 남쪽으로
(중략)
太平適當 태평적당 ; 큰 평화가 깃들게 하소서
主上萬歲萬歲 주상만세만세 ; 임금님 만세 만세.
<동문선 권 108, 이장용>
국자감(國子監)을 다시 짓게 되는 내력을 서술하고 차례로 축복의 내용을 율문으로 노래하고 있다. “아랑위포량동(兒郞偉抛梁東 ; 어영차 대들보를 미세 동쪽으로)”이라는 메김 소리를 사이 사이 넣어, 노동요의 성격을 강조하고 7언의 율격을 지켜서 구절을 짜고 있다.
상량문은 천지신명에게 비는 뜻이 있다. 국자감은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의 흥성과 교화의 길이 퍼짐, 그리고 인재가 많이 양성되어 나라가 잘 되어 가기를 비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끝에 임금님 만세로 그 비는 내용의 절정을 이루었다.
5) 청사(靑詞)와 재사(齎詞)
정의
청사(靑詞)와 재사(齎詞)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예식에 사용하는 기도문, 축문과 같은 것인데 특히 청사는 초례(醮禮 ; 도교의 의식)에 사용하는 축문을 푸른 종이에 붉은 글씨로 썼다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었다. 일종의 의식문(儀式文)이며 청사는 반드시 도교의 예식인 초례에 한정되어 쓰였으나, 재사는 절에서 재(齎)를 올릴 때에도 사용하였다.
청사의 배경과 발전사
청사는 <문체명변>에서 도교의 방사들이 허물을 뉘우치는 글을 쓴 데서 비롯되었다고 했다.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잘못을 뉘우치고, 천지신명에게 복을 빌고, 죽은 이를 좋은 데로 천거하여 망하는 일도 잘 되도록 하게 비니, 오직 도교에서 쓰는 것이다. 그 신비로운 말을 하는 것은 불교와 도교가 서로 같이 공유하는 바이며 글에 쓰는 말은 사륙체(四六體)다.
또 청사는 초례(도교의 의식)를 지내는 제단에서 청하여 비는 말인데 하늘의 돌보심을 바라는 글이라고도 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최치원이 당(唐)나라에 있을 때 지은 것이 그 처음인데, 글의 첫머리에 “도사(道士) 아무개는 말씀드립니다”로 시작되는 것을 보면, 최치원은 스스로 도교에 깊은 경지였는지, 도사에게 대필을 해 주었는지는 미상이지만, 상당한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고려를 거쳐 내려오면서 이 형식은 점점 격식화되었으며, 문체에 치중한 형식적인 글로 틀이 잡히게 되면서 청사와 재사의 형식도 드러나게 달라졌다.
조선 시대에도 초기와 비슷한 청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청사가 초례 때 술잔을 올리면서 드리는 축문으로 형식화 되었다. 이것을 헌작사(獻酌詞)라고도 한다.
이런 글들은 일정한 격식과 틀이 있는 일종의 실용문으로 옛날에는 항시 쓰던 글들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와 같은 예식도 없어지고 또 변모되어 이런 글의 필요가 전혀 없어졌다.
6) 소(疏)
정의
소(疏)는 임금에 대하여 신하가 올리는 글로써 본 뜻은 널리 편다는 말이다. 친지 사이에 왕래하는 문답의 글도 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문선>에서는 수많이 전하는 소가 모두 부처님에게 재를 올릴 때 드리는 글로 축문의 형식이나 내용과 같다. 이외에 임금이나 왕족 또는 불상이나 불경 등에 대한 찬양의 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속동문선>에는 임금께 간하는 신하의 글이 5편 실려 있다.
작품
선원사경찬법회소(禪源社慶讚法會疏)
道弘佛祖之相傳 도홍불조지상전 ; 큰 도는 부처님을 조상으로 서로 전하니
依舊淸風朗月 의구청풍랑월 ; 맑은 바람 밝은 달은 예 그대로일세
恩重乾坤而難答 은중건곤이난답 ; 은혜는 하늘과 땅같이 무거워 보답하기 어려우니
如今白髮丹心 여금백발단심 ; 지금 백발에 단심 그대로 같네
恭惟我晉陽公 공유아진양공 ; 생각하건대 우리 진양공은
巨刹以歸誠 창거찰이귀성 ; 큰 절을 지으시어 정성을 기울이고
集作家而瓣會 집작가이판회 ; 작가들을 모아 법회를 갖추었네
寄哉此事 기재차사 ; 기이하도다 이 일이여
萬劫鮮或耳聞 만겁선혹이문 ; 만겁에도 혹 듣기 어려우니
我以何緣 아이하연 ; 나 무슨 인연으로
一朝忽得目覩 일조홀득목도 ; 하루 아침에 문득 뵈었나
略支日供 략지일공 ; 간략히 공양을 하고
仰祝天年 앙축천년 ; 우러러 천수를 비네
伏願舍頂戴君 복원사정대군 ; 엎드려 바라옵건대 임금을 받들어
久培南山之壽 구배남산지수 ; 남산의 수에 배나 길도록 하고
玉峯柱漢 옥봉주한 ; 나라를 지켜
永安東海支派 영안동해지파 ; 동해의 물결을 길이 편안케 하소서
사륙문(四六文)으로 되어 있고 축원의 말을 담고 있다. 선원사(禪源社)에서 법회(法會)를 열고, 그 법회를 경축하고 찬양하는 글이다. 진양공(晋陽公)이 절을 지은 공적을 기리고, 글을 지은 이가 또 여기에 참여함을 감격해 하고 있다. 마지막에 나라의 안녕과 임금의 만수무강(萬壽無疆)을 빌고 있다.
未遑相地之宜 미황상지지의 ; 마땅한 땅을 고를 겨를이 없어
卽鄕學以經營 즉향학이경영 ; 곧 향교를 경영하여
爲泮宮而講習 위반궁이강습 ; 반궁을 삼아 강습하니
郊畿旣定 교기기정 ; 그 언저리가 이미 정해져서
連百堵以中施 련백도이중시 ; 일백 담을 이어서 그 가운데 세우니
形勢則然 형세즉연 ; 형세인 즉 그럴 듯하네
介一區而外絶 개일구이외절 ; 대개 한 구역을 이루어 밖과 단절 시키니
幸玆多暇 행자다가 ; 다행히 한가하여라
爾乃度功 이내탁공 ; 이에 공을 헤아려서
得秀壤於花山 득수양어화산 ; 북한산에 좋은 땅을 얻어
移宏模於槐市 이굉모어괴시 ; 높은 대감들의 마을에 큰 규모로 옮겼도다
(중략)
莫是英才之釀 막시영재지온양 ; 뛰어난 재주꾼을 기를 곳이 아닌가
脩梁乃擧 수양내거 ; 다듬은 대들보를 올림에
嘉頌斯揚 가송사양 ; 좋은 찬송으로 올리노라.
兒郞偉抛粱東 아랑위포량동 ; 어영차 대들보를 미세 동쪽으로
甲乙芳枝張桂宮 갑을방지장계궁 ; 이 가지 저 가지 꽃다운 가지 계수나무 궁전
此地的應鍾秀氣 차지적응종수기 ; 이 땅은 알맞게도 빼어난 기운 모두 모였으니
靑春袞袞拜三公 청춘곤곤배삼공 ; 청춘들은 넘실넘실 삼공에 오를 걸세.
兒郞偉抛樑西 아랑위포량서 ; 어영차 대들보를 미세 서쪽으로
至魯行看一變濟 지노행간일변제 ; 노나라에 가다 보니 제나라가 되었네
五學濟生言記取 오학제생언기취 ; 오교의 여러 선비 기록해 취할 걸 말하니
尙賢貴德化群黎 상현귀덕화군려 ; 어진 이를 숭상하고 덕을 귀히 여겨 백성을 교화하세.
兒郞偉抛樑南 아량위포량남 ; 어영차 대들보를 미세 남쪽으로
(중략)
太平適當 태평적당 ; 큰 평화가 깃들게 하소서
主上萬歲萬歲 주상만세만세 ; 임금님 만세 만세.
<동문선 권 108, 이장용>
국자감(國子監)을 다시 짓게 되는 내력을 서술하고 차례로 축복의 내용을 율문으로 노래하고 있다. “아랑위포량동(兒郞偉抛梁東 ; 어영차 대들보를 미세 동쪽으로)”이라는 메김 소리를 사이 사이 넣어, 노동요의 성격을 강조하고 7언의 율격을 지켜서 구절을 짜고 있다.
상량문은 천지신명에게 비는 뜻이 있다. 국자감은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의 흥성과 교화의 길이 퍼짐, 그리고 인재가 많이 양성되어 나라가 잘 되어 가기를 비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끝에 임금님 만세로 그 비는 내용의 절정을 이루었다.
5) 청사(靑詞)와 재사(齎詞)
정의
청사(靑詞)와 재사(齎詞)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예식에 사용하는 기도문, 축문과 같은 것인데 특히 청사는 초례(醮禮 ; 도교의 의식)에 사용하는 축문을 푸른 종이에 붉은 글씨로 썼다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었다. 일종의 의식문(儀式文)이며 청사는 반드시 도교의 예식인 초례에 한정되어 쓰였으나, 재사는 절에서 재(齎)를 올릴 때에도 사용하였다.
청사의 배경과 발전사
청사는 <문체명변>에서 도교의 방사들이 허물을 뉘우치는 글을 쓴 데서 비롯되었다고 했다.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잘못을 뉘우치고, 천지신명에게 복을 빌고, 죽은 이를 좋은 데로 천거하여 망하는 일도 잘 되도록 하게 비니, 오직 도교에서 쓰는 것이다. 그 신비로운 말을 하는 것은 불교와 도교가 서로 같이 공유하는 바이며 글에 쓰는 말은 사륙체(四六體)다.
또 청사는 초례(도교의 의식)를 지내는 제단에서 청하여 비는 말인데 하늘의 돌보심을 바라는 글이라고도 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최치원이 당(唐)나라에 있을 때 지은 것이 그 처음인데, 글의 첫머리에 “도사(道士) 아무개는 말씀드립니다”로 시작되는 것을 보면, 최치원은 스스로 도교에 깊은 경지였는지, 도사에게 대필을 해 주었는지는 미상이지만, 상당한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고려를 거쳐 내려오면서 이 형식은 점점 격식화되었으며, 문체에 치중한 형식적인 글로 틀이 잡히게 되면서 청사와 재사의 형식도 드러나게 달라졌다.
조선 시대에도 초기와 비슷한 청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청사가 초례 때 술잔을 올리면서 드리는 축문으로 형식화 되었다. 이것을 헌작사(獻酌詞)라고도 한다.
이런 글들은 일정한 격식과 틀이 있는 일종의 실용문으로 옛날에는 항시 쓰던 글들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와 같은 예식도 없어지고 또 변모되어 이런 글의 필요가 전혀 없어졌다.
6) 소(疏)
정의
소(疏)는 임금에 대하여 신하가 올리는 글로써 본 뜻은 널리 편다는 말이다. 친지 사이에 왕래하는 문답의 글도 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문선>에서는 수많이 전하는 소가 모두 부처님에게 재를 올릴 때 드리는 글로 축문의 형식이나 내용과 같다. 이외에 임금이나 왕족 또는 불상이나 불경 등에 대한 찬양의 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속동문선>에는 임금께 간하는 신하의 글이 5편 실려 있다.
작품
선원사경찬법회소(禪源社慶讚法會疏)
道弘佛祖之相傳 도홍불조지상전 ; 큰 도는 부처님을 조상으로 서로 전하니
依舊淸風朗月 의구청풍랑월 ; 맑은 바람 밝은 달은 예 그대로일세
恩重乾坤而難答 은중건곤이난답 ; 은혜는 하늘과 땅같이 무거워 보답하기 어려우니
如今白髮丹心 여금백발단심 ; 지금 백발에 단심 그대로 같네
恭惟我晉陽公 공유아진양공 ; 생각하건대 우리 진양공은
巨刹以歸誠 창거찰이귀성 ; 큰 절을 지으시어 정성을 기울이고
集作家而瓣會 집작가이판회 ; 작가들을 모아 법회를 갖추었네
寄哉此事 기재차사 ; 기이하도다 이 일이여
萬劫鮮或耳聞 만겁선혹이문 ; 만겁에도 혹 듣기 어려우니
我以何緣 아이하연 ; 나 무슨 인연으로
一朝忽得目覩 일조홀득목도 ; 하루 아침에 문득 뵈었나
略支日供 략지일공 ; 간략히 공양을 하고
仰祝天年 앙축천년 ; 우러러 천수를 비네
伏願舍頂戴君 복원사정대군 ; 엎드려 바라옵건대 임금을 받들어
久培南山之壽 구배남산지수 ; 남산의 수에 배나 길도록 하고
玉峯柱漢 옥봉주한 ; 나라를 지켜
永安東海支派 영안동해지파 ; 동해의 물결을 길이 편안케 하소서
사륙문(四六文)으로 되어 있고 축원의 말을 담고 있다. 선원사(禪源社)에서 법회(法會)를 열고, 그 법회를 경축하고 찬양하는 글이다. 진양공(晋陽公)이 절을 지은 공적을 기리고, 글을 지은 이가 또 여기에 참여함을 감격해 하고 있다. 마지막에 나라의 안녕과 임금의 만수무강(萬壽無疆)을 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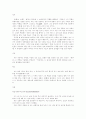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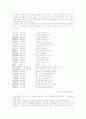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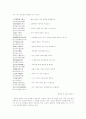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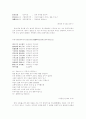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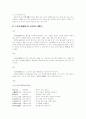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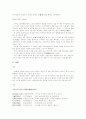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