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꽃을 꺾는 사람 - ‘소유’ 양식
ⅱ) 꽃을 ‘바라보는’ 사람 - ‘존재’ 양식
ⅲ) 꽃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안전성의 양면.
ⅳ) 현대 사회가 꽃을 대하는 태도.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ⅰ) 꽃을 꺾는 사람 - ‘소유’ 양식
ⅱ) 꽃을 ‘바라보는’ 사람 - ‘존재’ 양식
ⅲ) 꽃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안전성의 양면.
ⅳ) 현대 사회가 꽃을 대하는 태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홀로.
아무것도 찾지 않을
작정을 하면서.
나는 보았다, 그늘 아래
작은 꽃 하나 서 있는 걸,
뭇별처럼 반짝거리고
눈동자처럼 아름답게.
나는 꺾고 싶었다.
그때 작은 꽃이 상냥하게 말했다.
내가 꺾여져 꼭
시들어야만 하나요?
나는 꽃을 온통
뿌리째 뽑아 들고
아담한 집 안의
정원으로 가져 왔다.
그리고 꽃을 다시 심었다,
조용한 곳에.
이제 줄기가 자꾸 번져 나가고
계속해서 꽃을 피운다.
분명 괴테가 꽃을 온통 뿌리채 뽑아 들고 자신의 집으로 가져 왔다는 점에서 그가 꽃을 소유했다는 사실에는 반박할 여지가 없다. 그는 테니슨과 마찬가지로 소유하기를 갈망했고 소유함으로써 기쁨을 느꼈다. 그러나 괴테에게 꽃은 파괴의 대상이 아니라 말을 걸고 경고할 정도로 살아서 활동하는 존재였다. 꽃을 꺾으려는 결정적인 순간, 생명의 힘이 꽃을 파괴하고 소유하려는 그의 충동을 억눌렀다. 이 시에서 나타난 괴테는 ‘소유’ 양식의 인물인가, 혹은 ‘존재’ 양식의 인물인가. 쉽사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생명을 존중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소유를 향한 탐욕 그 이상이었다는 점에서 에리히 프롬은 괴테의 태도를 바쇼와 한데 묶어 ‘존재’ 양식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바쇼와 괴테는, 괴테와 테니슨만큼이나 엄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쇼와 달리 괴테는 소유에 대한 갈망을 완전히 비워내지 못했으며 끝내 소유를 포기하지도 않았다. 대신 괴테는 자신의 소유 욕구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꽃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적절한 합일점을 찾았다. 합일점. 사실 인생이라는 건 결국 만족스러운 합일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두 개를 모두 가진 듯, 두 개 중 아무것도 완전히 가지지 못한 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현실적이고도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물론 나는 지극히 소유적인 인감임에 틀림없다. 나는 매순간 무언가를 소유하고픈 탐욕에 지배당하고, 나는 ‘가지다’라는 말에 충분히 익숙하며, 나는 내 스스로를 조금 더 값나가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오늘하루도 아등바등 살아간다. 내게 있어서 소유란 안타깝게도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며 어쩌면 나 역시 나의 존재를 소유와 소비로서 확인받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의 삶은 언젠가부터 내게 무미건조함과 무의미함을 제공할 뿐이다. 완전한 ‘나’로서 살지 못하는 미완성의 나는 어떻게든 남은 나를 채워보려고 발버둥치지만 언제나 다시 제자리이다. 언제나 내게 돌아오는 건 삶의 공허함과 아무런 감흥조차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나에 대한 연민뿐이다. 그럼에도 나에게는 아직 ‘영웅’이 될 용기가 없다. 소유 양식의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가 정상인 척, 틀리지 않은 척하기 위해 만들어낸 ‘영웅’이 될 용기가 아직은 없다. 나에게는 사람들에게 ‘영웅’이라 불릴만한 용기가 아직은 없다. 이런 나에게 다가온 에리히 프롬의 책에 등장한 괴테와 그의 시 두 편은 매우 신선할 수 밖에 없었다. (-그 중 꽃에 대한 한 편은 이미 앞에서 이야기해보았고, 나머지 한 편은 에리히 프롬의 책 속에서 이 시가 너무도 난해하게 번역이 되어있어, 에리히 프롬이 인용한 영어문을 직접 찾아 그 뜻을 스스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http://blog.naver.com/jeholee46?Redirect=Log&logNo=150009141969
Property (Geothe)
I know that nothing belongs to me
But the thought which unimpeded
From my soul will flow
And every favorable moment
Which loving Fate
From the depth lets me enjoy
그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다. 다만 그는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막힘없는 생각과 인자한 운명이 그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는 모든 호의적인 순간들만이 그의 것임을 안다. 그의 모든 소유물들은 완전한 그의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언제든지 그의 곁을 떠나갈 수 있으며 그는 그 중 어떠한 것도 완전히 소유할 수 없다. 그는 완전히 소유할 수 없으며 그것들에 완전히 의존할 수 없다. 그가 붙잡을 수 있는 것,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의 생각과 그의 순간들뿐이다. 괴테는 에리히 프롬이나 에크하르트처럼 마음속에서 모든 것을 비워내길 강요하지 않는다. 그의 소유물을 모조리 부정하지도 않는다. 다만 그는 ‘존재’를 느낄 뿐이며, 소유물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그 곳에 메어두지 않을 뿐이다. 소유물이라는 것은 자신의 것이 될 수도, 자신의 곁을 떠날 수도 있는 것임을 언제나 받아들이고 인정할 뿐이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자유로워지고 싶다. 소유에서도 존재에서도 모두 자유로워지고 싶다. 나의 물건에서도, 사회에서도, 신이란 존재에서도, 하물며 ‘나’란 존재에서도 난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다. 소유함으로써 얻는 안전감, 소유하지 못함 혹은 덜 소유함에서 기인하는 불안 따위에 얽매이지 않으며 ‘존재’와 ‘본질’에 충실하려는 욕망, 자신의 탐욕을 모두 비워내고자 하는 다그침에서도 자유로워진 채 나를 나란 사람 그 자체로 누리고 싶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텅 빈 존재로 태어난 나는 오직 순간에 나를 맡기고 내 영혼의 생각에 나를 맡기며 그 꽃을 꺾든 혹은 바라보든 다만 난 그 꽃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 그 꽃 한 송이 가지고 싶은들 어떠하며 꽃 한 송이 그저 바라보고 싶은들 어떠한가. 오직 내게 중요한 건 내가 이 순간 그 곳에 존재한다는 것과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이 순간 나와 같은 공간에 존재한다는 것뿐. 난 잠시 꽃의 아름다움에 취할 것이며 난 그 꽃 한 송이에 날 메어두지 않는다는 것뿐. 꽃을 가지고픈 충동마저도 혹은 꽃을 향한 희생마저도 마음껏 받아들이며 동시에 마음껏 부인할 줄 알며 꽃에 집착하지 않은 채, 난 다만 꽃 한 송이 마음껏 즐기며 살다 가고 싶다. 나를 온전한 나로써 지킬 수 있을 만큼 더없이 자유롭게.
<참고문헌>
에리히 프롬, 박병덕 역(1994), 『소유냐 존재냐』, 학원사,
Du Marais(1769), \"Les Veritables Principes de la Grammaire\".
아무것도 찾지 않을
작정을 하면서.
나는 보았다, 그늘 아래
작은 꽃 하나 서 있는 걸,
뭇별처럼 반짝거리고
눈동자처럼 아름답게.
나는 꺾고 싶었다.
그때 작은 꽃이 상냥하게 말했다.
내가 꺾여져 꼭
시들어야만 하나요?
나는 꽃을 온통
뿌리째 뽑아 들고
아담한 집 안의
정원으로 가져 왔다.
그리고 꽃을 다시 심었다,
조용한 곳에.
이제 줄기가 자꾸 번져 나가고
계속해서 꽃을 피운다.
분명 괴테가 꽃을 온통 뿌리채 뽑아 들고 자신의 집으로 가져 왔다는 점에서 그가 꽃을 소유했다는 사실에는 반박할 여지가 없다. 그는 테니슨과 마찬가지로 소유하기를 갈망했고 소유함으로써 기쁨을 느꼈다. 그러나 괴테에게 꽃은 파괴의 대상이 아니라 말을 걸고 경고할 정도로 살아서 활동하는 존재였다. 꽃을 꺾으려는 결정적인 순간, 생명의 힘이 꽃을 파괴하고 소유하려는 그의 충동을 억눌렀다. 이 시에서 나타난 괴테는 ‘소유’ 양식의 인물인가, 혹은 ‘존재’ 양식의 인물인가. 쉽사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생명을 존중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소유를 향한 탐욕 그 이상이었다는 점에서 에리히 프롬은 괴테의 태도를 바쇼와 한데 묶어 ‘존재’ 양식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바쇼와 괴테는, 괴테와 테니슨만큼이나 엄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쇼와 달리 괴테는 소유에 대한 갈망을 완전히 비워내지 못했으며 끝내 소유를 포기하지도 않았다. 대신 괴테는 자신의 소유 욕구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꽃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적절한 합일점을 찾았다. 합일점. 사실 인생이라는 건 결국 만족스러운 합일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두 개를 모두 가진 듯, 두 개 중 아무것도 완전히 가지지 못한 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현실적이고도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물론 나는 지극히 소유적인 인감임에 틀림없다. 나는 매순간 무언가를 소유하고픈 탐욕에 지배당하고, 나는 ‘가지다’라는 말에 충분히 익숙하며, 나는 내 스스로를 조금 더 값나가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오늘하루도 아등바등 살아간다. 내게 있어서 소유란 안타깝게도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며 어쩌면 나 역시 나의 존재를 소유와 소비로서 확인받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의 삶은 언젠가부터 내게 무미건조함과 무의미함을 제공할 뿐이다. 완전한 ‘나’로서 살지 못하는 미완성의 나는 어떻게든 남은 나를 채워보려고 발버둥치지만 언제나 다시 제자리이다. 언제나 내게 돌아오는 건 삶의 공허함과 아무런 감흥조차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나에 대한 연민뿐이다. 그럼에도 나에게는 아직 ‘영웅’이 될 용기가 없다. 소유 양식의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가 정상인 척, 틀리지 않은 척하기 위해 만들어낸 ‘영웅’이 될 용기가 아직은 없다. 나에게는 사람들에게 ‘영웅’이라 불릴만한 용기가 아직은 없다. 이런 나에게 다가온 에리히 프롬의 책에 등장한 괴테와 그의 시 두 편은 매우 신선할 수 밖에 없었다. (-그 중 꽃에 대한 한 편은 이미 앞에서 이야기해보았고, 나머지 한 편은 에리히 프롬의 책 속에서 이 시가 너무도 난해하게 번역이 되어있어, 에리히 프롬이 인용한 영어문을 직접 찾아 그 뜻을 스스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http://blog.naver.com/jeholee46?Redirect=Log&logNo=150009141969
Property (Geothe)
I know that nothing belongs to me
But the thought which unimpeded
From my soul will flow
And every favorable moment
Which loving Fate
From the depth lets me enjoy
그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다. 다만 그는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막힘없는 생각과 인자한 운명이 그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는 모든 호의적인 순간들만이 그의 것임을 안다. 그의 모든 소유물들은 완전한 그의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언제든지 그의 곁을 떠나갈 수 있으며 그는 그 중 어떠한 것도 완전히 소유할 수 없다. 그는 완전히 소유할 수 없으며 그것들에 완전히 의존할 수 없다. 그가 붙잡을 수 있는 것,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의 생각과 그의 순간들뿐이다. 괴테는 에리히 프롬이나 에크하르트처럼 마음속에서 모든 것을 비워내길 강요하지 않는다. 그의 소유물을 모조리 부정하지도 않는다. 다만 그는 ‘존재’를 느낄 뿐이며, 소유물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그 곳에 메어두지 않을 뿐이다. 소유물이라는 것은 자신의 것이 될 수도, 자신의 곁을 떠날 수도 있는 것임을 언제나 받아들이고 인정할 뿐이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자유로워지고 싶다. 소유에서도 존재에서도 모두 자유로워지고 싶다. 나의 물건에서도, 사회에서도, 신이란 존재에서도, 하물며 ‘나’란 존재에서도 난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다. 소유함으로써 얻는 안전감, 소유하지 못함 혹은 덜 소유함에서 기인하는 불안 따위에 얽매이지 않으며 ‘존재’와 ‘본질’에 충실하려는 욕망, 자신의 탐욕을 모두 비워내고자 하는 다그침에서도 자유로워진 채 나를 나란 사람 그 자체로 누리고 싶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텅 빈 존재로 태어난 나는 오직 순간에 나를 맡기고 내 영혼의 생각에 나를 맡기며 그 꽃을 꺾든 혹은 바라보든 다만 난 그 꽃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 그 꽃 한 송이 가지고 싶은들 어떠하며 꽃 한 송이 그저 바라보고 싶은들 어떠한가. 오직 내게 중요한 건 내가 이 순간 그 곳에 존재한다는 것과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이 순간 나와 같은 공간에 존재한다는 것뿐. 난 잠시 꽃의 아름다움에 취할 것이며 난 그 꽃 한 송이에 날 메어두지 않는다는 것뿐. 꽃을 가지고픈 충동마저도 혹은 꽃을 향한 희생마저도 마음껏 받아들이며 동시에 마음껏 부인할 줄 알며 꽃에 집착하지 않은 채, 난 다만 꽃 한 송이 마음껏 즐기며 살다 가고 싶다. 나를 온전한 나로써 지킬 수 있을 만큼 더없이 자유롭게.
<참고문헌>
에리히 프롬, 박병덕 역(1994), 『소유냐 존재냐』, 학원사,
Du Marais(1769), \"Les Veritables Principes de la Grammai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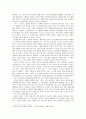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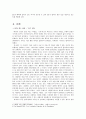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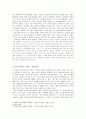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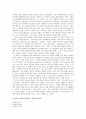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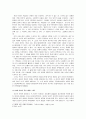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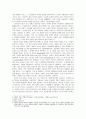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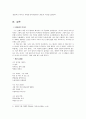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