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격구의 역사와 경기방법
①격구의 용어 및 역사
②격구의 규칙 및 경기 방법
③격구에 대한 사진 및 그림 자료
①격구의 용어 및 역사
②격구의 규칙 및 경기 방법
③격구에 대한 사진 및 그림 자료
본문내용
냐, 여러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일본식은 여러 개의 공을 각각 구문 속에 넣는 방식이다. 따라서 격렬한 접전이 없는 대신 개인의 기량을 위주로 한다. 이럴 경우 구장의 크기도 축소된다.
한편 공을 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폴로의 경우는 공을 치는 방식만 있지 우리처럼 장시안에 채 가지고 달리는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술이 단조로운 대신에 치밀한 작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문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공을 쳐서 구문 사이를 통과시키느냐, 아니면 일정한 구조물의 공간 사이를 말을 타고 통과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경국대전]에 이르기를 장시(;격구체)는 길이는 9치이고 너비가 3치이며, 자루의 길이는 3자 5치이고, 공둘레는 1자 3치이다.
출마표는 구표와 50보를 띠어둔다. 구표와 구문은 200보 거리를 둔다. 구문 내의 거리는 5보이다. 쳐서 구문을 빠져나가면 15푼 점을 주고, 빗나가는 자는 10점을 준다.
[용비어천가] 주에 이르기를,
\"고려시대에 매년 단오절에 예선에서 뽑힌 무관 중 나이 젊은 사람이나 의관자제들이 한 길가 넓은 곳 구규에 용봉장전을 설치하고, 장막 앞ㅍ 좌우에 각 200보를 허용하는 그 길 가운데 구문을 세우고, 길 양편에 오색 금단으로 장식한 부녀의 막에 명화로 수놓은 방석을 깐다. 격구자는 성대한 복장과 온갖 꾸밈을 다하여 궁극 사치가 화려하였다. 안장 하나의 비용이 중인 열집의 재산의 값과 맞먹었다.
2대로 나우어 좌우에 섰다가 기생 한 사람이 공을 잡고 걸어가는 중 주악이 그치면 공을 길 가운데로 던진다. 좌우에 있던 대오 모두가 말을 달려 공을 다투는데, 먼저 집는 자가 수격이 되고, 나머지 모두 물러난다. 서서 구경하는 자 산적한 것 같다.
격구보
맨처음 기 아래 말을 몰 때 장으로써 말목과 말귀와 더불어 가지런함을 비이(比耳)라 한다. 장으로써 말 가슴에 닿는 것을 할흉이라 한다.
몸을 기울여 드러누어 장으로써 말꼬리에 비김을 방미하 한다.
말을 달려 공을 훑어 놓은 곳까지 이르러 장의 안쪽으로 비껴 공을 높이 쳐드는 것을 배지라 한다.
장의 바깥으로 공을 밀었다가 끌어 들어 던지는 것을 지피라 하고, 또 이르기를 도령이라 한다. 인하여 비이로써 왼쪽으로 돌아 또 할흉하고, 두번째 방미하고, 공을 던지는 곳에 이르러 다시 공을 끌어들임을 이르러 구을방울이라 한다. 이같이 하기를 세번 하고 이에 말 달려 치며 행구하라.
세번 돌기를 마쳤으나 지세가 편편하지 못하여 가히 행구치 못할 때면 혹 네번, 혹 다서번 돌아도 무방하다. 첫 행구에서 놓치지 않으면 비이로써 두번, 혹 세번 하라.
비이한 후에 손을 들어 놓아쳐 손을 높이 들리고 아래로 드리워 양양함을 수양수라 한다. 수양수는 정한 수 없이 하나니 구문을 나가는 것을 한을 삼으라. 공을 던진 후에 허수양수를 하고, 또 방미를 하고, 또 공을 비껴 끌어들여 수양수로써 홍문을 향하여 던져 들거든, 인하여 공을 좇아 문으로 나가 허수양수로 공 둘레를 세번 돌아 한번 끌어들여 도로 홍문으로 들어와 도청 장막을 지나면 북을 울린다. 인하여 비이로써 달려 말을 몰아 운지로 돌아와 마친다.
혹 비이할 때 수양수를 미처 못하여 공이 이미 문으로 나갔거든 곧 구문 안에서 허수양수를 하고, 또 구문 밖에서 역시 허수양수를 하고, 혹 공이 구문 앞에 이르러 그칠려고 하거든 다시 치고 달려 구문으로 나감이 또한 무방하다.
③격구에 대한 사진 및 그림 자료
▲ 무예도보통지 격구 기구설명에 등장하는 모구(毛球) 사진입니다. 모구는 싸리나무를 둥글게 짜고, 그 위에 동물의 털을 씌워 말을 타고 끌고 가면 뒷사람이 그것을 쏘는 기예입니다. ⓒ2005 육군박물관 도록
한편 공을 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폴로의 경우는 공을 치는 방식만 있지 우리처럼 장시안에 채 가지고 달리는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술이 단조로운 대신에 치밀한 작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문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공을 쳐서 구문 사이를 통과시키느냐, 아니면 일정한 구조물의 공간 사이를 말을 타고 통과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경국대전]에 이르기를 장시(;격구체)는 길이는 9치이고 너비가 3치이며, 자루의 길이는 3자 5치이고, 공둘레는 1자 3치이다.
출마표는 구표와 50보를 띠어둔다. 구표와 구문은 200보 거리를 둔다. 구문 내의 거리는 5보이다. 쳐서 구문을 빠져나가면 15푼 점을 주고, 빗나가는 자는 10점을 준다.
[용비어천가] 주에 이르기를,
\"고려시대에 매년 단오절에 예선에서 뽑힌 무관 중 나이 젊은 사람이나 의관자제들이 한 길가 넓은 곳 구규에 용봉장전을 설치하고, 장막 앞ㅍ 좌우에 각 200보를 허용하는 그 길 가운데 구문을 세우고, 길 양편에 오색 금단으로 장식한 부녀의 막에 명화로 수놓은 방석을 깐다. 격구자는 성대한 복장과 온갖 꾸밈을 다하여 궁극 사치가 화려하였다. 안장 하나의 비용이 중인 열집의 재산의 값과 맞먹었다.
2대로 나우어 좌우에 섰다가 기생 한 사람이 공을 잡고 걸어가는 중 주악이 그치면 공을 길 가운데로 던진다. 좌우에 있던 대오 모두가 말을 달려 공을 다투는데, 먼저 집는 자가 수격이 되고, 나머지 모두 물러난다. 서서 구경하는 자 산적한 것 같다.
격구보
맨처음 기 아래 말을 몰 때 장으로써 말목과 말귀와 더불어 가지런함을 비이(比耳)라 한다. 장으로써 말 가슴에 닿는 것을 할흉이라 한다.
몸을 기울여 드러누어 장으로써 말꼬리에 비김을 방미하 한다.
말을 달려 공을 훑어 놓은 곳까지 이르러 장의 안쪽으로 비껴 공을 높이 쳐드는 것을 배지라 한다.
장의 바깥으로 공을 밀었다가 끌어 들어 던지는 것을 지피라 하고, 또 이르기를 도령이라 한다. 인하여 비이로써 왼쪽으로 돌아 또 할흉하고, 두번째 방미하고, 공을 던지는 곳에 이르러 다시 공을 끌어들임을 이르러 구을방울이라 한다. 이같이 하기를 세번 하고 이에 말 달려 치며 행구하라.
세번 돌기를 마쳤으나 지세가 편편하지 못하여 가히 행구치 못할 때면 혹 네번, 혹 다서번 돌아도 무방하다. 첫 행구에서 놓치지 않으면 비이로써 두번, 혹 세번 하라.
비이한 후에 손을 들어 놓아쳐 손을 높이 들리고 아래로 드리워 양양함을 수양수라 한다. 수양수는 정한 수 없이 하나니 구문을 나가는 것을 한을 삼으라. 공을 던진 후에 허수양수를 하고, 또 방미를 하고, 또 공을 비껴 끌어들여 수양수로써 홍문을 향하여 던져 들거든, 인하여 공을 좇아 문으로 나가 허수양수로 공 둘레를 세번 돌아 한번 끌어들여 도로 홍문으로 들어와 도청 장막을 지나면 북을 울린다. 인하여 비이로써 달려 말을 몰아 운지로 돌아와 마친다.
혹 비이할 때 수양수를 미처 못하여 공이 이미 문으로 나갔거든 곧 구문 안에서 허수양수를 하고, 또 구문 밖에서 역시 허수양수를 하고, 혹 공이 구문 앞에 이르러 그칠려고 하거든 다시 치고 달려 구문으로 나감이 또한 무방하다.
③격구에 대한 사진 및 그림 자료
▲ 무예도보통지 격구 기구설명에 등장하는 모구(毛球) 사진입니다. 모구는 싸리나무를 둥글게 짜고, 그 위에 동물의 털을 씌워 말을 타고 끌고 가면 뒷사람이 그것을 쏘는 기예입니다. ⓒ2005 육군박물관 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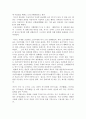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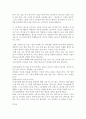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