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모더니즘과 모더니티
2. 새로운 문학정신
3. 한국 문학의 모더니즘
4. 모더니즘의 특성
5. 1930년대 모더니즘론
6. 모더니즘 개념에 관련된 문제
7. 1930년대 모더니즘 작가
8. 김기림 시로 본 30년대 모더니즘의 특질
Ⅲ. 결론
Ⅳ. 느낀점
Ⅴ. 참고자료
Ⅱ. 본론
1. 모더니즘과 모더니티
2. 새로운 문학정신
3. 한국 문학의 모더니즘
4. 모더니즘의 특성
5. 1930년대 모더니즘론
6. 모더니즘 개념에 관련된 문제
7. 1930년대 모더니즘 작가
8. 김기림 시로 본 30년대 모더니즘의 특질
Ⅲ. 결론
Ⅳ. 느낀점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분하고 잔잔하게 고향을 상실한 도시인인 자신의 비애와 고독을 읊고 있다.
그러나 시인 이상은 좀 더 급진적인 모더니즘의 세계관과 방법론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상의 시는 초현실주의와 다다이즘, 그리고 입체적인 경향이 섞인 시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상의 표현 방법을 모더니즘이라 말을 해야 하는지 약간의 의심을 가지게 된다. 이상의 표현방법은 이성의 허구성과 반 모랄적인 충동, 인간의 잠재의식과 역동적인 심층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단순히 모더니즘이라고 말하기는 힘이 들 것 같다. 모던(modern)의 모습을 비판하면서 모더니즘을 뛰어 넘으려는 어떤 현상이며 표현이라 생각을 한다. 이 표현 방법은 모더니즘 속에 있는 희망에 대한 상실 속에서 그 상실을 뛰어넘기 위한 표현이다.
그래서 이상의 시는 모더니즘이라 말하기 힘이 든다. 그렇다고 모더니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힘이 돈다.
이상의 시인 오감도나 꽃나무, 거울 등을 살펴보면 모던을 비판하면서 뭔가를 추구하는 모던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상실 속에서 절망 속에서 방향성을 찾는 것이라 생각을 해본다. 그것이 진정한 모던이 아닐까? 이상이 추구했던 모던은 철저한 자기의 nihil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한다. 좌절 속에서 느끼는 “나”의 한계. 그 안에서 그동안 가졌던 것에 대한 버림. 이것이 바로 Nihil을 이해하는 것이 되며, nihil를 뛰어넘는 것이 되는 어떤 원동력이다.
이런 역동성과 달리 30년대 후반에는 생명파가 등장한다. 그러나 이 집단을 “생명파”라고 부르는 것에 문제가 있다. 진정한 생명과 인생을 아는 것은 단순히 something을 something으로 보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nihil에서 시작해야 한다. 자신이 가졌던 것에 대한 포기와 그 포기 속에 나오는 nihil에서의 시작이 진정한 생명과 인생을 말하는 것이므로 생명파는 모더니즘을 비판하면서 현실 속 nihil에서 something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왜 생명과 인생이 nihil에서 시작해야 할까? something에서 something을 보면 something을 정확히 볼 수 없다. something에서 something을 볼 때 그 something은 something 자체가 아니라 “나”라는 주체로만 굴절된 something이 되기 때문에 something의 something이 죽어버린다. 그래서 30년대 후반에 등장한 생명파 시인들은 결국 자신의 보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친일파로 둔갑하여서 생명이라는 것을 악용한다. 자신의 something을 자신을 위한 something으로 사용한 것이다. 유명한 서정주 시인.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의미 없이 죽어가야 했는가? 해방 후에 1980년대에도 그런 잘못된 생명의 관점을 가진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야 했는가? 서정주시인과 같은 생명파 시인은 생명파라기 보다는 죽음을 부르는 반-생명파적 시인이라고 해야 한다.
진정한 생명을 아는 것은 nihil에서 something을 찾을 때 알 수 있다. Nihil은 nothing이 아니고 Nihil 그 자체이다. Nihil을 봐야 something을 볼 수 있다. 이것을 잘 표현한 시인이 생명의 서를 쓴 유치환이 아닐까 한다.
진정한 생명은 철저한 nihil에서 시작한다. 또한 자신의 nihil을 찾지 못할 때 그 nihil을 찾으려고 해야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며, 생명에 대한 존엄을 아는 것이 된다. 그 nihil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철저한 부정에서 시작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밖에 존재하는 나의 주체성을 포기하고 나의 내면에 존재하는 객체성에서 다시 나를 보는 것이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원동력이 되며, nihil에서 something을 만들어 내는 창조의 과정이 된다. 포기한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쪽만 보았던 나의 다른 한 쪽을 보기 위해서 강한 한 쪽의 “나”를 철저하게 버리는 것이고 보지 못했던 다른 쪽을 보면서 철저하게 버렸던 “나”를 다시 만나는 것이다.
Nihil은 비관적인 nihil(nothing)이 아니라 긍정적 nihil(Nihil)의 의지 속에서 삶을 긍정하고 인간을 찾는 것이다. Nihil은 nothing이 아니라, something을 위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며, 항상 자신을 냉철하게, 냉정하게 바라보는 거울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나”라는 객체는 철저하게 냉정한 모습이 존재해야 한다.
만일 칸트가 nihil을 알고 철학을 말했다면, 헤겔이 nihil을 알고 철학을 말했다면 그들의 철학은 더 깊은 철학이 되었으며, 악용되지 않았을 것이다.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에 한국을 본 외국인의 눈에 한국은 바로 nihil에서 시작한 생명의 원동력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들이 상실한 것은 바로 something에서 something을 보면서 왜곡된 “나”를 보기 때문에 그 “나”는 “나”가 아니라 “nothing"이다.
1930년대는 모더니즘과 생명파라는 시문학의 흐름이 있었고, 진정한 생명과 거짓된 생명이 있었다. 자신을 뛰어넘으려는 모더니즘이 있었고, 그저 안주하려는 모더니즘이 있었다. 지금 우리들에게 남은 것은 거짓된 생명이 참 생명인양 춤을 추고 있는 모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눈을 가리고 있으면서 우리를 더욱 더 Nothing으로 몰아가고 있다.
Ⅴ. 참고자료
김기림, 『김기림 전집』1-6, 심설당, 1988
김재용 외, 『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1993
김윤식, 『한국문학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민음사, 1989
나병철, 「근대성과 근대문학」, 문예출판사, 1995.
손정수, 『개념사로서의 한국근대비평사』, 도서출판 역락, 2002
윤여탁, 『김기림 문학비평』, 푸른사상, 2002
정순진 편, 『새미작가론총서-김기림』, 새미출판사, 1998
조달곤, 『김기림 문학연구』,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8
조달곤, 『한국 모더니즘 시학의 지형도』국학자료원, 2006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 지식산업사, 2005
조정래 외,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작가연구』평민사, 1999
그러나 시인 이상은 좀 더 급진적인 모더니즘의 세계관과 방법론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상의 시는 초현실주의와 다다이즘, 그리고 입체적인 경향이 섞인 시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상의 표현 방법을 모더니즘이라 말을 해야 하는지 약간의 의심을 가지게 된다. 이상의 표현방법은 이성의 허구성과 반 모랄적인 충동, 인간의 잠재의식과 역동적인 심층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단순히 모더니즘이라고 말하기는 힘이 들 것 같다. 모던(modern)의 모습을 비판하면서 모더니즘을 뛰어 넘으려는 어떤 현상이며 표현이라 생각을 한다. 이 표현 방법은 모더니즘 속에 있는 희망에 대한 상실 속에서 그 상실을 뛰어넘기 위한 표현이다.
그래서 이상의 시는 모더니즘이라 말하기 힘이 든다. 그렇다고 모더니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힘이 돈다.
이상의 시인 오감도나 꽃나무, 거울 등을 살펴보면 모던을 비판하면서 뭔가를 추구하는 모던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상실 속에서 절망 속에서 방향성을 찾는 것이라 생각을 해본다. 그것이 진정한 모던이 아닐까? 이상이 추구했던 모던은 철저한 자기의 nihil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한다. 좌절 속에서 느끼는 “나”의 한계. 그 안에서 그동안 가졌던 것에 대한 버림. 이것이 바로 Nihil을 이해하는 것이 되며, nihil를 뛰어넘는 것이 되는 어떤 원동력이다.
이런 역동성과 달리 30년대 후반에는 생명파가 등장한다. 그러나 이 집단을 “생명파”라고 부르는 것에 문제가 있다. 진정한 생명과 인생을 아는 것은 단순히 something을 something으로 보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nihil에서 시작해야 한다. 자신이 가졌던 것에 대한 포기와 그 포기 속에 나오는 nihil에서의 시작이 진정한 생명과 인생을 말하는 것이므로 생명파는 모더니즘을 비판하면서 현실 속 nihil에서 something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왜 생명과 인생이 nihil에서 시작해야 할까? something에서 something을 보면 something을 정확히 볼 수 없다. something에서 something을 볼 때 그 something은 something 자체가 아니라 “나”라는 주체로만 굴절된 something이 되기 때문에 something의 something이 죽어버린다. 그래서 30년대 후반에 등장한 생명파 시인들은 결국 자신의 보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친일파로 둔갑하여서 생명이라는 것을 악용한다. 자신의 something을 자신을 위한 something으로 사용한 것이다. 유명한 서정주 시인.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의미 없이 죽어가야 했는가? 해방 후에 1980년대에도 그런 잘못된 생명의 관점을 가진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야 했는가? 서정주시인과 같은 생명파 시인은 생명파라기 보다는 죽음을 부르는 반-생명파적 시인이라고 해야 한다.
진정한 생명을 아는 것은 nihil에서 something을 찾을 때 알 수 있다. Nihil은 nothing이 아니고 Nihil 그 자체이다. Nihil을 봐야 something을 볼 수 있다. 이것을 잘 표현한 시인이 생명의 서를 쓴 유치환이 아닐까 한다.
진정한 생명은 철저한 nihil에서 시작한다. 또한 자신의 nihil을 찾지 못할 때 그 nihil을 찾으려고 해야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며, 생명에 대한 존엄을 아는 것이 된다. 그 nihil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철저한 부정에서 시작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밖에 존재하는 나의 주체성을 포기하고 나의 내면에 존재하는 객체성에서 다시 나를 보는 것이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원동력이 되며, nihil에서 something을 만들어 내는 창조의 과정이 된다. 포기한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쪽만 보았던 나의 다른 한 쪽을 보기 위해서 강한 한 쪽의 “나”를 철저하게 버리는 것이고 보지 못했던 다른 쪽을 보면서 철저하게 버렸던 “나”를 다시 만나는 것이다.
Nihil은 비관적인 nihil(nothing)이 아니라 긍정적 nihil(Nihil)의 의지 속에서 삶을 긍정하고 인간을 찾는 것이다. Nihil은 nothing이 아니라, something을 위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며, 항상 자신을 냉철하게, 냉정하게 바라보는 거울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나”라는 객체는 철저하게 냉정한 모습이 존재해야 한다.
만일 칸트가 nihil을 알고 철학을 말했다면, 헤겔이 nihil을 알고 철학을 말했다면 그들의 철학은 더 깊은 철학이 되었으며, 악용되지 않았을 것이다.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에 한국을 본 외국인의 눈에 한국은 바로 nihil에서 시작한 생명의 원동력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들이 상실한 것은 바로 something에서 something을 보면서 왜곡된 “나”를 보기 때문에 그 “나”는 “나”가 아니라 “nothing"이다.
1930년대는 모더니즘과 생명파라는 시문학의 흐름이 있었고, 진정한 생명과 거짓된 생명이 있었다. 자신을 뛰어넘으려는 모더니즘이 있었고, 그저 안주하려는 모더니즘이 있었다. 지금 우리들에게 남은 것은 거짓된 생명이 참 생명인양 춤을 추고 있는 모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눈을 가리고 있으면서 우리를 더욱 더 Nothing으로 몰아가고 있다.
Ⅴ. 참고자료
김기림, 『김기림 전집』1-6, 심설당, 1988
김재용 외, 『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1993
김윤식, 『한국문학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민음사, 1989
나병철, 「근대성과 근대문학」, 문예출판사, 1995.
손정수, 『개념사로서의 한국근대비평사』, 도서출판 역락, 2002
윤여탁, 『김기림 문학비평』, 푸른사상, 2002
정순진 편, 『새미작가론총서-김기림』, 새미출판사, 1998
조달곤, 『김기림 문학연구』,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8
조달곤, 『한국 모더니즘 시학의 지형도』국학자료원, 2006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 지식산업사, 2005
조정래 외,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작가연구』평민사, 1999
추천자료
 국외한국어문학
국외한국어문학 한국문학사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과 특징
한국문학사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과 특징 한국현대문학사(일제강점기~1980년대)
한국현대문학사(일제강점기~1980년대) 한국문학 특질
한국문학 특질 한국문학통사 제 4판 1권 정리
한국문학통사 제 4판 1권 정리 한국문학통사 3권(4판)정리 - 9.13~15
한국문학통사 3권(4판)정리 - 9.13~15 한국근대문학의 기점
한국근대문학의 기점 『한국문학의 이해』(김흥규, 민음사, 1998) 내용 요약·정리
『한국문학의 이해』(김흥규, 민음사, 1998) 내용 요약·정리 제4판 한국문학통사 2 (조동일) 요약, 정리
제4판 한국문학통사 2 (조동일) 요약, 정리 제4판 한국문학통사 3 (조동일) 요약, 정리
제4판 한국문학통사 3 (조동일) 요약, 정리  [한국현대문학] 최명익의 『심문』과 『장삼이사』를 중심으로 1930~1940년대 작가세계관 분석
[한국현대문학] 최명익의 『심문』과 『장삼이사』를 중심으로 1930~1940년대 작가세계관 분석 [한국현대문학] 신경숙 외딴방 등장인물과 작품분석
[한국현대문학] 신경숙 외딴방 등장인물과 작품분석 고전 한국문학 「가사(歌詞)」의 명칭, 기원, 장르, 형식, 역사적 흐름과 유형별 대표 작품 (...
고전 한국문학 「가사(歌詞)」의 명칭, 기원, 장르, 형식, 역사적 흐름과 유형별 대표 작품 (... 한국문학사)사설시조를 분석하시오.
한국문학사)사설시조를 분석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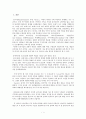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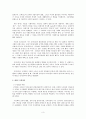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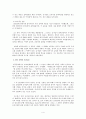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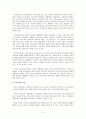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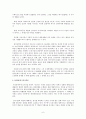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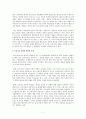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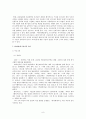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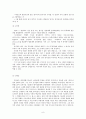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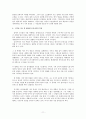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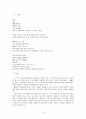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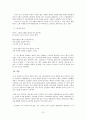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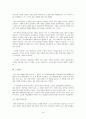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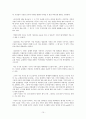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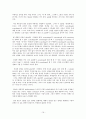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