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동일성과 존재론적 은유
Ⅱ. 치환은유와 시적 인식
Ⅲ. 병치은유와 존재의 시
Ⅳ. 비동일성의 원리
Ⅱ. 치환은유와 시적 인식
Ⅲ. 병치은유와 존재의 시
Ⅳ. 비동일성의 원리
본문내용
나의 하나님> 중에서
원관념 “하나님”에 이를 해명하는 보조관념 “늙은 悲哀”와 “푸줏간에 걸린 커다란 살점”과 “놋쇠 항아리”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 보조관념들은 아무런 유사성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원관념으로부터 너무나 먼 거리에 있다.
그리하여 돌연한 결합에서 우리는 ‘놀람’의 시적 긴장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의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 의미 차원과는 다른 매우 모호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기이한 것으로 변용되어 있다. 물론 이것은 보조관념들과의 결합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결합 속에서 보조관념들도 원형 그대로 남아 있지 않다. 비유는 두 사물의 결합으로 새로운 문맥을 만들어 내는 형식이다. 테이트가 내포와 외연의 접두사를 제거했다는 것은 일상적 차원에서 보면 대립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는, 먼 거리에 있는 두 사물을 파괴하여 새로운 제3의 의미차원으로 변용 융합시켰다는 것이며, 그 결과는 시적 긴장이 되는 것이다.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시의 은유에서 도피의 원리를 가져왔다면 이 도피의 다른 한 양상은 대결이 된다. 현대시는 의도상으로 보면 현실과의 ‘대결의 시’가 된다. 휠라이트는 삶의 원리가 자아와 타인간의, 자아와 물리적 환경간의 사랑과 적개심, 본능적 충동과 이성적 사고가 내리는 결정간의, 생의 충동과 죽음의 열망 사이의 여러 긴장 속에 나타나는 투쟁이라고 보고 언어도 살아 있는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긴장적 언어(tensive language)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현대시의 은유는 과거와는 달리 도피 또는 대결의 원리 속에서 성립한다.
허름한 처마 아래서 밤
열두 시에 나는 죽어,
나는 가을
비에 젖어 펄럭이는 疾患이 되고
한없이 깊은 층계를
굴러 떨어지는 昆蟲의 눈에 비친 暗黑이 된다
두려운 칼자욱이 된다.
- 이승훈, <寫眞> 중에서
카프카의 ≪변신≫을 연상하리만큼 이 작품의 화자는 죽어서 “비에 젖어 펄럭이는 疾患”이 되고, “층계를/ 굴러 떨어지는 昆蟲의 눈에 비친 暗黑”이 되고, 또 “두려운 칼자욱”이 된다. 동양적 인연관이 은유형식으로 나타나 있는 이 작품에서, 원관념인 화자(나)와 보조관념인 疾患 暗黑 칼자국 등 사이에는 동일성의 화해가 아니라 대립 갈등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보조관념들과 만날수록 원관념인 ‘나’는 점점 현실의 인간과는 다른 익명의 존재로 추상화된다. 말하자면 그만큼 현실의 모습이 지워진다. 앞에서 인용한 김춘수의 <나의 하나님>에 있어서도 원관념인 “하나님”과 보조관념인 “푸줏간에 걸린 살점”, “놋쇠 항아리” 사이의 그 당돌한 결합만큼 대립 갈등의 이질성을 뚜렷이 느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은유의 형태는 대상의 재현이 아니라 시의 세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상상적 질서다.
김춘수의 무의미시 그리고 이승훈의 비대상시란 ‘세계상실의 시’다. 외부세계를 상실한 상황에서 시인이 보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자신, 곧 자신의 내면세계다. 이 내면세계는 외부세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워진 만큼 순수한 추상적 세계다. 세계상실은 언어붕괴와 등가된다. 다시 말하면 세계상실의 추상시에서 은유는 화자를 포함해서 사물들의 현실적 모습을 지우며 사물들 사이의 연관성도 해체시키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추상시의 은유는 참조할 수 없는 은유, 곧 ‘절대은유’다. 그러니까 추상시의 이미지들은 언어와 지시적 기능이 무화된, 시 속에만 존재하는 절대적 심상이다. 이런 추상시가 언어의 지시적 기능이 우세한 리얼리즘시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됨은 물론이다.
이처럼 현대시의 은유는 현저하게 동일성의 원리에서 비동일성의 원리, 곧 도피 또는 대결의 원리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원관념 “하나님”에 이를 해명하는 보조관념 “늙은 悲哀”와 “푸줏간에 걸린 커다란 살점”과 “놋쇠 항아리”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 보조관념들은 아무런 유사성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원관념으로부터 너무나 먼 거리에 있다.
그리하여 돌연한 결합에서 우리는 ‘놀람’의 시적 긴장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의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 의미 차원과는 다른 매우 모호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기이한 것으로 변용되어 있다. 물론 이것은 보조관념들과의 결합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결합 속에서 보조관념들도 원형 그대로 남아 있지 않다. 비유는 두 사물의 결합으로 새로운 문맥을 만들어 내는 형식이다. 테이트가 내포와 외연의 접두사를 제거했다는 것은 일상적 차원에서 보면 대립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는, 먼 거리에 있는 두 사물을 파괴하여 새로운 제3의 의미차원으로 변용 융합시켰다는 것이며, 그 결과는 시적 긴장이 되는 것이다.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시의 은유에서 도피의 원리를 가져왔다면 이 도피의 다른 한 양상은 대결이 된다. 현대시는 의도상으로 보면 현실과의 ‘대결의 시’가 된다. 휠라이트는 삶의 원리가 자아와 타인간의, 자아와 물리적 환경간의 사랑과 적개심, 본능적 충동과 이성적 사고가 내리는 결정간의, 생의 충동과 죽음의 열망 사이의 여러 긴장 속에 나타나는 투쟁이라고 보고 언어도 살아 있는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긴장적 언어(tensive language)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현대시의 은유는 과거와는 달리 도피 또는 대결의 원리 속에서 성립한다.
허름한 처마 아래서 밤
열두 시에 나는 죽어,
나는 가을
비에 젖어 펄럭이는 疾患이 되고
한없이 깊은 층계를
굴러 떨어지는 昆蟲의 눈에 비친 暗黑이 된다
두려운 칼자욱이 된다.
- 이승훈, <寫眞> 중에서
카프카의 ≪변신≫을 연상하리만큼 이 작품의 화자는 죽어서 “비에 젖어 펄럭이는 疾患”이 되고, “층계를/ 굴러 떨어지는 昆蟲의 눈에 비친 暗黑”이 되고, 또 “두려운 칼자욱”이 된다. 동양적 인연관이 은유형식으로 나타나 있는 이 작품에서, 원관념인 화자(나)와 보조관념인 疾患 暗黑 칼자국 등 사이에는 동일성의 화해가 아니라 대립 갈등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보조관념들과 만날수록 원관념인 ‘나’는 점점 현실의 인간과는 다른 익명의 존재로 추상화된다. 말하자면 그만큼 현실의 모습이 지워진다. 앞에서 인용한 김춘수의 <나의 하나님>에 있어서도 원관념인 “하나님”과 보조관념인 “푸줏간에 걸린 살점”, “놋쇠 항아리” 사이의 그 당돌한 결합만큼 대립 갈등의 이질성을 뚜렷이 느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은유의 형태는 대상의 재현이 아니라 시의 세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상상적 질서다.
김춘수의 무의미시 그리고 이승훈의 비대상시란 ‘세계상실의 시’다. 외부세계를 상실한 상황에서 시인이 보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자신, 곧 자신의 내면세계다. 이 내면세계는 외부세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워진 만큼 순수한 추상적 세계다. 세계상실은 언어붕괴와 등가된다. 다시 말하면 세계상실의 추상시에서 은유는 화자를 포함해서 사물들의 현실적 모습을 지우며 사물들 사이의 연관성도 해체시키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추상시의 은유는 참조할 수 없는 은유, 곧 ‘절대은유’다. 그러니까 추상시의 이미지들은 언어와 지시적 기능이 무화된, 시 속에만 존재하는 절대적 심상이다. 이런 추상시가 언어의 지시적 기능이 우세한 리얼리즘시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됨은 물론이다.
이처럼 현대시의 은유는 현저하게 동일성의 원리에서 비동일성의 원리, 곧 도피 또는 대결의 원리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키워드
추천자료
 고등학교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바울 서신에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선교 행위에 대해가지는 신학적함축
바울 서신에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선교 행위에 대해가지는 신학적함축 바울 서신에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울 서신에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B. F. Skinner의 행동주의이론
B. F. Skinner의 행동주의이론 모세오경
모세오경 - 국부론 - (아담 스미스Adam Smith) 분석 - 스미스가 국부론을 저술한 목적, 의의와 주요내...
- 국부론 - (아담 스미스Adam Smith) 분석 - 스미스가 국부론을 저술한 목적, 의의와 주요내... 논리학의 개념과 형태
논리학의 개념과 형태 반두라의 이론
반두라의 이론 [일본 천황][일본 천황제][일본 상징천황제][천황대제]일본 천황(천황제) 관련 신화, 일본 천...
[일본 천황][일본 천황제][일본 상징천황제][천황대제]일본 천황(천황제) 관련 신화, 일본 천... 국어과(수업, 교육) 반응중심학습지도, 문제해결학습지도, 국어과(수업, 교육) 소집단토의학...
국어과(수업, 교육) 반응중심학습지도, 문제해결학습지도, 국어과(수업, 교육) 소집단토의학... 20120511_사회복지행정의 이론
20120511_사회복지행정의 이론 존 듀이의 민주주의와 교육 챕터별 정리
존 듀이의 민주주의와 교육 챕터별 정리
 [아동미술교육] 아동미술교육의 이론 (미술의 개념, 아동미술활동의 정의 및 의의, 아동미술...
[아동미술교육] 아동미술교육의 이론 (미술의 개념, 아동미술활동의 정의 및 의의, 아동미술... [교육심리] Behaviourism (행동주의/ 行動主義) 정리.pptx
[교육심리] Behaviourism (행동주의/ 行動主義) 정리.ppt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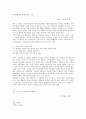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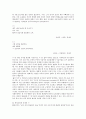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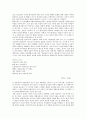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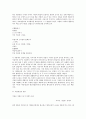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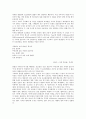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