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부재자의 재산관리
3. 실종선고
2. 부재자의 재산관리
3. 실종선고
본문내용
관계인이 원하면 새로이 실종선고를 청구해야 한다.
② 예 외
a)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善意로 한 행위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善意로 한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9조 1항 단서). 유의할 것은 「실종기간만료 후 선고 전」에 행한 행위에 관하여는 제29조 1항 단서의 적용이 없다. 예컨대, 실종선고 전에 잔존 배우자가 재혼하였다면 前婚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이므로 선의이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 그리고 善意가 당사자 모두에게 요구되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ⅰ. 재산관계와 신분관계를 구별하지 않는 견해 재산관계와 신분관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선의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모두에게 요구된다는 것이 多數說이다(단독행위는 물론 단독행위자만의 선의로 족하다). 예컨대, 실종자 A 소유의 가옥이 상속인 B로부터 C, D에게 차례로 매도된 경우, BCD 중 1인이라도 악의이면, A는 D에게 그 가옥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D는 C에게, C는 B에게 각각 제570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담보책임의 범위는 선의악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제570조 참조). 또한 A는 D에 대한 청구와 선택적으로,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 B에게 현존이익(예컨대 소비하지 않은 채 갖고 있는 매각대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9조 2항 참조). 그리고 잔존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재혼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악의이면 전혼은 부활하고 그 결과 중혼이 된다. 따라서 전혼에는 이혼사유가 발생하고(제840조), 후혼에는 취소사유가 있게 된다(제816조).
ⅱ. 재산관계를 구별하는 견해 신분관계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없으나, 「재산관계」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선악의에 따라 개별적상대적으로 그 효력을 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예컨대, 위 상속사례에서 D가 악의이고 BC가 선의이면 D에게 가옥의 반환을 청구하거나(이 경우 D는 C에게 제570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또는 B에게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29조 2항). 한편, BD는 선의이고 C가 악의라면 C에게 그 가옥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물론 C가 D로부터 가옥을 이전받아 A에게 반환할 수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C는 물론 B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b)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善意인 때에도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惡意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29조 2항).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얻은 자란, 예컨대 상속인, 受贈者(수증자, 유증받는 자), 생명보험수익자 등을 가리키며, 이들로부터의 전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c) 별도의 권리취득원인의 있는 경우 재산취득자에게 취득시효선의취득 등의 다른 권리취득원인이 있을 때에는 실종선고취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예 외
a)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善意로 한 행위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善意로 한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9조 1항 단서). 유의할 것은 「실종기간만료 후 선고 전」에 행한 행위에 관하여는 제29조 1항 단서의 적용이 없다. 예컨대, 실종선고 전에 잔존 배우자가 재혼하였다면 前婚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이므로 선의이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 그리고 善意가 당사자 모두에게 요구되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ⅰ. 재산관계와 신분관계를 구별하지 않는 견해 재산관계와 신분관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선의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모두에게 요구된다는 것이 多數說이다(단독행위는 물론 단독행위자만의 선의로 족하다). 예컨대, 실종자 A 소유의 가옥이 상속인 B로부터 C, D에게 차례로 매도된 경우, BCD 중 1인이라도 악의이면, A는 D에게 그 가옥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D는 C에게, C는 B에게 각각 제570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담보책임의 범위는 선의악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제570조 참조). 또한 A는 D에 대한 청구와 선택적으로,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 B에게 현존이익(예컨대 소비하지 않은 채 갖고 있는 매각대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9조 2항 참조). 그리고 잔존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재혼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악의이면 전혼은 부활하고 그 결과 중혼이 된다. 따라서 전혼에는 이혼사유가 발생하고(제840조), 후혼에는 취소사유가 있게 된다(제816조).
ⅱ. 재산관계를 구별하는 견해 신분관계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없으나, 「재산관계」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선악의에 따라 개별적상대적으로 그 효력을 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예컨대, 위 상속사례에서 D가 악의이고 BC가 선의이면 D에게 가옥의 반환을 청구하거나(이 경우 D는 C에게 제570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또는 B에게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29조 2항). 한편, BD는 선의이고 C가 악의라면 C에게 그 가옥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물론 C가 D로부터 가옥을 이전받아 A에게 반환할 수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C는 물론 B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b)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善意인 때에도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惡意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29조 2항).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얻은 자란, 예컨대 상속인, 受贈者(수증자, 유증받는 자), 생명보험수익자 등을 가리키며, 이들로부터의 전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c) 별도의 권리취득원인의 있는 경우 재산취득자에게 취득시효선의취득 등의 다른 권리취득원인이 있을 때에는 실종선고취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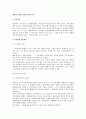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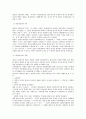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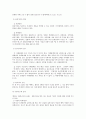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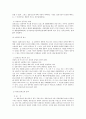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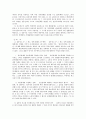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