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서(草書)의 단점을 함께 보완하고자 생겨난 서체가 행서(行書)이다. 발생 시기에 대해서 흔히 행서(行書)가 해서(楷書)와 초서(草書)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고, 일반적으로 초서(草書)가 서체의 종류 가운데 가장 흘려 쓴 형태이기 때문에 복잡함에서 단순함으로, 곧 규격체에서 흘림체로 변천하는 과정으로 볼 때 초서가 가장 마지막 단계의 서체(書體)로 보여, 발생 시기도 초서가 가장 후대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후대의 서체는 행서(行書)이다.
행서의 특징
후한(後漢) 말기부터 시작되어 진(晋)의 왕희지(王羲之)가 등장하면서 확고한 틀이 완성된 행서(行書)는 해서(楷書)의 필기체(筆記體) 형태를 띠고 있어 초서(草書)처럼 획을 연결해 쓰면서도 지나친 간략화를 하지 않아 쓰기 쉽고 보기 좋은 두 가지 양상을 모두 해결했다. 특히 서예의 대표적 작품으로 꼽는 왕희지의《난정서(蘭亭序)》는 행서의 특징인 표현의 다양성과 형태의 변화감을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작품으로 전해진다. 행서의 기본적인 특징은 해서와의 차이점에서 쉽게 알 수 있는데, 해서(楷書)가 쓰는 방식이 획을 정성들여 헛된 부분이 나타나지 않게 쓰는 감추는 방식인 \'장봉(藏鋒)의 필체\'인 반면에 행서(行書)는 자연스럽게 필기하는 방식이어서 획의 연결선 등을 드러내는 방식인 \'노봉(露鋒)의 필체\'를 지니고 있다.
행서의 가치
서체(書體)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서체의 변화 방향은 자형(字形)의 복잡함에서 간단함으로, 또 필기(筆記)와 이해의 난해함에서 편리함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형의 간단함과 필기 이해의 편리함을 모두 어느 정도 소화해 낸 서체가 바로 행서(行書)이다.
한자의 서체(書體) 6 - 초서(草書)
고대(古代)에서 중세(中世)로 접어들면서 문자(文字)의 활동도는 크게 신장된다. 이에 이전의 예서(隸書)가 지닌 혁신성 역시 크게 감소되면서, 보다 실용적으로 신속하게 문자를 쓸 필요가 생겨났고, 이에 부흥해서 크게 유행하게 된 초서(草書)가 등장하게 된다.
초서의 정의
초서는 아주 거칠고 단정하지 못하다는 의미인 \"초솔(草率)하다\"는 의미에서 극도로 흘려서 쓴 서체라는 의미로 초서(草書)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표의문자(表意文字)의 단점인 서체(書體)의 복잡함과 난해함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극도로 흘려서 빠르고 간단하게 쓴 서체를 생각해 낸 것이다. 규격을 갖춘 서체인 예서(隸書)로부터 해서(楷書)로 발전했지만, 글자를 쓸 때 너무 복잡하고 많은 정성이 들어가 쓰는 시간도 꾀 필요한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간략하게 흘려 쓰는 초서(草書)가 생겨난 것이다. 현재 초서는 문자로서의 실용성을 넘어 예술적 경지로까지 발전하여 그 멋을 자랑하고 있지만,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간략화시켜 흘려 쓰게 된 결과 해독(解讀)의 어려움을 가져와 실용성을 상실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초서의 특징
예서(隸書)나 해서(楷書)의 규격성과 복잡함을 해소하기 위해 글자의 윤곽이나 일부분만으로 표현하면서 전체적으로 획을 연결해서 신속하게 쓸 수 있게 발전한다. 발생 시기도 \"한조(漢朝)가 흥하자 초서(草書)가 나왔다\"는 《설문해자(說文解字)》서문(序文)을 보듯이 예서(隸書)가 한창 번성하던 한(漢)나라시대에 함께 등장했는데, 초기의 장초(章草)에서 동진(東晋)시대의 금초(今草)와 당(唐)나라 때의 광초(狂草)까지 다양하게 발전을 하지만 실용성은 떨어지게 된다.
▣ 장초(章草) :
초기의 초서체로 진말한초(秦末漢初)에 예서체(隸書體)를 간략하게 흘려 쓰기 시작하면서 발생되었는데, 장제(章帝)가 즐겨 써서 장초(章草)라고 합니다.
▣ 금초(今草) :
후한(後漢)에서 동진(東晋)시대에 장초(章草)에서 발전해 독자적인 서체의 틀을 완성해 현재까지 일반적인 초서(草書)의 틀을 의미하게 됩니다.
▣ 광초(狂草) :
마치 미친 듯이 거의 끊어짐 없이 글자들까지 이어서 쓰는 형식의 광초(狂草)는 당(唐)나라 때 벌써 예술적 경지로 발전합니다.
초서의 가치
몇 십번의 필획으로 사각형 네모꼴의 규격에 맞춰 정성을 들여야 하는 기존의 예서체(隸書體)나 해서체(楷書體)의 어려움을 극복한 초서(草書)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필기 형태로 인해 다양하게 발전한다. 그러나 그 취지가 너무 강조된 나머지 지나치게 간략화 해 현대까지 예술적 대상으로 다양하게 발전하였지만, 실용적 가치를 다소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일반인들의 속성(速成) 필기체의 주축을 행서체(行書體)로 옮겨가게 한다.
출처 :
4. 설문해자의 가치와 영향
설문해자는, 허신이 당시의 많은 경학가, 문자학자의 연구성과를 정리, 연구하여 편성한 총결적인 저작이며, 여기에는 대부분의 선진자체 및 한대와 그 이전의 문자의 적지 않은 文字훈고를 보존하고 있으며, 上古 한어사회의 문제를 반영하고, 비교적 계통적으로 文字분석의 이론을 제기하였는데; 오늘날 古文字學과 古漢語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자료이다. 만약 이 책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진한의 전서를 알 수 없었을 것이며, 상대 甲骨文과 상주의 종정문과 전국시대의 古文을 식별한다는 것은 더욱 말할 것이 없다. 이 책은 후대의 자전사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는데, 편방으로 部를 나눈 이 책의 방법은 줄곧 字典편찬의 일종의 주요한 본보기가 되었다. 그러나 설문해자에 비록 이러한 가치와 영향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중대한 결점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점은 우선 이 책의 해설내용의 측면에서 나타난다. 허신이 편한 說文解字는, 본래 그가 말한 \"속유비부\"의 文字에 대한 황당하고 잘못된 영향을 규정하려는 것이었으나, 그 역시 음양오행을 믿고, 참위지서의 영향을 받아, 자기의 저술 내에 마찬가지로 잘못된 견해가 있었다. 說文解字 에 대하여, 우리들은 반드시 이 책의 우수한 점과 결점을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이전의 문인들처럼 이 책을 맹목적으로 숭배해서는 안 된다.
출처 :
행서의 특징
후한(後漢) 말기부터 시작되어 진(晋)의 왕희지(王羲之)가 등장하면서 확고한 틀이 완성된 행서(行書)는 해서(楷書)의 필기체(筆記體) 형태를 띠고 있어 초서(草書)처럼 획을 연결해 쓰면서도 지나친 간략화를 하지 않아 쓰기 쉽고 보기 좋은 두 가지 양상을 모두 해결했다. 특히 서예의 대표적 작품으로 꼽는 왕희지의《난정서(蘭亭序)》는 행서의 특징인 표현의 다양성과 형태의 변화감을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작품으로 전해진다. 행서의 기본적인 특징은 해서와의 차이점에서 쉽게 알 수 있는데, 해서(楷書)가 쓰는 방식이 획을 정성들여 헛된 부분이 나타나지 않게 쓰는 감추는 방식인 \'장봉(藏鋒)의 필체\'인 반면에 행서(行書)는 자연스럽게 필기하는 방식이어서 획의 연결선 등을 드러내는 방식인 \'노봉(露鋒)의 필체\'를 지니고 있다.
행서의 가치
서체(書體)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서체의 변화 방향은 자형(字形)의 복잡함에서 간단함으로, 또 필기(筆記)와 이해의 난해함에서 편리함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형의 간단함과 필기 이해의 편리함을 모두 어느 정도 소화해 낸 서체가 바로 행서(行書)이다.
한자의 서체(書體) 6 - 초서(草書)
고대(古代)에서 중세(中世)로 접어들면서 문자(文字)의 활동도는 크게 신장된다. 이에 이전의 예서(隸書)가 지닌 혁신성 역시 크게 감소되면서, 보다 실용적으로 신속하게 문자를 쓸 필요가 생겨났고, 이에 부흥해서 크게 유행하게 된 초서(草書)가 등장하게 된다.
초서의 정의
초서는 아주 거칠고 단정하지 못하다는 의미인 \"초솔(草率)하다\"는 의미에서 극도로 흘려서 쓴 서체라는 의미로 초서(草書)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표의문자(表意文字)의 단점인 서체(書體)의 복잡함과 난해함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극도로 흘려서 빠르고 간단하게 쓴 서체를 생각해 낸 것이다. 규격을 갖춘 서체인 예서(隸書)로부터 해서(楷書)로 발전했지만, 글자를 쓸 때 너무 복잡하고 많은 정성이 들어가 쓰는 시간도 꾀 필요한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간략하게 흘려 쓰는 초서(草書)가 생겨난 것이다. 현재 초서는 문자로서의 실용성을 넘어 예술적 경지로까지 발전하여 그 멋을 자랑하고 있지만,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간략화시켜 흘려 쓰게 된 결과 해독(解讀)의 어려움을 가져와 실용성을 상실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초서의 특징
예서(隸書)나 해서(楷書)의 규격성과 복잡함을 해소하기 위해 글자의 윤곽이나 일부분만으로 표현하면서 전체적으로 획을 연결해서 신속하게 쓸 수 있게 발전한다. 발생 시기도 \"한조(漢朝)가 흥하자 초서(草書)가 나왔다\"는 《설문해자(說文解字)》서문(序文)을 보듯이 예서(隸書)가 한창 번성하던 한(漢)나라시대에 함께 등장했는데, 초기의 장초(章草)에서 동진(東晋)시대의 금초(今草)와 당(唐)나라 때의 광초(狂草)까지 다양하게 발전을 하지만 실용성은 떨어지게 된다.
▣ 장초(章草) :
초기의 초서체로 진말한초(秦末漢初)에 예서체(隸書體)를 간략하게 흘려 쓰기 시작하면서 발생되었는데, 장제(章帝)가 즐겨 써서 장초(章草)라고 합니다.
▣ 금초(今草) :
후한(後漢)에서 동진(東晋)시대에 장초(章草)에서 발전해 독자적인 서체의 틀을 완성해 현재까지 일반적인 초서(草書)의 틀을 의미하게 됩니다.
▣ 광초(狂草) :
마치 미친 듯이 거의 끊어짐 없이 글자들까지 이어서 쓰는 형식의 광초(狂草)는 당(唐)나라 때 벌써 예술적 경지로 발전합니다.
초서의 가치
몇 십번의 필획으로 사각형 네모꼴의 규격에 맞춰 정성을 들여야 하는 기존의 예서체(隸書體)나 해서체(楷書體)의 어려움을 극복한 초서(草書)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필기 형태로 인해 다양하게 발전한다. 그러나 그 취지가 너무 강조된 나머지 지나치게 간략화 해 현대까지 예술적 대상으로 다양하게 발전하였지만, 실용적 가치를 다소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일반인들의 속성(速成) 필기체의 주축을 행서체(行書體)로 옮겨가게 한다.
출처 :
4. 설문해자의 가치와 영향
설문해자는, 허신이 당시의 많은 경학가, 문자학자의 연구성과를 정리, 연구하여 편성한 총결적인 저작이며, 여기에는 대부분의 선진자체 및 한대와 그 이전의 문자의 적지 않은 文字훈고를 보존하고 있으며, 上古 한어사회의 문제를 반영하고, 비교적 계통적으로 文字분석의 이론을 제기하였는데; 오늘날 古文字學과 古漢語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자료이다. 만약 이 책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진한의 전서를 알 수 없었을 것이며, 상대 甲骨文과 상주의 종정문과 전국시대의 古文을 식별한다는 것은 더욱 말할 것이 없다. 이 책은 후대의 자전사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는데, 편방으로 部를 나눈 이 책의 방법은 줄곧 字典편찬의 일종의 주요한 본보기가 되었다. 그러나 설문해자에 비록 이러한 가치와 영향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중대한 결점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점은 우선 이 책의 해설내용의 측면에서 나타난다. 허신이 편한 說文解字는, 본래 그가 말한 \"속유비부\"의 文字에 대한 황당하고 잘못된 영향을 규정하려는 것이었으나, 그 역시 음양오행을 믿고, 참위지서의 영향을 받아, 자기의 저술 내에 마찬가지로 잘못된 견해가 있었다. 說文解字 에 대하여, 우리들은 반드시 이 책의 우수한 점과 결점을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이전의 문인들처럼 이 책을 맹목적으로 숭배해서는 안 된다.
출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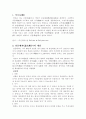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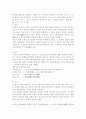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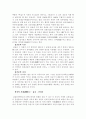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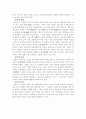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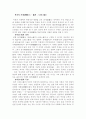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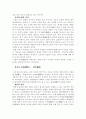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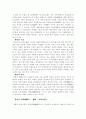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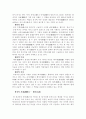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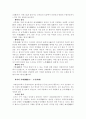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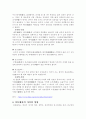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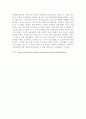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