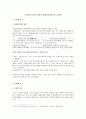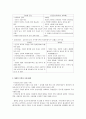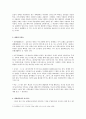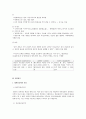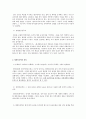목차
Ⅰ. 가볍게 보기
Ⅱ. 자세히 보기
1. 문인의 구분
2. 방외인 문학의 시대 배경
3. 방외형 인물들
4. 방외형인간의 자기모순
Ⅲ. 정리하기
Ⅱ. 자세히 보기
1. 문인의 구분
2. 방외인 문학의 시대 배경
3. 방외형 인물들
4. 방외형인간의 자기모순
Ⅲ. 정리하기
본문내용
듯, 방외에 노닌다는 것은 방외인문학의 중요한 미적 특질을 드러낸 말이다. 술에 취해 노닐고, 꿈속에서 노닐고, 세상을 조롱하는 행위는 모두 현질의 질곡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이다.
<취유부벽정기>, <남염부주지>, <원생몽유록>등의 작품들은 현실을 벗어난 방외인의 시각에서 유교 담론의 한계를 지적한다. 이들의 배경이 되는 방외 공간은 다분히 비현실적인 것이지만 안주할 곳이 없는 방외인들에게는 그들만의 공간이 된다. 이러한 방외 공간에서 드러난 방외인의 행동 양식은 다시 현실로 회귀하지 않는다. 방외 공간은 한번 가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곳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현실 세계에서 ‘갈 수 없는 나라’이다.
2. 방외인문학의 의의
1)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하는 시기에서 발견되는 사상사적 특색을 그대로 반영한다.
방외인들의 탈지역중심주의는 궁극에 있어서는 탈중화주의와 같이 중세 중심권으로부터의 이탈을 시도한다. 이러한 탈중심주의 노선은 변화된 주변 세계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여겨진다. 방외인들이 개척한 소설 갈래에서는 일찍이 지역중심주의에서 이탈을 시도했다. 그래서 체제의 외부와 내부에서 중세적 질서를 비판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중세 보편주의를 청산하고 주변세계의 변화를 문학으로 형상화하는 데까지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2) 방외인문학은 그 자체 자아와 세계의 모순을 정면으로 거론한 실험 문학적 성격을 지닌다.
방외인문학에서는 ‘문제적 개인’(홍길동, 전우치)을 등장시켜 주변 세계의 변화와 그에 대한 대응양상을 새롭게 마련했다. 그래서 충군을 주제로 하는 문학작품의 생산은 방외인문학에서만큼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3)방외인문학은 체제 밖의 질서를 인지하게 함으로써 유교문화권 내의 갈등 관계를 객관적으로 조망하게 하는 비판적 입지를 마련하였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유가 내부에서 유교 이데올로기를 자체적으로 비판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방외인문학의 일정한 기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방외인 문학은 후대에 이르러 ‘김시습-박세당-정약용’으로 이어지는 유교 혁신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 문헌>
임영택 외,『한국문학연구입문 ; 조선전기 문인유형과 방외인문학』
안동준·신익철,『한국문학사에 있어서 소수집단 문학의 존재와 위상; 방외인문학의 재인식』
윤주필,『한국의 방외인문학』
장덕순,『이야기국문학사』
<취유부벽정기>, <남염부주지>, <원생몽유록>등의 작품들은 현실을 벗어난 방외인의 시각에서 유교 담론의 한계를 지적한다. 이들의 배경이 되는 방외 공간은 다분히 비현실적인 것이지만 안주할 곳이 없는 방외인들에게는 그들만의 공간이 된다. 이러한 방외 공간에서 드러난 방외인의 행동 양식은 다시 현실로 회귀하지 않는다. 방외 공간은 한번 가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곳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현실 세계에서 ‘갈 수 없는 나라’이다.
2. 방외인문학의 의의
1)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하는 시기에서 발견되는 사상사적 특색을 그대로 반영한다.
방외인들의 탈지역중심주의는 궁극에 있어서는 탈중화주의와 같이 중세 중심권으로부터의 이탈을 시도한다. 이러한 탈중심주의 노선은 변화된 주변 세계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여겨진다. 방외인들이 개척한 소설 갈래에서는 일찍이 지역중심주의에서 이탈을 시도했다. 그래서 체제의 외부와 내부에서 중세적 질서를 비판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중세 보편주의를 청산하고 주변세계의 변화를 문학으로 형상화하는 데까지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2) 방외인문학은 그 자체 자아와 세계의 모순을 정면으로 거론한 실험 문학적 성격을 지닌다.
방외인문학에서는 ‘문제적 개인’(홍길동, 전우치)을 등장시켜 주변 세계의 변화와 그에 대한 대응양상을 새롭게 마련했다. 그래서 충군을 주제로 하는 문학작품의 생산은 방외인문학에서만큼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3)방외인문학은 체제 밖의 질서를 인지하게 함으로써 유교문화권 내의 갈등 관계를 객관적으로 조망하게 하는 비판적 입지를 마련하였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유가 내부에서 유교 이데올로기를 자체적으로 비판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방외인문학의 일정한 기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방외인 문학은 후대에 이르러 ‘김시습-박세당-정약용’으로 이어지는 유교 혁신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 문헌>
임영택 외,『한국문학연구입문 ; 조선전기 문인유형과 방외인문학』
안동준·신익철,『한국문학사에 있어서 소수집단 문학의 존재와 위상; 방외인문학의 재인식』
윤주필,『한국의 방외인문학』
장덕순,『이야기국문학사』
키워드
추천자료
 한국문학사에서의 고대와 중세, 중세와 고대의 시대구분 : 그 경계선, 논거,
한국문학사에서의 고대와 중세, 중세와 고대의 시대구분 : 그 경계선, 논거, [발표자료] 성숙기 근대문학 : 카프와 그의 시대
[발표자료] 성숙기 근대문학 : 카프와 그의 시대 각 시대별 일본 문학 흐름
각 시대별 일본 문학 흐름 러시아 문학에 관한 조사 -시대적 흐름에 중점을 두고
러시아 문학에 관한 조사 -시대적 흐름에 중점을 두고 고전문학사 <한국문학통사3 - 조선후기 : 소설시대로 들어서는 전환>
고전문학사 <한국문학통사3 - 조선후기 : 소설시대로 들어서는 전환> [고려시대][예술][음악][불교미술][문학][고려시대 예술][고려시대 음악][고려시대 불교미술]...
[고려시대][예술][음악][불교미술][문학][고려시대 예술][고려시대 음악][고려시대 불교미술]... 현대문학사 기말리포트11 - 디지털시대 진입에 따른 새로운 문학 컨텐츠의 등장
현대문학사 기말리포트11 - 디지털시대 진입에 따른 새로운 문학 컨텐츠의 등장 아버지와 아들 (시대적 갈등 사실주의를 통한 문학적 승화)
아버지와 아들 (시대적 갈등 사실주의를 통한 문학적 승화) 문학 속에서 찾아보는 조선시대 신분제
문학 속에서 찾아보는 조선시대 신분제  [세계의음식ㆍ음식의세계 공통] 우리나라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음식문화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세계의음식ㆍ음식의세계 공통] 우리나라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음식문화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한국문학연구] <노처녀가Ⅰ>에 나타난 조선시대 여성의식
[한국문학연구] <노처녀가Ⅰ>에 나타난 조선시대 여성의식 [중세전기문학] 제1기 삼국. 남북국 시대
[중세전기문학] 제1기 삼국. 남북국 시대  [문학교육론] 홍길동전에 담긴 전통문화 - 조선시대의 신분제도, 한국의 영웅상
[문학교육론] 홍길동전에 담긴 전통문화 - 조선시대의 신분제도, 한국의 영웅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