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종교적 환원론 그리고 자본주의
3. 자본주의의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비극
4. 결론
2. 종교적 환원론 그리고 자본주의
3. 자본주의의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비극
4. 결론
본문내용
여하는 순수한 경쟁적 열정과 결합되는 경향이 있다.” 같은 책, 145쪽.
자본가에 의한 타락이 극명히 드러난 미국을 보고서도, 그 도덕적 타락을 단지 ‘스포츠적 열정’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언뜻 납득이 안 간다. 이렇게 자본주의에 대해 지나친 낙관이 오히려 자본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것은 아닐까? 막스 베버는 칼뱅주의와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에서부터 끊임없는 노동과 생산과 이윤을 정당화 했다. 이미 이렇게 정당화된 이윤추구는 더 이상 윤리적 제재 없이 추구될 수 있게 됐다. 보다 근면한 노동으로, 좀 더 많은 재산을 부풀리는 것이 구원 받는 징표라는 칼뱅주의에 선뜻 동의해 버린다면, 대중들이 “많은 재산=진정한 인간, 도덕적 인간”으로 이해할 수도 있음을 예상치 못한 것일까? 오늘날 자본가와 노동자들이 아무런 양심적 가책 없이 사욕만 부풀리고, 급기야 소수의 탐욕이 전 세계적 경제위기를 불러온 이 때, 지나친 이윤 추구에 대한 윤리적 빗장을 풀어버린 듯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에게 아쉬움을 느낀다.
4. 결론
지금까지 막스 베버가 규정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관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해 보았다. 그의 작업은, 그 스스로는 부정하더라도, 확실히 사회적 환원론의 입장에 경도되어 있다. 게다가 선결문제인 인간 본성의 문제를 너무나 가볍게 규정한 채, 보다 상위단계로 넘어감으로써 논리적 오류 역시 발견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다. 그의 논문이 오리엔탈리즘적 경향마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화폐취득상의 자기 이익추구의 절대적인 파렴치가 보편적으로 지배하는 현상은 바로 부르주아적·자본주의적 발전이 - 서양의 발전에 비추어 - ‘뒤쳐지는’ 나라에 매우 특징적인 현상이었다.” 같은 책, 41쪽.
여태껏 서양이 동양을 보다 열등하고, 미개하고, 나약하며, 합리성을 결여한 존재로 규정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막스 베버 역시 이런 오리엔탈리즘에서 멀리 떨어져있지 않다.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한 지역(동양)이 그렇지 않은 지역(서양)보다 ‘뒤쳐져’ 있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서양에서 자생한 종교와 서양의 제도적 장치(자본주의)를 연결함으로써, 동양에 대한 서양의 우위를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막스 베버와 그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 끼친 영향력은 오늘날에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책을 둘러싼 논란이 분분한 것은, 바로 저런 부정적인 면 때문은 아닐까.
자본가에 의한 타락이 극명히 드러난 미국을 보고서도, 그 도덕적 타락을 단지 ‘스포츠적 열정’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언뜻 납득이 안 간다. 이렇게 자본주의에 대해 지나친 낙관이 오히려 자본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것은 아닐까? 막스 베버는 칼뱅주의와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에서부터 끊임없는 노동과 생산과 이윤을 정당화 했다. 이미 이렇게 정당화된 이윤추구는 더 이상 윤리적 제재 없이 추구될 수 있게 됐다. 보다 근면한 노동으로, 좀 더 많은 재산을 부풀리는 것이 구원 받는 징표라는 칼뱅주의에 선뜻 동의해 버린다면, 대중들이 “많은 재산=진정한 인간, 도덕적 인간”으로 이해할 수도 있음을 예상치 못한 것일까? 오늘날 자본가와 노동자들이 아무런 양심적 가책 없이 사욕만 부풀리고, 급기야 소수의 탐욕이 전 세계적 경제위기를 불러온 이 때, 지나친 이윤 추구에 대한 윤리적 빗장을 풀어버린 듯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에게 아쉬움을 느낀다.
4. 결론
지금까지 막스 베버가 규정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관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해 보았다. 그의 작업은, 그 스스로는 부정하더라도, 확실히 사회적 환원론의 입장에 경도되어 있다. 게다가 선결문제인 인간 본성의 문제를 너무나 가볍게 규정한 채, 보다 상위단계로 넘어감으로써 논리적 오류 역시 발견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다. 그의 논문이 오리엔탈리즘적 경향마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화폐취득상의 자기 이익추구의 절대적인 파렴치가 보편적으로 지배하는 현상은 바로 부르주아적·자본주의적 발전이 - 서양의 발전에 비추어 - ‘뒤쳐지는’ 나라에 매우 특징적인 현상이었다.” 같은 책, 41쪽.
여태껏 서양이 동양을 보다 열등하고, 미개하고, 나약하며, 합리성을 결여한 존재로 규정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막스 베버 역시 이런 오리엔탈리즘에서 멀리 떨어져있지 않다.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한 지역(동양)이 그렇지 않은 지역(서양)보다 ‘뒤쳐져’ 있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서양에서 자생한 종교와 서양의 제도적 장치(자본주의)를 연결함으로써, 동양에 대한 서양의 우위를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막스 베버와 그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 끼친 영향력은 오늘날에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책을 둘러싼 논란이 분분한 것은, 바로 저런 부정적인 면 때문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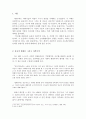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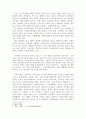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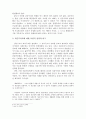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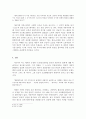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