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선된 것과도 극명하게 대조된다.
또<그림1-4>에서 보듯이, 도시 근로자가구의 소득 분배의 불평등은 1990년대 중반까지 완화되다가 1997년 이후 다시 악화됐다. 소득 수준 하위 20퍼센트의 소득에 대한 상위 20퍼센트 소득의 비율은 1995년 4.42에서 2003년 5.22로 상승했다. 또<그림1-5>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노동자의 1인당 연간 총노동시간은 1986년 2천7백34시간을 정점으로 1998년 2천3백90시간까지 감소했지만, 1999년 이후 이와 같은 감소 추세가 중단돼 2003년에도 여전히 2천3백90시간으로 세계 최장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자보다 연간 5백~1천 시간 덜 일하는 미국일본독일의 1인당 연간 총노동시간이 같은 기간인 1998~2003년 각각 1천8백41, 1천8백42, 1천4백89시간에서 1천7백92, 1천8백1, 1천4백46시간으로 단축된 것은 물론, 멕시코 노동자의 1인당 연간 총노동시간도 1천8백79시간에서 1천8백57시간으로 줄어든 것과 무척 대조된다, 이와 같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자계급의 상태 악화는 내외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 1987년 789월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수립된 ‘1987년 체제’가 붕괴하고 있는 사태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크로티이강국은 1997년 위기의 주요 원인은 한국 자본주의에 내재한 구조적 모순이 아니라 1990년대 이후 시작된 금융자유화에 기인한다는 “새로운 통념”을 되풀이했다. 그런데 크로티이강국에서는 마르크스주의적 이윤율 저하 이론에 대한 논박을 시도한다. 그들 주장의 요지는 1997년 위기 이전에 어떤 의미 있는 이윤율의 저하 현상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를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매출액영업이익률이 1995년 이후 적정 수준이었다는 사실로 뒷받침하려 했다. 즉 1997년 위기는 실물 부문의 효율성 붕괴에 기인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기업의 실물 부문 효율성을 측정하는 적저한 지표는 이자지불을 공제한 후의 경상이익이 아니라 이자지불을 공제하기 전인 영업이익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또 매출액영업이율은 분자에 이자지불을 포함하고 있고 분모에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실물 부문 변수부터로만 영향을 받으며 이 때문에 실물 부문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경상이익률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한다.
크로티이강국이 실물 부문의 수익성을 보이는 지표로서 경상이익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선택한 것은 옳다. 하지만 수익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은 잘못이다. 자본가 수익성을 올바르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윤은 유량(flow) 변수인 매출액이 아니라, 저량(stock) 변수인 투자된 자본스톡으로 나눠 줘야 한다. 게다가 이들이 의존한 <기업경영분석>은 전수 조사 자료가 아니라 표본조사이고, 그것도 대기업에 현저하게 편기돼 있어 자본가 전체의 수익성을 올바르게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크로티이강국이 1997년 위기가 이윤율 저하에 기인한다는 나의 주장을 논박하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
또<그림1-4>에서 보듯이, 도시 근로자가구의 소득 분배의 불평등은 1990년대 중반까지 완화되다가 1997년 이후 다시 악화됐다. 소득 수준 하위 20퍼센트의 소득에 대한 상위 20퍼센트 소득의 비율은 1995년 4.42에서 2003년 5.22로 상승했다. 또<그림1-5>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노동자의 1인당 연간 총노동시간은 1986년 2천7백34시간을 정점으로 1998년 2천3백90시간까지 감소했지만, 1999년 이후 이와 같은 감소 추세가 중단돼 2003년에도 여전히 2천3백90시간으로 세계 최장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자보다 연간 5백~1천 시간 덜 일하는 미국일본독일의 1인당 연간 총노동시간이 같은 기간인 1998~2003년 각각 1천8백41, 1천8백42, 1천4백89시간에서 1천7백92, 1천8백1, 1천4백46시간으로 단축된 것은 물론, 멕시코 노동자의 1인당 연간 총노동시간도 1천8백79시간에서 1천8백57시간으로 줄어든 것과 무척 대조된다, 이와 같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자계급의 상태 악화는 내외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 1987년 789월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수립된 ‘1987년 체제’가 붕괴하고 있는 사태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크로티이강국은 1997년 위기의 주요 원인은 한국 자본주의에 내재한 구조적 모순이 아니라 1990년대 이후 시작된 금융자유화에 기인한다는 “새로운 통념”을 되풀이했다. 그런데 크로티이강국에서는 마르크스주의적 이윤율 저하 이론에 대한 논박을 시도한다. 그들 주장의 요지는 1997년 위기 이전에 어떤 의미 있는 이윤율의 저하 현상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를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매출액영업이익률이 1995년 이후 적정 수준이었다는 사실로 뒷받침하려 했다. 즉 1997년 위기는 실물 부문의 효율성 붕괴에 기인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기업의 실물 부문 효율성을 측정하는 적저한 지표는 이자지불을 공제한 후의 경상이익이 아니라 이자지불을 공제하기 전인 영업이익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또 매출액영업이율은 분자에 이자지불을 포함하고 있고 분모에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실물 부문 변수부터로만 영향을 받으며 이 때문에 실물 부문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경상이익률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한다.
크로티이강국이 실물 부문의 수익성을 보이는 지표로서 경상이익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선택한 것은 옳다. 하지만 수익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은 잘못이다. 자본가 수익성을 올바르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윤은 유량(flow) 변수인 매출액이 아니라, 저량(stock) 변수인 투자된 자본스톡으로 나눠 줘야 한다. 게다가 이들이 의존한 <기업경영분석>은 전수 조사 자료가 아니라 표본조사이고, 그것도 대기업에 현저하게 편기돼 있어 자본가 전체의 수익성을 올바르게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크로티이강국이 1997년 위기가 이윤율 저하에 기인한다는 나의 주장을 논박하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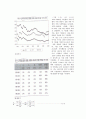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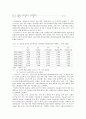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