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마구의 분류
1. 삼계
2. 제어구
3. 안정구
4. 장식구
1. 삼계
2. 제어구
3. 안정구
4. 장식구
본문내용
는데 삼각추형호등은 아직 국내에서 출토되어진 예가 없다. 호등의 제작 시기는 합천 반계제 다-A호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아 이미 삼국시대에서부터 호등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출토예가 극히 드물고 오히려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와서 일부 유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장식구
1) 운주(雲珠)
삼계 중 혁대가 교차되는 곳을 묵는 금구로 그 자체로서 말을 장식하는 장식구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용어가 아니라 일본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운주는 단순히 삼계나 고삐 등을 장식하는 기능도 있겠으나 주된 기능은 여러 줄의 혁대를 서로 묶어 연결하는 것이다.
삼국시대의 운주는 환형(環形)판형(板刑)반구형(半球形)의 세 종류가 있으며, 이외에 전술한 바와 같이 신라의 고분들에서 주로 출토되는 반구형의 정부에 입주를 세우고 영락을 매단 입주부운주(立柱附雲珠)와 반구형의 정부에 입주를 세우지 않고 원두정을 박은 무각소반구형(無脚小半球形) 등 5종이 있다.
대개 환형판형반구형운주들은 본체와 별조 혹은 공조되어진 각을 가지는데, 이 각의 수를 통하여 연결되어진 가죽끈의 수를 알 수가 있다.
2) 행엽(杏葉)
가슴걸이나 후걸이에 매달아 말을 장식하는 치레걸이이다. 금속제의 행엽이 출현하기 이전에는 유기질 제로써 말의 안장 좌우측에 베풀어 매단 장식에서 유래하였다고 생각된다.
삼국시대의 행엽은 본체에 해당하는 신부와 그 위에 가슴걸이나 후걸이에 매어 달기 위한 가죽 끈이 연결되는 구멍이 있는 입문으로 나누어지며 또 입문을 통한 가죽 끈을 직접 못으로 고정하기 위한 구금구(鉤金具)를 갖는 예도 있다.
행엽은 그 자체가 장식을 꾀한 것으로서 각종 문양이 베풀어지기도 하는데, 장식이 많이 가미된 행엽의 구성을 보면, 맨 나래에 대판이 있고 그 위에 상판으로서의 지판이 있으며 다시 투조 등의 문양이 있는 문양판이 얹어지며 마지막으로 주연부에만 돌아가는 주연판을 얹고 이들을 못으로 결합하는 구조를 한다. 그러나 실제 출토 유물 중에는 따로 대판이 없이 대판과 지판이 하나로 되어 바탕판을 이루는 예가 많고, 문양판과 주연판이 하나로 되어진 예가 많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지판과 문양판 혹은 상판으로 간단히 나누기도 한다. 시기가 가장 오랜 예들 중에는 하나의 철판만으로 구성되어진 경우도 있다.
행엽은 판들의 구성과 결합 방법에 따라 각 형식 행엽들의 제작시기를 알 수 있는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 삼국시대 행엽의 형태에 따른 분류
심엽형행엽 : 하트모양
타원형행엽 : 심엽형행엽 아래부분의 돌출된 자가 없어진 것
편원어미형행엽 : 위가 타원형이고 아래가 물고기 꼬리지느러미처럼 생각것을 결합한 형태
검능형행엽 : 타원형과 칼끝처럼 생긴 것을 결합한 형태
자엽형행엽 : 나뭇잎 모양(삼국시대 후기)
종형행엽 : 아래에 3~5개의 자가 있으나 전체모양이 종모양으로 생긴 형태(삼국시대 후기)
이형행엽 : 다양한 형태
3) 마령(馬鈴)
의장용의 말에 소리내는 명구(鳴具)를 장착하였다. 기승자의 권위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종류눈 마령, 마탁, 환령, 안장이나 운주에 부탁되었던 영락, 방울이 달린 영부행엽 등이 있다. 재질은 주로 청동제이며 가슴걸이에 주로 매달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형태는 구형(球形) 또는 타원형의 몸통 상부에 고리를 매달기 위한 뉴(紐)가 부착되어 있다. 구(球)의 하반부에는 일문자(一文字)로 구멍이 나 있어서 이곳을 통해 구체 내부에 들어 있는 작은 돌이나 청동의 소환이 움직여 몸통과 부딪히게 되면 소리가 난다.
4) 마탁(馬鐸)
아래가 벌어진 편편한 통상(筒狀)의 탁신(鐸身)과 그 상부에 탁을 매달기 위한 뉴(), 그리고 탁신 내부에 수하(垂下)된 설(舌)로 이루어져 있다. 주로 청동제의 주조품으로 주로 가슴걸이에 마달아 장식하였다. 우리나라의 청동기시대의 탁은 아래가 진선인 것으로 크기가 비교적 크고 마탁으로 쓰였다는 증거는 없다.
삼국시대의 마탁은 모두 아래가 호형(弧形)을 이룬다. 그 예로는 창원 다호리 1호분이나 경주 조양동 5호분 등 삼한 시대부터 출토되며 크기는 5cm이내의 것이다. 삼국시대의 마탁의 출토 예는 창녕 교동 89호분이나 임당동 6A호분과 경주지역의 고분에 집중되어 있다.
→ 마령이 신라백제가야에서 모두 출토되는데 반해 마탁은 신라지역에 한해 사용되며 그것도 상당한 신분의 소유자가 선호하였던 마장구였음을 알 수 있다.
5) 환령(環鈴)
환령은 청동의 주조제품으로 보통 둥근 환의 바깥에 돌아가면서 방울을 3개 혹은 4개 붙인 것이다. 방울이 3개 부은 것을 삼환령(三環鈴), 4개 붙은 것을 사환령(四環鈴)이라 한다.
출토 예는 사환령은 경주 금관총 2점과 경주 황오동 1점의 총 3점뿐이며 그 외에는 대부분이 삼환령이다. 하지만 출토지가 알려진 것은 월성 안계리 2호분 1점, 장성 만무리 1점, 함양 상백리 1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출토지가 불명하다.
무각식(無脚式) : 영의 외주가 환에 물려들어와 접합된 것
유각식(有脚式) : 환과 영의 외주가 서로 접하지 않고 따로 각과 같은 것을 매개로 한 것
→주로 5세가 후반에서 6세기 전반대의 분묘에서 출토되며, 시간적으로 유각식에서 무각식으로, 소형에서 대형으로, 또 2등변삼각형에서 정삼각형으로 변화해 간다는 것인 지금까지 일본측 연구자들의 성과이다.
6) 사행상철기(蛇行狀鐵器)
철봉을 여러 단에 걸쳐 굴곡시키고, 그 한쪽 끝에는 목병을 삽입할 수 있도록 공부를 만들여 다른 쪽 끝에는 U자상으로 굽어진 철봉을 결합한 이형의 철기를 말한다. U자상 철봉의 양끝은 말려져 작은 원공을 만들고 있으므로 이 구멍을 통해 어디에 장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행상철기의 용도에 대해 많은 추측이 있으나 현재 출토되고 있는 실물의 것과 가장 유사한 것은 쌍형총, 삼실총, 개마총과 같은 고구려 벽화고분에 묘사된 개마인물상의 그림에 보여지는 것들이다. 따라 사행상철기는 말의 엉덩이 부분을 장식하는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
안장의 후륜 쪽에 U자상으로 구부려진철봉을 장치하고 반대쪽공부에 기를 꽂아 말을 장식함과 동시에 기승자의 신분이나 권위를 나타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4. 장식구
1) 운주(雲珠)
삼계 중 혁대가 교차되는 곳을 묵는 금구로 그 자체로서 말을 장식하는 장식구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용어가 아니라 일본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운주는 단순히 삼계나 고삐 등을 장식하는 기능도 있겠으나 주된 기능은 여러 줄의 혁대를 서로 묶어 연결하는 것이다.
삼국시대의 운주는 환형(環形)판형(板刑)반구형(半球形)의 세 종류가 있으며, 이외에 전술한 바와 같이 신라의 고분들에서 주로 출토되는 반구형의 정부에 입주를 세우고 영락을 매단 입주부운주(立柱附雲珠)와 반구형의 정부에 입주를 세우지 않고 원두정을 박은 무각소반구형(無脚小半球形) 등 5종이 있다.
대개 환형판형반구형운주들은 본체와 별조 혹은 공조되어진 각을 가지는데, 이 각의 수를 통하여 연결되어진 가죽끈의 수를 알 수가 있다.
2) 행엽(杏葉)
가슴걸이나 후걸이에 매달아 말을 장식하는 치레걸이이다. 금속제의 행엽이 출현하기 이전에는 유기질 제로써 말의 안장 좌우측에 베풀어 매단 장식에서 유래하였다고 생각된다.
삼국시대의 행엽은 본체에 해당하는 신부와 그 위에 가슴걸이나 후걸이에 매어 달기 위한 가죽 끈이 연결되는 구멍이 있는 입문으로 나누어지며 또 입문을 통한 가죽 끈을 직접 못으로 고정하기 위한 구금구(鉤金具)를 갖는 예도 있다.
행엽은 그 자체가 장식을 꾀한 것으로서 각종 문양이 베풀어지기도 하는데, 장식이 많이 가미된 행엽의 구성을 보면, 맨 나래에 대판이 있고 그 위에 상판으로서의 지판이 있으며 다시 투조 등의 문양이 있는 문양판이 얹어지며 마지막으로 주연부에만 돌아가는 주연판을 얹고 이들을 못으로 결합하는 구조를 한다. 그러나 실제 출토 유물 중에는 따로 대판이 없이 대판과 지판이 하나로 되어 바탕판을 이루는 예가 많고, 문양판과 주연판이 하나로 되어진 예가 많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지판과 문양판 혹은 상판으로 간단히 나누기도 한다. 시기가 가장 오랜 예들 중에는 하나의 철판만으로 구성되어진 경우도 있다.
행엽은 판들의 구성과 결합 방법에 따라 각 형식 행엽들의 제작시기를 알 수 있는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 삼국시대 행엽의 형태에 따른 분류
심엽형행엽 : 하트모양
타원형행엽 : 심엽형행엽 아래부분의 돌출된 자가 없어진 것
편원어미형행엽 : 위가 타원형이고 아래가 물고기 꼬리지느러미처럼 생각것을 결합한 형태
검능형행엽 : 타원형과 칼끝처럼 생긴 것을 결합한 형태
자엽형행엽 : 나뭇잎 모양(삼국시대 후기)
종형행엽 : 아래에 3~5개의 자가 있으나 전체모양이 종모양으로 생긴 형태(삼국시대 후기)
이형행엽 : 다양한 형태
3) 마령(馬鈴)
의장용의 말에 소리내는 명구(鳴具)를 장착하였다. 기승자의 권위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종류눈 마령, 마탁, 환령, 안장이나 운주에 부탁되었던 영락, 방울이 달린 영부행엽 등이 있다. 재질은 주로 청동제이며 가슴걸이에 주로 매달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형태는 구형(球形) 또는 타원형의 몸통 상부에 고리를 매달기 위한 뉴(紐)가 부착되어 있다. 구(球)의 하반부에는 일문자(一文字)로 구멍이 나 있어서 이곳을 통해 구체 내부에 들어 있는 작은 돌이나 청동의 소환이 움직여 몸통과 부딪히게 되면 소리가 난다.
4) 마탁(馬鐸)
아래가 벌어진 편편한 통상(筒狀)의 탁신(鐸身)과 그 상부에 탁을 매달기 위한 뉴(), 그리고 탁신 내부에 수하(垂下)된 설(舌)로 이루어져 있다. 주로 청동제의 주조품으로 주로 가슴걸이에 마달아 장식하였다. 우리나라의 청동기시대의 탁은 아래가 진선인 것으로 크기가 비교적 크고 마탁으로 쓰였다는 증거는 없다.
삼국시대의 마탁은 모두 아래가 호형(弧形)을 이룬다. 그 예로는 창원 다호리 1호분이나 경주 조양동 5호분 등 삼한 시대부터 출토되며 크기는 5cm이내의 것이다. 삼국시대의 마탁의 출토 예는 창녕 교동 89호분이나 임당동 6A호분과 경주지역의 고분에 집중되어 있다.
→ 마령이 신라백제가야에서 모두 출토되는데 반해 마탁은 신라지역에 한해 사용되며 그것도 상당한 신분의 소유자가 선호하였던 마장구였음을 알 수 있다.
5) 환령(環鈴)
환령은 청동의 주조제품으로 보통 둥근 환의 바깥에 돌아가면서 방울을 3개 혹은 4개 붙인 것이다. 방울이 3개 부은 것을 삼환령(三環鈴), 4개 붙은 것을 사환령(四環鈴)이라 한다.
출토 예는 사환령은 경주 금관총 2점과 경주 황오동 1점의 총 3점뿐이며 그 외에는 대부분이 삼환령이다. 하지만 출토지가 알려진 것은 월성 안계리 2호분 1점, 장성 만무리 1점, 함양 상백리 1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출토지가 불명하다.
무각식(無脚式) : 영의 외주가 환에 물려들어와 접합된 것
유각식(有脚式) : 환과 영의 외주가 서로 접하지 않고 따로 각과 같은 것을 매개로 한 것
→주로 5세가 후반에서 6세기 전반대의 분묘에서 출토되며, 시간적으로 유각식에서 무각식으로, 소형에서 대형으로, 또 2등변삼각형에서 정삼각형으로 변화해 간다는 것인 지금까지 일본측 연구자들의 성과이다.
6) 사행상철기(蛇行狀鐵器)
철봉을 여러 단에 걸쳐 굴곡시키고, 그 한쪽 끝에는 목병을 삽입할 수 있도록 공부를 만들여 다른 쪽 끝에는 U자상으로 굽어진 철봉을 결합한 이형의 철기를 말한다. U자상 철봉의 양끝은 말려져 작은 원공을 만들고 있으므로 이 구멍을 통해 어디에 장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행상철기의 용도에 대해 많은 추측이 있으나 현재 출토되고 있는 실물의 것과 가장 유사한 것은 쌍형총, 삼실총, 개마총과 같은 고구려 벽화고분에 묘사된 개마인물상의 그림에 보여지는 것들이다. 따라 사행상철기는 말의 엉덩이 부분을 장식하는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
안장의 후륜 쪽에 U자상으로 구부려진철봉을 장치하고 반대쪽공부에 기를 꽂아 말을 장식함과 동시에 기승자의 신분이나 권위를 나타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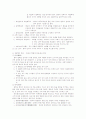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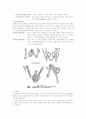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