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조선의 인삼과 일본의 은
Ⅲ. 대일 무역의 선구자, 동래상인
1. 개시무역(開市貿易)
2. 왜채의 증가
3. 동래 상인
Ⅳ. 맺음말
Ⅱ. 조선의 인삼과 일본의 은
Ⅲ. 대일 무역의 선구자, 동래상인
1. 개시무역(開市貿易)
2. 왜채의 증가
3. 동래 상인
Ⅳ. 맺음말
본문내용
관련된 자세한 기록들이 보존되어 있다. 둘째, 1720년경에 북아메리카에서 산삼이 발견되었다. 사실 인디언들이 이미 산삼을 약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산삼이 ‘발견되었다’고 새삼스럽게 이야기할 것은 못 되지만, 다만 기독교 선교사들이 산삼이 동아시아에서 비싸게 팔리는 고려인삼과 같은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곧 네덜란드 상인들을 중심으로 애팔래치아 산맥에서 다량의 산삼을 채집하여 1740년대에는 광동 지방으로 수출했고 이곳에서 다시 나가사키로 재수출했다. 고려인삼에 비해 값이 1/5에 불과한 아메리카 산삼이 들어오자 인삼 가격이 폭락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일본에서 재배한 삼이나 아메리카에서 수입한 삼보다는 조선의 인삼이 효능 면에서 비할 나위 없이 좋다는 점은 다 인정했지만 이제까지 누리던 독점적 지위가 크게 흔들린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임진왜란이 끝난 후 일본의 여러 지역 사람들을 제외하고, 오직 대마도 사람에게만 무역을 허락했다. 이들과 무역하는 조선 상인을 흔히 동래상고, 내상, 도중상고 등으로 불렀다. 이들을 통칭하여 동래상인이라 하였다. 1607년 조선은 대마도 상인과 동래상인이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부산진 부근에 왜관을 지어 무역 장소를 마련해 주었다. 이 왜관을 흔히 두모포 왜관이라 부른다.
두모포 왜관은 지금의 부산 동구청, 수정동시장 부근에 있었는데, 너무 비좁고 선착장이 부적합하여 1678년 지금은 용두산 공원부근으로 옮겼다. 이 왜관이 초량왜관이다. 신관인 초량왜관에 대비하여 두모포 왜관을 고관, 구관이라 불렀다. 지금도 부산에는 고관이란 지명이 남아 있다. 오량왜관은 1876년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후 일본인 전관 거류지로 바뀌었지만 일본인의 주요터전이 된 것은 변함이 없었다.
지금 부산에 남아있는 왜관 당시 관련 유물로는 약조제찰비(約條制札碑)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함부로 왜관 경계 밖을 나온 자는 사형에 처한다.
왜채를 주고 받다가 잡히면 둘 다 사형에 처한다.
개시때 방에 몰래 들어가 밀무역을 하는 자는 둘 다 사형에 처한다.
5일마다 왜관에 잡물을 지급할 때, 담당 아전, 창고지기, 하급 통역관 등을 때려서는 안된다.
조선인, 일본인 범죄자는 모두 왜관 밖에서 형을 집행한다.
가 거의 유일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비에는 1683년 동래부사와 대마도주가 맺은 계해약조 1443년(세종 25) 조정을 대표하여 변효문(卞孝文) 등이 쓰시마 섬에서 일본의 쓰시마 도주(對馬島主) 소 사다모리(宗貞盛)와 세견선(歲遣船) 등에 관하여 맺은 조약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견선은 1년에 50척으로 한다. ② 선원수는 대선(大船) 40명, 중선(中船) 30명, 소선(小船) 20명으로 정하고 이들에게는 식량을 지급한다. ③ 삼포에 머무르는 자의 날짜는 20일로 한하되, 상경한 자의 배를 지키는 간수인(看守人)은 50일로 정하고 이들에게도 식량을 지급한다. ④ 고초도(孤草島)에서 고기잡이하는 자는 조선의 지세포만호(知世浦萬戶)의 허락을 받은 뒤 고기를 잡고, 이어서 어세(漁稅)를 내야 한다. ⑤ 조선에서 왜인에게 주는 세사미두(歲賜米豆)는 쌀과 콩을 합하여 200섬으로 제한한다는 등이다.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17세기 후반 양국의 이해관계를 보여주는 한일관계사의 중요한 유물이다.
※ 참고 문헌
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 2천년 보이는 역사, 보이지 않는 역사 - 근세, 경인문화사, 2006.
정성일, 조선후기 대일무역, 신서원, 2000.
옥순정, 교양으로 읽는 인삼이야기, 이가서, 2005.
김동철, 조선후기 왜관 개시무역과 동래상인, 한국민족문화 21집, 1998.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임진왜란이 끝난 후 일본의 여러 지역 사람들을 제외하고, 오직 대마도 사람에게만 무역을 허락했다. 이들과 무역하는 조선 상인을 흔히 동래상고, 내상, 도중상고 등으로 불렀다. 이들을 통칭하여 동래상인이라 하였다. 1607년 조선은 대마도 상인과 동래상인이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부산진 부근에 왜관을 지어 무역 장소를 마련해 주었다. 이 왜관을 흔히 두모포 왜관이라 부른다.
두모포 왜관은 지금의 부산 동구청, 수정동시장 부근에 있었는데, 너무 비좁고 선착장이 부적합하여 1678년 지금은 용두산 공원부근으로 옮겼다. 이 왜관이 초량왜관이다. 신관인 초량왜관에 대비하여 두모포 왜관을 고관, 구관이라 불렀다. 지금도 부산에는 고관이란 지명이 남아 있다. 오량왜관은 1876년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후 일본인 전관 거류지로 바뀌었지만 일본인의 주요터전이 된 것은 변함이 없었다.
지금 부산에 남아있는 왜관 당시 관련 유물로는 약조제찰비(約條制札碑)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함부로 왜관 경계 밖을 나온 자는 사형에 처한다.
왜채를 주고 받다가 잡히면 둘 다 사형에 처한다.
개시때 방에 몰래 들어가 밀무역을 하는 자는 둘 다 사형에 처한다.
5일마다 왜관에 잡물을 지급할 때, 담당 아전, 창고지기, 하급 통역관 등을 때려서는 안된다.
조선인, 일본인 범죄자는 모두 왜관 밖에서 형을 집행한다.
가 거의 유일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비에는 1683년 동래부사와 대마도주가 맺은 계해약조 1443년(세종 25) 조정을 대표하여 변효문(卞孝文) 등이 쓰시마 섬에서 일본의 쓰시마 도주(對馬島主) 소 사다모리(宗貞盛)와 세견선(歲遣船) 등에 관하여 맺은 조약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견선은 1년에 50척으로 한다. ② 선원수는 대선(大船) 40명, 중선(中船) 30명, 소선(小船) 20명으로 정하고 이들에게는 식량을 지급한다. ③ 삼포에 머무르는 자의 날짜는 20일로 한하되, 상경한 자의 배를 지키는 간수인(看守人)은 50일로 정하고 이들에게도 식량을 지급한다. ④ 고초도(孤草島)에서 고기잡이하는 자는 조선의 지세포만호(知世浦萬戶)의 허락을 받은 뒤 고기를 잡고, 이어서 어세(漁稅)를 내야 한다. ⑤ 조선에서 왜인에게 주는 세사미두(歲賜米豆)는 쌀과 콩을 합하여 200섬으로 제한한다는 등이다.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17세기 후반 양국의 이해관계를 보여주는 한일관계사의 중요한 유물이다.
※ 참고 문헌
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 2천년 보이는 역사, 보이지 않는 역사 - 근세, 경인문화사, 2006.
정성일, 조선후기 대일무역, 신서원, 2000.
옥순정, 교양으로 읽는 인삼이야기, 이가서, 2005.
김동철, 조선후기 왜관 개시무역과 동래상인, 한국민족문화 21집, 1998.
추천자료
 은비녀 감상문
은비녀 감상문 피부와 관련된 인삼의 효능 및 인삼화장품에 대하여
피부와 관련된 인삼의 효능 및 인삼화장품에 대하여 우리나라 약용 허브 식물 - 인삼에 대하여
우리나라 약용 허브 식물 - 인삼에 대하여 [조선산업][조선업]조선산업(조선업) 특성,고용구조, 조선산업(조선업) 현황, 조선산업(조선...
[조선산업][조선업]조선산업(조선업) 특성,고용구조, 조선산업(조선업) 현황, 조선산업(조선... [인삼][산삼][좋은 산삼 구분법][좋은 산삼 특징][천종][진삼][지종][산삼 효능]인삼과 산삼...
[인삼][산삼][좋은 산삼 구분법][좋은 산삼 특징][천종][진삼][지종][산삼 효능]인삼과 산삼... [인삼][인삼의 형태][인삼의 종류][인삼의 성분][인삼의 효능][인삼의 7효설]인삼의 형태, 인...
[인삼][인삼의 형태][인삼의 종류][인삼의 성분][인삼의 효능][인삼의 7효설]인삼의 형태, 인... [조선시대전기]조선전기(조선시대전기)의 농업, 조선전기(조선시대전기)의 토지세금제도, 조...
[조선시대전기]조선전기(조선시대전기)의 농업, 조선전기(조선시대전기)의 토지세금제도, 조... 한국 중세문학 조선전기문학, 한국 중세문학 조선후기문학, 한국 중세문학 조선시대문학 야담...
한국 중세문학 조선전기문학, 한국 중세문학 조선후기문학, 한국 중세문학 조선시대문학 야담... [조선시대 음악][조선 음악][조선시대 음악 여악][조선시대 음악 만횡청][조선시대 음악 잡가...
[조선시대 음악][조선 음악][조선시대 음악 여악][조선시대 음악 만횡청][조선시대 음악 잡가... [조선시대 회화]조선시대 회화의 특성, 조선시대 회화의 전개, 조선시대 회화의 조선중기 회...
[조선시대 회화]조선시대 회화의 특성, 조선시대 회화의 전개, 조선시대 회화의 조선중기 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정부)의 형성배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정부)의 형성배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홍길동전 (洪吉童傳)』은 최초의 국문소설인가? (한글소설의 정의, 허균저작설 연구사, 한...
『홍길동전 (洪吉童傳)』은 최초의 국문소설인가? (한글소설의 정의, 허균저작설 연구사, 한... 고려인삼
고려인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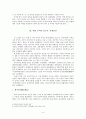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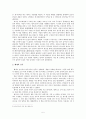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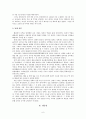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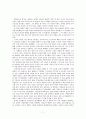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