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신화의 개념
2 원형의 개념
3 원형의 유형
4 원형의 분석
2 원형의 개념
3 원형의 유형
4 원형의 분석
본문내용
적 불모(不毛), 죽음, 허무, 절망, 결핍.
(3) 사계(四季)의 원형
프라이는 원형적 국면과 그에 상응하는 문학적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주로 계절적 순환의 국면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가 나타난다.
1) 봄
봄은 하루의 국면에서는 새벽, 인생의 국면에서는 탄생에서 해당된다. 문학적 유형으로는 기사담(romance), 음송시(dithyriambic), 광상시(rhapsodic)가 여기 속한다.
2) 여름
여름은 하루의 국면에서는 정오(절정), 인생의 국면에서는 결혼 혹은 승리에 해당된다. 문학적 유형으로는 희극(comedy), 목가시(pastoral), 전원시(idyll)가 여기 속한다.
3) 가을
가을은 하루의 국면에서는 일몰, 인생의 국면에서는 죽음(노쇠)에 해당한다. 문학적 유형으로는 비극(tragedy), 비가(elegy)가 여기 속한다.
4) 겨울
겨울은 하루의 국면에서는 밤, 인생의 국면에서는 죽음에 해당한다. 문학적 유형으로는 풍자(satire)가 여기 속한다.
4 원형의 분석
(1) 탄생의 원형
毛髮(모발)을 날리며 오랜만에
바다를 바라고 섰다.
눈보라도 걷히고
저 멀리 물거품 속에서
제일 아름다운 人間의 여자가
誕生(탄생)하는 것을 본다.
김춘수의「봄바다」의 전문이다. 이 시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물거품’ 속에서 ‘제일 아름다운 인간의 여자’가 태어난다는 이미지이다. 특히 원형을 중심으로 이 시를 해석하기로 한다.
첫째로 화자는 오랜만에 ‘바다’를 바라고 섰다. 표제와 문맥에 의하면, 때는 봄이며, 화자는 바다의 물거품에 환시(幻視)를 체험한다. 곧 그는 물거품 속에서 여자가 태어나는 것을 본다. 이런 문맥에 의하면, 바다는 물의 원형으로 해석된다. 휠라이트 식으로는 물은 ‘순수’와 ‘새 생명’을 상징한다.
둘째로 ‘물거품’은 ‘눈보라도 걷힌’ 다음에 나타난다. 따라서 겨울이 상징하던 죽음의 세계가 끝나고 다시 봄이 옴을 암시하며, 봄은 탄생의 국면으로 드러나고, 물의 움직임 곧 물거품이 인다는 것은 새 생명의 태어남을 암시한다.
셋째로 물거품 속에서‘제일 아름다운 인간의 여자’가 탄생한다는 이미지는, 비록 환시이긴 하지만 원형의 논리에 따르면 가장 자연스런 것으로 인식된다.
이 시에 나오는 ‘여자’는 귀에린의 네 가지 유형 가운데 ‘영혼의 친구’로 해석된다. 곧 미인이며, 그 미인은 화자의 영감과 장식적 충만을 상징한다.
결국 이 시는 물의 원형, 곧 ‘새로운 정신적 생명의 탄생’을 노래한다. 그러나 시인은 시를 쓸 때 언제나 원형의 논리를 전제하면서 쓰는 것은 아니고 대체로 무의식 논리/비논리에 따른다.
(2) 통과제의의 원형
나는 겨울을 느낀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듣는 네 말이
사기 그릇보다 차고
또 멀다.
성냥갑 속의 흥분도 가득한 꿈도
벌레처럼 온순함도
네겐 벌써 없다.
너는 그것을 울면서
나에게 알려 주었고
너는 스물이 넘은 것이다.
알고 있느냐. 너는 겨울을 알아야 한다.
귀를 막는 것에서부터
눈을 감아야 하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
이 겨울은 너를 재우기 위해서도
너를 더 가둬두기 위해서도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겨울을 느낀다.
네가 울면서 달려온 어둠 속의
뜨거운 입김이
목소리보다 먼저 와 닿는다.
이 먼 나의 이마에.
박의상의「성년」의 전문이다. 이 시는 표제가 암시하듯이 ‘성년’. 곧 통과제의(initiation)를 노래한다. 통과제의의 고통과 시련은 다음과 같은 원형으로 드러난다.
첫째로 ‘겨울’의 원형이 있다. 이 시에서 겨울은 ‘귀를 막고 눈을 가는 삶’을 상징하지만 이런 삶은 ‘어둠’의 이미지와 통하고 따라서 ‘겨울’은 ‘어둠’, ‘죽음’, ‘밤’을 상징한다.
둘째로 ‘말’의 원형이 있다. 말은 휠라이트 식으로는 이성(logos)을 상징하며, 따라서 존재의 정당성을 상징한다. 따라서 ‘너의 말’이 차고 멀다는 것은 화자가 말이 상징하는 이성적 삶, 혹은 존재의 정당성과 거리를 두고 있거나 대립하는 것을 상징한다.
셋째로 말의 변형이 있다. 화자에게 그것, 곧 성년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너의 말은 말이 아니라 울음이다. 이 울음은 이성적 삶, 혹은 존재의 정당화가 환기하는 고통과 시련을 상징한다.
이 시는 인간적으로 성숙하고, 생에 대한 무지(無知)의 세계에서 지(知)의 세계로 통과하는 과정의 고통과 시련을 노래한다. 이런 통과제의가 강조하는 것은 고통과 시련이다. 통과제의는 사회적 정신적으로 성인이 됨을 의미하고 이렇게 성인이 될 때 겨울의 참뜻을 알게 된다.
(3) 사계(四季)의 원형
프라이는 원형적 국면과 그에 상응하는 문학적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주로 계절적 순환의 국면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가 나타난다.
1) 봄
봄은 하루의 국면에서는 새벽, 인생의 국면에서는 탄생에서 해당된다. 문학적 유형으로는 기사담(romance), 음송시(dithyriambic), 광상시(rhapsodic)가 여기 속한다.
2) 여름
여름은 하루의 국면에서는 정오(절정), 인생의 국면에서는 결혼 혹은 승리에 해당된다. 문학적 유형으로는 희극(comedy), 목가시(pastoral), 전원시(idyll)가 여기 속한다.
3) 가을
가을은 하루의 국면에서는 일몰, 인생의 국면에서는 죽음(노쇠)에 해당한다. 문학적 유형으로는 비극(tragedy), 비가(elegy)가 여기 속한다.
4) 겨울
겨울은 하루의 국면에서는 밤, 인생의 국면에서는 죽음에 해당한다. 문학적 유형으로는 풍자(satire)가 여기 속한다.
4 원형의 분석
(1) 탄생의 원형
毛髮(모발)을 날리며 오랜만에
바다를 바라고 섰다.
눈보라도 걷히고
저 멀리 물거품 속에서
제일 아름다운 人間의 여자가
誕生(탄생)하는 것을 본다.
김춘수의「봄바다」의 전문이다. 이 시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물거품’ 속에서 ‘제일 아름다운 인간의 여자’가 태어난다는 이미지이다. 특히 원형을 중심으로 이 시를 해석하기로 한다.
첫째로 화자는 오랜만에 ‘바다’를 바라고 섰다. 표제와 문맥에 의하면, 때는 봄이며, 화자는 바다의 물거품에 환시(幻視)를 체험한다. 곧 그는 물거품 속에서 여자가 태어나는 것을 본다. 이런 문맥에 의하면, 바다는 물의 원형으로 해석된다. 휠라이트 식으로는 물은 ‘순수’와 ‘새 생명’을 상징한다.
둘째로 ‘물거품’은 ‘눈보라도 걷힌’ 다음에 나타난다. 따라서 겨울이 상징하던 죽음의 세계가 끝나고 다시 봄이 옴을 암시하며, 봄은 탄생의 국면으로 드러나고, 물의 움직임 곧 물거품이 인다는 것은 새 생명의 태어남을 암시한다.
셋째로 물거품 속에서‘제일 아름다운 인간의 여자’가 탄생한다는 이미지는, 비록 환시이긴 하지만 원형의 논리에 따르면 가장 자연스런 것으로 인식된다.
이 시에 나오는 ‘여자’는 귀에린의 네 가지 유형 가운데 ‘영혼의 친구’로 해석된다. 곧 미인이며, 그 미인은 화자의 영감과 장식적 충만을 상징한다.
결국 이 시는 물의 원형, 곧 ‘새로운 정신적 생명의 탄생’을 노래한다. 그러나 시인은 시를 쓸 때 언제나 원형의 논리를 전제하면서 쓰는 것은 아니고 대체로 무의식 논리/비논리에 따른다.
(2) 통과제의의 원형
나는 겨울을 느낀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듣는 네 말이
사기 그릇보다 차고
또 멀다.
성냥갑 속의 흥분도 가득한 꿈도
벌레처럼 온순함도
네겐 벌써 없다.
너는 그것을 울면서
나에게 알려 주었고
너는 스물이 넘은 것이다.
알고 있느냐. 너는 겨울을 알아야 한다.
귀를 막는 것에서부터
눈을 감아야 하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
이 겨울은 너를 재우기 위해서도
너를 더 가둬두기 위해서도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겨울을 느낀다.
네가 울면서 달려온 어둠 속의
뜨거운 입김이
목소리보다 먼저 와 닿는다.
이 먼 나의 이마에.
박의상의「성년」의 전문이다. 이 시는 표제가 암시하듯이 ‘성년’. 곧 통과제의(initiation)를 노래한다. 통과제의의 고통과 시련은 다음과 같은 원형으로 드러난다.
첫째로 ‘겨울’의 원형이 있다. 이 시에서 겨울은 ‘귀를 막고 눈을 가는 삶’을 상징하지만 이런 삶은 ‘어둠’의 이미지와 통하고 따라서 ‘겨울’은 ‘어둠’, ‘죽음’, ‘밤’을 상징한다.
둘째로 ‘말’의 원형이 있다. 말은 휠라이트 식으로는 이성(logos)을 상징하며, 따라서 존재의 정당성을 상징한다. 따라서 ‘너의 말’이 차고 멀다는 것은 화자가 말이 상징하는 이성적 삶, 혹은 존재의 정당성과 거리를 두고 있거나 대립하는 것을 상징한다.
셋째로 말의 변형이 있다. 화자에게 그것, 곧 성년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너의 말은 말이 아니라 울음이다. 이 울음은 이성적 삶, 혹은 존재의 정당화가 환기하는 고통과 시련을 상징한다.
이 시는 인간적으로 성숙하고, 생에 대한 무지(無知)의 세계에서 지(知)의 세계로 통과하는 과정의 고통과 시련을 노래한다. 이런 통과제의가 강조하는 것은 고통과 시련이다. 통과제의는 사회적 정신적으로 성인이 됨을 의미하고 이렇게 성인이 될 때 겨울의 참뜻을 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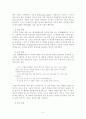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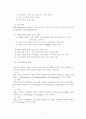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