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현대 서양윤리학의 전개 과정에서의 맥킨타이어
2. 도덕적 관행(practices), 담론적 자아(narrative self),
3. 인간의 의존성과 덕의 요청
2. 도덕적 관행(practices), 담론적 자아(narrative self),
3. 인간의 의존성과 덕의 요청
본문내용
설명 속에서 우리는 맥킨타이어가 덕의 필요성에 대해 어떤 답변을 할 것인가를 짐작해볼 수 있다. 결국 인간에게 덕이 필요한 이유는 동물적 위약성을 갖고 태어나서 그것에 그치지 않고, 자율적인 이성을 지닌 존재로 살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전환 과정에서 덕은 필수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실제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간의 동물성은 필연적으로 의존을 요구하고, 이 의존성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독립적이고 실천적인 이성인(practical reasoner)으로 살아가기 위한 요건으로 덕의 함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덕이 없이는 실천적 이성인의 활동을 성취할 수도, 유지할 수도 없고 역으로 덕 없이는 어린아이들을 실천적 이성인이 되도록 가르칠 수도 없다.
인간은 덕을 통해서 실천적 이성인이 될 수 있고, 도덕 교사도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실제로 맥킨타이어는 자신의 욕구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서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는 것이 덕에 입문하는 핵심적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 과정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어느 정도 이와 관련된 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그는 그동안 현대 서구 도덕교육의 주된 흐름을 형성해왔던 규칙 준수 위주의 교육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특정 상황에서의 결함 때문에 그 자체로 올바른 덕교육적 접근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즉 덕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항상 규칙 준수보다는 더 많은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맥킨타이어는 이러한 덕의 요청을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정당화하려고도 한다. 그에 따르면 모든 인간 관계는 이해관계를 전제로 하는 형식적 관계와 공감과 동정심을 전제로 해서 성립되는 정서적 관계의 두 유형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 그 중에서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지만, 덕의 요청은 주로 두 번째 유형의 관계에서 나온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본질적 결함과 그것에 근거한 의존성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할 때 정서적 공감과 의존이 가능해진다.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서 독립적인 실천적 이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도와주는 사람과 덕이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그러한 요소들이 작동할 수 있는 공동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덕이 전제되고 통용되는 공동체 사회는 맥킨타이어가 스스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의 소비사회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상적인 사회이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결함을 수용하면서 의존하고, 더 나아가 각 개인적 차원에서는 실천적 이성인(理性人)이 되고자 노력하면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회는 분명 유토피아적이다. 그렇지만 ‘유토피아적 기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는 유토피아가 아니다.’라고 그는 강조한다.
결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서 일정한 최고의 선이란 항상 변동되어 지는 것 같다. 덕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러한 덕의 가치도 어느 시대 혹은 사상을 만나면 그 모습이 달라지고는 한다. 그러나 덕이라는 것 도덕이라는 것은 이기심이나 안 좋은 맥락보다는 이타심이나 희생심 같은 것 등등을 내포하고 있다. 덕이라는 것에 대한 완벽한 해석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 그것보다는 그 덕이 존재하고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철학이고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번 메킨타이어를 공부하며 새삼 최소한의 덕이라도 모두다 펼치는 세상이었으면 한다. 모두가 희생하고 자신을 돌보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소함이라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조금만 덜어내고 그 자리에 다른 이들의 몫을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이다.
인간은 덕을 통해서 실천적 이성인이 될 수 있고, 도덕 교사도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실제로 맥킨타이어는 자신의 욕구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서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는 것이 덕에 입문하는 핵심적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 과정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어느 정도 이와 관련된 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그는 그동안 현대 서구 도덕교육의 주된 흐름을 형성해왔던 규칙 준수 위주의 교육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특정 상황에서의 결함 때문에 그 자체로 올바른 덕교육적 접근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즉 덕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항상 규칙 준수보다는 더 많은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맥킨타이어는 이러한 덕의 요청을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정당화하려고도 한다. 그에 따르면 모든 인간 관계는 이해관계를 전제로 하는 형식적 관계와 공감과 동정심을 전제로 해서 성립되는 정서적 관계의 두 유형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 그 중에서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지만, 덕의 요청은 주로 두 번째 유형의 관계에서 나온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본질적 결함과 그것에 근거한 의존성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할 때 정서적 공감과 의존이 가능해진다.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서 독립적인 실천적 이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도와주는 사람과 덕이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그러한 요소들이 작동할 수 있는 공동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덕이 전제되고 통용되는 공동체 사회는 맥킨타이어가 스스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의 소비사회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상적인 사회이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결함을 수용하면서 의존하고, 더 나아가 각 개인적 차원에서는 실천적 이성인(理性人)이 되고자 노력하면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회는 분명 유토피아적이다. 그렇지만 ‘유토피아적 기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는 유토피아가 아니다.’라고 그는 강조한다.
결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서 일정한 최고의 선이란 항상 변동되어 지는 것 같다. 덕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러한 덕의 가치도 어느 시대 혹은 사상을 만나면 그 모습이 달라지고는 한다. 그러나 덕이라는 것 도덕이라는 것은 이기심이나 안 좋은 맥락보다는 이타심이나 희생심 같은 것 등등을 내포하고 있다. 덕이라는 것에 대한 완벽한 해석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 그것보다는 그 덕이 존재하고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철학이고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번 메킨타이어를 공부하며 새삼 최소한의 덕이라도 모두다 펼치는 세상이었으면 한다. 모두가 희생하고 자신을 돌보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소함이라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조금만 덜어내고 그 자리에 다른 이들의 몫을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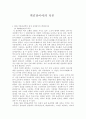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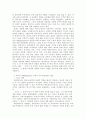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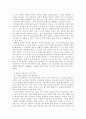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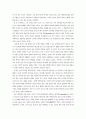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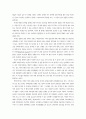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