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1. 적극론과 소극론
2. 사유주의와 자본주의
1) 사회주의
2) 자본주의
결론
본론
1. 적극론과 소극론
2. 사유주의와 자본주의
1) 사회주의
2) 자본주의
결론
본문내용
모든 행동이 사회를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것이 되는지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 안에서 개인의 삶은 사회적 협동에 있어서만 가능할 뿐, 생활과 생산의 사회조직이 깨진다면 각 개인은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개개인에 대해 행동할 때마다 그가 살고 있는 사회를 염두해 두도록 요구하고, 또 어떤 행동이 그에게는 당장의 이익이 되지만 사회에 해악이 되는 경우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라는 것이 아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희생은 잠정적이기 때문이다. 훨씬 더 큰 궁극적인 이익을 위한 즉각적이며 비교적 작은 이익을 부정하라는 것이다. 서로 협동하여 일하고 같은 생활방식을 나누는 사람들간의 결사체로서의 한 사회를 존속시키는 것은 모든 이에게 이로운 일이다. 사회의 지속적인 존립을 위해 한순간의 이익을 희생하는 사람은 누구나 큰 이익을 얻기 위해 작은 것을 희생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사회적 이익에 대한 이러한 존중이 갖는 의미는 종종 잘못 이해되곤 하였다. 그것의 도덕적 가치가 당장의 대가를 부정하는 희생 그 자체에 있다고 여겨지곤 하였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란 희생 그 자체라기보다는 희생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정해진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희생과 자기부정 그 자체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이 도덕적인 목적을 위한 것일 때에만 희생은 도덕적인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이 좋은 목적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과 재산을 희생하는 것과, 조금도 사회에 이익을 줌이 없이 그것들을 희생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난다.
사회질서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은 모두 다 도덕적이며 사회에 해가 되는 것은 모두 다 비도덕적이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제도가 사회에 대해 이익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 그것을 비도덕적이라고 비판할 수는 없다. 어떤 특정제도가 사회에 대해 이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사회에 이로움을 준다고 판정했으면 설명하기 힘든 다른 이유를 들어 그것이 비도덕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비난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간이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재산과 부를 축적하게 된다. 하지만 그것을 축적하는 방법과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어떠냐에 따라 그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 라는 속담이 있다. 열심히 벌어서 그것을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또한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윤리라는 것은 자신의 양심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자기의 양심에 따라 그것이 어떻게 획득했고 또한 어떻게 쓰여졌냐에 따라 윤리성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루드비히 폰 미제스,「자유주의」, CFE, 1988.
서광조,「기업윤리와 경제윤리」, 철학과 현실사, 1996.
이재율,「경제윤리」, 민음사, 1995.
개개인에 대해 행동할 때마다 그가 살고 있는 사회를 염두해 두도록 요구하고, 또 어떤 행동이 그에게는 당장의 이익이 되지만 사회에 해악이 되는 경우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라는 것이 아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희생은 잠정적이기 때문이다. 훨씬 더 큰 궁극적인 이익을 위한 즉각적이며 비교적 작은 이익을 부정하라는 것이다. 서로 협동하여 일하고 같은 생활방식을 나누는 사람들간의 결사체로서의 한 사회를 존속시키는 것은 모든 이에게 이로운 일이다. 사회의 지속적인 존립을 위해 한순간의 이익을 희생하는 사람은 누구나 큰 이익을 얻기 위해 작은 것을 희생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사회적 이익에 대한 이러한 존중이 갖는 의미는 종종 잘못 이해되곤 하였다. 그것의 도덕적 가치가 당장의 대가를 부정하는 희생 그 자체에 있다고 여겨지곤 하였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란 희생 그 자체라기보다는 희생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정해진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희생과 자기부정 그 자체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이 도덕적인 목적을 위한 것일 때에만 희생은 도덕적인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이 좋은 목적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과 재산을 희생하는 것과, 조금도 사회에 이익을 줌이 없이 그것들을 희생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난다.
사회질서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은 모두 다 도덕적이며 사회에 해가 되는 것은 모두 다 비도덕적이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제도가 사회에 대해 이익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 그것을 비도덕적이라고 비판할 수는 없다. 어떤 특정제도가 사회에 대해 이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사회에 이로움을 준다고 판정했으면 설명하기 힘든 다른 이유를 들어 그것이 비도덕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비난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간이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재산과 부를 축적하게 된다. 하지만 그것을 축적하는 방법과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어떠냐에 따라 그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 라는 속담이 있다. 열심히 벌어서 그것을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또한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윤리라는 것은 자신의 양심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자기의 양심에 따라 그것이 어떻게 획득했고 또한 어떻게 쓰여졌냐에 따라 윤리성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루드비히 폰 미제스,「자유주의」, CFE, 1988.
서광조,「기업윤리와 경제윤리」, 철학과 현실사, 1996.
이재율,「경제윤리」, 민음사,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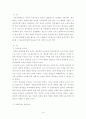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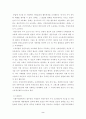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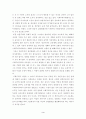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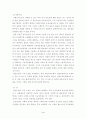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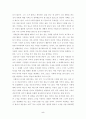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