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정확한 측정값을 얻을 수 없었다 . - 소수점 둘째자리 이후부터는 반올림을 하여 가까운 쪽으로 표기하였다.
-> 그림자의 길이, 방향각, 고도 등을 모두 근사값을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서 온 오차도 있는것 같았다. 그래도 교수님께서 주신 실험 보고서 형식을 따라 가며 최대한 정밀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 이번에 내가 관측한 곳의 경도와 위도를 계산해보니 위도는 얼추 맞는데 경도가 5°정도 차이가 나서 무려 울릉도가 나와버리고 말았다... 펜을 찍을때 종이가 흔들린것, 자로 잴 때 근사값을 사용한 것 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큰 오차가 나와버리게 된 것 같다.
이번 실험을 하면서 새롭게 느끼게 된 원리나 사실들이 많았다.
-> 그림자 측정을 할 때는 그림자 길이의 소수점자리가 바뀌기만 해도 나중에 결과로 나올 위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남중시간의 분 차이가 경도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았다. 남중시각이 12시 10분이라니, 말도 안되는 소리였지만 그래도 결과가 그렇게 나오기에 어쩔수 없이 사용했는데 역시나 큰 오차가 나고 말았다. 지도를 보았을때 1°만 변해도 서울과 충남,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인다. 시간상으로 보았을때 1시간이면 15°가 변하는 데 15°면 이미 다른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밀한 측정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 위도를 결정할때 , 관계식이 \"남중고도 = 90°- 위도 + 적위\" 이렇게 되는것이 나는 왜 그런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남중고도가 우리나라의 위도를 알기위해서 왜 어떻게 필요한지도 알지 못했다. 그런데 실험을 하면서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 춘분과 추분날은 태양과 직선으로 연결이 되지만 하지날이나 동지날은 가까이 갈수록 태양이 약간의 이동을 하여 그 각도가 변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이 태양적위인데 ±23.5° 안팎으로 변한다. 0.101091 이었는데 거의 춘분에 가깝다는 뜻이었다. 우리나라의 위치에 점을 찍고 직선을 그어 지면과 90°를 이루게 하면 측정 당일에 태양이 남중했을 때 남중고도를 구할 수 있다. 90°에서 고도값을 빼주면 위도가 되는데 태양의 위치가 변했기 대문에 그만큼의 값을 더해주거나 빼 주면 위도를 구하게 되는 것이었다. 나는 왜 정확히 23.5°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가 궁금했는데 지구의 공전궤도면이 자전축에 대해 23.5° 기울어져 있는 점 때문이라는 해답을 얻었다.
-> 그리고 관측할때의 그림자끝을 찍은 점들은 거의 일직선이었는데 방안지로 옮겨 보니 곡성이 대칭축을 중심으로 포물선 형태를 그리고 있고 , 그 정점이 모두 남중시각과 남중고도였다. 그리고 나는 정북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약간 기울어지게 측정했는데 그렇게 실험을 했을때 남중시각인 부분의 방향각이 정 북 방향이라는 사실이 놀랍고 또 신기했다.
내가 이번에 결과로 나온 위도와 경도는 울릉도 보다 조금 안쪽의 바다였다. 서울과 정확하진 않아도 수도권 지역이라도 나왔으면 하고 바랬는데 살짝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지만 나는 실험을 하고,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지금까지 이론으로만 알고 응 그렇구나 했던 것들을 직접 몸으로 체험을 했다는 사실에 의의를 두고 싶다.
예비 교사로서 나중에 아이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려면 내가 더 확실히 알고 있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아직도 과학적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 이번 사실만을 깨달은 것에서 멈추지 말고 앞으론 일상생활에서 과학적 원리를 찾아 이해하는데 노력해야겠다.
<조금 더 조사해본 내용>
이번 그림자 관측을 하면서, 그림자를 통해 시간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고, 과거 우리의 조상들은 어떠한 원리로 해시계를 만들었을지 궁금해졌다.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잠깐 말씀해주시기는 했지만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인터넷에서 조금 더 조사해 보았는데,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다. 바로 앙부일구에 대한 설명이었다. 앙구일부의 생김새는 흡사 시골에 있는 솥뚜껑을 연상시키는데, 그것은 앙구일부의 생김새가 마치 솥뚜껑을 뒤집어 놓은 것 같기 때문이다. ‘앙구일부’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 또한 그것과 관련이 있었다. ‘앙부’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솥을 뜻하고, ‘일구’는 해의 그림자를 의미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앙구일부를 솥뚜껑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수업시간에 배운 것처럼 해는 동지, 하지, 춘분, 추분 등 각각의 절기에 따라 움직임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런데 솥 모양으로 시반을 만들어 태양의 그림자를 나타내게 되면 각 절기의 특징을 살려 그림자 표시가 쉽게 가능해진다고 한다. 즉, 앙부일구를 보면 하루의 시간뿐만 아니라 24절기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 농사철이나 전쟁시에 유용하게 사용되었다고 한다.
< 세종대의 학자들은 평면을 파서 오목한 구형으로 만들고 그림자를 만드는 막대의 축을 북극에 일치시키는 방식의 해시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지구 주위를 도는 태양의 위치를 거의 완전하게 재현할 수 있다. 앙부일구의 내부에 설치된 영침( 그림자를 만드는 침)의 방향을 지축과 평행한 정북극 방향을 맞춘다. 영침의 끝은 구의 중심이 된다. 그리고 앙부일구의 평면은 그 지점의 수평면이 된다. 여기에서 해시계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필수적인 것은 정북극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세종 당시의 유수한 천문학자들이 서울을 기준으로 하는 정북극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냈고 이를 기준으로 앙부일구 내부의 눈금선이 정확히 매겨질 수 있었다. 결국 앙부일구 내부에서는 영침의 그림자 길이가 하루종일 달라지지 않고 해당 절기 (즉 태양 고도에 해당하는)의 눈금선을 따라간다. 시각은 그림자가 떨어진 지점의 시각선을 읽으면 된다. 시각선은 절기선과 교차하고 있으므로 그림자가 떨어진 지점에서 절기선과 눈금선을 동시에 읽으면 그날의 절기와 당시의 시각을 정확히 읽을 수 있다. 이것은 그림자를 읽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천구상에서 태양의 연주운동의 위치와 일주운동의 위치를 동시에 읽는 것과 동일하다. >
- 과학동아 전용훈 기자의 글에서 (http://chemmate.com/news/c14.htm) -
http://edu21.naweb.cc/Mm/Module/start.htm
-> 그림자의 길이, 방향각, 고도 등을 모두 근사값을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서 온 오차도 있는것 같았다. 그래도 교수님께서 주신 실험 보고서 형식을 따라 가며 최대한 정밀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 이번에 내가 관측한 곳의 경도와 위도를 계산해보니 위도는 얼추 맞는데 경도가 5°정도 차이가 나서 무려 울릉도가 나와버리고 말았다... 펜을 찍을때 종이가 흔들린것, 자로 잴 때 근사값을 사용한 것 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큰 오차가 나와버리게 된 것 같다.
이번 실험을 하면서 새롭게 느끼게 된 원리나 사실들이 많았다.
-> 그림자 측정을 할 때는 그림자 길이의 소수점자리가 바뀌기만 해도 나중에 결과로 나올 위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남중시간의 분 차이가 경도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았다. 남중시각이 12시 10분이라니, 말도 안되는 소리였지만 그래도 결과가 그렇게 나오기에 어쩔수 없이 사용했는데 역시나 큰 오차가 나고 말았다. 지도를 보았을때 1°만 변해도 서울과 충남,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인다. 시간상으로 보았을때 1시간이면 15°가 변하는 데 15°면 이미 다른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밀한 측정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 위도를 결정할때 , 관계식이 \"남중고도 = 90°- 위도 + 적위\" 이렇게 되는것이 나는 왜 그런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남중고도가 우리나라의 위도를 알기위해서 왜 어떻게 필요한지도 알지 못했다. 그런데 실험을 하면서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 춘분과 추분날은 태양과 직선으로 연결이 되지만 하지날이나 동지날은 가까이 갈수록 태양이 약간의 이동을 하여 그 각도가 변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이 태양적위인데 ±23.5° 안팎으로 변한다. 0.101091 이었는데 거의 춘분에 가깝다는 뜻이었다. 우리나라의 위치에 점을 찍고 직선을 그어 지면과 90°를 이루게 하면 측정 당일에 태양이 남중했을 때 남중고도를 구할 수 있다. 90°에서 고도값을 빼주면 위도가 되는데 태양의 위치가 변했기 대문에 그만큼의 값을 더해주거나 빼 주면 위도를 구하게 되는 것이었다. 나는 왜 정확히 23.5°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가 궁금했는데 지구의 공전궤도면이 자전축에 대해 23.5° 기울어져 있는 점 때문이라는 해답을 얻었다.
-> 그리고 관측할때의 그림자끝을 찍은 점들은 거의 일직선이었는데 방안지로 옮겨 보니 곡성이 대칭축을 중심으로 포물선 형태를 그리고 있고 , 그 정점이 모두 남중시각과 남중고도였다. 그리고 나는 정북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약간 기울어지게 측정했는데 그렇게 실험을 했을때 남중시각인 부분의 방향각이 정 북 방향이라는 사실이 놀랍고 또 신기했다.
내가 이번에 결과로 나온 위도와 경도는 울릉도 보다 조금 안쪽의 바다였다. 서울과 정확하진 않아도 수도권 지역이라도 나왔으면 하고 바랬는데 살짝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지만 나는 실험을 하고,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지금까지 이론으로만 알고 응 그렇구나 했던 것들을 직접 몸으로 체험을 했다는 사실에 의의를 두고 싶다.
예비 교사로서 나중에 아이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려면 내가 더 확실히 알고 있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아직도 과학적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 이번 사실만을 깨달은 것에서 멈추지 말고 앞으론 일상생활에서 과학적 원리를 찾아 이해하는데 노력해야겠다.
<조금 더 조사해본 내용>
이번 그림자 관측을 하면서, 그림자를 통해 시간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고, 과거 우리의 조상들은 어떠한 원리로 해시계를 만들었을지 궁금해졌다.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잠깐 말씀해주시기는 했지만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인터넷에서 조금 더 조사해 보았는데,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다. 바로 앙부일구에 대한 설명이었다. 앙구일부의 생김새는 흡사 시골에 있는 솥뚜껑을 연상시키는데, 그것은 앙구일부의 생김새가 마치 솥뚜껑을 뒤집어 놓은 것 같기 때문이다. ‘앙구일부’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 또한 그것과 관련이 있었다. ‘앙부’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솥을 뜻하고, ‘일구’는 해의 그림자를 의미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앙구일부를 솥뚜껑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수업시간에 배운 것처럼 해는 동지, 하지, 춘분, 추분 등 각각의 절기에 따라 움직임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런데 솥 모양으로 시반을 만들어 태양의 그림자를 나타내게 되면 각 절기의 특징을 살려 그림자 표시가 쉽게 가능해진다고 한다. 즉, 앙부일구를 보면 하루의 시간뿐만 아니라 24절기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 농사철이나 전쟁시에 유용하게 사용되었다고 한다.
< 세종대의 학자들은 평면을 파서 오목한 구형으로 만들고 그림자를 만드는 막대의 축을 북극에 일치시키는 방식의 해시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지구 주위를 도는 태양의 위치를 거의 완전하게 재현할 수 있다. 앙부일구의 내부에 설치된 영침( 그림자를 만드는 침)의 방향을 지축과 평행한 정북극 방향을 맞춘다. 영침의 끝은 구의 중심이 된다. 그리고 앙부일구의 평면은 그 지점의 수평면이 된다. 여기에서 해시계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필수적인 것은 정북극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세종 당시의 유수한 천문학자들이 서울을 기준으로 하는 정북극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냈고 이를 기준으로 앙부일구 내부의 눈금선이 정확히 매겨질 수 있었다. 결국 앙부일구 내부에서는 영침의 그림자 길이가 하루종일 달라지지 않고 해당 절기 (즉 태양 고도에 해당하는)의 눈금선을 따라간다. 시각은 그림자가 떨어진 지점의 시각선을 읽으면 된다. 시각선은 절기선과 교차하고 있으므로 그림자가 떨어진 지점에서 절기선과 눈금선을 동시에 읽으면 그날의 절기와 당시의 시각을 정확히 읽을 수 있다. 이것은 그림자를 읽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천구상에서 태양의 연주운동의 위치와 일주운동의 위치를 동시에 읽는 것과 동일하다. >
- 과학동아 전용훈 기자의 글에서 (http://chemmate.com/news/c14.htm) -
http://edu21.naweb.cc/Mm/Module/start.htm
추천자료
 [과외]중학 과학 2-2학기 중간 지구의 역사와 지각변동
[과외]중학 과학 2-2학기 중간 지구의 역사와 지각변동 [과외]중학 과학 2-1학기 기말 05 지구의 역사와 지각변동(교사용)
[과외]중학 과학 2-1학기 기말 05 지구의 역사와 지각변동(교사용) [과외]중학 과학 2-1학기 기말 05 지구의 역사와 지각변동
[과외]중학 과학 2-1학기 기말 05 지구의 역사와 지각변동 [과외]중학 과학 1-1학기 중간 01 지구의 구조
[과외]중학 과학 1-1학기 중간 01 지구의 구조 [과외]중학 과학 1-1학기 중간 01 지구의 구조(교사용)
[과외]중학 과학 1-1학기 중간 01 지구의 구조(교사용) [과외]중학 과학 2-2학기 중간2 지구의 역사와 지각변동(교사용)
[과외]중학 과학 2-2학기 중간2 지구의 역사와 지각변동(교사용) [과외]중학 과학 2-2학기 기말 01 지구의 역사와 지각변동(교사용)
[과외]중학 과학 2-2학기 기말 01 지구의 역사와 지각변동(교사용) [과외]중학 과학 2-2학기 기말 01 지구의 역사와 지각변동
[과외]중학 과학 2-2학기 기말 01 지구의 역사와 지각변동 [과외]중학 과학 중1-03 지구의 역사 02
[과외]중학 과학 중1-03 지구의 역사 02 [과외]중학 과학 중1-03 지구의 역사 03
[과외]중학 과학 중1-03 지구의 역사 03 [과외]중학 과학 중1-03 지구의 역사 04
[과외]중학 과학 중1-03 지구의 역사 04 [물리][물리학][물리학자][물리영재][물리 관련 공식][물리 관련 직업][지구물리탐사][국제물...
[물리][물리학][물리학자][물리영재][물리 관련 공식][물리 관련 직업][지구물리탐사][국제물... 지구와 환경(이야기 나누기, 과학 연계활동) 비가 내려요 과학 실험 모의수업 교육 활동 계획...
지구와 환경(이야기 나누기, 과학 연계활동) 비가 내려요 과학 실험 모의수업 교육 활동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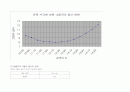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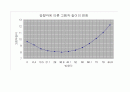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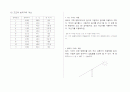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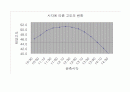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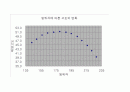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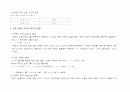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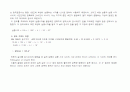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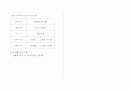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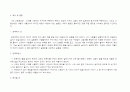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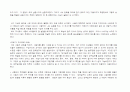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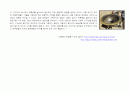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