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물탐구>
1. 염상진
2. 염상구
3. 김범우
4. 하대치
5. 세 여인 (죽산댁, 들목댁, 외서댁)
6. 서민영
7. 지주들(최익승, 정현동, 김사용)
1. 염상진
2. 염상구
3. 김범우
4. 하대치
5. 세 여인 (죽산댁, 들목댁, 외서댁)
6. 서민영
7. 지주들(최익승, 정현동, 김사용)
본문내용
서민영이 하고자 했던 여러 시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뿐더러 그러한 인물들이 더욱 활발한 사회적인 운동들을 벌여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지주들(최익승, 정현동, 김사용)
최익승과 정현동은 염상진과 이념과 계급적으로 완전히 대비되는 인물들이다. 즉 지주 계급의 우익 대표세력이다.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좌익 운동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며 빨갱이 색출에 눈을 붉히는 것 또한 전부 그 때문이다. 이 둘은 그 당시 전형적인 지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제 시대 때는 친일파였다가 해방 후 친미파로 변신한다. 권력과 재물에 자신들의 생명만큼 끔찍이 매달리는 인물들이다.
최익승은 보성벌교지구 국회의원출신으로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 서울에서 국회의원활동을 하면서 최씨문중의 최익달, 최익현, 최익도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착취를 일삼는다. 초기에 경찰서장인 남인태와도 연락을 하면서 권력을 악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물정에 관계없이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품고 있는 듯하다.
정하섭의 아버지인 정현동 또한 해방 직후 일본인으로부터 양조장을 흥정하여 넘겨 받은 벌교의 재산가이다. 아들이 좌익에 가담하고 있어서 여순사건 당시 다른 재산가들이 처단될때에도 살아날 수 있었으나, 그 후 아들에게 공산당 자금을 대주었다는 걸로 재판을 받게되고, 재산을 빼앗긴다. 결국 그는 농토개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서운상에게 소작인들 몰래 팔아넘기기도 하여 소작인들의 미움을 샀으며, 자신의 땅을 지키기 위해 벌판의 논을 염전으로 만들려다 소작인의 낫에 찍혀 죽게 된다.
이들에 반해 김범우의 아버지인 김사용은 양심적인 지주의 모습을 보인다. 염상진의 타고난 낮은 신분에도 개의치않고, 어렸을 때부터 총명함을 인정하고 자식처럼 사랑한다. 경작할 땅을 조금 달라는 염상진의 부탁에 조금도 서슴치 않고, 상답을 주셨던 것 또한 그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염상진의 도움으로 1948년 10월 숙청을 면하게 된다. 큰 아들 김범준이 일찍이 독립투사로 성장하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비록 자신이 적극적으로 사회개혁운동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지주이다. 하지만 사회주의 혁명에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당시 지주들은 끝없는 탐욕을 드러내었으며, 심지어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소작인들을 이해하지는 못할망정 수탈하는 데에 정신이 없다.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와 같지는 않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 한국에서또한 그 모습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본다. 고작 50년전의 역사일 뿐인데 그런 아픔들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사회가 갈수록 삭막해져가고 개인주의화 되어갈뿐더러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발맞춘 경쟁속에서 우리는 잊고 사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 태백산맥은 나의 삶의 지평을 넓혀 주었을뿐더러 우리가 알고 배웠던 역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역사를 답습하지 말아야 겠다는 여러 각오를 세울 수 있게 되어 감사한다.
지주들(최익승, 정현동, 김사용)
최익승과 정현동은 염상진과 이념과 계급적으로 완전히 대비되는 인물들이다. 즉 지주 계급의 우익 대표세력이다.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좌익 운동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며 빨갱이 색출에 눈을 붉히는 것 또한 전부 그 때문이다. 이 둘은 그 당시 전형적인 지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제 시대 때는 친일파였다가 해방 후 친미파로 변신한다. 권력과 재물에 자신들의 생명만큼 끔찍이 매달리는 인물들이다.
최익승은 보성벌교지구 국회의원출신으로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 서울에서 국회의원활동을 하면서 최씨문중의 최익달, 최익현, 최익도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착취를 일삼는다. 초기에 경찰서장인 남인태와도 연락을 하면서 권력을 악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물정에 관계없이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품고 있는 듯하다.
정하섭의 아버지인 정현동 또한 해방 직후 일본인으로부터 양조장을 흥정하여 넘겨 받은 벌교의 재산가이다. 아들이 좌익에 가담하고 있어서 여순사건 당시 다른 재산가들이 처단될때에도 살아날 수 있었으나, 그 후 아들에게 공산당 자금을 대주었다는 걸로 재판을 받게되고, 재산을 빼앗긴다. 결국 그는 농토개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서운상에게 소작인들 몰래 팔아넘기기도 하여 소작인들의 미움을 샀으며, 자신의 땅을 지키기 위해 벌판의 논을 염전으로 만들려다 소작인의 낫에 찍혀 죽게 된다.
이들에 반해 김범우의 아버지인 김사용은 양심적인 지주의 모습을 보인다. 염상진의 타고난 낮은 신분에도 개의치않고, 어렸을 때부터 총명함을 인정하고 자식처럼 사랑한다. 경작할 땅을 조금 달라는 염상진의 부탁에 조금도 서슴치 않고, 상답을 주셨던 것 또한 그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염상진의 도움으로 1948년 10월 숙청을 면하게 된다. 큰 아들 김범준이 일찍이 독립투사로 성장하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비록 자신이 적극적으로 사회개혁운동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지주이다. 하지만 사회주의 혁명에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당시 지주들은 끝없는 탐욕을 드러내었으며, 심지어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소작인들을 이해하지는 못할망정 수탈하는 데에 정신이 없다.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와 같지는 않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 한국에서또한 그 모습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본다. 고작 50년전의 역사일 뿐인데 그런 아픔들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사회가 갈수록 삭막해져가고 개인주의화 되어갈뿐더러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발맞춘 경쟁속에서 우리는 잊고 사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 태백산맥은 나의 삶의 지평을 넓혀 주었을뿐더러 우리가 알고 배웠던 역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역사를 답습하지 말아야 겠다는 여러 각오를 세울 수 있게 되어 감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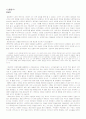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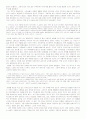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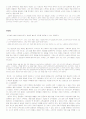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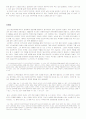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