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다이어그램 #1. 그 배경과 작도방법 자체
#2.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이행
동일성의 평면과 근본적 대립
반동주의자와 아나키스트
자유주의적 국가학 공격
#2.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이행
동일성의 평면과 근본적 대립
반동주의자와 아나키스트
자유주의적 국가학 공격
본문내용
능력 없는 정상상태는 생각할 수조차 없으리라. 이에 따라 유기체주의는 매우 나이브한 것으로서 기각되게 된다.
- 국가의 주권 즉 예외의 원리적 타당성
크랍베의 법주권론과 같은 논의는 주권의 소재를 인간에게서 합리적 법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주의에서도 주권개념은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은 것 같다. 다만 결정을 행하는 예외적인 것이 구체적인 집행자와 질적 차이를 지니고 있는 합리성과 필연성의 법칙 자체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슈미트와 자유주의는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켈젠의 신칸트주의. 그의 방법은 근본적으로 사회학과 법학의 완전한 분리에서 출발한다. 슈미트는 켈젠을 이렇게 재현한다. ‘국가의 법학적 고찰은 순수하게 법학적인 것이어야 하며 규범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PT 28).’ 따라서 국가는 헌법이다. 여기서 예외를 발동하는 주권적 권능의 자리는 없다. 모든 것은 헌법이라는 최고의 형식적 규범에서 출발하고 그것이 지정하는 형식적 질서 속에서 통일된다. 슈미트는 이를 예정조화라고 비꼰다. 그리고 실정적 규정의 명령성을 통해 켈젠의 규범적 법학의 체계를 비웃는다. ‘주권 개념은 단호히 배제되어야 한다(PT 30)’고 말해 법 실현의 명령성과 독자성을 무시하는 켈젠은 슈미트에게 호되게 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 크랍베의 법주권론. 앞서 말했듯 이것은 주권의 소재를 규범으로 돌리는 행위이며 켈젠의 신칸트주의적 법학과 닮아있다. 슈미트의 공격은 명료하다. ‘결정은 모든 법적 지각의 일부를 이룬다.’ 그리고 ‘구체적 사실은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이상 PT 37)'. 결정적으로 ’법이념은 자신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형태와 형식을 필요로 한다(PT 35).‘
결정의 층위가 실존한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내고자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쌍개념인 숙려와 행동, 그리고 베버의 세 가지 형식개념까지 등장한다. 베버의 형식 가운데 첫 번째는 규범적인 규제처럼 법학적 인식의 선험적 조건으로서의 형식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합리적 훈련을 통한 규칙성이고. 여기서 세 번째의 형식 개념이 등장한다. 합목적성에 의해 지배되는 기술적 형식말이다. 어쨌든 19세기 이후 형식은 객관적인 것으로 이행한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그것이 내포한 객관성은 결코 주권적 권능의 소멸을 의미할 수는 없다. 숙려와 행동의 쌍개념을 떠올려보라. 숙려는 법적 규범의 형식에 적합하다. 그러나 행동은 합목적적인 기술적 형식화에 적합하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주권자다. ‘모든 [사법적] 변형에는 권위의 개념이 존재한다(PT 37).’ 그리고 주권자의 결정에 의해 ‘무엇이 규범이며 무엇이 규범적인 정당성인가 하는 것이 결정된다(PT 38).' 결국 결정이라는 예외적 형식은 객관성이라는 일종의 에피스테메 위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 슈미트의 논점으로 보인다. 객관성이 결정의 차원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저들의 주장은 결국 부당하다. 독재론에서 인용(D 29)되었던 의결과 집행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적 구별이 다시 인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집행의 본성인 합목적성은 결국 기술적 형식에 따라 이뤄질 때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
결정의 층위가 실존한다는 것을 밝히는 부분은 이 논문에서 슈미트가 투사로서 말하는 부분이다. 즉 1·2장과 4장의 기술 방식은 전혀 다르다.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2장의 기술을 4장의 관찰 대상과 같은 것으로 다뤄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형 속에서 1848년 결정적으로 이뤄진 다중의 변형과 함께 객관성이라는 공통된 전제 즉 일종의 에피스테메를 목도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는 분명 다중의 변형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양측 모두에게 당연한 것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의 존재다. 이 위에 양측의 논의 모두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슈미트와 자유주의자들은 같은 지평 위에서 전투를 벌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주권적인 것의 존재와 예외의 타당성을 밝히는 작업은 그것이 대응하는 작업과 함께 모두 객관성의 존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만 하는 것이다. 대결의 지점은 그 객관성이 어떠한 구체적인 형태를 띄고 있는가에 있을 뿐이다. 대결 지점은 인격적 국왕과 객관성 사이가 아니라 객관성의 내부에 존재한다. 비인격적이고 규범적인 객관성에 기초한 합목적성인가 집행적이고 기술적인 객관성에 기초한 합목적성인가? 이 전투를 요약하면 이렇게 되리라.
- 국가의 주권 즉 예외의 원리적 타당성
크랍베의 법주권론과 같은 논의는 주권의 소재를 인간에게서 합리적 법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주의에서도 주권개념은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은 것 같다. 다만 결정을 행하는 예외적인 것이 구체적인 집행자와 질적 차이를 지니고 있는 합리성과 필연성의 법칙 자체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슈미트와 자유주의는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켈젠의 신칸트주의. 그의 방법은 근본적으로 사회학과 법학의 완전한 분리에서 출발한다. 슈미트는 켈젠을 이렇게 재현한다. ‘국가의 법학적 고찰은 순수하게 법학적인 것이어야 하며 규범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PT 28).’ 따라서 국가는 헌법이다. 여기서 예외를 발동하는 주권적 권능의 자리는 없다. 모든 것은 헌법이라는 최고의 형식적 규범에서 출발하고 그것이 지정하는 형식적 질서 속에서 통일된다. 슈미트는 이를 예정조화라고 비꼰다. 그리고 실정적 규정의 명령성을 통해 켈젠의 규범적 법학의 체계를 비웃는다. ‘주권 개념은 단호히 배제되어야 한다(PT 30)’고 말해 법 실현의 명령성과 독자성을 무시하는 켈젠은 슈미트에게 호되게 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 크랍베의 법주권론. 앞서 말했듯 이것은 주권의 소재를 규범으로 돌리는 행위이며 켈젠의 신칸트주의적 법학과 닮아있다. 슈미트의 공격은 명료하다. ‘결정은 모든 법적 지각의 일부를 이룬다.’ 그리고 ‘구체적 사실은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이상 PT 37)'. 결정적으로 ’법이념은 자신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형태와 형식을 필요로 한다(PT 35).‘
결정의 층위가 실존한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내고자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쌍개념인 숙려와 행동, 그리고 베버의 세 가지 형식개념까지 등장한다. 베버의 형식 가운데 첫 번째는 규범적인 규제처럼 법학적 인식의 선험적 조건으로서의 형식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합리적 훈련을 통한 규칙성이고. 여기서 세 번째의 형식 개념이 등장한다. 합목적성에 의해 지배되는 기술적 형식말이다. 어쨌든 19세기 이후 형식은 객관적인 것으로 이행한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그것이 내포한 객관성은 결코 주권적 권능의 소멸을 의미할 수는 없다. 숙려와 행동의 쌍개념을 떠올려보라. 숙려는 법적 규범의 형식에 적합하다. 그러나 행동은 합목적적인 기술적 형식화에 적합하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주권자다. ‘모든 [사법적] 변형에는 권위의 개념이 존재한다(PT 37).’ 그리고 주권자의 결정에 의해 ‘무엇이 규범이며 무엇이 규범적인 정당성인가 하는 것이 결정된다(PT 38).' 결국 결정이라는 예외적 형식은 객관성이라는 일종의 에피스테메 위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 슈미트의 논점으로 보인다. 객관성이 결정의 차원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저들의 주장은 결국 부당하다. 독재론에서 인용(D 29)되었던 의결과 집행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적 구별이 다시 인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집행의 본성인 합목적성은 결국 기술적 형식에 따라 이뤄질 때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
결정의 층위가 실존한다는 것을 밝히는 부분은 이 논문에서 슈미트가 투사로서 말하는 부분이다. 즉 1·2장과 4장의 기술 방식은 전혀 다르다.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2장의 기술을 4장의 관찰 대상과 같은 것으로 다뤄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형 속에서 1848년 결정적으로 이뤄진 다중의 변형과 함께 객관성이라는 공통된 전제 즉 일종의 에피스테메를 목도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는 분명 다중의 변형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양측 모두에게 당연한 것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의 존재다. 이 위에 양측의 논의 모두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슈미트와 자유주의자들은 같은 지평 위에서 전투를 벌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주권적인 것의 존재와 예외의 타당성을 밝히는 작업은 그것이 대응하는 작업과 함께 모두 객관성의 존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만 하는 것이다. 대결의 지점은 그 객관성이 어떠한 구체적인 형태를 띄고 있는가에 있을 뿐이다. 대결 지점은 인격적 국왕과 객관성 사이가 아니라 객관성의 내부에 존재한다. 비인격적이고 규범적인 객관성에 기초한 합목적성인가 집행적이고 기술적인 객관성에 기초한 합목적성인가? 이 전투를 요약하면 이렇게 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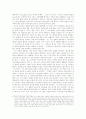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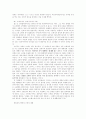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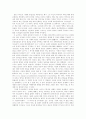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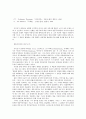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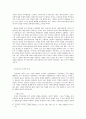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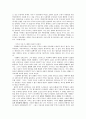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