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정치= 야누스 신(神)의 두 얼굴
(1) 정치를 사악(邪惡)한 것으로 보는 견해
1) 마키아벨리 견해
2) 패도정치(覇道政治)
(2) 정치를 선(善)한 것으로 보는 견해
1) 왕도정치(王道政治)
2) 철인정치
2. 권력과 자유의 조화
(1) 중간자로서의 인간과 정치의 선악
(2)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3) 정부의 지도성과 국민의 자발성의 조화
3. 민주적 지도성과 전제적 지도성의 차이
(1) 민주적 지도성
(2) 전제적 지도성
4. 국가현상설과 집단현상설
(1) 국가현상설(國家現象說)
(2) 집단현상설(集團現像說)
(3) 국가현상설과 집단현상설의 비교
(1) 정치를 사악(邪惡)한 것으로 보는 견해
1) 마키아벨리 견해
2) 패도정치(覇道政治)
(2) 정치를 선(善)한 것으로 보는 견해
1) 왕도정치(王道政治)
2) 철인정치
2. 권력과 자유의 조화
(1) 중간자로서의 인간과 정치의 선악
(2)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3) 정부의 지도성과 국민의 자발성의 조화
3. 민주적 지도성과 전제적 지도성의 차이
(1) 민주적 지도성
(2) 전제적 지도성
4. 국가현상설과 집단현상설
(1) 국가현상설(國家現象說)
(2) 집단현상설(集團現像說)
(3) 국가현상설과 집단현상설의 비교
본문내용
에 의한 제재가 더욱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3) 국가현상설과 집단현상설의 비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현상설과 집단현상설은 어느 편에서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반대론도 있다.
국가현상설은 방법론적으로는 국가를 주체로서 한정시켜, 현실적인 면에서의 정치의 특수성이 국가에 있어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난다고 가르쳐 준 점에서는 뛰어나고 있다. 그러나 방법론적 또는 대상론적인 시야로부터 보아 정치가 어찌하여 국가와 필연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현상인가를 분명하게 제시 못하고 있다.
물론 국가가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한 포괄적인 조직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국가내적 존재 내지 사회적 존재라는 것은 분명한 이치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그대로 국가의 자기목적화와 사회적 연대성의 절대시, 또는 전체의 개인에 대한 우선의 주장에로 결부될 수 없다.
집단현상설은 국가와 사회를 국가와 사회를 구별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국가와 정치의 역사성을 설명을 할 수 없으며 국가라는 사회와 다른 단체 또는 사회가 전혀 판이하다는 것을 간과하는 결점이 있다. 즉, 그것은 국가가 다른 사회를 통제하며 지배할 수 있는 특수한 역사적인 권력적 사회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정치의 개념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생활에 근거하는 정치활동이 국가와 사회를 필요함과 동시에 이것을 실지로 움직이는 사회행동을 내포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현상설과 집단현상설처럼 사회적 실재의 일면만을 들어 그 본질을 규정코자 하는 태도를 버리고 양자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인간의 정치생활 그 속에서 정치의 개념을 파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논어(論語)
이극찬, 『정치학』, 법문사, 1997.
Aurelius Augustinus, De Civitate Dei, (The City of God), 21.(Man, on the other hand, whose nature was to be a mean beween the angelic and bestial.)
Maurics Duverger, The Idea of Politics(London: Methuen & co., Ltd., 1966)
N. Machiavelli, The Prince (New American Library of World Literature, Inc., 1952)
Platon, The Republic,
(3) 국가현상설과 집단현상설의 비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현상설과 집단현상설은 어느 편에서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반대론도 있다.
국가현상설은 방법론적으로는 국가를 주체로서 한정시켜, 현실적인 면에서의 정치의 특수성이 국가에 있어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난다고 가르쳐 준 점에서는 뛰어나고 있다. 그러나 방법론적 또는 대상론적인 시야로부터 보아 정치가 어찌하여 국가와 필연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현상인가를 분명하게 제시 못하고 있다.
물론 국가가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한 포괄적인 조직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국가내적 존재 내지 사회적 존재라는 것은 분명한 이치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그대로 국가의 자기목적화와 사회적 연대성의 절대시, 또는 전체의 개인에 대한 우선의 주장에로 결부될 수 없다.
집단현상설은 국가와 사회를 국가와 사회를 구별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국가와 정치의 역사성을 설명을 할 수 없으며 국가라는 사회와 다른 단체 또는 사회가 전혀 판이하다는 것을 간과하는 결점이 있다. 즉, 그것은 국가가 다른 사회를 통제하며 지배할 수 있는 특수한 역사적인 권력적 사회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정치의 개념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생활에 근거하는 정치활동이 국가와 사회를 필요함과 동시에 이것을 실지로 움직이는 사회행동을 내포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현상설과 집단현상설처럼 사회적 실재의 일면만을 들어 그 본질을 규정코자 하는 태도를 버리고 양자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인간의 정치생활 그 속에서 정치의 개념을 파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논어(論語)
이극찬, 『정치학』, 법문사, 1997.
Aurelius Augustinus, De Civitate Dei, (The City of God), 21.(Man, on the other hand, whose nature was to be a mean beween the angelic and bestial.)
Maurics Duverger, The Idea of Politics(London: Methuen & co., Ltd., 1966)
N. Machiavelli, The Prince (New American Library of World Literature, Inc., 1952)
Platon, The Republ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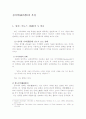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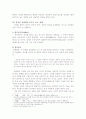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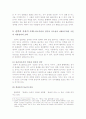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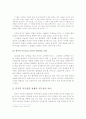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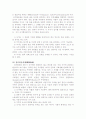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