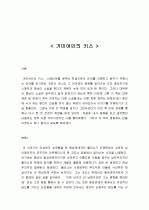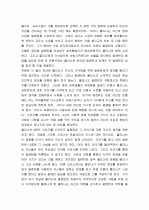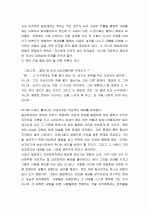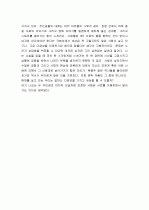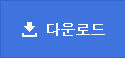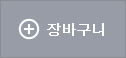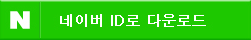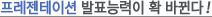목차
없음
본문내용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사람들 사이에 어떤 정당화된 규정은 어쩜 존재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미 어떤 질서조차도 하나의 규범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범하다는 것만큼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기적인 존재는 아닐까 생각해본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 규범을 스스로 체득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체득한 규범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의무화하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주인공들의 대화는 마치 비유들의 스토리 같다. 감방 안에서 하루 종일 서로의 이야기와 그리고 영화 이야기를 밀접하게 매치해 놓는 섬세함, 그리고 스토리를 끌어가는 힘이 느껴진다. 사람들은 왜? 서로의 몸을 탐하는 것이 반드시 남자와 여자여야만 한다는 규범아래서 세상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사람이 살고 있구나. 그런 다양성을 인정하기란 참으로 힘들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문제는 누군가 상대방을 위로할 수 있다면 여자든 남자든 그건 상관없는 일인데 말이다. 나는 소설을 읽을 때 마치 한 스크린처럼 스쳐가는 단 한 장면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상황에 집중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험과 그리고 사회적 현상에 표류하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혹은 어떤 신념에 의해서 그 신념대로 살아가기가 힘든 것인가. 푹풍우 같은 역사들을 돌아보면 과거와 역사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친다. 또한 문학 작품도 그 중에 하나이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다양성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을까?
여기 나오는 두 주인공의 마지막 모습처럼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면서 닮아가는 것이라 생각된다.
여기 나오는 두 주인공의 마지막 모습처럼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면서 닮아가는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