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티야지트 레이에 대하여
2. 구로사와 아키라에 대하여
3. 오즈 야스지로에 대하여
4. 미조구찌 겐지에 대하여
2. 구로사와 아키라에 대하여
3. 오즈 야스지로에 대하여
4. 미조구찌 겐지에 대하여
본문내용
지만 52년의 베니스영화제의 작품상에는 금사자상과 국제상이 있었으니까 국제상은 은사자상에 해당하는 준그랑프리이다.그리고 다음해인 1953년에는 은사자상이라는 명칭이 붙어 <우게츠이야기 雨月物語>가 수상했다. 이 해는 금사자상은 해당작이 없었다. 54년에는 <산숙대부>로 금사자상을 수상했다.
영화 <서학일대녀>는 오하루(타나까 키누요)라는 한 창녀가 여러 가지 운명을 거치며 그 유전 속에서 자신의 몸을 거쳐간 옛날 남자들을 떠올린다는 연상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식미를 중요시하고 오하루를 유전의 인생에 집어넣으며 당시 봉건사회의 모습을 부각해 외국인에게는 지극히 특이한 영화로 비쳤음직하다. 다른 제목으로는 <오하루의 일생>이라는 타이틀로 알려져 있다.
다음해 수상작인 <우게츠이야기>는 우에다 아끼나리(上田秋成 1734~1809)의 명작으로 평판이 높은 괴이단편소설집(1776년 간)에서 [아사지가야도]와 [자세이의 음행]을 토대로 한 영화. 애욕과 배신을 환상적인 분위기로 웅대하게 묘사했다.
미조구찌 감독을 일류로 만든 것에는 원작 선택안목의 적확함도 들어간다. <호색일대녀>가 영화화의 비원이었듯이 미조구찌 겐지는 이 시대를 특별히 연구했다고 한다. 겐로꾸시대의 3대 문호란, 이하라 사이가꾸외 찌까마쓰몬자에몬, 마쓰오 바쇼인데, 미조구찌가 후에 <찌까마쓰 이야기 近松物語>(1954)를 발표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미조구찌 겐지가 선택한 원작자들은 모두 몇 백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일본 대입시험에 출제될 정도의 중요한 문호들이다. 미조구찌 감독이 좋아해 이 고전문학을 선택한 것도 일본의 고전이라든가 전통적인 양식을 영상으로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전후, 미조구찌 겐지 감독은 현장에서 천황으로 군림하며 스탭진을 많이 울리기도 했다고 한다. 그가 아사꾸사에서 태어나, 에도토박이로 자란 불량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해댔던 것이다. 그밖에도 많은 작품에서 화류계를 다루고 여자의 애욕을 테마로 했으며, 1925년에 애인에게 칼을 맞아 신문지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을 돌이켜 보면 미조구찌 겐지 감독은 꽤 의협심이 강한 기분파였던 것이 틀림없다.
1896년에 태어나 고베에서 그림을 배우고 고베소식신문사[神戶送信新聞社]에서 광고 디자인을 했다. 1919년 도쿄로 돌아온 그는 닛카쓰 영화사[日活映畵社]의 배우가 되었다가 영화를 연출했다.
그의 영화 《거리의 스케치》(1925), 《종이 인형이 속삭이는 봄》(1926), 《도쿄행진곡 (東京行進曲)》(1929), 《도회교향악 (都會交響樂)》(1929) 등은 대부분 흥행에 성공했다. 그는 1930년대 중반부터 독창적인 영화들을 찍기 시작했다. 《기원의 자매(祈園の姉妹)》(1936), 《나니와 엘레지(浪花悲歌)》(1936) 등은 현대 일본 사회에서 거부되는 전통적 가치에 대해서 다루었다.
1939년 《마지막 국화이야기(殘菊物語)》를 시작으로 메이지 시대를 배경으로 한 연작 시대극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되도록 피하려고 했으며, 전후 일본 근대 사회의 문제를 다룬 영화를 주로 찍었다. 그는 남성의 사회 속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여성이나 남성 때문에 고생하며 살아가는 여성들을 주로 다루었다. 그가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의 탐미주의적 작품 경향 때문이다. 카메라와 등장 인물 사이에 먼 거리를 두고 찍는 롱 테이크 촬영기법은 일본적인 탐미적 경향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미조구치의 촬영기법은 1940년대 오손 웰스, 루키노 비스콘티, 막스 오퓔스 등보다 이전에 독자적인 경지를 확보하였다.
《오하루의 일생》(1952)은 일본판 《여자의 일생》으로 기생 오하루의 일생을 관조적으로 그려냈다. 이 영화는 1950년대 말 누벨바그 감독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미조구치의 대표적 시대극 《우게쓰이야기(雨月物語)》(1953)는 특유의 탐미적 리얼리즘을 통해 3년 연속 베니스영화제의 은곰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다. 누벨바그 앙드레 바쟁은 미조구치의 ‘원 신 원 쇼트’의 카메라기법을 진정한 리얼리즘의 모범이라고 극찬하였다
후기 작으로 갈수록 비극적인 취향이 두드러지는데 1956년 죽기 직전에 찍은 《산쇼 다이유(赤線地帶)》의 마지막 장면은 유명하다. 여주인공은 남동생을 살리기 위해 호수에 빠져 자살하는데 자살장면은 보이지 않고 호수에 퍼지는 동심원만으로 자살을 암시했다. 그는 호수 주변의 황폐하고 몽환적인 풍경을 통해 슬픔과 아름다움, 숭고함의 감정을 탐미적으로 추구했다.
영화 <서학일대녀>는 오하루(타나까 키누요)라는 한 창녀가 여러 가지 운명을 거치며 그 유전 속에서 자신의 몸을 거쳐간 옛날 남자들을 떠올린다는 연상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식미를 중요시하고 오하루를 유전의 인생에 집어넣으며 당시 봉건사회의 모습을 부각해 외국인에게는 지극히 특이한 영화로 비쳤음직하다. 다른 제목으로는 <오하루의 일생>이라는 타이틀로 알려져 있다.
다음해 수상작인 <우게츠이야기>는 우에다 아끼나리(上田秋成 1734~1809)의 명작으로 평판이 높은 괴이단편소설집(1776년 간)에서 [아사지가야도]와 [자세이의 음행]을 토대로 한 영화. 애욕과 배신을 환상적인 분위기로 웅대하게 묘사했다.
미조구찌 감독을 일류로 만든 것에는 원작 선택안목의 적확함도 들어간다. <호색일대녀>가 영화화의 비원이었듯이 미조구찌 겐지는 이 시대를 특별히 연구했다고 한다. 겐로꾸시대의 3대 문호란, 이하라 사이가꾸외 찌까마쓰몬자에몬, 마쓰오 바쇼인데, 미조구찌가 후에 <찌까마쓰 이야기 近松物語>(1954)를 발표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미조구찌 겐지가 선택한 원작자들은 모두 몇 백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일본 대입시험에 출제될 정도의 중요한 문호들이다. 미조구찌 감독이 좋아해 이 고전문학을 선택한 것도 일본의 고전이라든가 전통적인 양식을 영상으로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전후, 미조구찌 겐지 감독은 현장에서 천황으로 군림하며 스탭진을 많이 울리기도 했다고 한다. 그가 아사꾸사에서 태어나, 에도토박이로 자란 불량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해댔던 것이다. 그밖에도 많은 작품에서 화류계를 다루고 여자의 애욕을 테마로 했으며, 1925년에 애인에게 칼을 맞아 신문지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을 돌이켜 보면 미조구찌 겐지 감독은 꽤 의협심이 강한 기분파였던 것이 틀림없다.
1896년에 태어나 고베에서 그림을 배우고 고베소식신문사[神戶送信新聞社]에서 광고 디자인을 했다. 1919년 도쿄로 돌아온 그는 닛카쓰 영화사[日活映畵社]의 배우가 되었다가 영화를 연출했다.
그의 영화 《거리의 스케치》(1925), 《종이 인형이 속삭이는 봄》(1926), 《도쿄행진곡 (東京行進曲)》(1929), 《도회교향악 (都會交響樂)》(1929) 등은 대부분 흥행에 성공했다. 그는 1930년대 중반부터 독창적인 영화들을 찍기 시작했다. 《기원의 자매(祈園の姉妹)》(1936), 《나니와 엘레지(浪花悲歌)》(1936) 등은 현대 일본 사회에서 거부되는 전통적 가치에 대해서 다루었다.
1939년 《마지막 국화이야기(殘菊物語)》를 시작으로 메이지 시대를 배경으로 한 연작 시대극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되도록 피하려고 했으며, 전후 일본 근대 사회의 문제를 다룬 영화를 주로 찍었다. 그는 남성의 사회 속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여성이나 남성 때문에 고생하며 살아가는 여성들을 주로 다루었다. 그가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의 탐미주의적 작품 경향 때문이다. 카메라와 등장 인물 사이에 먼 거리를 두고 찍는 롱 테이크 촬영기법은 일본적인 탐미적 경향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미조구치의 촬영기법은 1940년대 오손 웰스, 루키노 비스콘티, 막스 오퓔스 등보다 이전에 독자적인 경지를 확보하였다.
《오하루의 일생》(1952)은 일본판 《여자의 일생》으로 기생 오하루의 일생을 관조적으로 그려냈다. 이 영화는 1950년대 말 누벨바그 감독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미조구치의 대표적 시대극 《우게쓰이야기(雨月物語)》(1953)는 특유의 탐미적 리얼리즘을 통해 3년 연속 베니스영화제의 은곰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다. 누벨바그 앙드레 바쟁은 미조구치의 ‘원 신 원 쇼트’의 카메라기법을 진정한 리얼리즘의 모범이라고 극찬하였다
후기 작으로 갈수록 비극적인 취향이 두드러지는데 1956년 죽기 직전에 찍은 《산쇼 다이유(赤線地帶)》의 마지막 장면은 유명하다. 여주인공은 남동생을 살리기 위해 호수에 빠져 자살하는데 자살장면은 보이지 않고 호수에 퍼지는 동심원만으로 자살을 암시했다. 그는 호수 주변의 황폐하고 몽환적인 풍경을 통해 슬픔과 아름다움, 숭고함의 감정을 탐미적으로 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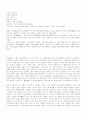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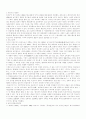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