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들어가며
Ⅱ.정지용 님의 생애
(1) 옥천의 실개천에서 태어난 용
(2)지독한 심연엣 자란 시정
(3) 두루마기 차림의 교사 시인
(4) 깨끗한 잠적 후의 숱한 풍문
Ⅲ.향수
(1) 시에 대하여
(2)시 ‘향수’가 아직도 인구에 회자되는 이유?
(3)감상과 분석
Ⅳ.자아 표출의 시가 아닌 대상묘사의 시로서의 멋
Ⅴ.왜 지용은 20세기 대표적 시인인가?
Ⅵ.마치면서
Ⅱ.정지용 님의 생애
(1) 옥천의 실개천에서 태어난 용
(2)지독한 심연엣 자란 시정
(3) 두루마기 차림의 교사 시인
(4) 깨끗한 잠적 후의 숱한 풍문
Ⅲ.향수
(1) 시에 대하여
(2)시 ‘향수’가 아직도 인구에 회자되는 이유?
(3)감상과 분석
Ⅳ.자아 표출의 시가 아닌 대상묘사의 시로서의 멋
Ⅴ.왜 지용은 20세기 대표적 시인인가?
Ⅵ.마치면서
본문내용
.... 그 날 저녁에 제가 그녀를 떠올리며 쓴 글에는 이와 같이 비슷하게 썼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지용이 연민의 정과 미안한 감정으로 저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고향의 정경에 대한 묘사는 아홉째 연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밤하늘의 별이 알 수 없는 모래성으로 움직이고, 도란 도란거리듯 지붕들이 다정스럽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인정 어린 모습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Ⅳ. 자아표출의 시가 아닌 대상묘사의 시로서의 멋
화자가 자아의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단지 대상의 묘사를 한다면 의미전달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을 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미술관에 갔는데, 난해한 그림을 홀로 보는 경우와 작가가 직접 와서 그 작품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을 들으면서 그림을 보는 차이 갔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면 작품에 대해 스스로가 깨치는 것이 있겠지만, 난해한 시의 경우에는 여러 번 읽어도 감(感)도 못 잡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지용이 시가 저한테는 그러하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그린 시인 <유리창>, 산의 고용함을 그린 장수산(長壽山)은 사전에 시에 대한 배경을 알기 전에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당연히 지용의 시에게는 쉽게 눈이 가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용의 시 <난초9>와 <이른 봄 아침>을 보고서는 놀라지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바다는 뿔뿔이
달어 날랴고 했다.
푸른 도마뱀떼 같이
재재발렀다.
꼬리가 이루
잡히지 않았다.
|
|
찰찰 넘치도록
돌돌 굴르도록
|
|
|
이 시는 바닷물이 해안으로 밀려왔다가 다시 바다로 빠져나간 모습을 낯설게 묘사한 시이다. 밀물의 빠른 물살과 물 이랑이 해안에 부딪혀 흩어지는 모습을 도마뱀 떼에 비유한 참신한 묘사가 뛰어나다.
썰물의 파도는 \"뿔뿔이 달어 날랴고\"했고 \"도마뱀떼 같이 재재발렸다\"라고 묘사했다. 이렇게 파도를 세밀하게 관찰하여 동적으로 표현했다. 이에 비해 썰물 때의 바다는 \"찰찰 넘치도록/ 돌돌 굴르도록\"으로 묘사했다.
이는 파도를 추상적으로 정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귀에 설은 새 소기가 새어 들어와
참한 은시계로 자근자근 얻어맞은 듯,
마음은 이 일 저 일 보살필 일로 갈러져,
수은 방울처럼 동글동글 나동그라져,
춥기는 하고 진정 일어나기 싫어라.
시의 배경은 제목 그대로 이른 봄 아침이다. 아직 자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인데 어디에선가 새 울음소리가 들여온다. 그 새 울음소리가 청각에 자극을 주는 것을 \"참한 은시계로 자근자근 얻어맞은 듯\"하다고 표현한 것은 놀라운 장면이다. 새소리는 작을 터이니 호화로운 금시계보다는 얌전한 은시계가 어울릴 것이고 새의 지저귀는 소리와 시계의 재깍대는 소리가 잠에서 덜 깬 사람에게 유사한 효과를 주리라는 것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특히 \'자근자근\'이라는 말은 \'얻어맞은\'이라는 말의 어감을 약화시커면서 시계의 초침소리를 연상기킨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수은방울에 의한 마음의 상태 표현도 신선하고 재미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어느 이른 봄날 낯선 새소리에 잠에서 어렴풋이 깨어나 여러 가지 할 일이 생각나기는 하는데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뒹구는 화자의 모습을 대할 수 있다.
이상이 글을 읽을 때 참 감탄을 하였습니다. 화자가 직접표현을 하지 않구서도 저렇게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잘 전달할 수 있구나 하고 놀랄 뿐이었습니다.
\"참한 은시계로 자근자근 얻어맞은 듯\"
참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지용의 이런 자기 감정의, 감상주의에 대한 극복의지는 그의 절제주의 시관에 잘 나타나 있는데, [문학독본]에 실린 그의 글을 살펴보면 더욱 더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말도 아주 멋진 말이었습니다. 저를 충분히 감동시키고도 남았습니다.
\"안으로 열하고 겉으로 서늘옵기란 일종의 생리를 압복시키는 노릇이기에 심히 어렵다. 그러나 시의 위의는 겉으로 서늘옵기를 바라서 마지않는다.
........남을 슬프기 그지 없는 정황으로 유도함에는 자기의 감격을 먼저 신중히 이동시킬 것이다.
.........감격벽이 시의 미명이 아니고 말았다. 미 비정기적 육체적 지진 때문에 예지의 수원이 붕괴되는 수가 많았다.\"
Ⅴ.왜 지용은 20세기의 대표적 시인인가?
이 물음에 대하여 민병기 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저 또한 이 의견에 상당부분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1. 그는 언어 감각이 세련된 시인이었다.
2. 한국의 현대시가 지용에 의하여 획기적인 전환을 했다.
3. 지용은 3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4. 20세기 시인 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5. 지용의 시는 소월의 시와 더불어 가장 많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6. 지용은 후진(청록파 시인등)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Ⅵ. 마치면서
이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여러 권의 책을 보았으며, 많이 시간을 들였습니다. 학점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서두에 말씀드린 데로 왜 정지용이 과연 20세기 최고의 시인으로 대표될 수 있는가가 궁금했었으며, 또한 제 자신의 문학에 대한 조그마한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아쉽기는 더 많은 내용을 공부하지 못했던 것과 공부한 내용을 이 보고서에 다 담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용에 대해서는 그 동안 너무 몰랐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이 저에게는 참으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이는 모르지만 지용에 대해서 아주 좋은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도서:정지용 -20세기 한국시의 성좌(민병기저)-1996
한국현대시 대표작품 연구(신용협편)-1998
근대시와 인식(김윤식 평론집)-1992
한국현대시 감상론(이종원저)-1996
한국의 명시를 찾아서(박제천)-1998
목차:
Ⅰ.들어가며
Ⅱ.정지용 님의 생애
(1) 옥천의 실개천에서 태어난 용
(2)지독한 심연엣 자란 시정
(3) 두루마기 차림의 교사 시인
(4) 깨끗한 잠적 후의 숱한 풍문
Ⅲ.향수
(1) 시에 대하여
(2)시 \'향수\'가 아직도 인구에 회자되는 이유?
(3)감상과 분석
Ⅳ.자아 표출의 시가 아닌 대상묘사의 시로서의 멋
Ⅴ.왜 지용은 20세기 대표적 시인인가?
Ⅵ.마치면서
고향의 정경에 대한 묘사는 아홉째 연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밤하늘의 별이 알 수 없는 모래성으로 움직이고, 도란 도란거리듯 지붕들이 다정스럽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인정 어린 모습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Ⅳ. 자아표출의 시가 아닌 대상묘사의 시로서의 멋
화자가 자아의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단지 대상의 묘사를 한다면 의미전달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을 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미술관에 갔는데, 난해한 그림을 홀로 보는 경우와 작가가 직접 와서 그 작품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을 들으면서 그림을 보는 차이 갔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면 작품에 대해 스스로가 깨치는 것이 있겠지만, 난해한 시의 경우에는 여러 번 읽어도 감(感)도 못 잡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지용이 시가 저한테는 그러하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그린 시인 <유리창>, 산의 고용함을 그린 장수산(長壽山)은 사전에 시에 대한 배경을 알기 전에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당연히 지용의 시에게는 쉽게 눈이 가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용의 시 <난초9>와 <이른 봄 아침>을 보고서는 놀라지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바다는 뿔뿔이
달어 날랴고 했다.
푸른 도마뱀떼 같이
재재발렀다.
꼬리가 이루
잡히지 않았다.
|
|
찰찰 넘치도록
돌돌 굴르도록
|
|
|
이 시는 바닷물이 해안으로 밀려왔다가 다시 바다로 빠져나간 모습을 낯설게 묘사한 시이다. 밀물의 빠른 물살과 물 이랑이 해안에 부딪혀 흩어지는 모습을 도마뱀 떼에 비유한 참신한 묘사가 뛰어나다.
썰물의 파도는 \"뿔뿔이 달어 날랴고\"했고 \"도마뱀떼 같이 재재발렸다\"라고 묘사했다. 이렇게 파도를 세밀하게 관찰하여 동적으로 표현했다. 이에 비해 썰물 때의 바다는 \"찰찰 넘치도록/ 돌돌 굴르도록\"으로 묘사했다.
이는 파도를 추상적으로 정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귀에 설은 새 소기가 새어 들어와
참한 은시계로 자근자근 얻어맞은 듯,
마음은 이 일 저 일 보살필 일로 갈러져,
수은 방울처럼 동글동글 나동그라져,
춥기는 하고 진정 일어나기 싫어라.
시의 배경은 제목 그대로 이른 봄 아침이다. 아직 자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인데 어디에선가 새 울음소리가 들여온다. 그 새 울음소리가 청각에 자극을 주는 것을 \"참한 은시계로 자근자근 얻어맞은 듯\"하다고 표현한 것은 놀라운 장면이다. 새소리는 작을 터이니 호화로운 금시계보다는 얌전한 은시계가 어울릴 것이고 새의 지저귀는 소리와 시계의 재깍대는 소리가 잠에서 덜 깬 사람에게 유사한 효과를 주리라는 것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특히 \'자근자근\'이라는 말은 \'얻어맞은\'이라는 말의 어감을 약화시커면서 시계의 초침소리를 연상기킨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수은방울에 의한 마음의 상태 표현도 신선하고 재미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어느 이른 봄날 낯선 새소리에 잠에서 어렴풋이 깨어나 여러 가지 할 일이 생각나기는 하는데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뒹구는 화자의 모습을 대할 수 있다.
이상이 글을 읽을 때 참 감탄을 하였습니다. 화자가 직접표현을 하지 않구서도 저렇게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잘 전달할 수 있구나 하고 놀랄 뿐이었습니다.
\"참한 은시계로 자근자근 얻어맞은 듯\"
참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지용의 이런 자기 감정의, 감상주의에 대한 극복의지는 그의 절제주의 시관에 잘 나타나 있는데, [문학독본]에 실린 그의 글을 살펴보면 더욱 더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말도 아주 멋진 말이었습니다. 저를 충분히 감동시키고도 남았습니다.
\"안으로 열하고 겉으로 서늘옵기란 일종의 생리를 압복시키는 노릇이기에 심히 어렵다. 그러나 시의 위의는 겉으로 서늘옵기를 바라서 마지않는다.
........남을 슬프기 그지 없는 정황으로 유도함에는 자기의 감격을 먼저 신중히 이동시킬 것이다.
.........감격벽이 시의 미명이 아니고 말았다. 미 비정기적 육체적 지진 때문에 예지의 수원이 붕괴되는 수가 많았다.\"
Ⅴ.왜 지용은 20세기의 대표적 시인인가?
이 물음에 대하여 민병기 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저 또한 이 의견에 상당부분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1. 그는 언어 감각이 세련된 시인이었다.
2. 한국의 현대시가 지용에 의하여 획기적인 전환을 했다.
3. 지용은 3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4. 20세기 시인 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5. 지용의 시는 소월의 시와 더불어 가장 많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6. 지용은 후진(청록파 시인등)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Ⅵ. 마치면서
이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여러 권의 책을 보았으며, 많이 시간을 들였습니다. 학점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서두에 말씀드린 데로 왜 정지용이 과연 20세기 최고의 시인으로 대표될 수 있는가가 궁금했었으며, 또한 제 자신의 문학에 대한 조그마한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아쉽기는 더 많은 내용을 공부하지 못했던 것과 공부한 내용을 이 보고서에 다 담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용에 대해서는 그 동안 너무 몰랐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이 저에게는 참으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이는 모르지만 지용에 대해서 아주 좋은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도서:정지용 -20세기 한국시의 성좌(민병기저)-1996
한국현대시 대표작품 연구(신용협편)-1998
근대시와 인식(김윤식 평론집)-1992
한국현대시 감상론(이종원저)-1996
한국의 명시를 찾아서(박제천)-1998
목차:
Ⅰ.들어가며
Ⅱ.정지용 님의 생애
(1) 옥천의 실개천에서 태어난 용
(2)지독한 심연엣 자란 시정
(3) 두루마기 차림의 교사 시인
(4) 깨끗한 잠적 후의 숱한 풍문
Ⅲ.향수
(1) 시에 대하여
(2)시 \'향수\'가 아직도 인구에 회자되는 이유?
(3)감상과 분석
Ⅳ.자아 표출의 시가 아닌 대상묘사의 시로서의 멋
Ⅴ.왜 지용은 20세기 대표적 시인인가?
Ⅵ.마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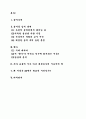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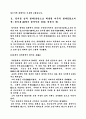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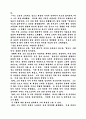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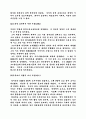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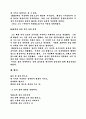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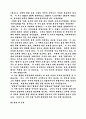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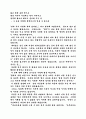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