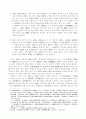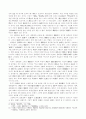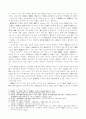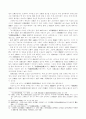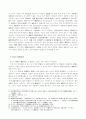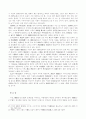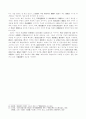목차
머리말
1 沸流說話와 彌鄒忽
2‘彌鄒忽=仁川’說의 檢討
3 새로운 位置比定
맺음말
1 沸流說話와 彌鄒忽
2‘彌鄒忽=仁川’說의 檢討
3 새로운 位置比定
맺음말
본문내용
婆娑尼師今의 妃인 史省夫人이 史肖夫人으로 기록되기도 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婆娑尼師今立 … 妃金氏 史省夫人 許婁葛文王之女也.(三國史記 新羅本紀 婆娑尼師今 즉위년조)
○第五婆娑尼叱今 … 妃史肖夫人.(三國遺事 王曆 第五婆娑尼叱今)
省과 音韻上 통하는 글자로서, 보통 ‘s’로 轉寫된다. 그 자체로 買召忽은 물론 彌鄒忽과도 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대조법은 단지 음운상의 문제일 뿐이어서, 그다지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 시기가 거슬러 올라갈수록 음운 변화의 폭은 좁아지고, 따라서 유사한 地名, 人名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楊州古邑과 仁川의 古名이 서로 통한다고 할 때, 그것은 일면 地名의 派生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두 지역 사이의 연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어느 한 지역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주민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같은 지명이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楊州→仁川’이라는 파생 경로가 상대적으로 자연스럽다.
‘渡浿帶二水’ ‘帶方故地’ ‘負兒嶽’ 등의 용어와도 楊州古邑方面은 서로 잘 어울린다. ‘渡浿帶二水’의 帶水는 흔히 臨津江으로 간주되는데, 楊州古邑이라면 臨津江의 南岸부근이어서 설화의 내용과 부합된다. 그리고 帶方郡의 治所가 지금의 黃海道 鳳山郡 文井面의 智塔里土城이었으며, 경기도 북부지역이 그 영향권에 들었다고 할 때, 楊州古邑은 ‘帶方故地’와도 잘 부합된다. 또한, 負兒嶽을 기준으로 南方의 慰禮城과 北方의 彌鄒忽(楊州古邑方面)이라는 대칭을 생각할 수 있다.
건국설화에서 沸流와 溫祚가 형제로 설정된 것은 비단 勢力과 時期의 문제만은 아닌 듯하다. 만일 沸流集團과 溫祚集團이 同一種族系統으로서 이웃하여 거주한 사실을 ‘兄弟’라는 용어 속에 투영한 것이라면, 北漢山을 사이에 두고 각각 臨津江과 漢江을 기반삼아 경쟁하던 두 세력의 대치 상황을 상정해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나아가 沸流集團을 西部에만 연결시키는 종래의 편견에서 벗어나 北部의 解氏와도 연결지어 볼 수 있는 것이다.
沸流의 定都地=彌鄒忽을 지금의 坡州楊州일대에서 찾게 될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城郭의 분포이다. 坡州市 積城面의 六溪土城七重城, 漣川郡 靑山面의 哨城里城址와 大田里城址 등은 모두 三國時代 初期의 성곽일 개연성이 높은 곳이며, 楊州郡 州內面의 大母山城도 城 안팎에서 발견된 先史時代이래의 다양한 유물상으로 보아 山城의 기반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조성된 듯하다. 이상의 城郭에 대해서는 김기섭, <경기지역의 관방문화>(京畿地域의 鄕土文化下, 1997) 673~675쪽 및 704~724쪽 참조.
특히 臨津江 南岸에 版築式으로 축조된 六溪土城은 둘레 1.5km로서 규모만 작을 뿐, 立地平面形態築造方式이 한강변의 風納里土城을 연상시킬 정도로 흡사하여 우리의 관심을 끈다. 더욱이 六溪土城風納里土城처럼 한반도 중부지방에 분포한 方形系 平地土城의 系譜를 모두 中國-樂浪文化의 영향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高句麗의 영향이라는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 尹龍九, <한국 고대의 ‘中國式 土城’에 대하여>(韓國古代史論叢 8, 1996) 335~340쪽
에 귀기울이고 나면, 優台-沸流系의 南下와 帶方故地에서의 建國이라는 설화 내용을 보다 생동감있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
仇台의 帶方故地가 구체적으로 지금의 어디에 해당하며, 沸流의 彌鄒忽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집어내기는 아직 어렵다. 다만, 이른바 仇台說話와 沸流說話가 백제의 성장과정과 밀접히 관련된 설화이고, 優台(=仇台)-沸流說話가 東明(=朱蒙)-溫祚說話와 더불어 백제 건국설화의 兩大軸을 형성할 정도로 歷史的 示唆性을 지닌다는 관점에서 보면, 서울市 松坡區일대의 백제관련 유적과 일부분 同質的이면서도 비견될만한 세력의 흔적을 보여주는 臨津江流域 내지 그 以南 一帶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맺 음 말
이상, ‘彌鄒忽=仁川’說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름대로의 대안을 간략하게 제시해보았다. ‘彌鄒忽=仁川’說이 상식화한 마당에 그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명한 증거와 명쾌한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필자도 잘 알고 있으나, 古記錄에 대한 無批判的 踏襲과 偏見이 주는 毒素를 스스로 경계한다는 생각에서, 일단 문제 제기부터 한 것이다.
필자의 논지는 매우 간단하다. 우선, 百濟建國說話 중 溫祚傳承에서 彌鄒忽의 지리적 특성을 시사하는 대목은 후대의 오해와 부회에 기인한 것이어서, 오히려 沸流傳承의 彌鄒忽 관련 기록이 더 신용할 만하며, 따라서 沸流集團의 근거지는 지금의 仁川방면보다는 楊州北方의 坡州漣川 인근지역에 비정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羅末麗初에 유행한 風水地理思想이 後代의 史家로 하여금 沸流의 彌鄒忽을 仁川에 비정하고, 仁川의 지리적 특성을 백제의 建國說話에 반영시키도록 하였다고 본다.
필자는 수년전 (8)古爾王-(9)責稽王-(10)汾西王-(12)契王으로 이어지는 沸流-古爾王系를 溫祚-肖古王系의 伯濟國과 同時竝存하다가 흡수된 세력으로 보고, 그들의 근거지를 지금의 坡州방면으로 추정한 바 있다. 金起燮, <漢城時代 百濟의 王系에 대하여>(韓國史硏究 83, 1993)
그런데 최근에는 臨津江流域에서 확인된 無基壇式 積石塚의 분포에 자극받아, 禮成江臨津江流域一帶에서 건국한 백제가 漢郡縣과 충돌하던 중 古爾王代(234~286)에 漢江流域으로 移都 내지 移住하였다는 견해 文安植, <百濟 聯盟王國 形成期의 對中國郡縣關係 硏究>(東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5)
李賢惠, <3세기 馬韓과 伯濟國>(百濟의 中央과 地方, 忠南大學校 百濟硏究所, 1997)
가 제출되어, 백제의 국가 형성 및 성장과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시각의 차이는 있지만, 臨津江流域에 분포한 각종 유적을 百濟初期史와 연결짓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데, 우리가 彌鄒忽=仁川이라는 선입견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재논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믿는다. 다만, 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반드시 臨津江流域→漢江流域이라는 繼起的 理解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沸流와 溫祚뿐 아니라 (5)肖古王과 (8)古爾王도 兄弟關係로 설정된 점에 유의하여 同時隣接共存이라는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先輩諸賢의 叱正을 기다린다.
○第五婆娑尼叱今 … 妃史肖夫人.(三國遺事 王曆 第五婆娑尼叱今)
省과 音韻上 통하는 글자로서, 보통 ‘s’로 轉寫된다. 그 자체로 買召忽은 물론 彌鄒忽과도 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대조법은 단지 음운상의 문제일 뿐이어서, 그다지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 시기가 거슬러 올라갈수록 음운 변화의 폭은 좁아지고, 따라서 유사한 地名, 人名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楊州古邑과 仁川의 古名이 서로 통한다고 할 때, 그것은 일면 地名의 派生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두 지역 사이의 연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어느 한 지역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주민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같은 지명이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楊州→仁川’이라는 파생 경로가 상대적으로 자연스럽다.
‘渡浿帶二水’ ‘帶方故地’ ‘負兒嶽’ 등의 용어와도 楊州古邑方面은 서로 잘 어울린다. ‘渡浿帶二水’의 帶水는 흔히 臨津江으로 간주되는데, 楊州古邑이라면 臨津江의 南岸부근이어서 설화의 내용과 부합된다. 그리고 帶方郡의 治所가 지금의 黃海道 鳳山郡 文井面의 智塔里土城이었으며, 경기도 북부지역이 그 영향권에 들었다고 할 때, 楊州古邑은 ‘帶方故地’와도 잘 부합된다. 또한, 負兒嶽을 기준으로 南方의 慰禮城과 北方의 彌鄒忽(楊州古邑方面)이라는 대칭을 생각할 수 있다.
건국설화에서 沸流와 溫祚가 형제로 설정된 것은 비단 勢力과 時期의 문제만은 아닌 듯하다. 만일 沸流集團과 溫祚集團이 同一種族系統으로서 이웃하여 거주한 사실을 ‘兄弟’라는 용어 속에 투영한 것이라면, 北漢山을 사이에 두고 각각 臨津江과 漢江을 기반삼아 경쟁하던 두 세력의 대치 상황을 상정해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나아가 沸流集團을 西部에만 연결시키는 종래의 편견에서 벗어나 北部의 解氏와도 연결지어 볼 수 있는 것이다.
沸流의 定都地=彌鄒忽을 지금의 坡州楊州일대에서 찾게 될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城郭의 분포이다. 坡州市 積城面의 六溪土城七重城, 漣川郡 靑山面의 哨城里城址와 大田里城址 등은 모두 三國時代 初期의 성곽일 개연성이 높은 곳이며, 楊州郡 州內面의 大母山城도 城 안팎에서 발견된 先史時代이래의 다양한 유물상으로 보아 山城의 기반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조성된 듯하다. 이상의 城郭에 대해서는 김기섭, <경기지역의 관방문화>(京畿地域의 鄕土文化下, 1997) 673~675쪽 및 704~724쪽 참조.
특히 臨津江 南岸에 版築式으로 축조된 六溪土城은 둘레 1.5km로서 규모만 작을 뿐, 立地平面形態築造方式이 한강변의 風納里土城을 연상시킬 정도로 흡사하여 우리의 관심을 끈다. 더욱이 六溪土城風納里土城처럼 한반도 중부지방에 분포한 方形系 平地土城의 系譜를 모두 中國-樂浪文化의 영향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高句麗의 영향이라는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 尹龍九, <한국 고대의 ‘中國式 土城’에 대하여>(韓國古代史論叢 8, 1996) 335~340쪽
에 귀기울이고 나면, 優台-沸流系의 南下와 帶方故地에서의 建國이라는 설화 내용을 보다 생동감있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
仇台의 帶方故地가 구체적으로 지금의 어디에 해당하며, 沸流의 彌鄒忽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집어내기는 아직 어렵다. 다만, 이른바 仇台說話와 沸流說話가 백제의 성장과정과 밀접히 관련된 설화이고, 優台(=仇台)-沸流說話가 東明(=朱蒙)-溫祚說話와 더불어 백제 건국설화의 兩大軸을 형성할 정도로 歷史的 示唆性을 지닌다는 관점에서 보면, 서울市 松坡區일대의 백제관련 유적과 일부분 同質的이면서도 비견될만한 세력의 흔적을 보여주는 臨津江流域 내지 그 以南 一帶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맺 음 말
이상, ‘彌鄒忽=仁川’說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름대로의 대안을 간략하게 제시해보았다. ‘彌鄒忽=仁川’說이 상식화한 마당에 그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명한 증거와 명쾌한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필자도 잘 알고 있으나, 古記錄에 대한 無批判的 踏襲과 偏見이 주는 毒素를 스스로 경계한다는 생각에서, 일단 문제 제기부터 한 것이다.
필자의 논지는 매우 간단하다. 우선, 百濟建國說話 중 溫祚傳承에서 彌鄒忽의 지리적 특성을 시사하는 대목은 후대의 오해와 부회에 기인한 것이어서, 오히려 沸流傳承의 彌鄒忽 관련 기록이 더 신용할 만하며, 따라서 沸流集團의 근거지는 지금의 仁川방면보다는 楊州北方의 坡州漣川 인근지역에 비정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羅末麗初에 유행한 風水地理思想이 後代의 史家로 하여금 沸流의 彌鄒忽을 仁川에 비정하고, 仁川의 지리적 특성을 백제의 建國說話에 반영시키도록 하였다고 본다.
필자는 수년전 (8)古爾王-(9)責稽王-(10)汾西王-(12)契王으로 이어지는 沸流-古爾王系를 溫祚-肖古王系의 伯濟國과 同時竝存하다가 흡수된 세력으로 보고, 그들의 근거지를 지금의 坡州방면으로 추정한 바 있다. 金起燮, <漢城時代 百濟의 王系에 대하여>(韓國史硏究 83, 1993)
그런데 최근에는 臨津江流域에서 확인된 無基壇式 積石塚의 분포에 자극받아, 禮成江臨津江流域一帶에서 건국한 백제가 漢郡縣과 충돌하던 중 古爾王代(234~286)에 漢江流域으로 移都 내지 移住하였다는 견해 文安植, <百濟 聯盟王國 形成期의 對中國郡縣關係 硏究>(東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5)
李賢惠, <3세기 馬韓과 伯濟國>(百濟의 中央과 地方, 忠南大學校 百濟硏究所, 1997)
가 제출되어, 백제의 국가 형성 및 성장과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시각의 차이는 있지만, 臨津江流域에 분포한 각종 유적을 百濟初期史와 연결짓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데, 우리가 彌鄒忽=仁川이라는 선입견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재논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믿는다. 다만, 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반드시 臨津江流域→漢江流域이라는 繼起的 理解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沸流와 溫祚뿐 아니라 (5)肖古王과 (8)古爾王도 兄弟關係로 설정된 점에 유의하여 同時隣接共存이라는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先輩諸賢의 叱正을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