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절제와 감정 노출 사이의 의미 공백 실현
(1) 환각의 현실화를 통한 대상에의 접근
(2) 감정의 절제와 감상적 표출의 대립
(3) 죽음이 가져온 비극의 정서
(4) 슬픔의 비극적 극복
(1) 환각의 현실화를 통한 대상에의 접근
(2) 감정의 절제와 감상적 표출의 대립
(3) 죽음이 가져온 비극의 정서
(4) 슬픔의 비극적 극복
본문내용
硏究, 연세대 대학원 박사논문. 1989. pp. 17-19)
누구의 죽음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정지용 개인의 삶에 있어 그의 작품에 수다하게 표현될 정도로 정지용의 정서를 지배했던 것정지용의 父情과 자녀 상실의식이 직간접으로 드러나는 시로는 悲劇 發熱 등이 있으며 이 시들은 1927년에서 1935년 사이에 창작되고 발표된 시들로 전기적 사실과도 일치한다.
이라면 중요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것으로 해결되는 텍스트의 의미가 있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정지용의 시에서 그에 관한 언급이 직접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다.‘일즉이 나의 딸하나와 아들하나를 드린 일이 있기에 / 혹은 이 밤에 그가 禮儀를 가추지 않고 오량이면 / 문밖에서 가벼히 사양하겠다!’ 悲劇 中에서 카톨닉 靑年 22호, 1935.3.
이상의 작가적 배경을 시 텍스트 해석의 자료로 할 때 우리는 해결되지 않았던 ‘폐혈관’이라는 시어가 텍스트에서 지니는 위치를 해석할 수 있게 된다.
(4) 슬픔의 비극적 극복
이상으로 보아 琉璃窓Ⅰ에 나타난 산새는 정지용의 죽은 아이와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여기서 ‘외로운 황홀한’의 모순형용은 더 명확한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아이의 죽음을 통한 화자의 정서는 ‘외로운’것이면서 동시에 유리창을 통해 그 어렴풋한 영상이나마 만나보는 것은 또 ‘황홀한’ 심사가 된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유리에 나타난 아이의 형상과 대화를 나누는 행위이며, 죽은 이를 실제로 만나지 못하고 환각으로 만나기 때문에 외롭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환각으로나마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황홀함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텍스트의 마지막 행에 등장하는 ‘아아, 늬는 산 ㅅ새처럼 날러갔구나!’는 우리의 문화적인 약호 속에서 다시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문학 텍스트의 생산자들이 문학 텍스트로 생산하는 것은 그들의, 포괄적이거나 광범위한 문화적 규범들의 제약의 수용에 의해 달성된다.로버트 쇼울즈, 앞의 책. p.30
사람이 죽으면 흔히 ‘하늘나라로 갔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 발언은 그 사람의 육신의 죽음은 인정하면서도 혼의 죽음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나온 발언이다. 죽음 후의 또 하나의 세계를 가정하는 것이다. 이런 발언의 목적은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극복하려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물질적으로 확인되는 육신의 죽음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한한 육신(肉身)삶과는 대비되는 영원한 혼(魂)의 살아있음을 믿고 싶은 소망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런 소망은 우리 시문학사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다.
제망매가의 경우, 죽은 누이 동생을 애도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죽은 누이와 극락정토(極樂淨土)에서의 새로운 만남을 기원하고 있다.
아으 彌陀刹애 맛보올 내
道 닷가 기드리고다.
한편 혼의 살아있음이 하늘나라 혹은 극락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살아있음의 형태를 노래한 것도 있다. 이 경우 육신은 인간의 모습이 아닌 자연물 혹은 동물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김소월의 시에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예날, 우리 나라
먼 뒤쪽의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
어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오 불설워
시새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김소월, 접동새 중 3연 4연.
‘아아, 늬는 산 ㅅ새처럼 날러갔구나!’에서 산새처럼 날라갔다는 것은 ‘늬’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살아있음을 기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 유리창을 통해 본 환각을 현실 속에서 계속 유지시키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즉 환각은 깨지고 환각 속의 형상이었던 새가 날아감으로해서 돌아올 수는 없지만 계속 살아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헤어짐이면서 동시에 살아있음을 이중적으로 의미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그 산새는 ‘폐혈관이 찢어진 채’ 날라갔다. ‘채’는 ‘어떤 상태가 계속된 대로 그냥’의 뜻을 지닌다. 혼은 살아 산새가 되었지만 혼이 들어 있는 형체란 ‘폐혈관이 찢어진’ 산새이다. 폐혈관이 찢어진 채 날아간 산새의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혼의 살아있음을 인정하고자 하지만,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지만 그것은 비극적인 극복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
이상을 통해 유리창에 나타난 영상의 어리고 여린 실체가 죽은 아이의 영상과 관련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琉璃窓Ⅰ의 의미는 작고 어린 대상을 죽음으로 보낸 후의 슬픔에 대한 비극적 극복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의 죽음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정지용 개인의 삶에 있어 그의 작품에 수다하게 표현될 정도로 정지용의 정서를 지배했던 것정지용의 父情과 자녀 상실의식이 직간접으로 드러나는 시로는 悲劇 發熱 등이 있으며 이 시들은 1927년에서 1935년 사이에 창작되고 발표된 시들로 전기적 사실과도 일치한다.
이라면 중요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것으로 해결되는 텍스트의 의미가 있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정지용의 시에서 그에 관한 언급이 직접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다.‘일즉이 나의 딸하나와 아들하나를 드린 일이 있기에 / 혹은 이 밤에 그가 禮儀를 가추지 않고 오량이면 / 문밖에서 가벼히 사양하겠다!’ 悲劇 中에서 카톨닉 靑年 22호, 1935.3.
이상의 작가적 배경을 시 텍스트 해석의 자료로 할 때 우리는 해결되지 않았던 ‘폐혈관’이라는 시어가 텍스트에서 지니는 위치를 해석할 수 있게 된다.
(4) 슬픔의 비극적 극복
이상으로 보아 琉璃窓Ⅰ에 나타난 산새는 정지용의 죽은 아이와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여기서 ‘외로운 황홀한’의 모순형용은 더 명확한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아이의 죽음을 통한 화자의 정서는 ‘외로운’것이면서 동시에 유리창을 통해 그 어렴풋한 영상이나마 만나보는 것은 또 ‘황홀한’ 심사가 된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유리에 나타난 아이의 형상과 대화를 나누는 행위이며, 죽은 이를 실제로 만나지 못하고 환각으로 만나기 때문에 외롭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환각으로나마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황홀함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텍스트의 마지막 행에 등장하는 ‘아아, 늬는 산 ㅅ새처럼 날러갔구나!’는 우리의 문화적인 약호 속에서 다시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문학 텍스트의 생산자들이 문학 텍스트로 생산하는 것은 그들의, 포괄적이거나 광범위한 문화적 규범들의 제약의 수용에 의해 달성된다.로버트 쇼울즈, 앞의 책. p.30
사람이 죽으면 흔히 ‘하늘나라로 갔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 발언은 그 사람의 육신의 죽음은 인정하면서도 혼의 죽음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나온 발언이다. 죽음 후의 또 하나의 세계를 가정하는 것이다. 이런 발언의 목적은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극복하려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물질적으로 확인되는 육신의 죽음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한한 육신(肉身)삶과는 대비되는 영원한 혼(魂)의 살아있음을 믿고 싶은 소망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런 소망은 우리 시문학사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다.
제망매가의 경우, 죽은 누이 동생을 애도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죽은 누이와 극락정토(極樂淨土)에서의 새로운 만남을 기원하고 있다.
아으 彌陀刹애 맛보올 내
道 닷가 기드리고다.
한편 혼의 살아있음이 하늘나라 혹은 극락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살아있음의 형태를 노래한 것도 있다. 이 경우 육신은 인간의 모습이 아닌 자연물 혹은 동물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김소월의 시에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예날, 우리 나라
먼 뒤쪽의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
어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오 불설워
시새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김소월, 접동새 중 3연 4연.
‘아아, 늬는 산 ㅅ새처럼 날러갔구나!’에서 산새처럼 날라갔다는 것은 ‘늬’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살아있음을 기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 유리창을 통해 본 환각을 현실 속에서 계속 유지시키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즉 환각은 깨지고 환각 속의 형상이었던 새가 날아감으로해서 돌아올 수는 없지만 계속 살아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헤어짐이면서 동시에 살아있음을 이중적으로 의미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그 산새는 ‘폐혈관이 찢어진 채’ 날라갔다. ‘채’는 ‘어떤 상태가 계속된 대로 그냥’의 뜻을 지닌다. 혼은 살아 산새가 되었지만 혼이 들어 있는 형체란 ‘폐혈관이 찢어진’ 산새이다. 폐혈관이 찢어진 채 날아간 산새의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혼의 살아있음을 인정하고자 하지만,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지만 그것은 비극적인 극복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
이상을 통해 유리창에 나타난 영상의 어리고 여린 실체가 죽은 아이의 영상과 관련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琉璃窓Ⅰ의 의미는 작고 어린 대상을 죽음으로 보낸 후의 슬픔에 대한 비극적 극복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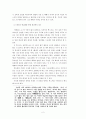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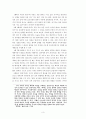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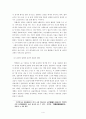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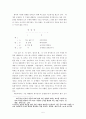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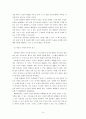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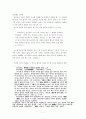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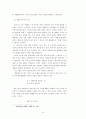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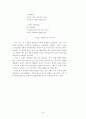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