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공예의 분류
Ⅲ. 공예의 동향
Ⅳ. 염색공예
1. 교염(홀치기염)과 침염
2. 호염(호방염)
3. 납힐염(초방염, 바틱)
1) 초의 배합
2) 초의 용해
3) 초방염에 사용하는 붓
4) 초를 사용하는 법
4. 손으로 그려서 염색하는 법
5. 형지염
6. 스크린 염색
Ⅴ. 목공예
1. 칠공예(漆工藝)
2. 나전칠기(螺鈿漆器)
3. 화각장공예(華角張工藝)
4. 죽세공(竹細工)
Ⅵ. 도자공예(도자기공예)
1. 흙
2. 그릇 성형
1) 빚어서 만들기
2) 말아 올려서 만드는 기법
3) 점토판으로 만들기
4) 주입식 기법
5) 물레성형 방법
3. 점토판에 부조로 표현하기
4. 장식용 벽걸이 만들기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Ⅱ. 공예의 분류
Ⅲ. 공예의 동향
Ⅳ. 염색공예
1. 교염(홀치기염)과 침염
2. 호염(호방염)
3. 납힐염(초방염, 바틱)
1) 초의 배합
2) 초의 용해
3) 초방염에 사용하는 붓
4) 초를 사용하는 법
4. 손으로 그려서 염색하는 법
5. 형지염
6. 스크린 염색
Ⅴ. 목공예
1. 칠공예(漆工藝)
2. 나전칠기(螺鈿漆器)
3. 화각장공예(華角張工藝)
4. 죽세공(竹細工)
Ⅵ. 도자공예(도자기공예)
1. 흙
2. 그릇 성형
1) 빚어서 만들기
2) 말아 올려서 만드는 기법
3) 점토판으로 만들기
4) 주입식 기법
5) 물레성형 방법
3. 점토판에 부조로 표현하기
4. 장식용 벽걸이 만들기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며, 대나 버들을 엮어서 바탕으로 쓴 남태(藍胎)칠기 등 다양하다. 현존하는 유물은 12세기 이후의 것이 대부분이다. 고려시대의 유물로는 불교 경전들을 담아 두었던 경함(經函)이 다수 보존되어 있으며, 문양은 잔잔하고 촘촘한 국화, 모란, 당초문 등이 표현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옷이나 문방구를 담아두던 의함(衣函)과 문서함(文書函)과 같은 소품에서부터 장롱(欌籠)등까지 제작하였고, 모란, 매죽, 십장생 및 포도동자문 등이 표현되었다.
3. 화각장공예(華角張工藝)
쇠뿔을 얇게 저며 반투명으로 만든 다음 그 안쪽에 광물성 색료인 석채로 그림이나 무늬를 그린 후 나무나 대나무 바탕으로 된 공예품 위에 덧붙여서 장식하는 복채(伏彩) 기법의 일종이다. 화각은 어리지도 늙지도 않은 수소의 고추뿔을 재료로 하여 백골(白骨)각질(角質)설채(設彩)의 과정으로 만드는데, 특히 각질과정이 중요하다. 잘라낸 쇠뿔은 길이대로 갈라서 뿔 속의 각질을 없애기 위해 익힌 다음 익힌 뿔 속을 고루 깎아 내고 박달나무 방망이로 평평하게 다듬어서 사용한다. 화각은 제작의 정성에 비해 실용성이 적은 것이 결점이나 화려한 색채와 장식성 때문에 여성 취향의 고급혼수였다. 현존 유물들은 대부분 조선 후기의 여성용 소품들인 베갯모와 빗, 실패, 바느질자, 부채 및 소형의 함 장롱 등이고, 문양은 십장생을 비롯하여 화조, 산수 등 민화적 소재가 많다.
4. 죽세공(竹細工)
대나무를 재료로 하여 물건을 만드는 기술로 참대, 솜대, 검은색의 오죽(吳竹), 대통이 굵은 맹종죽과 같은 대나무를 껍질 벗긴 양태 그대로[白竹] 사용하거나 또는 염색하거나, 인두로 지지지는 등 가공한 것을 재료로 사용한다. 제작할 때는 통으로 된 대나무 절반을 잘라 1/4로 쪼갠 것을 다시 붙여서 아래만 막은 통으로 쓰기도 하고 위아래로 막은 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 대나무의 껍질을 가늘게 쪼개서 목가구에 부착하여 장식하는 피죽(皮竹) 기법이 있다. 주로 조선 후기의 소형 기물이 많다.
Ⅵ. 도자공예(도자기공예)
1. 흙
도자 공예는 조형적 요소를 생각하여 어떤 형태든지 표현과 창조 가 가능한 영역으로 도자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좋은 흙의 선택이 중요하다.
흙은 점토라고 불리며 작품의 특성에 맞춰 점력이 좋고 소성에 잘 견디며 유약이나 안료의 발색이 뛰어난 흙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여러 종류의 흙이 있으나 작품을 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포가 생기지 않게 고르게 반죽하고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즈음에는 이러한 점을 잘 보완하여 시판하는 흙으로써 조합토와 옹기토가 있다.
조합토는 흙의 입자가 굵고 점력이 뛰어나며 작품을 완성했을 때 투박하고 자연스러워서 벽걸이 장식, 화병, 그릇 성형 등 초등학생의 도자 공예에 적당하다.
옹기토는 흙의 입자가 가늘고 점력이 뛰어나며 그릇 성형, 테라코타 등의 작품을 만드는데 적당하다. 단, 다른 점토보다 수축력이 크기 때문에 이점을 감안하여 실제 작품보다 크게 만들어야 한다.
백토는 입자가 가늘고 곱기 때문에 석고 틀에 대량으로 찍어서 만든 후 염료로 그림을 그려 넣을 수 있어 회화성이 있다. 흔히 학생들이 체험학습장에 가서 초벌구이 된 그릇에 붓으로 염료를 찍어서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 넣으면 체험학습장에서 재벌 구이해서 예쁘게 완성된 작품을 돌려받을 수 있다.
2. 그릇 성형
그릇 성형할 때는 만들고자하는 형태와 크기, 수량에 따라 적절한 성형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릇의 성형 기법은 다음과 같다.
1) 빚어서 만들기
적당한 량의 점토를 손바닥에서 둥글게 굴린 다음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서 돌려가며 기물의 형태를 빚어서 만드는 기법
2) 말아 올려서 만드는 기법
점토를 잘 주물러서 바닥에 놓고 손바닥으로 떡가래처럼 빚은 다음, 말아서 쌓아가며 만들어 가는 기법. 떡가래 기법이라고도 한다. 비교적 큰 그릇. 화병. 화분. 장식용 그릇, 항아리 등
3) 점토판으로 만들기
· 점토로 판을 만든 후 원하는 형태로 붙여가며 완성하는 기법이다.
· 점토판을 만든 후 가장 자리를 올려서 만드는 간단한 기법. 재떨이. 접시, 쟁반 등
· 점토판을 사각형으로 재단한 후 꼭지점 부분을 사각형으로 오려내고 붙여서 올리는 기법.쟁반, 상자모양의 그릇 등
4) 주입식 기법
석고 틀을 만들고 거기에 흙물을 부어서 같은 형태의 작품을 다량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기법
5) 물레성형 방법
전기 물레의 회전하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만드는 기법
※ 초등학교에서는 빚어서 만들기의 성형 기법. 말아서 만들기의 성형 기법. 판으로 만들기의 성형 기법만으로 지도해도 될 것이다.
※ 도자 공예의 성형기법을 익힌 뒤 작품의 형태에 맞는 기법을 선택하여 표현하도록 한다. 그리고 장식은 여러 가지 도구나 물건, 문양 집 등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3. 점토판에 부조로 표현하기
자신의 얼굴을 캐릭터화해서 도자 타일로 표현한다. 점토판을 이용하여 자신의 얼굴을 캐릭터화하여 표현 한 후 초벌구이만 한 작품.
4. 장식용 벽걸이 만들기
점토판에 일상생활 중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표현하여 초벌구이 한 작품으로 적당한 두께의 점토판을 만든 후 스케치하고 점토를 붙여 가며 표현하도록 한다.
Ⅶ. 결론 및 시사점
모든 이들이 전통에의 회귀만을 꿈꾸라는 것은 아니다. 급변하는 사회가 있고 그러한 변화에 대처해 나아가야만 생존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므로, 전통에 대한 보존만으로는 현실의 도태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정신과 의식을 잃는다면 우리공예의 발전은 사상누각(砂上樓閣)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적어도 우리 공예인들의 가슴 한쪽에는 자연에 순응하려 하는 우리 전통에 대한 이해와 사고가 자리 잡아야 할 것이며, 이를 기초로 하여 공예문화를 이끌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종태(1991), 한국 수공예 미술, 예경
김용진(1996), 한국 민속 공예사, 학문사
공예 염색 기법, 미진사
박명도(1991), 전통공예의장 의미체계의 전승과 변화, 경북대 석사논문
이순석(1964), 현대의 공예, 한국예술 총람 개관편, 예술원
임영주(1983), 한국문양사, 미진사
3. 화각장공예(華角張工藝)
쇠뿔을 얇게 저며 반투명으로 만든 다음 그 안쪽에 광물성 색료인 석채로 그림이나 무늬를 그린 후 나무나 대나무 바탕으로 된 공예품 위에 덧붙여서 장식하는 복채(伏彩) 기법의 일종이다. 화각은 어리지도 늙지도 않은 수소의 고추뿔을 재료로 하여 백골(白骨)각질(角質)설채(設彩)의 과정으로 만드는데, 특히 각질과정이 중요하다. 잘라낸 쇠뿔은 길이대로 갈라서 뿔 속의 각질을 없애기 위해 익힌 다음 익힌 뿔 속을 고루 깎아 내고 박달나무 방망이로 평평하게 다듬어서 사용한다. 화각은 제작의 정성에 비해 실용성이 적은 것이 결점이나 화려한 색채와 장식성 때문에 여성 취향의 고급혼수였다. 현존 유물들은 대부분 조선 후기의 여성용 소품들인 베갯모와 빗, 실패, 바느질자, 부채 및 소형의 함 장롱 등이고, 문양은 십장생을 비롯하여 화조, 산수 등 민화적 소재가 많다.
4. 죽세공(竹細工)
대나무를 재료로 하여 물건을 만드는 기술로 참대, 솜대, 검은색의 오죽(吳竹), 대통이 굵은 맹종죽과 같은 대나무를 껍질 벗긴 양태 그대로[白竹] 사용하거나 또는 염색하거나, 인두로 지지지는 등 가공한 것을 재료로 사용한다. 제작할 때는 통으로 된 대나무 절반을 잘라 1/4로 쪼갠 것을 다시 붙여서 아래만 막은 통으로 쓰기도 하고 위아래로 막은 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 대나무의 껍질을 가늘게 쪼개서 목가구에 부착하여 장식하는 피죽(皮竹) 기법이 있다. 주로 조선 후기의 소형 기물이 많다.
Ⅵ. 도자공예(도자기공예)
1. 흙
도자 공예는 조형적 요소를 생각하여 어떤 형태든지 표현과 창조 가 가능한 영역으로 도자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좋은 흙의 선택이 중요하다.
흙은 점토라고 불리며 작품의 특성에 맞춰 점력이 좋고 소성에 잘 견디며 유약이나 안료의 발색이 뛰어난 흙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여러 종류의 흙이 있으나 작품을 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포가 생기지 않게 고르게 반죽하고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즈음에는 이러한 점을 잘 보완하여 시판하는 흙으로써 조합토와 옹기토가 있다.
조합토는 흙의 입자가 굵고 점력이 뛰어나며 작품을 완성했을 때 투박하고 자연스러워서 벽걸이 장식, 화병, 그릇 성형 등 초등학생의 도자 공예에 적당하다.
옹기토는 흙의 입자가 가늘고 점력이 뛰어나며 그릇 성형, 테라코타 등의 작품을 만드는데 적당하다. 단, 다른 점토보다 수축력이 크기 때문에 이점을 감안하여 실제 작품보다 크게 만들어야 한다.
백토는 입자가 가늘고 곱기 때문에 석고 틀에 대량으로 찍어서 만든 후 염료로 그림을 그려 넣을 수 있어 회화성이 있다. 흔히 학생들이 체험학습장에 가서 초벌구이 된 그릇에 붓으로 염료를 찍어서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 넣으면 체험학습장에서 재벌 구이해서 예쁘게 완성된 작품을 돌려받을 수 있다.
2. 그릇 성형
그릇 성형할 때는 만들고자하는 형태와 크기, 수량에 따라 적절한 성형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릇의 성형 기법은 다음과 같다.
1) 빚어서 만들기
적당한 량의 점토를 손바닥에서 둥글게 굴린 다음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서 돌려가며 기물의 형태를 빚어서 만드는 기법
2) 말아 올려서 만드는 기법
점토를 잘 주물러서 바닥에 놓고 손바닥으로 떡가래처럼 빚은 다음, 말아서 쌓아가며 만들어 가는 기법. 떡가래 기법이라고도 한다. 비교적 큰 그릇. 화병. 화분. 장식용 그릇, 항아리 등
3) 점토판으로 만들기
· 점토로 판을 만든 후 원하는 형태로 붙여가며 완성하는 기법이다.
· 점토판을 만든 후 가장 자리를 올려서 만드는 간단한 기법. 재떨이. 접시, 쟁반 등
· 점토판을 사각형으로 재단한 후 꼭지점 부분을 사각형으로 오려내고 붙여서 올리는 기법.쟁반, 상자모양의 그릇 등
4) 주입식 기법
석고 틀을 만들고 거기에 흙물을 부어서 같은 형태의 작품을 다량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기법
5) 물레성형 방법
전기 물레의 회전하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만드는 기법
※ 초등학교에서는 빚어서 만들기의 성형 기법. 말아서 만들기의 성형 기법. 판으로 만들기의 성형 기법만으로 지도해도 될 것이다.
※ 도자 공예의 성형기법을 익힌 뒤 작품의 형태에 맞는 기법을 선택하여 표현하도록 한다. 그리고 장식은 여러 가지 도구나 물건, 문양 집 등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3. 점토판에 부조로 표현하기
자신의 얼굴을 캐릭터화해서 도자 타일로 표현한다. 점토판을 이용하여 자신의 얼굴을 캐릭터화하여 표현 한 후 초벌구이만 한 작품.
4. 장식용 벽걸이 만들기
점토판에 일상생활 중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표현하여 초벌구이 한 작품으로 적당한 두께의 점토판을 만든 후 스케치하고 점토를 붙여 가며 표현하도록 한다.
Ⅶ. 결론 및 시사점
모든 이들이 전통에의 회귀만을 꿈꾸라는 것은 아니다. 급변하는 사회가 있고 그러한 변화에 대처해 나아가야만 생존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므로, 전통에 대한 보존만으로는 현실의 도태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정신과 의식을 잃는다면 우리공예의 발전은 사상누각(砂上樓閣)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적어도 우리 공예인들의 가슴 한쪽에는 자연에 순응하려 하는 우리 전통에 대한 이해와 사고가 자리 잡아야 할 것이며, 이를 기초로 하여 공예문화를 이끌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종태(1991), 한국 수공예 미술, 예경
김용진(1996), 한국 민속 공예사, 학문사
공예 염색 기법, 미진사
박명도(1991), 전통공예의장 의미체계의 전승과 변화, 경북대 석사논문
이순석(1964), 현대의 공예, 한국예술 총람 개관편, 예술원
임영주(1983), 한국문양사, 미진사
추천자료
 디자인 공예 교사의 역할
디자인 공예 교사의 역할 창작공예 일일활동계획안(크리스마스)
창작공예 일일활동계획안(크리스마스) 고려시대의 금속공예
고려시대의 금속공예 중앙박물관 불교 공예품 중 약사불
중앙박물관 불교 공예품 중 약사불 창작공예(일일활동계획안)
창작공예(일일활동계획안) 한국 미술공예의 발전을 위해서 살펴보는 yBa의 실험정신
한국 미술공예의 발전을 위해서 살펴보는 yBa의 실험정신 [조선시대][공예][그림][왕의 의복][과거제도][교육제도][기녀제도][군사조직]조선시대 공예,...
[조선시대][공예][그림][왕의 의복][과거제도][교육제도][기녀제도][군사조직]조선시대 공예,... [조선시대][조선][공예][회화][성리학][양명학][농민통제][신분제도]조선시대(조선) 공예, 조...
[조선시대][조선][공예][회화][성리학][양명학][농민통제][신분제도]조선시대(조선) 공예, 조... 한국공예사
한국공예사 비누공예 수업지도안
비누공예 수업지도안 금속공예에 대하여
금속공예에 대하여 [일본의 교육][노인교육][정보교육][특수교육][평생교육][기초생활교육][공예교육][환경교육]...
[일본의 교육][노인교육][정보교육][특수교육][평생교육][기초생활교육][공예교육][환경교육]... 미술공예운동
미술공예운동 공예와 지식재산 - 5가지 발명연구,
공예와 지식재산 - 5가지 발명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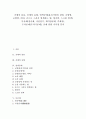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