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행복을 바라보는 두 가지 입장
Ⅱ. 주지주의(우월론)의 난점과 Kraut의 입장
Ⅲ. Kraut의 행복주의자의 제약과 Irwin의 비판
Ⅳ. 행복과 행복한 삶에 대한 Irwin의 Kraut비판
Ⅴ. 숙고와 덕(deliberation and virtue)
..(중략)..
Ⅱ. 주지주의(우월론)의 난점과 Kraut의 입장
Ⅲ. Kraut의 행복주의자의 제약과 Irwin의 비판
Ⅳ. 행복과 행복한 삶에 대한 Irwin의 Kraut비판
Ⅴ. 숙고와 덕(deliberation and virtue)
..(중략)..
본문내용
b19-28).
따라서 앞선 필자의 주장과 관련하여, 지적인 덕, 특히나 소피아에 따르는 관조적 활동만을 추구하는 것은 신적인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적 차원보다 높은 단계에 있는 삶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종의 당위로서 “인간이니 인간적이 것을 생각하라”(1177b31-32)와 같은 말을 따르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중 최고의 것에 따라 살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1177b34-35)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일종의 현실적인 측면을 결여한 설명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도 알고 있음을 읽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현실적이 측면에서의 행복을 추구는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현실적인 면모를 결여한 그의 행복적인 추구는 한편의 공상 영화를 보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차적인 의미에서 행복한 삶”(1178a9)이라 언급하여 관조적 활동을 통한 행복의 추구와는 구분되는 다른 행복 추구의 개념을 언급하려 든다. 특히나 그는 실천적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실천적 지혜는 성격의 탁월성에 결부되며 성격의 탁월성 또한 실천적 지혜에 결부된다. … 이러한 탁월성에 따른 삶도, 행복도 또한 인간적인 것”(1178a17-22)이란 결국은 인간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행복의 면모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소피아뿐만이 아닌 실천지를 통해서도 관조적 활동을 통한 행복과 동일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앞서 관조적 활동을 통한 행복과 실천지와 성품적 덕들 간의 상호성에서 비롯된 행복과는 그 차이가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 둘은 결국 인간의 삶 속에서 관조적 활동이 실천적 삶에 기여함으로써 인간의 윤리적이며 정치적인 삶을 완결시키면서, 실천적 활동 역시 인간의 욕구와 감정을 잘 조절함으로써 최대한의 관조적 활동을 가능하게 해준다. 손병석,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에르곤(ergon), 덕(aret) 그리고 행복(eudaimonia)의 의미”, 『철학연구』, 제76집(대구: 대한철학회, 2000), p. 62
포괄론과 우월론에 앞선 논의를 적용시킨다면, 포괄론의 입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완전한 행복과 이차적 의미의 행복을 다 포함해야 하며, 우월론은 단지 완전한 행복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포괄론이 지지하는 행복의 개념은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을 모두 포함해야만 하고, 우월론은 인간적인 행복이 아닌 신적인 행복만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주장해야만 한다. 김상돈,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의 두 가지 개념”, 『국민윤리연구』, 제73호(한국윤리학회, 2009), p. 184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윤리학 전반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신적인 개념의 인간화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우리들이 불사불면의 존재가 되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1178b34-35)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촉구에서 여실히 드러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조적 활동과 실천적 활동은 상대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인간 내부에서 상호적으로 행복을 위해 서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당위적인 접근을 접목시킬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는데, 다시 말해, 행복의 관조적 활동과 실천적 활동의 뚜렷한 구분은 한걸음 더 나아간다면, 니코마코스 윤리학 후에 이루어지는 정치 철학적 체계를 염두 해둔 것으로 보인다.
Ⅹ. 맺는말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에 관한 입장은 1장과 10장이 상반된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일차적 행복이라 부를 수 있는 소피아의 덕에 의한 행복과 실천지의 덕에 의한 이차적 행복이다. 전자는 신적인 면모를 갖춘 것인 반면, 후자는 인간적인 면모를 갖춘 것이다. 두 가지는 분명한 차이를 지니고 있지만, 실천지는 관조적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서 그 차이는 존재하나 소피아에 상응하는 행복이므로 간과할 수 없는 행복이 바로 실천지에 의한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우리의 앞선 논의는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의 갈등, 완전한 행복과 이차적인 행복의 갈등, 실천지와 소피아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서로 갈등하는 각각이 인간의 삶의 전체에서 질서 있게 배열될 수 있는 방법 혹은 조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포괄론과 우월론의 논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과 같다. 김상돈,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의 두 가지 개념”, 『국민윤리연구』, 제73호(한국윤리학회, 2009)
따라서, 우리가 명백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실천 윤리의 입장 아래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 곧 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인간적인 것의 지극한 추구를 인정하는데서 포괄론과 우월론의 화해가 시작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관조적 활동이 인간의 실천적 삶을 완결시킨다고 하고, 실천적 활동은 인간의 최고의 완벽한 행복인 관조적 활동을 최대한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최선의 노력, 그것은 인간 고유의 기능(ergon)인 이성을 완전히 발휘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능력이겠고, 이는 “불사불멸의 존재가 되도록 … (우리가)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만”(1177b34-45)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대오,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 『서양고전학 연구』, 제15집, 서울: 한국서양고전학회, 2000.
김상돈,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의 두 가지 개념”, 『국민윤리연구』, 제73호(한국윤리학회, 2009)
손병석,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에르곤(ergon), 덕(aret) 그리고 행복(eudaimonia)의 의미”, 『철학연구』, 제76집(대구: 대한철학회, 2000)
Aristoteles, Ethica Nicomachea, 이창우, 김재홍, 강상진 옮김,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울: 이제이북스, 2006.
Irwin, T. H., 1991, “The Structure of Aristotelian Happiness”in Ethics (1991), Vol. 101 No. 2,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382-391
따라서 앞선 필자의 주장과 관련하여, 지적인 덕, 특히나 소피아에 따르는 관조적 활동만을 추구하는 것은 신적인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적 차원보다 높은 단계에 있는 삶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종의 당위로서 “인간이니 인간적이 것을 생각하라”(1177b31-32)와 같은 말을 따르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중 최고의 것에 따라 살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1177b34-35)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일종의 현실적인 측면을 결여한 설명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도 알고 있음을 읽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현실적이 측면에서의 행복을 추구는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현실적인 면모를 결여한 그의 행복적인 추구는 한편의 공상 영화를 보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차적인 의미에서 행복한 삶”(1178a9)이라 언급하여 관조적 활동을 통한 행복의 추구와는 구분되는 다른 행복 추구의 개념을 언급하려 든다. 특히나 그는 실천적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실천적 지혜는 성격의 탁월성에 결부되며 성격의 탁월성 또한 실천적 지혜에 결부된다. … 이러한 탁월성에 따른 삶도, 행복도 또한 인간적인 것”(1178a17-22)이란 결국은 인간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행복의 면모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소피아뿐만이 아닌 실천지를 통해서도 관조적 활동을 통한 행복과 동일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앞서 관조적 활동을 통한 행복과 실천지와 성품적 덕들 간의 상호성에서 비롯된 행복과는 그 차이가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 둘은 결국 인간의 삶 속에서 관조적 활동이 실천적 삶에 기여함으로써 인간의 윤리적이며 정치적인 삶을 완결시키면서, 실천적 활동 역시 인간의 욕구와 감정을 잘 조절함으로써 최대한의 관조적 활동을 가능하게 해준다. 손병석,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에르곤(ergon), 덕(aret) 그리고 행복(eudaimonia)의 의미”, 『철학연구』, 제76집(대구: 대한철학회, 2000), p. 62
포괄론과 우월론에 앞선 논의를 적용시킨다면, 포괄론의 입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완전한 행복과 이차적 의미의 행복을 다 포함해야 하며, 우월론은 단지 완전한 행복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포괄론이 지지하는 행복의 개념은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을 모두 포함해야만 하고, 우월론은 인간적인 행복이 아닌 신적인 행복만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주장해야만 한다. 김상돈,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의 두 가지 개념”, 『국민윤리연구』, 제73호(한국윤리학회, 2009), p. 184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윤리학 전반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신적인 개념의 인간화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우리들이 불사불면의 존재가 되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1178b34-35)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촉구에서 여실히 드러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조적 활동과 실천적 활동은 상대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인간 내부에서 상호적으로 행복을 위해 서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당위적인 접근을 접목시킬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는데, 다시 말해, 행복의 관조적 활동과 실천적 활동의 뚜렷한 구분은 한걸음 더 나아간다면, 니코마코스 윤리학 후에 이루어지는 정치 철학적 체계를 염두 해둔 것으로 보인다.
Ⅹ. 맺는말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에 관한 입장은 1장과 10장이 상반된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일차적 행복이라 부를 수 있는 소피아의 덕에 의한 행복과 실천지의 덕에 의한 이차적 행복이다. 전자는 신적인 면모를 갖춘 것인 반면, 후자는 인간적인 면모를 갖춘 것이다. 두 가지는 분명한 차이를 지니고 있지만, 실천지는 관조적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서 그 차이는 존재하나 소피아에 상응하는 행복이므로 간과할 수 없는 행복이 바로 실천지에 의한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우리의 앞선 논의는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의 갈등, 완전한 행복과 이차적인 행복의 갈등, 실천지와 소피아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서로 갈등하는 각각이 인간의 삶의 전체에서 질서 있게 배열될 수 있는 방법 혹은 조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포괄론과 우월론의 논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과 같다. 김상돈,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의 두 가지 개념”, 『국민윤리연구』, 제73호(한국윤리학회, 2009)
따라서, 우리가 명백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실천 윤리의 입장 아래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 곧 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인간적인 것의 지극한 추구를 인정하는데서 포괄론과 우월론의 화해가 시작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관조적 활동이 인간의 실천적 삶을 완결시킨다고 하고, 실천적 활동은 인간의 최고의 완벽한 행복인 관조적 활동을 최대한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최선의 노력, 그것은 인간 고유의 기능(ergon)인 이성을 완전히 발휘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능력이겠고, 이는 “불사불멸의 존재가 되도록 … (우리가)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만”(1177b34-45)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대오,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 『서양고전학 연구』, 제15집, 서울: 한국서양고전학회, 2000.
김상돈,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의 두 가지 개념”, 『국민윤리연구』, 제73호(한국윤리학회, 2009)
손병석,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에르곤(ergon), 덕(aret) 그리고 행복(eudaimonia)의 의미”, 『철학연구』, 제76집(대구: 대한철학회, 2000)
Aristoteles, Ethica Nicomachea, 이창우, 김재홍, 강상진 옮김,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울: 이제이북스, 2006.
Irwin, T. H., 1991, “The Structure of Aristotelian Happiness”in Ethics (1991), Vol. 101 No. 2,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382-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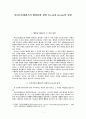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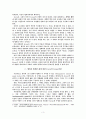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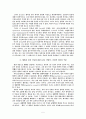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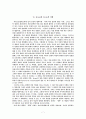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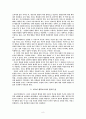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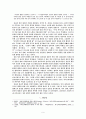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