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풍수(풍수지리사상)의 명칭
Ⅱ. 풍수(풍수지리사상)의 흐름
Ⅲ. 풍수(풍수지리사상)의 목적
Ⅳ. 풍수(풍수지리사상)의 비보
1. 황룡사의 구층탑
2. 안동의 고찰고탑
3. 충주의 중앙탑
Ⅴ. 풍수(풍수지리사상)와 땅의 기운
1. 잠을 자보는 방법
2. 꿈
3. 바위나 암반이 묻혀 있는 경우
4. 우물
Ⅵ. 풍수(풍수지리사상)와 서울
Ⅶ. 명풍수 도선대사의 사례(설화)
참고문헌
Ⅱ. 풍수(풍수지리사상)의 흐름
Ⅲ. 풍수(풍수지리사상)의 목적
Ⅳ. 풍수(풍수지리사상)의 비보
1. 황룡사의 구층탑
2. 안동의 고찰고탑
3. 충주의 중앙탑
Ⅴ. 풍수(풍수지리사상)와 땅의 기운
1. 잠을 자보는 방법
2. 꿈
3. 바위나 암반이 묻혀 있는 경우
4. 우물
Ⅵ. 풍수(풍수지리사상)와 서울
Ⅶ. 명풍수 도선대사의 사례(설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날도 눈이 펑펑 내려 문밖 출입은 생각지도 못하고 방안에서 삯바느질을 하다가 졸음이 몰려와서 한 손에 바늘을 든 채 벽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그러자 꿈속에서 백발도사가 나타나 큰소리로 이렇게 외쳐댔다.
\"오! 가엾구나. 그대의 착한 마음 때문에 내가 왔다. 얼른 일어나 마을 우물가로 가보아라. 거기에 파란 오이가 하나 있을 터이니 그것을 아무도 보지 않게 먹어라!\"
잠에서 깨어난 대사의 어머니는 도사가 현몽한 대로 마을 우물가로 가보았다. 과연 꿈속에서 도사가 말한 것 같이 파란 오이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오이를 치마폭에 싸 가지고 와서 누가 볼까 두려워 금방 먹어 치웠다. 그런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나자 대사 어머니의 배가 차츰차츰 불어나는 것이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남 보기가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고민하다가 그만 마을을 떠나 산기슭에 움막을 치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모진 통증을 참으며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 먹을 것도 없고 남들이 눈치라도 채는 날에는 괴이하게 여길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아이를 숲 속에 버려두고 전에 살던 마을 집으로 돌아와 하룻밤을 지냈다. 하지만 숲 속에 버려둔 아이 생각 때문에 마음이 놓이지 않아 그 숲 속으로 다시 찾아가 보았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버린 아이를 비둘기들이 모여서 감싸고 있는 것이었다. 신기하게 느낀 대사 어머니는 이 아이가 보통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데려다 기르기로 마음을 고쳐먹고는 ‘숲 속에 버려진 아이를 비둘기들이 돌봤다‘는 뜻에서 아이 이름을 구림(鳩林)이라 불렀다.
그 후, 아이는 아무 탈 없이 무럭무럭 자랐으나 13살 때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 올 데 갈 데가 없게 되었다.
마침내 그 아이는 입산수도(入山修道)하여 법명을 도선(道詵)이라 하였다. 성장하여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다가 하루는 송악에서 머무르고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좋은 정기를 받은 길지(吉地)가 발견되었다. 멀리서 바라보이는 그 길지는 오색 무지개가 서려있는 것처럼 보여 대사는 그곳을 직접 가보기로 했다. 가서 보니 그 근처에다 집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왕융이란 사람이었는데 대사는 그에게 길지를 가리키며,
“저기에다 새로운 집을 짓게 되면 틀림없이 왕이 될 큰 인물이 나올 것이오.”
깜짝 놀란 왕융은 대사에게,
\"그러나 지금은 제가 자식하나 없는데 대사의 이야기와는 전혀 거리가 먼 듯하오. 혹 제가 집을 지을 길지가 아닌 게 아닌 지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도선 대사가 껄껄 웃으면서,
\"이곳 산수(山水)는 빼어난 곳이 많아 내가 시키는 대로 집을 짓는다면 반드시 득남하게 되는데 이는 단순한 득남이 아니고 득국(得國)까지 하게 될 것이오.\"
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왕융은 대사가 시키는 대로 집을 지었다. 집을 짓고 2년이 될 무렵쯤 옥동자를 얻었는데 그 옥동자가 바로 후일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王建)이었다.
왕건은 고려 태조가 된 후, 도읍을 송악으로 정하고 국가 부흥에 힘썼다. 한편 대사는 고려의 도읍 송악을 보고 적어도 8백여 년 정도는 고려가 이어갈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런지 얼마 후, 다시 그 자리에 서서 도읍지 송악을 바라보니 옛날에 볼 때와는 판이하게 다르게 보였다. 이상하다 싶어 자세히 살펴본 결과, 동남쪽에 적기(赤氣)가 보였으므로 이는 군사들이 고려에 쳐들어올 조짐이라며 ‘전날 8백년 도읍지라 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고 4백년 정도면 그 기운이 쇠약하여 도읍을 옮겨야 된다.’고 예언했다. 고려 왕실에서는 크게 걱정을 하면서 최소한 8백년 정도로 고려의 맥을 이을 수 있는 비책을 물었다. 대사는 인간에게도 운명이 있듯이 국가에도 흥왕기가 있어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그런데도 계속 그 비책을 물어오자, 내 흉중에 비책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후일에 그 효과에 대해서는 자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도 최선책을 알려달라는 부탁에 대사는 우선 적기(赤氣)가 강하게 운집돼 있는 동남쪽을 향하여 돌 75개로 개(犬)의 형상을 만들어 배치하라고 하였다. 의아하게 생각한 고려 대신들은 그 까닭을 알려 달라고 대사에게 간청을 하였다. 그러자 대사는,
\"적기가 있는 동남쪽은 조화(造化)의 상징인 용(龍)이 있는 곳인데 이 용을 칠 수 있는 기운은 오직 개(戌)이고, 역학(易學)상 용을 뜻하는 진(辰))과 개를 뜻하는 술(戌)이 진술충살(辰戌殺)이 되므로 동남쪽에 있는 강한 기운인 용(龍)은 강한 개(犬)를 만남으로써 자연히 힘이 쇠약해지오.\"
라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오래도록 흥왕하기를 고대하던 고려도 대사의 예언대로 4백 75년 만에 멸망했지만 헤아릴 수 없는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왕조를 연장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었다. 나라가 점점 쇠퇴해지는 징후가 보이자 갖가지 소문이 파다해져 갔고, 특히 문종(文宗)시대부터는 장차 이씨(李氏) 성을 가진 사람이 한양에 도읍을 정하고 고려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등의 풍수지리설에 의한 유언비어가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그러자 고려 조정에서는 불안한 나머지 충숙왕 때에는 한양에 남경(南京)을 별도로 두고 이씨(李氏) 성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관할케 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한양의 명산인 삼각산(三角山) 근처에 오얏나무를 수없이 심어 놓고 무성하게 큰 숲을 이루면 불시에 벌목해 버리는 웃지 못할 방법까지 동원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까닭은 결국 이씨(李氏)는 오얏나무 이자(李字)이므로, 만에 하나라도 있을지 모르는 이씨 왕조의 싹을 사전에 잘라버린다는 의미에서였다. 그 후, 세상사람들은 그곳을 오얏나무를 베어냈다는 의미에서 벌리(伐李)라고 부르게 되었다.
참고문헌
○ 우영재(2002), 대권과 풍수 - 地氣를 해부하다, 관음출판사
○ 조해식, 영남 사대 길지마을의 풍수지리적 고찰
○ 최창조(1984),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 최창조(1992),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함인가, 서해문집
○ 최원석(1992), 풍수의 입장에서 본 한민족의 산 개념 : 천산, 용산, 그리고 인간화, 지리학논총 19
○ 최영주(1994), 신 한국풍수, 동학사
\"오! 가엾구나. 그대의 착한 마음 때문에 내가 왔다. 얼른 일어나 마을 우물가로 가보아라. 거기에 파란 오이가 하나 있을 터이니 그것을 아무도 보지 않게 먹어라!\"
잠에서 깨어난 대사의 어머니는 도사가 현몽한 대로 마을 우물가로 가보았다. 과연 꿈속에서 도사가 말한 것 같이 파란 오이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오이를 치마폭에 싸 가지고 와서 누가 볼까 두려워 금방 먹어 치웠다. 그런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나자 대사 어머니의 배가 차츰차츰 불어나는 것이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남 보기가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고민하다가 그만 마을을 떠나 산기슭에 움막을 치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모진 통증을 참으며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 먹을 것도 없고 남들이 눈치라도 채는 날에는 괴이하게 여길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아이를 숲 속에 버려두고 전에 살던 마을 집으로 돌아와 하룻밤을 지냈다. 하지만 숲 속에 버려둔 아이 생각 때문에 마음이 놓이지 않아 그 숲 속으로 다시 찾아가 보았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버린 아이를 비둘기들이 모여서 감싸고 있는 것이었다. 신기하게 느낀 대사 어머니는 이 아이가 보통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데려다 기르기로 마음을 고쳐먹고는 ‘숲 속에 버려진 아이를 비둘기들이 돌봤다‘는 뜻에서 아이 이름을 구림(鳩林)이라 불렀다.
그 후, 아이는 아무 탈 없이 무럭무럭 자랐으나 13살 때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 올 데 갈 데가 없게 되었다.
마침내 그 아이는 입산수도(入山修道)하여 법명을 도선(道詵)이라 하였다. 성장하여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다가 하루는 송악에서 머무르고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좋은 정기를 받은 길지(吉地)가 발견되었다. 멀리서 바라보이는 그 길지는 오색 무지개가 서려있는 것처럼 보여 대사는 그곳을 직접 가보기로 했다. 가서 보니 그 근처에다 집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왕융이란 사람이었는데 대사는 그에게 길지를 가리키며,
“저기에다 새로운 집을 짓게 되면 틀림없이 왕이 될 큰 인물이 나올 것이오.”
깜짝 놀란 왕융은 대사에게,
\"그러나 지금은 제가 자식하나 없는데 대사의 이야기와는 전혀 거리가 먼 듯하오. 혹 제가 집을 지을 길지가 아닌 게 아닌 지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도선 대사가 껄껄 웃으면서,
\"이곳 산수(山水)는 빼어난 곳이 많아 내가 시키는 대로 집을 짓는다면 반드시 득남하게 되는데 이는 단순한 득남이 아니고 득국(得國)까지 하게 될 것이오.\"
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왕융은 대사가 시키는 대로 집을 지었다. 집을 짓고 2년이 될 무렵쯤 옥동자를 얻었는데 그 옥동자가 바로 후일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王建)이었다.
왕건은 고려 태조가 된 후, 도읍을 송악으로 정하고 국가 부흥에 힘썼다. 한편 대사는 고려의 도읍 송악을 보고 적어도 8백여 년 정도는 고려가 이어갈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런지 얼마 후, 다시 그 자리에 서서 도읍지 송악을 바라보니 옛날에 볼 때와는 판이하게 다르게 보였다. 이상하다 싶어 자세히 살펴본 결과, 동남쪽에 적기(赤氣)가 보였으므로 이는 군사들이 고려에 쳐들어올 조짐이라며 ‘전날 8백년 도읍지라 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고 4백년 정도면 그 기운이 쇠약하여 도읍을 옮겨야 된다.’고 예언했다. 고려 왕실에서는 크게 걱정을 하면서 최소한 8백년 정도로 고려의 맥을 이을 수 있는 비책을 물었다. 대사는 인간에게도 운명이 있듯이 국가에도 흥왕기가 있어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그런데도 계속 그 비책을 물어오자, 내 흉중에 비책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후일에 그 효과에 대해서는 자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도 최선책을 알려달라는 부탁에 대사는 우선 적기(赤氣)가 강하게 운집돼 있는 동남쪽을 향하여 돌 75개로 개(犬)의 형상을 만들어 배치하라고 하였다. 의아하게 생각한 고려 대신들은 그 까닭을 알려 달라고 대사에게 간청을 하였다. 그러자 대사는,
\"적기가 있는 동남쪽은 조화(造化)의 상징인 용(龍)이 있는 곳인데 이 용을 칠 수 있는 기운은 오직 개(戌)이고, 역학(易學)상 용을 뜻하는 진(辰))과 개를 뜻하는 술(戌)이 진술충살(辰戌殺)이 되므로 동남쪽에 있는 강한 기운인 용(龍)은 강한 개(犬)를 만남으로써 자연히 힘이 쇠약해지오.\"
라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오래도록 흥왕하기를 고대하던 고려도 대사의 예언대로 4백 75년 만에 멸망했지만 헤아릴 수 없는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왕조를 연장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었다. 나라가 점점 쇠퇴해지는 징후가 보이자 갖가지 소문이 파다해져 갔고, 특히 문종(文宗)시대부터는 장차 이씨(李氏) 성을 가진 사람이 한양에 도읍을 정하고 고려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등의 풍수지리설에 의한 유언비어가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그러자 고려 조정에서는 불안한 나머지 충숙왕 때에는 한양에 남경(南京)을 별도로 두고 이씨(李氏) 성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관할케 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한양의 명산인 삼각산(三角山) 근처에 오얏나무를 수없이 심어 놓고 무성하게 큰 숲을 이루면 불시에 벌목해 버리는 웃지 못할 방법까지 동원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까닭은 결국 이씨(李氏)는 오얏나무 이자(李字)이므로, 만에 하나라도 있을지 모르는 이씨 왕조의 싹을 사전에 잘라버린다는 의미에서였다. 그 후, 세상사람들은 그곳을 오얏나무를 베어냈다는 의미에서 벌리(伐李)라고 부르게 되었다.
참고문헌
○ 우영재(2002), 대권과 풍수 - 地氣를 해부하다, 관음출판사
○ 조해식, 영남 사대 길지마을의 풍수지리적 고찰
○ 최창조(1984),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 최창조(1992),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함인가, 서해문집
○ 최원석(1992), 풍수의 입장에서 본 한민족의 산 개념 : 천산, 용산, 그리고 인간화, 지리학논총 19
○ 최영주(1994), 신 한국풍수, 동학사
추천자료
 러시아 정치,문화,지리,역사
러시아 정치,문화,지리,역사 정치 지리학
정치 지리학 인문지리학 원리을 읽고
인문지리학 원리을 읽고 송광사와 선암사의 가람배치의 비교 분석과 현대 지리학적 접근
송광사와 선암사의 가람배치의 비교 분석과 현대 지리학적 접근 GIS(지리정보시스템)의 모든것
GIS(지리정보시스템)의 모든것 마을의 풍수적 입지
마을의 풍수적 입지 침실 풍수인테리어 기법
침실 풍수인테리어 기법 [지리]이중환의 택리지
[지리]이중환의 택리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하는 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하는 일 콜롬버스의 지리상의 발견에 대한 고찰
콜롬버스의 지리상의 발견에 대한 고찰 [인도][인도문화][인도의 문화][인도 지리환경][인도 언어][인도 종교][인도 축제]인도의 지...
[인도][인도문화][인도의 문화][인도 지리환경][인도 언어][인도 종교][인도 축제]인도의 지... [경제학][노동경제학][경영경제학][고전경제학][후생경제학][경제성공학][경제사회학][경제지...
[경제학][노동경제학][경영경제학][고전경제학][후생경제학][경제성공학][경제사회학][경제지... [중국의 경제지리를 읽는다],[중국의 문화지리를 읽는다]
[중국의 경제지리를 읽는다],[중국의 문화지리를 읽는다] 한국지리여행 - 자연지리여행적 관점에서 소개하시오 ( 창녕 우포늪 )
한국지리여행 - 자연지리여행적 관점에서 소개하시오 ( 창녕 우포늪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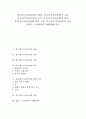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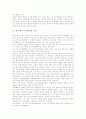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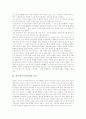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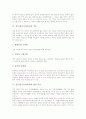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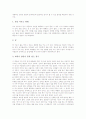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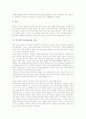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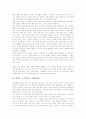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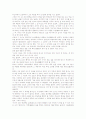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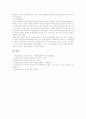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