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무속(무속신앙)의 개념
Ⅲ. 무속(무속신앙)의 내외개념
Ⅳ. 무속(무속신앙)의 사상
Ⅴ. 무속(무속신앙)의 구조
Ⅵ. 무속(무속신앙)의 현세적 행복주의
Ⅶ. 무속(무속신앙)과 유교
Ⅷ. 무속(무속신앙)과 불교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Ⅱ. 무속(무속신앙)의 개념
Ⅲ. 무속(무속신앙)의 내외개념
Ⅳ. 무속(무속신앙)의 사상
Ⅴ. 무속(무속신앙)의 구조
Ⅵ. 무속(무속신앙)의 현세적 행복주의
Ⅶ. 무속(무속신앙)과 유교
Ⅷ. 무속(무속신앙)과 불교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안을 드렸고, 그 중의 한 아들인 처용(處容)을 보내어 왕을 보좌하게 하였다.
순정공(純貞公)은 아내인 수로부인(水路夫人)과 함께 강릉에 갔다가 해룡에게 납치당한 일도 있었다. 백제의 무왕은 그의 어머니와 남지(南池)의 지룡(池龍)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전한다. 이들은 모두 물에 사는 용과 인간과를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민간신앙의 한 유형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삼국유사≫ 등에는 역신과 동물신, 기타 특별히 이름을 명확히 할 수 없는 신들이 나타나고 있다. 병의 신인 역신은 처용의 설화에 나타나고 있다.
역신이 사람으로 변하여 천하의 절색인 처용의 처와 관계를 맺었으나 이를 본 처용은 오히려 태연한 자세를 보였으므로, 역신이 감동하여 처용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침범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였다. 그 뒤부터 민간에서는 역신을 쫓기 위한 처용 부적이 생겼다고 한다.
소지왕 때의 사금갑(射琴匣) 고사에는 까마귀쥐돼지 등의 신령스러운 동물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원성왕 때의 김현(金現)이 흥륜사(興輪寺)에서 미녀를 만나 정을 통한 뒤에 알고 보니 호랑(虎娘)이었다는 것, 진성여왕 때의 활의 명수였던 거타지(居陀知)가 해룡의 청으로 고도(孤島)에 남아 있다가 괴신을 활로 쏘았는데 늙은 여우의 정(精)이었다는 것, 선덕여왕이 병들었을 때 밀교 승려 밀본(密本)이 ≪약사경≫을 읽은 뒤 손에 쥐고 있던 석장(錫杖)을 날려 보내니 늙은 여우를 잡아 마당에다 쓰러뜨렸다는 이야기 등은 모두가 동물신에 관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여우의 신인 호신(狐神)은 신앙의 대상이 되는 선신이라기보다는 악한 신으로 간주되었다. 이 밖에 잡신으로는 진지왕과 도화녀(桃花女)가 생전에 나누지 못한 정을 죽어서 이루어 낳은 비형(鼻荊), 선덕왕 때 어린 김양도(金良圖)를 벙어리로 만들어 버린 뒤 횡포를 부렸던 대귀(大鬼)소귀(小鬼)에 얽힌 설화 등은 도깨비신앙의 모태가 되었다고도 보고 있다.
그리고 민간신앙에서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장승 또한 신라 때부터 있었다.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산선원(雲門山禪院)에는 장생이 있었고, 운문산선원의 장생표탑(長生標塔) 공문에는 청도 경내에 장승 11개가 있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당시에 장승의 수가 매우 많았으며, 장승이 사찰과 관계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으로 보아 불교는 삼국시대에 전파되고,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서 현대에 이르는 동안, 민간신앙을 상당히 포용한다는 걸 잘 알 수 있다. 절에 가보면 산신각이나 칠성각등, 원래 불교와 상관없는 건물들이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것은 불교가 포교를 위해서 한국 고유의 민간신앙을 흡수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나가다 보이는 무속인의 집을 알려주는 절 모양의 표시도 이런 이유인 것 같다.
즉 불교는 민간신앙을 끌어들여서 하나의 종교적인 요소로 동화를 시켰다. 하지만, 이것이 불교 정통의 불법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부수적인 요소일 뿐. 불교는 원래 현세구복적 종교가 아니지만 끌어들인 민간신앙은 구복적 요소를 충족시킨다. 이 요소를 계기로 민중계층으로 불교를 파고들게 만든다. 따라서 불교와 민간신앙은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두 신앙을 같다고 보면 안 될 것 같다.
무속신앙을 미신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불교가 무속신앙을 이용하여 민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었는데 왜 불교는 떳떳한 하나의 종교로 인정받고 무속신앙은 미신으로 치부되는 것일까.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아서 라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숭배하고 받들었던 것들을 믿어 주고 싶다.
Ⅸ. 결론 및 제언
우리가 무속을 우리 문화의 원류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속과 자연과학을 융합하거나 조화시키기 위한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먼저 소위 과학적 태도에 익숙하다고 믿는 사람, 혹은 과학적 태도와 기독교적 신앙이 잘 조화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무속에 대해서 갖는 편견부터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무속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가운데 한 가지는 기독교가 과학과 잘 조화될 수 있는데 비해서 무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과학자가 교회에 나가는 것은 자연스런 일인데 비해서 과학자가 굿판에 참여하는 것은 조금 이상한 일로 여겨진다. 그것은 기독교가 고등종교인데 비해서, 무속은 주술이요, 미신이라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서양문화에 있어서 기독교와 과학 사이의 반목과 갈등, 그리고 상호작용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갈릴레오 사건으로부터 뉴턴 역학에 대한 논쟁, 그리고 진화론을 둘러싼 신학적 갈등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와 자연과학을 절충하고 쌍방의 접점을 찾으려는 서구인들의 노력이 오늘날 기독교와 자연과학 사이의 외면적 조화를 가져온 것이다. 기독교와 과학 사이의 만남의 역사가 완전히 이질적인 논리와 세계관, 문제해결 양식을 가진 두 문화가 오늘날 그런대로 공존할 수 있게 한 배경이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전통종교인 무속과 자연과학을 서로 만나게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우리가 한 일이 있다면 무속을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미신으로 몰고, 타파의 대상으로 여긴 것뿐이다. 비과학적인 점에 있어서는 무속이나 기독교나 마찬가지다. 차이가 있다면 서양에는 기독교와 과학적 세계관을 조화시키는 기계론과 설계논변, 기독교적 다윈주의, 과학과 종교의 이원론 등이 있었던 데 비해서,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과연 무속이 주술이고, 미신인가 하는 문제는 그러한 노력이 선행된 후에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다.
참고문헌
김인회 / 한국무속사상연구, 집문당, 1987
김태곤 / 무속과 불교의 습합, 무속신앙, 교문사, 1989
김헌선 / 한국 화랭이 무속의 역사와 원리 1, 집문당, 1997
금장태 / 한국 근대의 유교사상,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장주근 / 무속편,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경기편, 문화재관리국, 1978
제 바야르마 / 한국과 몽골의 무속신앙 비교연구 : 한국의 강신무와 세습무를 중심으로, 강원 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순정공(純貞公)은 아내인 수로부인(水路夫人)과 함께 강릉에 갔다가 해룡에게 납치당한 일도 있었다. 백제의 무왕은 그의 어머니와 남지(南池)의 지룡(池龍)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전한다. 이들은 모두 물에 사는 용과 인간과를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민간신앙의 한 유형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삼국유사≫ 등에는 역신과 동물신, 기타 특별히 이름을 명확히 할 수 없는 신들이 나타나고 있다. 병의 신인 역신은 처용의 설화에 나타나고 있다.
역신이 사람으로 변하여 천하의 절색인 처용의 처와 관계를 맺었으나 이를 본 처용은 오히려 태연한 자세를 보였으므로, 역신이 감동하여 처용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침범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였다. 그 뒤부터 민간에서는 역신을 쫓기 위한 처용 부적이 생겼다고 한다.
소지왕 때의 사금갑(射琴匣) 고사에는 까마귀쥐돼지 등의 신령스러운 동물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원성왕 때의 김현(金現)이 흥륜사(興輪寺)에서 미녀를 만나 정을 통한 뒤에 알고 보니 호랑(虎娘)이었다는 것, 진성여왕 때의 활의 명수였던 거타지(居陀知)가 해룡의 청으로 고도(孤島)에 남아 있다가 괴신을 활로 쏘았는데 늙은 여우의 정(精)이었다는 것, 선덕여왕이 병들었을 때 밀교 승려 밀본(密本)이 ≪약사경≫을 읽은 뒤 손에 쥐고 있던 석장(錫杖)을 날려 보내니 늙은 여우를 잡아 마당에다 쓰러뜨렸다는 이야기 등은 모두가 동물신에 관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여우의 신인 호신(狐神)은 신앙의 대상이 되는 선신이라기보다는 악한 신으로 간주되었다. 이 밖에 잡신으로는 진지왕과 도화녀(桃花女)가 생전에 나누지 못한 정을 죽어서 이루어 낳은 비형(鼻荊), 선덕왕 때 어린 김양도(金良圖)를 벙어리로 만들어 버린 뒤 횡포를 부렸던 대귀(大鬼)소귀(小鬼)에 얽힌 설화 등은 도깨비신앙의 모태가 되었다고도 보고 있다.
그리고 민간신앙에서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장승 또한 신라 때부터 있었다.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산선원(雲門山禪院)에는 장생이 있었고, 운문산선원의 장생표탑(長生標塔) 공문에는 청도 경내에 장승 11개가 있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당시에 장승의 수가 매우 많았으며, 장승이 사찰과 관계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으로 보아 불교는 삼국시대에 전파되고,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서 현대에 이르는 동안, 민간신앙을 상당히 포용한다는 걸 잘 알 수 있다. 절에 가보면 산신각이나 칠성각등, 원래 불교와 상관없는 건물들이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것은 불교가 포교를 위해서 한국 고유의 민간신앙을 흡수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나가다 보이는 무속인의 집을 알려주는 절 모양의 표시도 이런 이유인 것 같다.
즉 불교는 민간신앙을 끌어들여서 하나의 종교적인 요소로 동화를 시켰다. 하지만, 이것이 불교 정통의 불법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부수적인 요소일 뿐. 불교는 원래 현세구복적 종교가 아니지만 끌어들인 민간신앙은 구복적 요소를 충족시킨다. 이 요소를 계기로 민중계층으로 불교를 파고들게 만든다. 따라서 불교와 민간신앙은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두 신앙을 같다고 보면 안 될 것 같다.
무속신앙을 미신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불교가 무속신앙을 이용하여 민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었는데 왜 불교는 떳떳한 하나의 종교로 인정받고 무속신앙은 미신으로 치부되는 것일까.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아서 라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숭배하고 받들었던 것들을 믿어 주고 싶다.
Ⅸ. 결론 및 제언
우리가 무속을 우리 문화의 원류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속과 자연과학을 융합하거나 조화시키기 위한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먼저 소위 과학적 태도에 익숙하다고 믿는 사람, 혹은 과학적 태도와 기독교적 신앙이 잘 조화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무속에 대해서 갖는 편견부터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무속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가운데 한 가지는 기독교가 과학과 잘 조화될 수 있는데 비해서 무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과학자가 교회에 나가는 것은 자연스런 일인데 비해서 과학자가 굿판에 참여하는 것은 조금 이상한 일로 여겨진다. 그것은 기독교가 고등종교인데 비해서, 무속은 주술이요, 미신이라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서양문화에 있어서 기독교와 과학 사이의 반목과 갈등, 그리고 상호작용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갈릴레오 사건으로부터 뉴턴 역학에 대한 논쟁, 그리고 진화론을 둘러싼 신학적 갈등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와 자연과학을 절충하고 쌍방의 접점을 찾으려는 서구인들의 노력이 오늘날 기독교와 자연과학 사이의 외면적 조화를 가져온 것이다. 기독교와 과학 사이의 만남의 역사가 완전히 이질적인 논리와 세계관, 문제해결 양식을 가진 두 문화가 오늘날 그런대로 공존할 수 있게 한 배경이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전통종교인 무속과 자연과학을 서로 만나게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우리가 한 일이 있다면 무속을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미신으로 몰고, 타파의 대상으로 여긴 것뿐이다. 비과학적인 점에 있어서는 무속이나 기독교나 마찬가지다. 차이가 있다면 서양에는 기독교와 과학적 세계관을 조화시키는 기계론과 설계논변, 기독교적 다윈주의, 과학과 종교의 이원론 등이 있었던 데 비해서,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과연 무속이 주술이고, 미신인가 하는 문제는 그러한 노력이 선행된 후에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다.
참고문헌
김인회 / 한국무속사상연구, 집문당, 1987
김태곤 / 무속과 불교의 습합, 무속신앙, 교문사, 1989
김헌선 / 한국 화랭이 무속의 역사와 원리 1, 집문당, 1997
금장태 / 한국 근대의 유교사상,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장주근 / 무속편,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경기편, 문화재관리국, 1978
제 바야르마 / 한국과 몽골의 무속신앙 비교연구 : 한국의 강신무와 세습무를 중심으로, 강원 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추천자료
 무속과 무속신앙
무속과 무속신앙 무속(무속신앙)의 성격, 무속(무속신앙)의 윤리관, 무속(무속신앙)의 범위, 무속(무속신앙)의...
무속(무속신앙)의 성격, 무속(무속신앙)의 윤리관, 무속(무속신앙)의 범위, 무속(무속신앙)의... 무(巫, 무속, 무속신앙) 유형, 무(巫, 무속, 무속신앙) 역사, 무(巫, 무속, 무속신앙) 사상, ...
무(巫, 무속, 무속신앙) 유형, 무(巫, 무속, 무속신앙) 역사, 무(巫, 무속, 무속신앙) 사상, ... 무속(무속신앙)의 정의, 무속(무속신앙)의 성격, 무속(무속신앙)의 사생관, 무속(무속신앙)의...
무속(무속신앙)의 정의, 무속(무속신앙)의 성격, 무속(무속신앙)의 사생관, 무속(무속신앙)의... [무속]무속(무속신앙)의 역사, 무속(무속신앙)의 인간중심주의, 무속(무속신앙)의 원형, 무속...
[무속]무속(무속신앙)의 역사, 무속(무속신앙)의 인간중심주의, 무속(무속신앙)의 원형, 무속... 무(무속신앙, 무속)의 개념, 무(무속신앙, 무속)의 유형, 무(무속신앙, 무속)의 특징, 무(무...
무(무속신앙, 무속)의 개념, 무(무속신앙, 무속)의 유형, 무(무속신앙, 무속)의 특징, 무(무... [무][巫][무속][무속신앙][무가][무가의 연구][여성성][서정성]무(巫, 무속, 무속신앙)의 정...
[무][巫][무속][무속신앙][무가][무가의 연구][여성성][서정성]무(巫, 무속, 무속신앙)의 정... 무속(무속신앙)의 특성, 무속(무속신앙)의 역사, 무속(무속신앙)의 지연성, 무속(무속신앙)의...
무속(무속신앙)의 특성, 무속(무속신앙)의 역사, 무속(무속신앙)의 지연성, 무속(무속신앙)의... 무속신앙.무교.굿 - 천기누설 무속종교
무속신앙.무교.굿 - 천기누설 무속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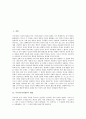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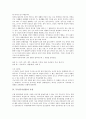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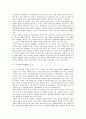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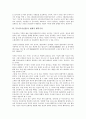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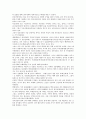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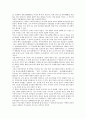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