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유신체제의 성립
2. 국가능력
3. 중화학공업화 전개
4. 중화학공업화의 결과와 평가
2. 국가능력
3. 중화학공업화 전개
4. 중화학공업화의 결과와 평가
본문내용
인은 중화학공업에 대한 무리한 투자에서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제2차 석유파동과 10.26에 의한 국내정치의 혼란에서 온 것이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의 경제회복이 자동차 등의 중화학공업의 주도로 이루어졌음을 고려한다면 중화학공업의 추진이 실패했다는 결론은 성급한 것이다.
한편, 한국정치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은 대부분 유신체제가 가장 강력한 국가능력을 지니고 노동을 강력하게 통제했다는 점에 동의한다.
특히 유신체제의 후반기 4년 (1976~1979년)은 전반기 4년에 비하여 이러한 양상이 두드러진다. 즉 유신체제의 임금규제는 고도의 국가능력에 기초한 정치적 억압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경제성장의 혜택 배분에서 임노동자를 완전히 배제시킬 만큼 억압적이지는 못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유신체제의 몰락이 임노동자의 배제에 의한 분배위기의 결과라는 논의는 수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고도의 억압적 기구를 지니고도 철저하게 저임금을 유지하려고 했던 임금정책이 왜 실패를 하게되었는가? 70년대 전반부에는 價格統制가 어느 정도 성공한 덕분에 임금규제에 실효를 거둘 수 있었다. 노동조합 역시 비상조치의 발동과 노조지도부에 대한 탄압과 회유 때문에 활동이 금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1974년부터 국가는 노동에 대한 탄압을 완화하기 시작하였는데, 1월 14일의 긴급조치 제4호가 그 효시가 되었다. 이는 유신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묻는 찬반투표를 앞두고 노동자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박정권의 회유책과 가격통제의 와해, 노동력 부족의 대두에 의한 노동자의 경쟁력 상승 등의 구조적 변화가 국가의 노동정치에 대한 자율성을 제약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의 경제회복이 자동차 등의 중화학공업의 주도로 이루어졌음을 고려한다면 중화학공업의 추진이 실패했다는 결론은 성급한 것이다.
한편, 한국정치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은 대부분 유신체제가 가장 강력한 국가능력을 지니고 노동을 강력하게 통제했다는 점에 동의한다.
특히 유신체제의 후반기 4년 (1976~1979년)은 전반기 4년에 비하여 이러한 양상이 두드러진다. 즉 유신체제의 임금규제는 고도의 국가능력에 기초한 정치적 억압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경제성장의 혜택 배분에서 임노동자를 완전히 배제시킬 만큼 억압적이지는 못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유신체제의 몰락이 임노동자의 배제에 의한 분배위기의 결과라는 논의는 수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고도의 억압적 기구를 지니고도 철저하게 저임금을 유지하려고 했던 임금정책이 왜 실패를 하게되었는가? 70년대 전반부에는 價格統制가 어느 정도 성공한 덕분에 임금규제에 실효를 거둘 수 있었다. 노동조합 역시 비상조치의 발동과 노조지도부에 대한 탄압과 회유 때문에 활동이 금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1974년부터 국가는 노동에 대한 탄압을 완화하기 시작하였는데, 1월 14일의 긴급조치 제4호가 그 효시가 되었다. 이는 유신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묻는 찬반투표를 앞두고 노동자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박정권의 회유책과 가격통제의 와해, 노동력 부족의 대두에 의한 노동자의 경쟁력 상승 등의 구조적 변화가 국가의 노동정치에 대한 자율성을 제약하였다.
키워드
추천자료
 한국경제 변천사(한국 경제사, 한국경제 발전사, 경제발전,경제위기)
한국경제 변천사(한국 경제사, 한국경제 발전사, 경제발전,경제위기) [싱가폴][싱가포르]싱가폴(싱가포르)의 경제발전과 생활상, 싱가폴(싱가포르)의 학교개선사업...
[싱가폴][싱가포르]싱가폴(싱가포르)의 경제발전과 생활상, 싱가폴(싱가포르)의 학교개선사업... 싱가포르 경제발전, 성공요인, 내재적 상황, 외재적 상황, 과정,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의 공...
싱가포르 경제발전, 성공요인, 내재적 상황, 외재적 상황, 과정,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의 공... 러시아 경제발전, 과정, 고르바초프, 옐친, 푸틴 집권기, 경제개혁, 러시아 경제구조의 특징,...
러시아 경제발전, 과정, 고르바초프, 옐친, 푸틴 집권기, 경제개혁, 러시아 경제구조의 특징,... 싱가포르의 경제발전, 성공요인, 과정,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의 비교, 특징, 경제적 효과, 현...
싱가포르의 경제발전, 성공요인, 과정,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의 비교, 특징, 경제적 효과, 현... 카타르의 경제발전, 성공요인, 과정,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의 비교, 특징, 경제적 효과, 현황...
카타르의 경제발전, 성공요인, 과정,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의 비교, 특징, 경제적 효과, 현황... 카타르 경제발전, 성공요인, 과정,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의 비교, 특징, 경제적 효과, 현황, ...
카타르 경제발전, 성공요인, 과정,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의 비교, 특징, 경제적 효과, 현황, ... [한국의 경제발전 전략] 한국의 경제발전과정, 한국경제성장의 특징과 한국경제의 문제점 및 ...
[한국의 경제발전 전략] 한국의 경제발전과정, 한국경제성장의 특징과 한국경제의 문제점 및 ... 일제시대(식민지시대, 일제강점기)의 교육목적, 경제발전, 일제시대(식민지시대, 일제강점기)...
일제시대(식민지시대, 일제강점기)의 교육목적, 경제발전, 일제시대(식민지시대, 일제강점기)... [경제발전의 본질] 경제발전론의 개념과 과제, 경제발전론에 있어서 가치의 역할
[경제발전의 본질] 경제발전론의 개념과 과제, 경제발전론에 있어서 가치의 역할 경제와 경제체제 (경제와 경제학, 경제발전 단계설, 경제체제)
경제와 경제체제 (경제와 경제학, 경제발전 단계설, 경제체제) [세계경제의 발전모델] 경제발전론의 과제, 경제발전모델
[세계경제의 발전모델] 경제발전론의 과제, 경제발전모델 [경제발전과 외식산업의 관계] 경제발전과 외식산업의 관련성, 경제활동 발전단계와 외식산업
[경제발전과 외식산업의 관계] 경제발전과 외식산업의 관련성, 경제활동 발전단계와 외식산업 계급구조의 발전발전하는 계급구조신경제정책 경제발전신경제정책 교육정책동남아시아의 질서...
계급구조의 발전발전하는 계급구조신경제정책 경제발전신경제정책 교육정책동남아시아의 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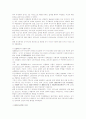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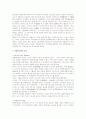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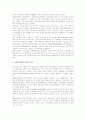










소개글